본문내용
이에 대해 이자나기는 날마다 천오백 명을 태어나게 하겠노라고 응수한다.
천명을 죽이겠다는 신과 천오백명을 태어나게 하겠다는 신이 동시에 보이는 이 건국신화에서는 삶과 죽음, 선과 악의 개념들이 미묘하게 뒤엉켜 있어, 고대 일본인들의 사유방식을 선악을 기준으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와 같이 분명한 선악구분과 삶과 죽음에 대한 객관적 인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즉 고대인의 사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건국신화 역시 가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악에 모호한 전통적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드러내 주고 있다.
하나비에도 이러한 전통적 사유방식이 곳곳에 드러나는데, 고리대금을 하는 사채업자, 총기를 난사해 동료를 부상당하게 하는 흉악범, 후배동료 둘을 죽인 또다른 범인, 그리고 그에게 총기를 난사한 자신 모두에게 특별한 선악의 관념을 주입시키지 않기도 하거니와 최악의 순간에도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을 은행을 털어 보내는 따위의 행동은 절대적인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고래의 관념이 현대적인 냉소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도 하다.
한편 신도의 신관념에서 절대적인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어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는 상대적인 악의 개념은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 즉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를 신도에서는 케가레라고 하는데,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이 케가레는 불변하는 가치기준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라이\'라는 정화의례를 통해 정화되어야 할 무엇이다. 요컨대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를 상대적으로 \'선\'한 상태라고 한다면, 생활 속에서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를 상대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정화의례를 갖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마쓰리에 앞서 케가레를 씻어내어 정화시키는 의례가 행해지는 것은 이러한 의식의 상징성을 염두에 둔 행사라고 한다.
\"이러한 하라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악과 흉(凶)을 씻어내는 정화의례이고 다른 하나는 선과 길(吉)을 불러오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하라이는 통상 동시에 행해진다. 이처럼 선과 악 모두에 관련된 하라이의 정화의식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레의 축제, 마쓰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 산다는 것은 하나의 축제이며 생명력의 누림을 뜻한다. 거기에는 본래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악은 더럽혀진 것일 뿐이며, 그것은 씻어내기만 하면 본래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본래의 생명력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다.\"
박규태, 『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 : 종교로 읽는 일본인의 마음』, 54쪽, 책세상, 2001
이런 의미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하나비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죽기 직전의 여행과 불꽃놀이로 이는 언급한 하레와 마쓰리를 연상시킨다. 상기하듯 하레와 마쓰리는 일상의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시켜 생명력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축제
에밀뒤르켐의 사회학자와 레비나스 등 문화인류학자에 의해 밝혀진 바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문화권의 축제는 공통적으로 일상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다. 하나비에서도 이러한 축제의 의미에 걸맞게 일상의 혼란으로부터 떠나는 여행과 소소한 에피소드, 불꽃놀이는 하레와 마쓰리와 같은 에너지 충전을 위한 축제의 성격이 있기도 하다. 물론 옵티미즘과 페시미즘이 불분명하게 뒤섞여 있는 고래의 사유와는 다르게 페시미즘이 전반적으로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 탓으로(가령 일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현실 즉 아내의 예정된 죽음, 동료들의 부상, 죽음 등등으로 인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감이 무의미하기에 하레와 마쓰리가 두발의 총성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예감한 아내의 고맙다는 말을 뒤로하고. 끊어진 연을 날리는 아이의 천진함 앞에서.
5. 새로운 창조로서 전통의 재현을 위해
돌이켜 살펴보면 제일 처음 만난 일본인이랄 수 있는 『미야모도 무사시』에 대한 탐독(耽讀)은 일종의 절충이랄 수도 있는바, 재미와 호기심을 발동하는 만화라는 정(正, these)과 강제와 감시로 점철된 위인전의 반(反, antitheses)이 미야모도 무사시에 이르러 묘하게 합치되었고, 이는 만화는 아니지만 만화적 재미와 상상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위인전은 아니지만 역사적 정황과 실존인물의 탐색이라는 위인전적인 본성을 유지하되 무협지라는 장르로 융합된, 이른바 변증적(辨證的) 통일 혹은 지향을 이룬 것이었다고 자평(自評)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절충을 전통과 현대란 사회적 관심으로 시선을 돌리면 전통을 계승하는 다양한 시각들에도 시선이 미친다. 가령 감추어진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계승하느냐 하는 문제다. 감추어졌다는 이유에서는 복원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가지지만, 당위가 현실을 보증해 주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임권택의 춘향전이나 취화선 같은 명작들이 전통에 대한 무관심보다야 훨씬 위대하지만, 그렇다고 현대적 보편성을 결여한 우리 것의 복원에 매몰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는 먼나라의 기타노 다께시는 적절한 시사점을 준다.
살펴본 것처럼 그의 영화에는 죽음에 대한 탐구, 모호한 선악관 등 전통적이랄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코드들은 정신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형상화 될 뿐, 그것으로만 매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전통적 사고유형들은 현대인의 심리 공황 상태와 조응하여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 낸다. 가령 사고의 기저에 있는 전통적 사유방식을 드러내면서, 현대인의 문제도 드러내면서. 요컨대 영화사(映畵史)에서 오즈 등의 전통적 영화형식과 뉴웨이브의 새로운 실험정신을 잘 조화한 인물이라는 평은 영화사 이외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고래의 사유방식과 현대인의 심리를 잘 아우른다는 평으로.
전통은 계승되어야 하지만 창조되어서는 안 된다. 전통의 강요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둘째로 하더라도 자칫 현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께시가 이런 면에서 시사를 준다면 아마 언급한 것들이지 않을까 한다.
천명을 죽이겠다는 신과 천오백명을 태어나게 하겠다는 신이 동시에 보이는 이 건국신화에서는 삶과 죽음, 선과 악의 개념들이 미묘하게 뒤엉켜 있어, 고대 일본인들의 사유방식을 선악을 기준으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와 같이 분명한 선악구분과 삶과 죽음에 대한 객관적 인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즉 고대인의 사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건국신화 역시 가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악에 모호한 전통적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드러내 주고 있다.
하나비에도 이러한 전통적 사유방식이 곳곳에 드러나는데, 고리대금을 하는 사채업자, 총기를 난사해 동료를 부상당하게 하는 흉악범, 후배동료 둘을 죽인 또다른 범인, 그리고 그에게 총기를 난사한 자신 모두에게 특별한 선악의 관념을 주입시키지 않기도 하거니와 최악의 순간에도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을 은행을 털어 보내는 따위의 행동은 절대적인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고래의 관념이 현대적인 냉소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도 하다.
한편 신도의 신관념에서 절대적인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어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는 상대적인 악의 개념은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 즉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를 신도에서는 케가레라고 하는데,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이 케가레는 불변하는 가치기준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라이\'라는 정화의례를 통해 정화되어야 할 무엇이다. 요컨대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를 상대적으로 \'선\'한 상태라고 한다면, 생활 속에서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를 상대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정화의례를 갖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마쓰리에 앞서 케가레를 씻어내어 정화시키는 의례가 행해지는 것은 이러한 의식의 상징성을 염두에 둔 행사라고 한다.
\"이러한 하라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악과 흉(凶)을 씻어내는 정화의례이고 다른 하나는 선과 길(吉)을 불러오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하라이는 통상 동시에 행해진다. 이처럼 선과 악 모두에 관련된 하라이의 정화의식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레의 축제, 마쓰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 산다는 것은 하나의 축제이며 생명력의 누림을 뜻한다. 거기에는 본래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악은 더럽혀진 것일 뿐이며, 그것은 씻어내기만 하면 본래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본래의 생명력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다.\"
박규태, 『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 : 종교로 읽는 일본인의 마음』, 54쪽, 책세상, 2001
이런 의미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하나비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죽기 직전의 여행과 불꽃놀이로 이는 언급한 하레와 마쓰리를 연상시킨다. 상기하듯 하레와 마쓰리는 일상의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시켜 생명력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축제
에밀뒤르켐의 사회학자와 레비나스 등 문화인류학자에 의해 밝혀진 바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문화권의 축제는 공통적으로 일상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다. 하나비에서도 이러한 축제의 의미에 걸맞게 일상의 혼란으로부터 떠나는 여행과 소소한 에피소드, 불꽃놀이는 하레와 마쓰리와 같은 에너지 충전을 위한 축제의 성격이 있기도 하다. 물론 옵티미즘과 페시미즘이 불분명하게 뒤섞여 있는 고래의 사유와는 다르게 페시미즘이 전반적으로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 탓으로(가령 일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현실 즉 아내의 예정된 죽음, 동료들의 부상, 죽음 등등으로 인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감이 무의미하기에 하레와 마쓰리가 두발의 총성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예감한 아내의 고맙다는 말을 뒤로하고. 끊어진 연을 날리는 아이의 천진함 앞에서.
5. 새로운 창조로서 전통의 재현을 위해
돌이켜 살펴보면 제일 처음 만난 일본인이랄 수 있는 『미야모도 무사시』에 대한 탐독(耽讀)은 일종의 절충이랄 수도 있는바, 재미와 호기심을 발동하는 만화라는 정(正, these)과 강제와 감시로 점철된 위인전의 반(反, antitheses)이 미야모도 무사시에 이르러 묘하게 합치되었고, 이는 만화는 아니지만 만화적 재미와 상상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위인전은 아니지만 역사적 정황과 실존인물의 탐색이라는 위인전적인 본성을 유지하되 무협지라는 장르로 융합된, 이른바 변증적(辨證的) 통일 혹은 지향을 이룬 것이었다고 자평(自評)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절충을 전통과 현대란 사회적 관심으로 시선을 돌리면 전통을 계승하는 다양한 시각들에도 시선이 미친다. 가령 감추어진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계승하느냐 하는 문제다. 감추어졌다는 이유에서는 복원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가지지만, 당위가 현실을 보증해 주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임권택의 춘향전이나 취화선 같은 명작들이 전통에 대한 무관심보다야 훨씬 위대하지만, 그렇다고 현대적 보편성을 결여한 우리 것의 복원에 매몰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는 먼나라의 기타노 다께시는 적절한 시사점을 준다.
살펴본 것처럼 그의 영화에는 죽음에 대한 탐구, 모호한 선악관 등 전통적이랄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코드들은 정신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형상화 될 뿐, 그것으로만 매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전통적 사고유형들은 현대인의 심리 공황 상태와 조응하여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 낸다. 가령 사고의 기저에 있는 전통적 사유방식을 드러내면서, 현대인의 문제도 드러내면서. 요컨대 영화사(映畵史)에서 오즈 등의 전통적 영화형식과 뉴웨이브의 새로운 실험정신을 잘 조화한 인물이라는 평은 영화사 이외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고래의 사유방식과 현대인의 심리를 잘 아우른다는 평으로.
전통은 계승되어야 하지만 창조되어서는 안 된다. 전통의 강요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둘째로 하더라도 자칫 현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께시가 이런 면에서 시사를 준다면 아마 언급한 것들이지 않을까 한다.
추천자료
 배틀로얄을 통해본 일본청소년들의 문제점
배틀로얄을 통해본 일본청소년들의 문제점 `링`으로 살펴보는 일본문화
`링`으로 살펴보는 일본문화 츠치모토 노리아키의 영화운동과 [미나마타] 시리즈
츠치모토 노리아키의 영화운동과 [미나마타] 시리즈 [인문과학] 냉정과 열정사이, 소설과 영화 분석
[인문과학] 냉정과 열정사이, 소설과 영화 분석 [영어에세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Howl`s Moving Castle - 미야자키 하야오 - Hayao Miyazaki...
[영어에세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Howl`s Moving Castle - 미야자키 하야오 - Hayao Miyazaki... [일본 애니메이션][일본 게임산업]일본 애니메이션(일본 애니메이션의 발전과정과 일본 애니...
[일본 애니메이션][일본 게임산업]일본 애니메이션(일본 애니메이션의 발전과정과 일본 애니... [영어에세이] My Neighbor Totoro 이웃집 토토로 -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일본 애니메이션 ...
[영어에세이] My Neighbor Totoro 이웃집 토토로 -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일본 애니메이션 ... 동아시아 역사와 영화
동아시아 역사와 영화 일본의 역사_일본의 무사도에 대하여
일본의 역사_일본의 무사도에 대하여 영화 shall we dance(일본)와 여가의 관계
영화 shall we dance(일본)와 여가의 관계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리포트)극장판 일본애니메이션의 발전과정과 그 명암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리포트)극장판 일본애니메이션의 발전과정과 그 명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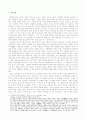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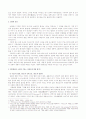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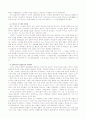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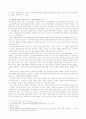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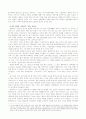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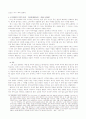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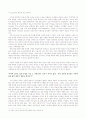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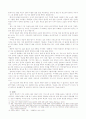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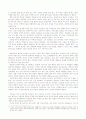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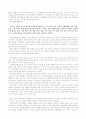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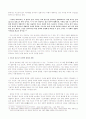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