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대(唐代)의 시대적 배경
2. 성당(盛唐)의 시대적 배경
3. 당시(唐詩)의 흥성원인
4. 당시(唐詩)의 시기별 특징
5. 시선(詩仙) 이백(李白, 701~762)
1) 이백의 생애
2) 사상내용
3) 예술적 특징
4) 문학사적 지위와 후대에 미친 영향
5) 한계성
6. 시성(詩聖) 두보(杜甫, 712~770)
1) 두보의 생애
2) 사상내용
3) 예술적 특징
4) 문학사적 지위와 후대에 미친 영향
5) 한계성
7. 이백과 두보의 비교
※ 작품설명
1. 이백의 작품
① 장진주(將進酒, 이 술 한잔 받으시오)
② 월하독작(月下獨酌,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
2. 두보의 작품
① 석호리(石壕吏, 석호의 관리)
② 춘망(春望, 봄이 왔는데)
# 참고문헌
2. 성당(盛唐)의 시대적 배경
3. 당시(唐詩)의 흥성원인
4. 당시(唐詩)의 시기별 특징
5. 시선(詩仙) 이백(李白, 701~762)
1) 이백의 생애
2) 사상내용
3) 예술적 특징
4) 문학사적 지위와 후대에 미친 영향
5) 한계성
6. 시성(詩聖) 두보(杜甫, 712~770)
1) 두보의 생애
2) 사상내용
3) 예술적 특징
4) 문학사적 지위와 후대에 미친 영향
5) 한계성
7. 이백과 두보의 비교
※ 작품설명
1. 이백의 작품
① 장진주(將進酒, 이 술 한잔 받으시오)
② 월하독작(月下獨酌,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
2. 두보의 작품
① 석호리(石壕吏, 석호의 관리)
② 춘망(春望, 봄이 왔는데)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제목의 원 뜻도 술을 권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백은 이 題名을 빌려 스스로의 인생관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시는 천보(天寶) 11년(752)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양귀비와 얽힌 사연으로 장안(長安)을 쫓겨난 지 7년째 되는 해에 이백은 잠훈(岑勛)과 함께 숭산(嵩山)에 있는 친구 원단구(元丹丘)의 산장에 들렀을 때 술자리에서 이 시를 지었다. 전편을 통하여 \'포용세지재불우합(抱用世之才不遇合)\'한 이백 심중의 울분과 격정이 강렬하게 표출돼 있으며 그 기세가 자못 세차다.
② 월하독작(月下獨酌,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
花 間 一 壺 酒 꽃밭 가운데 술항아리
獨 酌 無 相 親 함께 할 사람 없어 혼자 마신다.
擧 杯 邀 明 月 술잔 들어 밝은 달 모셔오니
對 影 成 三 人 그림자까지 셋이 되었구나.
月 旣 不 解 飮 그러나 달은 술 마실 줄 모르고
影 徒 隨 我 身 그림자 또한 그저 내 몸 따라 움직일 뿐.
暫 伴 月 將 影 그런 대로 달과 그림자 데리고
行 樂 須 及 春 이 봄 가기 전에 즐겨나 보리로다.
我 歌 月 徘 徊 내가 노래하면 달 서성이고
我 舞 影 凌 亂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 함께 어른거린다.
醒 時 同 交 歡 깨어있을 때는 함께 즐기지만
醉 後 各 分 散 취하고 나면 또 제각기 흩어져 가겠지.
永 結 無 情 遊 아무렴 우리끼리의 이 우정 길이 맺어
相 期 邈 雲 漢 이 다음엔 은하수 저쪽에서 다시 만나세.
[해석] 달의 시인, 술의 시인 이백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백이 마치 전 인류의 대표로 멋있게 술 마시는 우주 대회에 참석하여 달과 어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시제인 『月下獨酌』이 전편의 내용을 설명적으로 개괄하고 있다. 꽃, 달빛, 술, 시인, 시인의 그림자, 은하수, 이 밖에는 아무도 없다. 서두에서는 달밤에 꽃밭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외로움을 호소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어우러져 들어가 마침내는 달과 우정을 맺고 미래를 기약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시의 경계가 매우 넓고 사고의 진행이 자유롭다.
2. 두보의 작품
① 석호리(石壕吏, 석호의 관리)
暮 投 石 壕 村 날 저물어 석호촌에 묵었는데
有 吏 夜 捉 人 밤이 되자 관리가 사람을 잡아가네.
老 翁 踰 墻 走 할아범은 담 넘어 도망가고
老 婦 出 看 門 늙은 부인 문 열고 나와 보네.
吏 呼 一 何 怒 관리의 소리 어찌 그리도 노여울까?
婦 啼 一 何 苦 부인의 울음소리 어찌 그리도 괴로울까?
聽 婦 前 致 詞 부인이 나서서 하는 말 들어보니
三 男 城 戍 \"세 아들이 업성 싸움에 출정하였지요.
一 男 附 書 至 한 아들이 서신을 보냈는데
二 男 新 城 死 두 아들이 막 전사했다고 하였소.
存 者 且 偸 生 살아있는 애야 그래도 잠시 살 수 있겠지만
死 者 長 已 矣 죽은 애야 영영 그만이지요.
室 中 更 無 人 집안에 남자라고는 다시없고
惟 有 乳 下 孫 오직 젖먹이 손자가 있을 뿐이라오.
有 孫 母 未 去 며느리가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데
出 入 無 完 裙 출입할 때 입을 변변한 치마가 없기 때문이라오.
老 力 雖 衰 늙은 할멈이라 힘이 비록 쇠잔하기는 하나
請 從 吏 夜 歸 나으리 따라 이 밤에 떠날까 하오.
急 應 河 陽 役 급한 대로 하양의 부역에 응하여
猶 得 備 晨 炊 그럭저럭 새벽밥은 지울 수 있을 게요\"라고 한다.
夜 久 語 聲 絶 밤이 깊어지자 말소리 끊어지고
如 聞 泣 幽 咽 숨 죽여 흐느끼는 소리 들었던 듯하다.
天 明 登 前 途 날이 밝아 앞길에 오를 때
獨 與 老 翁 別 할아버지 한사람과만 작별하였다.
[해석] 석호는 하남성 섬현(陝縣)에 있었던 마을이다. 이 시는 시인이 이 곳에서 한밤에 관리가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인을 마구 잡아가는 참극을 보고 쓴 것이다. 시의 대부분을 부인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형식으로 엮은 것이 특이하다.
② 춘망(春望, 봄이 왔는데)
國 破 山 河 在 나라는 망하였는데도 산과 강은 그대로고
城 春 草 木 深 성에는 봄이 왔는데도 초목만이 우거져 있구나.
感 時 花 淚 시절을 느껴 꽃을 보고도 눈물 뿌리고
恨 別 鳥 驚 心 이별의 한스러움으로 새가 퍼득 나는 소리에도 놀란다.
烽 火 連 三 月 전쟁을 알리는 봉화는 벌써 여러 달째 이어졌고
家 書 抵 萬 金 고향 소식은 만금에 값하리만큼 귀하구나.
白 頭 搔 更 短 흰머리 긁을수록 짧아지고
渾 欲 不 勝 簪 몽땅 휘어 모아도 비녀하나 견디지 못할 정도라네
[해석] 당 숙종 지덕(至德) 원년(756) 6월, 안록산, 사사명(史思明)의 반란군이 수도 장안을 함락시켰다. 7월에 두보는 숙종이 영무(靈武)에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을 잠시 부주( 州)강촌(羌村)에 남겨두고 숙종을 찾아가는 도중 반군에게 붙들려 장안으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두보는 관직이 낮았으므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는 면할 수 있었다. 이 시는 그 다음해 봄 장안성에서 느낀 망국의 한을 읊은 것이다. 이 해 4월 두보는 봉상(鳳翔)으로 도망쳐 나와 숙종에게로 갔다. 자매편으로 『月夜』가 있다.
첫 연은 9개월 동안이나 반군의 유린 하에 있던 장안성의 봄 날 황폐한 모습을 읊은 것이고, 둘째 연은 망국민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며, 셋째 연은 전란 중 가족과 헤어진 사람의 고향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연은 근심과 고생으로 급격히 노쇠한 시인 스스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시를 지을 때의 두보의 나이는 46세였으므로 근심과 고생의 정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장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간추린 중국문학사』, 김장환 엮, 서울학고방, 1997.
2. 『중국문학사의 이해』, 신진호 편, 지영사, 1998.
3. 『중국시가예술연구 下』, 애행패 저, 아세아문화사, 1994.
4. 『중국문학 입문』, 정범진외 공저, 성균관대출판부, 1981.
5. 『중국의 어제와 오늘』, 왕순흥 저, 평민사, 1998.
6. 『이백시신평』, 손종변, 정신세계사, 1996.
7. 『당시선』, 이병한외 공저, 서울대출판부, 1998
8. 『곽말약의 이백과 두보』, 임효섭·황선재 옮김, 도서출판까치, 1996.
9. 『중국문학사 상』, 김영덕외 2 편저, 청년사,
② 월하독작(月下獨酌,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
花 間 一 壺 酒 꽃밭 가운데 술항아리
獨 酌 無 相 親 함께 할 사람 없어 혼자 마신다.
擧 杯 邀 明 月 술잔 들어 밝은 달 모셔오니
對 影 成 三 人 그림자까지 셋이 되었구나.
月 旣 不 解 飮 그러나 달은 술 마실 줄 모르고
影 徒 隨 我 身 그림자 또한 그저 내 몸 따라 움직일 뿐.
暫 伴 月 將 影 그런 대로 달과 그림자 데리고
行 樂 須 及 春 이 봄 가기 전에 즐겨나 보리로다.
我 歌 月 徘 徊 내가 노래하면 달 서성이고
我 舞 影 凌 亂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 함께 어른거린다.
醒 時 同 交 歡 깨어있을 때는 함께 즐기지만
醉 後 各 分 散 취하고 나면 또 제각기 흩어져 가겠지.
永 結 無 情 遊 아무렴 우리끼리의 이 우정 길이 맺어
相 期 邈 雲 漢 이 다음엔 은하수 저쪽에서 다시 만나세.
[해석] 달의 시인, 술의 시인 이백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백이 마치 전 인류의 대표로 멋있게 술 마시는 우주 대회에 참석하여 달과 어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시제인 『月下獨酌』이 전편의 내용을 설명적으로 개괄하고 있다. 꽃, 달빛, 술, 시인, 시인의 그림자, 은하수, 이 밖에는 아무도 없다. 서두에서는 달밤에 꽃밭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외로움을 호소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어우러져 들어가 마침내는 달과 우정을 맺고 미래를 기약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시의 경계가 매우 넓고 사고의 진행이 자유롭다.
2. 두보의 작품
① 석호리(石壕吏, 석호의 관리)
暮 投 石 壕 村 날 저물어 석호촌에 묵었는데
有 吏 夜 捉 人 밤이 되자 관리가 사람을 잡아가네.
老 翁 踰 墻 走 할아범은 담 넘어 도망가고
老 婦 出 看 門 늙은 부인 문 열고 나와 보네.
吏 呼 一 何 怒 관리의 소리 어찌 그리도 노여울까?
婦 啼 一 何 苦 부인의 울음소리 어찌 그리도 괴로울까?
聽 婦 前 致 詞 부인이 나서서 하는 말 들어보니
三 男 城 戍 \"세 아들이 업성 싸움에 출정하였지요.
一 男 附 書 至 한 아들이 서신을 보냈는데
二 男 新 城 死 두 아들이 막 전사했다고 하였소.
存 者 且 偸 生 살아있는 애야 그래도 잠시 살 수 있겠지만
死 者 長 已 矣 죽은 애야 영영 그만이지요.
室 中 更 無 人 집안에 남자라고는 다시없고
惟 有 乳 下 孫 오직 젖먹이 손자가 있을 뿐이라오.
有 孫 母 未 去 며느리가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데
出 入 無 完 裙 출입할 때 입을 변변한 치마가 없기 때문이라오.
老 力 雖 衰 늙은 할멈이라 힘이 비록 쇠잔하기는 하나
請 從 吏 夜 歸 나으리 따라 이 밤에 떠날까 하오.
急 應 河 陽 役 급한 대로 하양의 부역에 응하여
猶 得 備 晨 炊 그럭저럭 새벽밥은 지울 수 있을 게요\"라고 한다.
夜 久 語 聲 絶 밤이 깊어지자 말소리 끊어지고
如 聞 泣 幽 咽 숨 죽여 흐느끼는 소리 들었던 듯하다.
天 明 登 前 途 날이 밝아 앞길에 오를 때
獨 與 老 翁 別 할아버지 한사람과만 작별하였다.
[해석] 석호는 하남성 섬현(陝縣)에 있었던 마을이다. 이 시는 시인이 이 곳에서 한밤에 관리가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인을 마구 잡아가는 참극을 보고 쓴 것이다. 시의 대부분을 부인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형식으로 엮은 것이 특이하다.
② 춘망(春望, 봄이 왔는데)
國 破 山 河 在 나라는 망하였는데도 산과 강은 그대로고
城 春 草 木 深 성에는 봄이 왔는데도 초목만이 우거져 있구나.
感 時 花 淚 시절을 느껴 꽃을 보고도 눈물 뿌리고
恨 別 鳥 驚 心 이별의 한스러움으로 새가 퍼득 나는 소리에도 놀란다.
烽 火 連 三 月 전쟁을 알리는 봉화는 벌써 여러 달째 이어졌고
家 書 抵 萬 金 고향 소식은 만금에 값하리만큼 귀하구나.
白 頭 搔 更 短 흰머리 긁을수록 짧아지고
渾 欲 不 勝 簪 몽땅 휘어 모아도 비녀하나 견디지 못할 정도라네
[해석] 당 숙종 지덕(至德) 원년(756) 6월, 안록산, 사사명(史思明)의 반란군이 수도 장안을 함락시켰다. 7월에 두보는 숙종이 영무(靈武)에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을 잠시 부주( 州)강촌(羌村)에 남겨두고 숙종을 찾아가는 도중 반군에게 붙들려 장안으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두보는 관직이 낮았으므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는 면할 수 있었다. 이 시는 그 다음해 봄 장안성에서 느낀 망국의 한을 읊은 것이다. 이 해 4월 두보는 봉상(鳳翔)으로 도망쳐 나와 숙종에게로 갔다. 자매편으로 『月夜』가 있다.
첫 연은 9개월 동안이나 반군의 유린 하에 있던 장안성의 봄 날 황폐한 모습을 읊은 것이고, 둘째 연은 망국민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며, 셋째 연은 전란 중 가족과 헤어진 사람의 고향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연은 근심과 고생으로 급격히 노쇠한 시인 스스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시를 지을 때의 두보의 나이는 46세였으므로 근심과 고생의 정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장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간추린 중국문학사』, 김장환 엮, 서울학고방, 1997.
2. 『중국문학사의 이해』, 신진호 편, 지영사, 1998.
3. 『중국시가예술연구 下』, 애행패 저, 아세아문화사, 1994.
4. 『중국문학 입문』, 정범진외 공저, 성균관대출판부, 1981.
5. 『중국의 어제와 오늘』, 왕순흥 저, 평민사, 1998.
6. 『이백시신평』, 손종변, 정신세계사, 1996.
7. 『당시선』, 이병한외 공저, 서울대출판부, 1998
8. 『곽말약의 이백과 두보』, 임효섭·황선재 옮김, 도서출판까치, 1996.
9. 『중국문학사 상』, 김영덕외 2 편저, 청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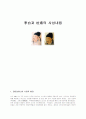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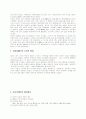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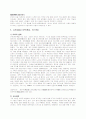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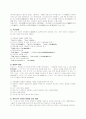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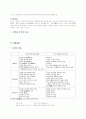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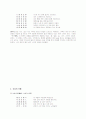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