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구 온난화
(1) 개요
(2) 온실기체의 대기중 농도 현황
(3) 지구 온난화 영향
(4)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 오존층
(1) 개요
(2) 오존층 파괴
(3) 오존층 파괴에 의한 기후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에서 성층권 오존층 관측
(5) 오존층 회복 전망
3. 산성비
(1) 정의
(2) 오염원
(3) 생성과정
(4) 오염상태
(5) 산성비에 의한 영향
(6) 문제점
4.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1) 오염현황
(2) 문제점
5. 대책
(1) 개요
(2) 온실기체의 대기중 농도 현황
(3) 지구 온난화 영향
(4)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 오존층
(1) 개요
(2) 오존층 파괴
(3) 오존층 파괴에 의한 기후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에서 성층권 오존층 관측
(5) 오존층 회복 전망
3. 산성비
(1) 정의
(2) 오염원
(3) 생성과정
(4) 오염상태
(5) 산성비에 의한 영향
(6) 문제점
4.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1) 오염현황
(2) 문제점
5. 대책
본문내용
. 1990년대 이후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가 단기환경기준(0.1ppm/시간)을 초과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림 3.5.1 부문별 이산화질소 배출량
표 3.5.4 국내 1-3종 배출시설의 NOx 배출량 순위 (ton/yr)
배출시설의 NOx 배출순위
NOx
백분율(%)
국내 총배출량
671,350
100.00
1. 발전시설
268,418
39.98
2. 보일러
193,286
28.79
3. 시멘트, 석회제조시설
81,977
12.21
4. 기타 금속제품 제조, 가공시설
23,003
3.43
5. 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19,788
2.95
6. 석유정제시설
10,669
1.59
7.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9,752
1.45
8. 비누, 세정제 제조시설
8,824
1.31
9. 레미콘 제조시설
8,754
1.30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7,315
1.09
3) 도시별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
· 그림은 주요 도시의 환경중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농도를 보인 것으로 서울의 경우 선진 국 도시와 대등소이한 30ppb 내외를 보이고 있다.
· 장기기준(1년 평균)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으나 반포 측정소의 경우 24시간 평균농도의 99%에 해당하는 고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단기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자동차 등의 증가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이 고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5 이산화질소 단기기준 초과현황
\'95
\'96
\'97
1시간 기준
(0.15ppm)
2개소 16회
2개소 22회
5개소 158회
24시간 기준
(0.08ppm)
1개소 10회
3개소 12회
7개소 66회
그림 3.5.2. 7대도시의 10년간 이산화질소농도 변화추이
(2) 문제점
1) 자체적으로 독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중에서 산성비를 유발하고,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오염물질인 오존 및 PAN과 같은 광화학산화물을 발생시킨다.
2) 저감 대책에 있어서도 연소시의 연료중 질소 성분보다는 연소공기 중의 질소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이므로 연료의 개선으로는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이 어렵다.
3) 따라서 연소시설의 개선 및 탈질기술에 크게 의존해야 하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경제적, 기술적 이유 때문에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고 있다.
5. 대책
1) 지구온난화의 경우
·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인다.
화석연료 뿐 아니라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기체가 발생할 수 가장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한 사용부터 줄여야 할 것이다.
· 재활용을 실천한다.
온실기체의 하나인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주로 폐기물의 매각과 소각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쓰레기 재활용을 실천한다면 이러한 폐기물 처리과정에 생기는 온실기체의 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다.
· 환경친화적 상품을 사용한다.
재활용보다도 더 근본적인 요인인 온실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보다 고효율이면서 환경마크가 부착된 환경친화적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 나무를 심는다.
나무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로 바꿔준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므로 온실기체의 하나인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면 좋을 것이다.
2) 오존층파괴의 경우
·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규제한다.
알고있다시피 오존층파괴의 주범은 뭐니뭐니해도 프레온가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레온가스의 규제에 대한 협약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체물질을 개발한다.
프레온가스는 굉장히 안정한 물질로서 지금껏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존층파괴의 주범으로서 지금은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의 개발이 시급하다.
· 오존층에 존재하고 있는 프레온가스의 수명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한다.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같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프레온가스가 오존층내에서 오래 잔류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존층이 파괴되는 양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프레온가스의 소멸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 산성비의 경우
·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신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등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배출원을 규제한다.
산성비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원인 공장과 자동차에 탈황시설 및 탈질기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4) 자동차오염의 경우
· 배출가스를 저감한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쓸데없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고, 기존차량은 물론 새로 출시되는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탈질기나 촉매변환기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대체연료를 개발한다.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경유사용 대신 오염물질 발생이 덜한 LNG, LPG 등으로 교체하거나 태양열자동차, 수소자동차, 폐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 새로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개발한다.
· 자동차 사용량을 줄인다.
현재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이나 카풀제도를 이용하거나, 차량10부제를 준수하는 등 자동차 사용량을 줄인다면 그만큼 배출량도 줄게 될 것이다.
5)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의 정도에 대해 물으면 심각하다고 대답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몸으로 직접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탓인지 아니면 될대로되라는 생각에서인지 그 이상의 관심은 갖고 있지 않다. 그저 언론에서 환경에 대해 떠들면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 금새 또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이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듯이 환경 또한 현재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치료해주고, 또다시 아프지 않도록 관심을 갖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림 3.5.1 부문별 이산화질소 배출량
표 3.5.4 국내 1-3종 배출시설의 NOx 배출량 순위 (ton/yr)
배출시설의 NOx 배출순위
NOx
백분율(%)
국내 총배출량
671,350
100.00
1. 발전시설
268,418
39.98
2. 보일러
193,286
28.79
3. 시멘트, 석회제조시설
81,977
12.21
4. 기타 금속제품 제조, 가공시설
23,003
3.43
5. 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19,788
2.95
6. 석유정제시설
10,669
1.59
7.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9,752
1.45
8. 비누, 세정제 제조시설
8,824
1.31
9. 레미콘 제조시설
8,754
1.30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7,315
1.09
3) 도시별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
· 그림은 주요 도시의 환경중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농도를 보인 것으로 서울의 경우 선진 국 도시와 대등소이한 30ppb 내외를 보이고 있다.
· 장기기준(1년 평균)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으나 반포 측정소의 경우 24시간 평균농도의 99%에 해당하는 고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단기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자동차 등의 증가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이 고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5 이산화질소 단기기준 초과현황
\'95
\'96
\'97
1시간 기준
(0.15ppm)
2개소 16회
2개소 22회
5개소 158회
24시간 기준
(0.08ppm)
1개소 10회
3개소 12회
7개소 66회
그림 3.5.2. 7대도시의 10년간 이산화질소농도 변화추이
(2) 문제점
1) 자체적으로 독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중에서 산성비를 유발하고,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오염물질인 오존 및 PAN과 같은 광화학산화물을 발생시킨다.
2) 저감 대책에 있어서도 연소시의 연료중 질소 성분보다는 연소공기 중의 질소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이므로 연료의 개선으로는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이 어렵다.
3) 따라서 연소시설의 개선 및 탈질기술에 크게 의존해야 하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경제적, 기술적 이유 때문에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고 있다.
5. 대책
1) 지구온난화의 경우
·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인다.
화석연료 뿐 아니라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기체가 발생할 수 가장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한 사용부터 줄여야 할 것이다.
· 재활용을 실천한다.
온실기체의 하나인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주로 폐기물의 매각과 소각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쓰레기 재활용을 실천한다면 이러한 폐기물 처리과정에 생기는 온실기체의 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다.
· 환경친화적 상품을 사용한다.
재활용보다도 더 근본적인 요인인 온실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보다 고효율이면서 환경마크가 부착된 환경친화적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 나무를 심는다.
나무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로 바꿔준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므로 온실기체의 하나인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면 좋을 것이다.
2) 오존층파괴의 경우
·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규제한다.
알고있다시피 오존층파괴의 주범은 뭐니뭐니해도 프레온가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레온가스의 규제에 대한 협약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체물질을 개발한다.
프레온가스는 굉장히 안정한 물질로서 지금껏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존층파괴의 주범으로서 지금은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의 개발이 시급하다.
· 오존층에 존재하고 있는 프레온가스의 수명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한다.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같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프레온가스가 오존층내에서 오래 잔류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존층이 파괴되는 양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프레온가스의 소멸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 산성비의 경우
·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신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등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배출원을 규제한다.
산성비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원인 공장과 자동차에 탈황시설 및 탈질기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4) 자동차오염의 경우
· 배출가스를 저감한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쓸데없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고, 기존차량은 물론 새로 출시되는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탈질기나 촉매변환기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대체연료를 개발한다.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경유사용 대신 오염물질 발생이 덜한 LNG, LPG 등으로 교체하거나 태양열자동차, 수소자동차, 폐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 새로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개발한다.
· 자동차 사용량을 줄인다.
현재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이나 카풀제도를 이용하거나, 차량10부제를 준수하는 등 자동차 사용량을 줄인다면 그만큼 배출량도 줄게 될 것이다.
5)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의 정도에 대해 물으면 심각하다고 대답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몸으로 직접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탓인지 아니면 될대로되라는 생각에서인지 그 이상의 관심은 갖고 있지 않다. 그저 언론에서 환경에 대해 떠들면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 금새 또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이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듯이 환경 또한 현재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치료해주고, 또다시 아프지 않도록 관심을 갖어주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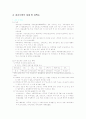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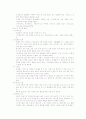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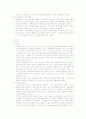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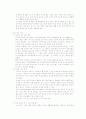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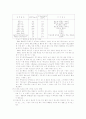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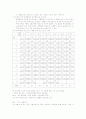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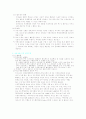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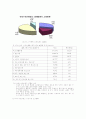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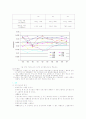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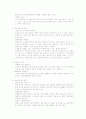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