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통적이다. 정씨의 경우에서 보듯, 그들이 고향을 잃어 버리게 된 까닭은 산업화 내지 도시화로 인하여 고향이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유랑하고 있다는 점도 세 사람의 공통점이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고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며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못한 그들로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결국 그들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농어촌으로부터 쫓겨나와 정처 없이 떠도는 소외 계층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김윤식 교수의 소설 특강>에서 인용
이 작품은 1970년대의 시대적 전형성을 띠고 있다는데...
1970년대는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경제 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 우리나라가 근대 공업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진 시대이다. 물론 근대화는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적지 않게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농어촌의 해체와 그로 인한 농어민의 고향 상실, 노동자로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인구의 도시 집중, 공해 문제, 빈부 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삼포 가는 길>을 두고, 본격적인 도시화와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의 사회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1970년 사회의 어두운 면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농어촌의 해체 과정은 정씨의 고향인 삼포가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불도저에 떠밀려서 관광지로 변해 가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며, 농어민의 고향 상실은 뿌리를 내릴 곳을 찾지 못하고 유랑만 거듭하는 백화, 정씨, 영달 세 사람 모두의 삶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농어민의 노동자화는 시골 출신인 영달과 정씨가 막노동자가 되어 전국의 공사판을 떠도는 데서 표출되고 있다.
말하자면, 영달과 정씨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생겨난 농촌 출신 막노동자의 전형이다.
한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층민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는 근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된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에 덧붙여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를 이끌어가던 중요한 힘의 하나인 민중의 튼튼한 연대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1970년대적인 전형성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유랑하고 있다는 점도 세 사람의 공통점이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고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며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못한 그들로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결국 그들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농어촌으로부터 쫓겨나와 정처 없이 떠도는 소외 계층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김윤식 교수의 소설 특강>에서 인용
이 작품은 1970년대의 시대적 전형성을 띠고 있다는데...
1970년대는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경제 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 우리나라가 근대 공업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진 시대이다. 물론 근대화는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적지 않게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농어촌의 해체와 그로 인한 농어민의 고향 상실, 노동자로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인구의 도시 집중, 공해 문제, 빈부 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삼포 가는 길>을 두고, 본격적인 도시화와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의 사회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1970년 사회의 어두운 면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농어촌의 해체 과정은 정씨의 고향인 삼포가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불도저에 떠밀려서 관광지로 변해 가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며, 농어민의 고향 상실은 뿌리를 내릴 곳을 찾지 못하고 유랑만 거듭하는 백화, 정씨, 영달 세 사람 모두의 삶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농어민의 노동자화는 시골 출신인 영달과 정씨가 막노동자가 되어 전국의 공사판을 떠도는 데서 표출되고 있다.
말하자면, 영달과 정씨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생겨난 농촌 출신 막노동자의 전형이다.
한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층민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는 근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된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에 덧붙여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를 이끌어가던 중요한 힘의 하나인 민중의 튼튼한 연대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1970년대적인 전형성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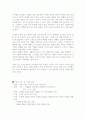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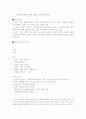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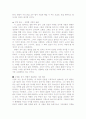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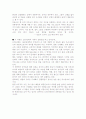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