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백제의 성립
2. 백제의 발전과 전개
3. 백제의 대외관계
4. 백제의 멸망
5. 백제부흥운동의 주역 흑치상지
6. 백제의 영토확장과 전성기
7. 백제의 왕들
2. 백제의 발전과 전개
3. 백제의 대외관계
4. 백제의 멸망
5. 백제부흥운동의 주역 흑치상지
6. 백제의 영토확장과 전성기
7. 백제의 왕들
본문내용
28) 혜왕(598~599)
▶ 혜왕은 성왕의 둘째 아들이다. 598년 형인 위덕왕(威德王)을 이어 고령(高齡)으로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위덕왕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혜왕은 즉위 다음 해인 599년에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효순태자(孝順太子)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의 재위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재위당시의 역사를 살펴보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위덕왕대처럼 귀족들이 정권을 좌우하는 상황이 계속된 것으로 추측된다.
29) 법왕(599~600)
▶ 법왕은 혜왕의 아들이다. 아버지 혜왕의 뒤를 이어 599년에 즉위하였다. 당시 법왕은 적극적인 불교정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백제를 진호(鎭護)하는 5악(五岳)의 하나인 북악(北岳)에 호국사찰인 오합사(烏合寺)를 창건하고 사비 3산(三山)의 하나인 부산(浮山)에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왕흥사(王興寺)를 창건하였다. 한편 불교의 계율을 널리 확대시키기 위해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렸다. 사냥에 쓰이는 매를 풀어주고 사냥도구를 모아 불사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재위 2년 만에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게된다.
30) 무왕(600~641)
▶ 무왕은 제29대 법왕의 아들이며, 제31대 의자왕의 아버지이다. 그는 할아버지인 혜왕과 아버지인 법왕은 모두 재위 2년 만에 죽자 그 뒤를 이어 백제의 30대 왕으로 즉위해 기울어져가는 백제의 국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 무왕의 즉위 당시 백제는 내외적으로 정세가 악화된 상태로 귀족간에 내분이 일고 왕실의 권위는 약해져 있었다. 게다가, 앞서의 두 왕이 단명하게 되자 이 같은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왕은 41년간 재위하면서 어느정도 왕권의 안정을 되찾는 데에 기여하였다.
▶ 무왕의 재위 기간 동안 신라의 서쪽 변방을 자주 쳐서 백제군이 낙동강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시에 군사적으로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는 신라와 당나라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나, 국내 정치가 안정되고 정복전쟁에 승리하면서 백제가 국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구려와 수나라가 서로 각축전을 벌일 당시에 양쪽의 대결을 이용하는 외교술을 펼쳐서,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고구려를 토벌하기 위해 여러번 원병을 청했으며 수가 멸망하고 당이 중국을 통일하자 624년 당에 조공을 바치고 당고조로부터 대방국왕 백제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 또한 무왕은 강화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역사를 단행하였다. 630년 사비궁(泗宮)을 중수하였으며, 634년 왕궁의 남쪽에 인공호수와 그 안에 인공섬이 조성되었는데, 그 모습은 신선이 산다는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방불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에는 600년에 법왕이 착공하였던 왕흥사(王興寺)를 30여년 만에 완성시켰다. 왕흥사는 당시 백제의 중심 사원으로서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이 건립을 주도하였고 몸소 불공을 드리는 곳이어서, 왕실의 원찰(願刹) 또는 왕과 특별히 밀착된 사원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역사로 보아 무왕대에는 귀족내부의 분쟁요인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나 비교적 왕권이 안정되면서 귀족들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억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왕권의 안정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대왕포(大王浦: 충청남도 부여 백마강에 지금도 그 지명이 전한다)라는 지명과 함께, 무왕과 그 신하들이 그곳에서 흥겹게 어우러져 즐겼다는 고사가 전해지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태평한 백제지배층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 강화된 왕권에 힘입어 무왕은 재위 후반기에는 익산지역을 중시하여 이곳에 별도(別都)를 경영하고, 나아가 장차 천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리하여 궁성이 될 왕궁평성(王宮坪城)을 이곳에 축조하는 동시에, 흔히 궁성 안에 있어서 내불당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석사(帝釋寺)를 창건하기도 하였다. 또한,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들여 동방 최대규모의 미륵사를 같은 익산에 창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무왕은 익산천도를 통해 귀족세력의 재편성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무왕의 의도대로 익산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옥천회전(沃川會戰) 패배 이후 동요된 백제왕권은 무왕 때에 와서 급속히 회복되었다. 또한, 관륵을 일본에 보내어 천문, 지리, 역본등의 서적과 불교를 전하게 하기도 하여 일본과의 친선을 유지시켜 삼국의 항쟁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무왕의 치적은 그의 아들인 의자왕이 즉위 초기 정치적 개혁을 통하여 전제왕권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 이처럼 무왕 때의 백제는 정복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사비궁의 중수나 왕흥사와 미륵사의 창건과 같은 대규모역사가 시행될 정도로 전제왕권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대규모의 토목사업과 향락, 사치에 빠져 국력을 쇠잔시켜 백제의 멸망 원인을 남겨놓기도 하였다.
무왕의 능은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쌍릉(관련유적참조)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고려시대 이미 도굴된 바 있는 쌍릉은 1916년에 조사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사비시대의 능산리고분의 묘제와 일치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31) 의자왕(641~660)
▶ 백제의 제 31대 마지막 왕(재위 641~660). 의자는 왕의 이름이며, 시호가 없다. 무왕의 맏아들로 태어나 632(무왕 33)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효성과 우애가 깊어 해동 증자로 불리었다. 왕위에 오르자 신라를 공격하여 미후성 등 40 성을 빼앗고, 윤충을 시켜 대야성(지금의 합천)을 공격함으로써 성주품석 등을 죽게 하였다. 그 뒤 당항성, 요차성을 공격하고 국위를 회복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만년에는 사치와 방탕에 빠져 성충, 흥수 같은 충신의 말을 듣지 않다가 660년 나. 당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다. 계백의 황산벌 싸움을 마지막으로,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자 태자와 함께 웅진성으로 피신하였다가 소정방에게 끌려가 당나라에서 병사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31대 678년 만에 멸망하였다.
▶ 혜왕은 성왕의 둘째 아들이다. 598년 형인 위덕왕(威德王)을 이어 고령(高齡)으로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위덕왕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혜왕은 즉위 다음 해인 599년에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효순태자(孝順太子)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의 재위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재위당시의 역사를 살펴보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위덕왕대처럼 귀족들이 정권을 좌우하는 상황이 계속된 것으로 추측된다.
29) 법왕(599~600)
▶ 법왕은 혜왕의 아들이다. 아버지 혜왕의 뒤를 이어 599년에 즉위하였다. 당시 법왕은 적극적인 불교정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백제를 진호(鎭護)하는 5악(五岳)의 하나인 북악(北岳)에 호국사찰인 오합사(烏合寺)를 창건하고 사비 3산(三山)의 하나인 부산(浮山)에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왕흥사(王興寺)를 창건하였다. 한편 불교의 계율을 널리 확대시키기 위해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렸다. 사냥에 쓰이는 매를 풀어주고 사냥도구를 모아 불사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재위 2년 만에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게된다.
30) 무왕(600~641)
▶ 무왕은 제29대 법왕의 아들이며, 제31대 의자왕의 아버지이다. 그는 할아버지인 혜왕과 아버지인 법왕은 모두 재위 2년 만에 죽자 그 뒤를 이어 백제의 30대 왕으로 즉위해 기울어져가는 백제의 국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 무왕의 즉위 당시 백제는 내외적으로 정세가 악화된 상태로 귀족간에 내분이 일고 왕실의 권위는 약해져 있었다. 게다가, 앞서의 두 왕이 단명하게 되자 이 같은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왕은 41년간 재위하면서 어느정도 왕권의 안정을 되찾는 데에 기여하였다.
▶ 무왕의 재위 기간 동안 신라의 서쪽 변방을 자주 쳐서 백제군이 낙동강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시에 군사적으로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는 신라와 당나라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나, 국내 정치가 안정되고 정복전쟁에 승리하면서 백제가 국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구려와 수나라가 서로 각축전을 벌일 당시에 양쪽의 대결을 이용하는 외교술을 펼쳐서,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고구려를 토벌하기 위해 여러번 원병을 청했으며 수가 멸망하고 당이 중국을 통일하자 624년 당에 조공을 바치고 당고조로부터 대방국왕 백제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 또한 무왕은 강화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역사를 단행하였다. 630년 사비궁(泗宮)을 중수하였으며, 634년 왕궁의 남쪽에 인공호수와 그 안에 인공섬이 조성되었는데, 그 모습은 신선이 산다는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방불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에는 600년에 법왕이 착공하였던 왕흥사(王興寺)를 30여년 만에 완성시켰다. 왕흥사는 당시 백제의 중심 사원으로서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이 건립을 주도하였고 몸소 불공을 드리는 곳이어서, 왕실의 원찰(願刹) 또는 왕과 특별히 밀착된 사원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역사로 보아 무왕대에는 귀족내부의 분쟁요인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나 비교적 왕권이 안정되면서 귀족들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억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왕권의 안정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대왕포(大王浦: 충청남도 부여 백마강에 지금도 그 지명이 전한다)라는 지명과 함께, 무왕과 그 신하들이 그곳에서 흥겹게 어우러져 즐겼다는 고사가 전해지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태평한 백제지배층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 강화된 왕권에 힘입어 무왕은 재위 후반기에는 익산지역을 중시하여 이곳에 별도(別都)를 경영하고, 나아가 장차 천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리하여 궁성이 될 왕궁평성(王宮坪城)을 이곳에 축조하는 동시에, 흔히 궁성 안에 있어서 내불당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석사(帝釋寺)를 창건하기도 하였다. 또한,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들여 동방 최대규모의 미륵사를 같은 익산에 창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무왕은 익산천도를 통해 귀족세력의 재편성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무왕의 의도대로 익산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옥천회전(沃川會戰) 패배 이후 동요된 백제왕권은 무왕 때에 와서 급속히 회복되었다. 또한, 관륵을 일본에 보내어 천문, 지리, 역본등의 서적과 불교를 전하게 하기도 하여 일본과의 친선을 유지시켜 삼국의 항쟁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무왕의 치적은 그의 아들인 의자왕이 즉위 초기 정치적 개혁을 통하여 전제왕권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 이처럼 무왕 때의 백제는 정복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사비궁의 중수나 왕흥사와 미륵사의 창건과 같은 대규모역사가 시행될 정도로 전제왕권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대규모의 토목사업과 향락, 사치에 빠져 국력을 쇠잔시켜 백제의 멸망 원인을 남겨놓기도 하였다.
무왕의 능은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쌍릉(관련유적참조)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고려시대 이미 도굴된 바 있는 쌍릉은 1916년에 조사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사비시대의 능산리고분의 묘제와 일치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31) 의자왕(641~660)
▶ 백제의 제 31대 마지막 왕(재위 641~660). 의자는 왕의 이름이며, 시호가 없다. 무왕의 맏아들로 태어나 632(무왕 33)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효성과 우애가 깊어 해동 증자로 불리었다. 왕위에 오르자 신라를 공격하여 미후성 등 40 성을 빼앗고, 윤충을 시켜 대야성(지금의 합천)을 공격함으로써 성주품석 등을 죽게 하였다. 그 뒤 당항성, 요차성을 공격하고 국위를 회복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만년에는 사치와 방탕에 빠져 성충, 흥수 같은 충신의 말을 듣지 않다가 660년 나. 당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다. 계백의 황산벌 싸움을 마지막으로,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자 태자와 함께 웅진성으로 피신하였다가 소정방에게 끌려가 당나라에서 병사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31대 678년 만에 멸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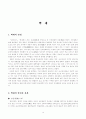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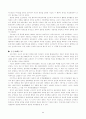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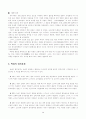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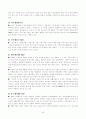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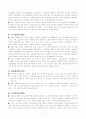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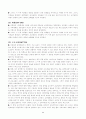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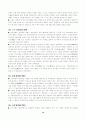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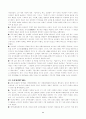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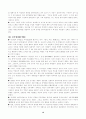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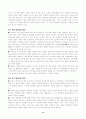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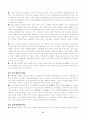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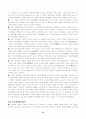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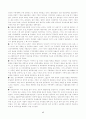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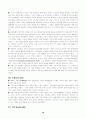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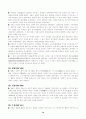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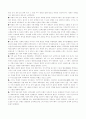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