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백제의 변천
1. 한성시대 후기의 정치적 변화
1)한강 유역의 상실
2)백제와 신라의 동맹
2.웅진천도와 중흥
1)동성왕의 활동
2)무령왕의 활동
3. 사비천도와 지배체제의 재편
1)성왕의 사비천도
2)정치체제의 개편
4. 지배세력의 분열과 왕권의 약화
1)집권체제의 모순
2)귀족세력의 분열
3)대외관계의 변화
1. 한성시대 후기의 정치적 변화
1)한강 유역의 상실
2)백제와 신라의 동맹
2.웅진천도와 중흥
1)동성왕의 활동
2)무령왕의 활동
3. 사비천도와 지배체제의 재편
1)성왕의 사비천도
2)정치체제의 개편
4. 지배세력의 분열과 왕권의 약화
1)집권체제의 모순
2)귀족세력의 분열
3)대외관계의 변화
본문내용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국왕의 권력강화에 따라 22부사와 6좌평간의 세력관계가 변화되면서 22부사의 중요성은 격감되고 6좌평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리적일 것이다. 내관인 6좌평제는 중앙행정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 6좌평제도가 중앙행정 조직체계내로 편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좌평제에 또 한 차례의 변화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6좌평의 임무와 22부사의 임무가 서로 대응되는 점이 주목된다. 즉 그 임무상에서 내신좌평은 전내부, 내두좌평은 사구부, 내법좌평은 사도부, 조정좌평은 사구부, 병관위사좌평은 사군부와 임무상에서 각각 대응될 수 있다. 무왕은 위덕왕대의 행정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함에 따라 좌평을 6좌평제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국왕의 행정관료로 편제시켜 22부사를 통치하도록 하였다. 이 행정조직체계는 의자왕대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귀족세력의 분열
국왕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성8족과는 결탁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대성8족 이외의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 세력이 바로 신진귀족이라고 부를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대성8족과 또 대성8족이 아니면서 달솔 관등에 머무르고 만 사람들도 같은 시기에 정치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신진귀족이라고 해서 정계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신진귀족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먼저 왕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성8족이 아니면서 달솔 관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을 신진세력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階伯과 黑齒常之는 모두 달솔이었다. 이들은 국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계백과 흑치상지는 대성8족이 아니면서 달솔 관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왕과는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고 할 수 있다. 국왕의 권력강화를 뒷받침해 주었던 덕분으로 점차 그 세력이 성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의자왕15년을 전후하여 크게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던 것은 아무래도 의자왕과의 정치적 대립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대성8족을 중심으로 한 좌평층에 심각한 정치적 동요가 일어난 그것과 같은 맥락이다.
왕실측의 한강유역에 대한 집요한 집념이 있는데 그것은 신라의 당과의 교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신라를 고립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고, 관산성전투에서 패한 이후 대성8족으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를 받아왔던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자왕이 신라의 북계30여 성을 차지함으로써 대성8족이 왕권을 견제하려는 명분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좌평의 정치적 지위도 크게 변하였다. 좌평을 역임하였던 대성8족이 정치적 세력이 달솔을 역임하였던 신진세력의 그것에 비하여 점차 열세한 위치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자왕 말기에 이르러 대성8족과 신진세력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당연합군의 침입으로 위태로울 때, 서로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쳐 백제는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3)대외관계의 변화
중국은 분열시대를 지나 수에 의하여 통일되었다.(589) 백제는 우선 수를 이용하여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하지만 백제는 수와 고구려에 대하여 등거리 외교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왕3년(602)에 국내정세를 회복하기 위해 신라에 침범하지 않고 6좌평의 관료화 추진, 미륵사의 건립 등을 통하여 대성8족의 세력이 쇠퇴하자 국왕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의자왕5년 이후 백제는 당 대신 고구려를 택했다고 하겠다. 이에 신라는 나당연합군을 결성하여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백제의 외교정책은 결국 의자왕 말기에 가서 국정혼란으로 인해 백제는 멸망하게 된다.
2)귀족세력의 분열
국왕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성8족과는 결탁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대성8족 이외의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 세력이 바로 신진귀족이라고 부를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대성8족과 또 대성8족이 아니면서 달솔 관등에 머무르고 만 사람들도 같은 시기에 정치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신진귀족이라고 해서 정계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신진귀족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먼저 왕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성8족이 아니면서 달솔 관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을 신진세력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階伯과 黑齒常之는 모두 달솔이었다. 이들은 국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계백과 흑치상지는 대성8족이 아니면서 달솔 관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왕과는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고 할 수 있다. 국왕의 권력강화를 뒷받침해 주었던 덕분으로 점차 그 세력이 성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의자왕15년을 전후하여 크게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던 것은 아무래도 의자왕과의 정치적 대립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대성8족을 중심으로 한 좌평층에 심각한 정치적 동요가 일어난 그것과 같은 맥락이다.
왕실측의 한강유역에 대한 집요한 집념이 있는데 그것은 신라의 당과의 교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신라를 고립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고, 관산성전투에서 패한 이후 대성8족으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를 받아왔던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자왕이 신라의 북계30여 성을 차지함으로써 대성8족이 왕권을 견제하려는 명분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좌평의 정치적 지위도 크게 변하였다. 좌평을 역임하였던 대성8족이 정치적 세력이 달솔을 역임하였던 신진세력의 그것에 비하여 점차 열세한 위치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자왕 말기에 이르러 대성8족과 신진세력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당연합군의 침입으로 위태로울 때, 서로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쳐 백제는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3)대외관계의 변화
중국은 분열시대를 지나 수에 의하여 통일되었다.(589) 백제는 우선 수를 이용하여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하지만 백제는 수와 고구려에 대하여 등거리 외교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왕3년(602)에 국내정세를 회복하기 위해 신라에 침범하지 않고 6좌평의 관료화 추진, 미륵사의 건립 등을 통하여 대성8족의 세력이 쇠퇴하자 국왕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의자왕5년 이후 백제는 당 대신 고구려를 택했다고 하겠다. 이에 신라는 나당연합군을 결성하여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백제의 외교정책은 결국 의자왕 말기에 가서 국정혼란으로 인해 백제는 멸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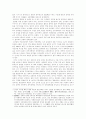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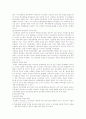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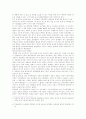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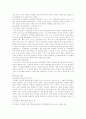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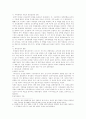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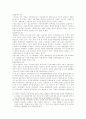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