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글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인문학의 위기
1) 위기의그림자와실체
2) '쓸모'의한부정적계기로서인문학
3. 위기에 대한 대안
1) 우리인문학이들어설자리
2) 철학, 과연 '신생'의명약인가독약인가?
3) 초월의갈림길
4) 존재로, 사랑으로, 공동체로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2. 인문학의 위기
1) 위기의그림자와실체
2) '쓸모'의한부정적계기로서인문학
3. 위기에 대한 대안
1) 우리인문학이들어설자리
2) 철학, 과연 '신생'의명약인가독약인가?
3) 초월의갈림길
4) 존재로, 사랑으로, 공동체로
맺음말
본문내용
의 열매는 삶의 지혜, 즉 철학으로 남는다. 지혜의 밭은 삶의 현실이고, 그 밭의 오곡백과는 사랑으로 성숙한다. 성숙의 삶은 사랑과 그 열매인 지혜로 풍요롭다. 부재와 공허의 자리에 존재의 속살이 차오른다. 아름다움으로 성숙한 성체, 그것이 내비치는 삶의 결과 무늬가 눈부시다.
이제 욕망과 소유의 근대적 등식은 사라진다. 사랑도 필요요 욕망이기 때문이다. 소유양식을 지향하는 이기심이 인간의 유일한 성향은 아니다. 인간은 존재하려는 해방과 사랑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욕망의 또 다른 영역이다. 소유는 반사회적이지만 사랑은 사회적인 욕망이다.
함께 있으려는 공존의 욕망, 그래서 \"사랑은 잔치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즐거운 잔치다. 사랑의 힘으로 공존의 길이 열린다. 사랑으로 공존의 삶을 향유하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부재와 부재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니르바나\', 존재의 세계로 간다. \'克己復禮\'. 극기 다음이 복례다. 다음이 아니고 하나라고 해도 좋다. 문제는 함께 \'있는\' 공존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사회성\'을 밝히려고 그토록 사랑을 사색했고, 플라톤은 사랑으로 성숙하는 그 \'보편\'의 길을 열어 보려고 고심했다. 또한 사랑의 상실을 서구의 근대로 규정하고, 그 결과 스스로 서구문명의 아이러니를 폭로하는 꼴이 되고 만 헤겔도 주목된다. 오늘날 문화적 상대주의도 속셈이 보인다.
어쨌거나 철학은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소유의 정체를 숨겨준 흔적들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학이 소유 부정의 전사일 때만, \'자유\'와 \'해방\'의 깃발로 남는다. 그리고 그 깃발은 발전과 성장을 맹신하는 기형적인 유개념, Homo oeconomicus의 승리의 깃발을 대신한다. 그 깃발아래 철학과 인문학이 함께 웃는다. 관념이냐 아니냐, 갈라설 게 아니다. 관념 혹은 개념이 아니고서 어찌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실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그 말 속에서 살아가는 \'에덴 동산\'은 이미 인류사에서 사라졌다. 다만 이론과 사실이 어긋남을 경계할 뿐이다. 누차 지적되었듯이 그 어긋남의 정체는 가치 매체이다.
돈이냐 사람이냐. 문제는 가치 매체의 차이이다. 사회와 반사회. 우리의 선택은 필연이다. 공동체,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터전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내쫓기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과 존재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반성의 긴 노정, 이제 그 두터운 흔적이 기둥이 되어 \'우리\'를 세운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축적되는\', 그리고 \'그 축적되는 경험이 하나의 인간적인 이념을 생산해 내는\' 이런 사회를 그린다.
\'뇌물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 인간적인 사회.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경제 구조,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전혀 다른 이미지가 제시될 때,\" 오직 그럴 경우에만 가능하다.
희망의 그림이 너무 희미하다.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과거로서 남는 역사의 그림은 그 흔적에 따라 선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미래는 무늬가 없다. 다만 그것은 전망으로 남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역사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유보했지 않았는가.
다만 나는 \'사람이 진실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사랑에 가득 찬 사회적 보편성이 어느날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전망한다. 철학적 기획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이다.
또 한 가지. 나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 그 규정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나 자신 탓이다. 불투명성, 그것 때문에 희망의 그림이 희미하다. 사르트르의 \"변명\"인가, 사이드의 \"섞임\"인가? 불투명하다. 김영민의 글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나에게 교훈적이다.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른 경제 구조\", \"인간에 대한 전혀 다른 이미지\"에 더욱 감동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이 무늬를 그리기까지는 \'미래 사회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유보하자는 뜻이기도 하다.
맺음말
\'성숙\'의 페러담임은 인간은 \'되어간다\'는 것을 함축한다. 설사 \'본질의 발현\'이라고 해도 \'인간됨\'은 익히고 배워서 되는 것이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지행합일의 교훈이다. 그래서 탐욕적인 사회, 탐욕적인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사회가 문제다. 배움의 터전은 문화다. 문화는 지식의 소유가 아니다. 교통법규나 질서를 제아무리 많이 암기하더라도 그것이 곧장 교통문화로 이어지지 않듯이. 문화는 삶의 지혜다. 그래서 지혜의 철학이 문화의 중심이다. 정치와 사회도 모두 거기에 걸려 있다. 권력 중심의 이동을 위해 과학과 종교가 마치 생선뼈 추리듯이 앗아간 것들이 근본학의 등뼈를 중심으로 다시 모인다. 짐이 무겁다고 엄살떨 일이 아니다. 또 훌훌 털고 나태한 일상으로 돌아갈 처지도 아니다. 식민의 영토로 잠식당한 철학, 거대한 공룡의 잡식성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인문학, 이제 그 \'신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 길은 열렸다. 거대한 공룡에 대항하는 깃발을 세웠다. 문제는 근본이다. 뿌리를 세우고, 그 잔뿌리를 통해 성숙하는 문화를 보자. 사유의 조건 혹은 근원을 밝히고, 또 사유한 것을 다시 사유하는 것이 철학의 개념 규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문제의식을 식민성과 자본주의의 \'타율\'과 \'편파\'에 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유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사고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서 시작된다. 이 일이 요긴함은 사유가 사유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유하는 자도 함께 규정하기에 그렇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은 그래서 더 요긴하고 절실하다.
전도된 가치 매체를 바로잡아 왜곡된 인간의 등뼈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서면, 인문학은 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바로 서리라.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철학은 비로소 \"소외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회에서 소외를 영속시키고,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소외를 가르치고 있다\"는 오명을 벗어나게 되리라.
소외와 소외 극복, 제한된 문제의식을 전제했으나 맺음이 싱겁다. 궁여지책이다. 그래서 나는 온갖 질책과 핀잔을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미리 준비하여 그 속뜻을 겸허히 읽어 갈 자세를 갖춘다.
이제 욕망과 소유의 근대적 등식은 사라진다. 사랑도 필요요 욕망이기 때문이다. 소유양식을 지향하는 이기심이 인간의 유일한 성향은 아니다. 인간은 존재하려는 해방과 사랑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욕망의 또 다른 영역이다. 소유는 반사회적이지만 사랑은 사회적인 욕망이다.
함께 있으려는 공존의 욕망, 그래서 \"사랑은 잔치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즐거운 잔치다. 사랑의 힘으로 공존의 길이 열린다. 사랑으로 공존의 삶을 향유하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부재와 부재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니르바나\', 존재의 세계로 간다. \'克己復禮\'. 극기 다음이 복례다. 다음이 아니고 하나라고 해도 좋다. 문제는 함께 \'있는\' 공존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사회성\'을 밝히려고 그토록 사랑을 사색했고, 플라톤은 사랑으로 성숙하는 그 \'보편\'의 길을 열어 보려고 고심했다. 또한 사랑의 상실을 서구의 근대로 규정하고, 그 결과 스스로 서구문명의 아이러니를 폭로하는 꼴이 되고 만 헤겔도 주목된다. 오늘날 문화적 상대주의도 속셈이 보인다.
어쨌거나 철학은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소유의 정체를 숨겨준 흔적들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학이 소유 부정의 전사일 때만, \'자유\'와 \'해방\'의 깃발로 남는다. 그리고 그 깃발은 발전과 성장을 맹신하는 기형적인 유개념, Homo oeconomicus의 승리의 깃발을 대신한다. 그 깃발아래 철학과 인문학이 함께 웃는다. 관념이냐 아니냐, 갈라설 게 아니다. 관념 혹은 개념이 아니고서 어찌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실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그 말 속에서 살아가는 \'에덴 동산\'은 이미 인류사에서 사라졌다. 다만 이론과 사실이 어긋남을 경계할 뿐이다. 누차 지적되었듯이 그 어긋남의 정체는 가치 매체이다.
돈이냐 사람이냐. 문제는 가치 매체의 차이이다. 사회와 반사회. 우리의 선택은 필연이다. 공동체,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터전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내쫓기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과 존재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반성의 긴 노정, 이제 그 두터운 흔적이 기둥이 되어 \'우리\'를 세운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축적되는\', 그리고 \'그 축적되는 경험이 하나의 인간적인 이념을 생산해 내는\' 이런 사회를 그린다.
\'뇌물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 인간적인 사회.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경제 구조,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전혀 다른 이미지가 제시될 때,\" 오직 그럴 경우에만 가능하다.
희망의 그림이 너무 희미하다.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과거로서 남는 역사의 그림은 그 흔적에 따라 선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미래는 무늬가 없다. 다만 그것은 전망으로 남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역사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유보했지 않았는가.
다만 나는 \'사람이 진실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사랑에 가득 찬 사회적 보편성이 어느날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전망한다. 철학적 기획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이다.
또 한 가지. 나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 그 규정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나 자신 탓이다. 불투명성, 그것 때문에 희망의 그림이 희미하다. 사르트르의 \"변명\"인가, 사이드의 \"섞임\"인가? 불투명하다. 김영민의 글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나에게 교훈적이다.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른 경제 구조\", \"인간에 대한 전혀 다른 이미지\"에 더욱 감동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이 무늬를 그리기까지는 \'미래 사회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유보하자는 뜻이기도 하다.
맺음말
\'성숙\'의 페러담임은 인간은 \'되어간다\'는 것을 함축한다. 설사 \'본질의 발현\'이라고 해도 \'인간됨\'은 익히고 배워서 되는 것이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지행합일의 교훈이다. 그래서 탐욕적인 사회, 탐욕적인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사회가 문제다. 배움의 터전은 문화다. 문화는 지식의 소유가 아니다. 교통법규나 질서를 제아무리 많이 암기하더라도 그것이 곧장 교통문화로 이어지지 않듯이. 문화는 삶의 지혜다. 그래서 지혜의 철학이 문화의 중심이다. 정치와 사회도 모두 거기에 걸려 있다. 권력 중심의 이동을 위해 과학과 종교가 마치 생선뼈 추리듯이 앗아간 것들이 근본학의 등뼈를 중심으로 다시 모인다. 짐이 무겁다고 엄살떨 일이 아니다. 또 훌훌 털고 나태한 일상으로 돌아갈 처지도 아니다. 식민의 영토로 잠식당한 철학, 거대한 공룡의 잡식성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인문학, 이제 그 \'신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 길은 열렸다. 거대한 공룡에 대항하는 깃발을 세웠다. 문제는 근본이다. 뿌리를 세우고, 그 잔뿌리를 통해 성숙하는 문화를 보자. 사유의 조건 혹은 근원을 밝히고, 또 사유한 것을 다시 사유하는 것이 철학의 개념 규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문제의식을 식민성과 자본주의의 \'타율\'과 \'편파\'에 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유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사고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서 시작된다. 이 일이 요긴함은 사유가 사유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유하는 자도 함께 규정하기에 그렇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은 그래서 더 요긴하고 절실하다.
전도된 가치 매체를 바로잡아 왜곡된 인간의 등뼈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서면, 인문학은 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바로 서리라.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철학은 비로소 \"소외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회에서 소외를 영속시키고,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소외를 가르치고 있다\"는 오명을 벗어나게 되리라.
소외와 소외 극복, 제한된 문제의식을 전제했으나 맺음이 싱겁다. 궁여지책이다. 그래서 나는 온갖 질책과 핀잔을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미리 준비하여 그 속뜻을 겸허히 읽어 갈 자세를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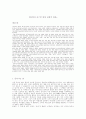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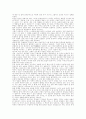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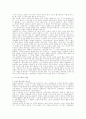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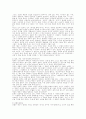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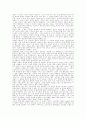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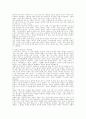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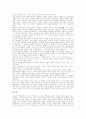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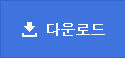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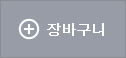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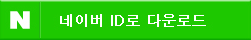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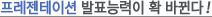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