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환경적 계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미술이 가져온 충격은 미술사나 후원자를 막론하고 그들 모두를 감동시켰으며, 그러한 경향이 간섭주의적 절차에서 벗어나 선택된 장소와는 독립되어 있으나 그것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조각적, 혹은 건축적 형식으로 발전한 때에도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었다. 이제 미술가들은 개별 조각 작품이 아니라 토지 이용, 도시 계획 및 재개발 등에 관한 미적 결정을 내리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이사무 노구치의 <하트 광장>에서 보듯 조각 분수와 연관하여 원형 극장과 녹색의 포장된 구역, 비틀린 형태의 탑 등 광할함이나 웅대함은 물론 친밀감이나 인간적인 규모까지도 성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조각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시각과 직결되는 조형성의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일상적인 삶 자체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접근해 들어오고 있다. 그것은 특히 현대 건축과 궤를 같이 하여 전개되는 양상을 띠어 우리에게 건물 자체의 조형성이라는 주제를 제시한다. 또한 현대적인 공간 속에서의 조형은 시각적인 영상을 초래하여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서 기존의 공간 효과를 만들어 내는 새로움을 던져준다. 새로움이란 과거의 형태로부터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친숙해짐에 따라서 편안한 것으로 된다. 우리는 현대에 와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조형성에 이미 친숙해져 있으며 또 편안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한다는 예술적 대의에 결코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조각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시각과 직결되는 조형성의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일상적인 삶 자체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접근해 들어오고 있다. 그것은 특히 현대 건축과 궤를 같이 하여 전개되는 양상을 띠어 우리에게 건물 자체의 조형성이라는 주제를 제시한다. 또한 현대적인 공간 속에서의 조형은 시각적인 영상을 초래하여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서 기존의 공간 효과를 만들어 내는 새로움을 던져준다. 새로움이란 과거의 형태로부터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친숙해짐에 따라서 편안한 것으로 된다. 우리는 현대에 와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조형성에 이미 친숙해져 있으며 또 편안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한다는 예술적 대의에 결코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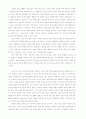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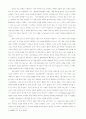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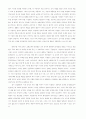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