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物權行爲의 有因 無因性의 槪念
Ⅲ. 物權行爲의 有因·無因性의 展開
1. 理論의 背景
2. Savigny의 要件上 物權行爲의 無因性論
3. 후기보통법학에 있어서의 效果上 物權行爲의 無因性論
4. 로마 법문의 재해석을 통한 物權行爲의 有因·無因性論
Ⅳ. 현행 민법상 物權行爲의 有因·無因性論
1. 현행 민법상 物權行爲의 有因 無因性의 槪念
2. 현행 민법에 있어서의 이른바 效果上 내지 기능상 物權行爲의 有因·無因性論
Ⅴ. 結 論
Ⅱ. 物權行爲의 有因 無因性의 槪念
Ⅲ. 物權行爲의 有因·無因性의 展開
1. 理論의 背景
2. Savigny의 要件上 物權行爲의 無因性論
3. 후기보통법학에 있어서의 效果上 物權行爲의 無因性論
4. 로마 법문의 재해석을 통한 物權行爲의 有因·無因性論
Ⅳ. 현행 민법상 物權行爲의 有因·無因性論
1. 현행 민법상 物權行爲의 有因 無因性의 槪念
2. 현행 민법에 있어서의 이른바 效果上 내지 기능상 物權行爲의 有因·無因性論
Ⅴ. 結 論
본문내용
점에서, 오히려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인정이 권리관계를 불명확하게 한다.주75)
주75) 그리고 학설 중에 物權行爲의 無因性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物權行爲의 獨自性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金容漢, 前揭 物權法論, 89면)가 있으나 의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物權行爲의 獨自性論은 法律行爲의 해석의 문제인 물권행위의 시기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인정을 위한 전제로는 物權行爲의 독자적 존재의 인정을 들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法律政策的 측면에서 物權行爲의 無因性을 인정함으로써 去來安全을 圖謀하고자 하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첫째,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인정으로 인한 제3자의 保護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효과이지 직접적으로 제3자관계에서 문제되는 無權利者로부터의 權利取得이 정당화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즉 物權行爲의 無因性이 인정되고 있는 독일 민법하에서도 不實登記의 信賴者는 登記의 公信力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인정으로 이러한 者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래의 안전과 善意의 제3자보호는 物權行爲理論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信賴保護領域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物權行爲의 無因性이 去來安全保護의 기능을 하는 영역은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의 경우이고 그것도 物權行爲 자체에 瑕疵가 없는 경우라고 하겠는데, 이 경우 현행 민법은 善意의 제3자보호를 위한 信賴保護規定이 마련되어 있다.
_ 둘째, 物權行爲의 無因性論은 去來安全保護라고 하는 立法政策的 考慮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물론 그 理論發展過程에 있어서 去來安全保護의 문제가 전혀 考慮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나 物權行爲論과 登記의 公信力과는 그 形成의 過程을 달리한다), Savigny의 無因的物權契約理論이 立法化되는 過程에 있어서도 프로이센 저당권등기제도에 있어서 不動産信用의 장애가 되었던 登記原因에 대한 實質審査主義의 排除의 역할을 가지고 게르만법상의 Auflassung에 기한 登記制度와 결합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登記의 公信力缺陷을 이의 인정으로 補充한다고 하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주76) 더욱이 우리 나라의 無因論者의 대부분은 相對的 無因性을 취하고 있는 바, 相對的 無因性을 취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去來安全을 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주76) 高翔龍,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의 再檢討小考」, 法思想과 民事法, 玄勝鍾博士華甲紀念論文集, 國民書館, 1979, 246면.
[977]
Ⅴ. 結 論
_ 이상의 검토로부터 현행법의 해석상 物權行爲의 無因性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의 立法者 意思는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새길 수도 있으나, 현행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物權行爲의 無因性에 기초하여 解釋을 하면 惡意의 제3자까지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주77) 他法律制度와의 균형상 맞지 않는다(물론 解除의 경우는 無效 取消와 그 原因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 또한 契約解除의 효과에 대하여 物權行爲의 無因性에 기초를 둔 債權的 效果說을 취하는 경우 민법 제548조 2항을 설명하기 어렵다.주78)
주77) P.Heck, Das abstrakte dingliche Rechtsgesch ft, Verlag von J.C.B.Mohr, 1937, SS.17-26.
주78) 최근에는 독일 법학의 영향을 받아 契約解除의 효과와 관련하여 淸算關係說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淸算關係說에 의하면 物權行爲論과는 관계없이 契約解除의 효과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淸算關係說은 독일 민법상 우리 나라 민법에서와 같은 解止制度를 解除制度와 구별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또 繼續的 債權關係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결과,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苦肉之策의 理論構成이다. 또한 解除의 效果에 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 解除權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문제의식하에 형성되 理論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법은 契約의 遡及效를 가져오는 解除制度와 장래에 대하여서만 契約을 소멸시키는 解止制度를 대립시켜 규정하고 있다. 또 解除權의 행사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소급적무효를 가져오는 해제권을 인정하면서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法規範의 형성에 있어서 언제나 그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立法 政策的인 法規範의 形成도 있는 것이다(프랑스 민법 제1184조 2항 참조). 나아가 淸算關係說은 해제의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法定債權關係로 이해하지 않고 約定債務關係로 이해하고 있으나, 解除의 意思表示와 같이 形成權의 행사의 효과는 法律의 規定에 의해서 정하여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를 約定債務關係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金旭坤, 前揭로 인하여 返還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의 利子를 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직접효과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현행 민법하에서의 解除의 效果에 대한 法理構成의 문제는 여전히 物權行爲의 有因 無因性論과 관련을 가지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다.
_ 더욱이 登記原因인 제186조 소정의 法律行爲의 의미를 債權行爲 내지 物權的 合意를 포함하는 債權行爲로 이해한다면, 原因行爲인 債權行爲의 失效는 物權行爲의 意思的 要素인 物權的 合意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즉, 요건상 物權行爲의 有因性을 인정한다면 효과상 物權行爲의 有因性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物權行爲의 有因性에 의하면 不動産登記에 公信力을 인정할 수 없는 현행법제하에서 不實登記信賴者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문제되나, 이는 민법상의 信賴保護規定 등의 擴大 내지 類推適用에 의한 信賴保護法理의 構成으로 보호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주79)
주79) 高翔龍, 「民法 제108조 2항 類推適用論」, 考試硏究(1988.7), 255면; 拙者, 前揭 不動産物權變動論, 353면 이하 참조
주75) 그리고 학설 중에 物權行爲의 無因性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物權行爲의 獨自性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金容漢, 前揭 物權法論, 89면)가 있으나 의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物權行爲의 獨自性論은 法律行爲의 해석의 문제인 물권행위의 시기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인정을 위한 전제로는 物權行爲의 독자적 존재의 인정을 들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法律政策的 측면에서 物權行爲의 無因性을 인정함으로써 去來安全을 圖謀하고자 하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첫째,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인정으로 인한 제3자의 保護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효과이지 직접적으로 제3자관계에서 문제되는 無權利者로부터의 權利取得이 정당화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즉 物權行爲의 無因性이 인정되고 있는 독일 민법하에서도 不實登記의 信賴者는 登記의 公信力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인정으로 이러한 者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래의 안전과 善意의 제3자보호는 物權行爲理論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信賴保護領域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物權行爲의 無因性이 去來安全保護의 기능을 하는 영역은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의 경우이고 그것도 物權行爲 자체에 瑕疵가 없는 경우라고 하겠는데, 이 경우 현행 민법은 善意의 제3자보호를 위한 信賴保護規定이 마련되어 있다.
_ 둘째, 物權行爲의 無因性論은 去來安全保護라고 하는 立法政策的 考慮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물론 그 理論發展過程에 있어서 去來安全保護의 문제가 전혀 考慮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나 物權行爲論과 登記의 公信力과는 그 形成의 過程을 달리한다), Savigny의 無因的物權契約理論이 立法化되는 過程에 있어서도 프로이센 저당권등기제도에 있어서 不動産信用의 장애가 되었던 登記原因에 대한 實質審査主義의 排除의 역할을 가지고 게르만법상의 Auflassung에 기한 登記制度와 결합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登記의 公信力缺陷을 이의 인정으로 補充한다고 하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주76) 더욱이 우리 나라의 無因論者의 대부분은 相對的 無因性을 취하고 있는 바, 相對的 無因性을 취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去來安全을 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주76) 高翔龍,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의 再檢討小考」, 法思想과 民事法, 玄勝鍾博士華甲紀念論文集, 國民書館, 1979, 246면.
[977]
Ⅴ. 結 論
_ 이상의 검토로부터 현행법의 해석상 物權行爲의 無因性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의 立法者 意思는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새길 수도 있으나, 현행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物權行爲의 無因性에 기초하여 解釋을 하면 惡意의 제3자까지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주77) 他法律制度와의 균형상 맞지 않는다(물론 解除의 경우는 無效 取消와 그 原因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 또한 契約解除의 효과에 대하여 物權行爲의 無因性에 기초를 둔 債權的 效果說을 취하는 경우 민법 제548조 2항을 설명하기 어렵다.주78)
주77) P.Heck, Das abstrakte dingliche Rechtsgesch ft, Verlag von J.C.B.Mohr, 1937, SS.17-26.
주78) 최근에는 독일 법학의 영향을 받아 契約解除의 효과와 관련하여 淸算關係說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淸算關係說에 의하면 物權行爲論과는 관계없이 契約解除의 효과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淸算關係說은 독일 민법상 우리 나라 민법에서와 같은 解止制度를 解除制度와 구별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또 繼續的 債權關係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결과,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苦肉之策의 理論構成이다. 또한 解除의 效果에 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 解除權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문제의식하에 형성되 理論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법은 契約의 遡及效를 가져오는 解除制度와 장래에 대하여서만 契約을 소멸시키는 解止制度를 대립시켜 규정하고 있다. 또 解除權의 행사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소급적무효를 가져오는 해제권을 인정하면서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法規範의 형성에 있어서 언제나 그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立法 政策的인 法規範의 形成도 있는 것이다(프랑스 민법 제1184조 2항 참조). 나아가 淸算關係說은 해제의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法定債權關係로 이해하지 않고 約定債務關係로 이해하고 있으나, 解除의 意思表示와 같이 形成權의 행사의 효과는 法律의 規定에 의해서 정하여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를 約定債務關係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金旭坤, 前揭로 인하여 返還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의 利子를 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직접효과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현행 민법하에서의 解除의 效果에 대한 法理構成의 문제는 여전히 物權行爲의 有因 無因性論과 관련을 가지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다.
_ 더욱이 登記原因인 제186조 소정의 法律行爲의 의미를 債權行爲 내지 物權的 合意를 포함하는 債權行爲로 이해한다면, 原因行爲인 債權行爲의 失效는 物權行爲의 意思的 要素인 物權的 合意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즉, 요건상 物權行爲의 有因性을 인정한다면 효과상 物權行爲의 有因性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物權行爲의 有因性에 의하면 不動産登記에 公信力을 인정할 수 없는 현행법제하에서 不實登記信賴者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문제되나, 이는 민법상의 信賴保護規定 등의 擴大 내지 類推適用에 의한 信賴保護法理의 構成으로 보호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주79)
주79) 高翔龍, 「民法 제108조 2항 類推適用論」, 考試硏究(1988.7), 255면; 拙者, 前揭 不動産物權變動論, 353면 이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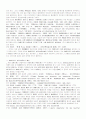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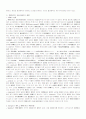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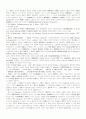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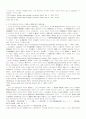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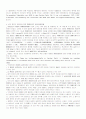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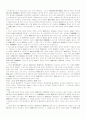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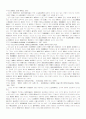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