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힘도 오늘날 더 이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소유권의 사회적 힘의 무제한적 행사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소유권자가 더 이상 파괴할 수 없는 노동의 사회적 실존질서에 오늘날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 노동법적 규율의 특징이다. 노동법적 규율은, 소유권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에 대한 소유권의 사회적 지배력를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주32) Lassalle는 노동법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 Lassalle는 \"획득된 권리의 체계\"라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32)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대와 중세의 물권법과 근대의 채권법을 \"노동에 대한 소유의 명령법(命令法)\"이라고 한다면, 현대의 노동법은 \"소유에 대한 노동의 조화법(調和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_ \"이러한 주장은 첫눈에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법사의 문화사적 행보는 사적 개인주의의 소유권 영역을 점차 제한하고 사적 소유권 밖에서 대상을 제정하는[158] 데 있다. 진정한 법사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기술할 때, 이것이 가장 주된 지도적 사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다.\"주33)
주33) H.Sinzheimer, Die Demokratisierung des Arbeitsverhaltnisses, ders., Arbeitsrecht und Rechtssoziologie, Bd I, 1976, S.124에서 재인용.
_ 위와 같은 Lassalle의 언급은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의 사회화 현상과 그 본질에 관한 핵심적 파악이라고 하겠다. Lassalle는 그의 생존동안 노동법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사상은 노동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에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법적 규율은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감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_ 둘째, 우리는 소유권이 후퇴하는 만큼 노동하는 인간이 새로운 법적 효력으로서 고양되고 있다는 것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오늘날 노동의 법적 상황은 노예 또는 농노노동에서부터 산업조직적 종속노동으로의 변동하고 있다. 노동의 물권법적 규율에서 어떠한 권리능력도 없는 노동자가 노동의 채권법적 규율에서는 법적 주체로 되고, 노동법적 규율에서는 일반적 법주체성을 넘어서 일정한 인간적 생활영역에 대한 불가침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고대와 중세에서 물건이었던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근대에서 추상적인 \"인\"으로 향상되었다가, 현대에서 노동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노동법은 인간이 단지 유적 존재(類的 存在)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유적 존재는 단지 모든 인간이 권리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능력의 주체인 인(人)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노동법은 인간이 여러 계급에서 상이한 구체적인 생활속에 존재한다는 것, 즉 근로자가 추상적 인(人)일 뿐만 아니라 계급의 주체, 즉 그의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이 배제된 채 추상적 인으로만 취급하면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계급적 상황의 주체라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에는 인간을 추상적 인개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 생활 모습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간개념이 있다.주34)
주34) 노동법의 인간상에 관해서는 강희원, \"노동법에 있어서 인간상\", 「경희법학」, 제31권 제1호, 1996, 137 150면 참조.
_ 이러한 인간개념이 근대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법은 개인이 자유롭게 투쟁할 수 있게금 방임하는 것, 즉 자유경쟁에서 먹거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근대법은 모든 인간이 그에게 필요한 생활 재화를 얻는데 자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근대법적 시각에서 자유를 사용함에서 있어서 개인간의 사회적 힘의 차이는 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근대법은 생활능력의 실질[159] 적 차이로 인하여 생존투쟁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다. 노동법은 권리능력 뿐만 아니라 생존능력을 인간의 본질로 파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노동법에 있어서 인간은 사회적인 개념이다.
_ 노동법은 인간 그 자체의 구속적 조건을 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소유와 노동을 모순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주35) 이라는 개념하에 조화시킨다. 인간은 그가 소유권에 기하여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힘이 부여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법은 노동주체로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창설하고 실현한다. 생존권은 근로자의 힘, 재화영역, 의사결정권를 보호해서 소유권을 축소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자유영역을 확장한다. 이러한 생존권은 구체적 인간이 법에 구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인간은 그 본질상 소유의 낡은 법원칙에 대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법원칙들을 형성한다. 과거에는 소유에 의하여 노동과 소유의 관계가 결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노동법에 의해서 쌍방이 대항력으로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소유와 노동의 관계를 결정하는 법으로서 현대 노동법의 발전은 결국 소유와 노동의 대향력의 상호작용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유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우리가 노동이 노동법을 통해서 소유를 일방적으로 구속해야 된다는 사고를 전개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노동법을 소유와 노동의 변증법적 합으로서 인간의 실질적 지위를 고양하는 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35) 이러한 맥락에서 Sinzheimer논 노동과 소유의 합으로서 인간 그 자체를 \"Menschentum\"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Menschentum은 \"인간성\" 또는 \"인간고유\"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는 소유(Eigentum)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H.Sinzheimer, Die Demokratisierung des Arbeitsverhaltnisses, ders., Arbeitsrecht und Rechtssoziologie, Bd I, 1976, S.125.
주32)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대와 중세의 물권법과 근대의 채권법을 \"노동에 대한 소유의 명령법(命令法)\"이라고 한다면, 현대의 노동법은 \"소유에 대한 노동의 조화법(調和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_ \"이러한 주장은 첫눈에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법사의 문화사적 행보는 사적 개인주의의 소유권 영역을 점차 제한하고 사적 소유권 밖에서 대상을 제정하는[158] 데 있다. 진정한 법사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기술할 때, 이것이 가장 주된 지도적 사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다.\"주33)
주33) H.Sinzheimer, Die Demokratisierung des Arbeitsverhaltnisses, ders., Arbeitsrecht und Rechtssoziologie, Bd I, 1976, S.124에서 재인용.
_ 위와 같은 Lassalle의 언급은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의 사회화 현상과 그 본질에 관한 핵심적 파악이라고 하겠다. Lassalle는 그의 생존동안 노동법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사상은 노동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에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법적 규율은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감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_ 둘째, 우리는 소유권이 후퇴하는 만큼 노동하는 인간이 새로운 법적 효력으로서 고양되고 있다는 것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오늘날 노동의 법적 상황은 노예 또는 농노노동에서부터 산업조직적 종속노동으로의 변동하고 있다. 노동의 물권법적 규율에서 어떠한 권리능력도 없는 노동자가 노동의 채권법적 규율에서는 법적 주체로 되고, 노동법적 규율에서는 일반적 법주체성을 넘어서 일정한 인간적 생활영역에 대한 불가침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고대와 중세에서 물건이었던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근대에서 추상적인 \"인\"으로 향상되었다가, 현대에서 노동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노동법은 인간이 단지 유적 존재(類的 存在)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유적 존재는 단지 모든 인간이 권리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능력의 주체인 인(人)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노동법은 인간이 여러 계급에서 상이한 구체적인 생활속에 존재한다는 것, 즉 근로자가 추상적 인(人)일 뿐만 아니라 계급의 주체, 즉 그의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이 배제된 채 추상적 인으로만 취급하면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계급적 상황의 주체라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에는 인간을 추상적 인개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 생활 모습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간개념이 있다.주34)
주34) 노동법의 인간상에 관해서는 강희원, \"노동법에 있어서 인간상\", 「경희법학」, 제31권 제1호, 1996, 137 150면 참조.
_ 이러한 인간개념이 근대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법은 개인이 자유롭게 투쟁할 수 있게금 방임하는 것, 즉 자유경쟁에서 먹거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근대법은 모든 인간이 그에게 필요한 생활 재화를 얻는데 자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근대법적 시각에서 자유를 사용함에서 있어서 개인간의 사회적 힘의 차이는 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근대법은 생활능력의 실질[159] 적 차이로 인하여 생존투쟁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다. 노동법은 권리능력 뿐만 아니라 생존능력을 인간의 본질로 파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노동법에 있어서 인간은 사회적인 개념이다.
_ 노동법은 인간 그 자체의 구속적 조건을 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소유와 노동을 모순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주35) 이라는 개념하에 조화시킨다. 인간은 그가 소유권에 기하여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힘이 부여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법은 노동주체로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창설하고 실현한다. 생존권은 근로자의 힘, 재화영역, 의사결정권를 보호해서 소유권을 축소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자유영역을 확장한다. 이러한 생존권은 구체적 인간이 법에 구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인간은 그 본질상 소유의 낡은 법원칙에 대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법원칙들을 형성한다. 과거에는 소유에 의하여 노동과 소유의 관계가 결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노동법에 의해서 쌍방이 대항력으로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소유와 노동의 관계를 결정하는 법으로서 현대 노동법의 발전은 결국 소유와 노동의 대향력의 상호작용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유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우리가 노동이 노동법을 통해서 소유를 일방적으로 구속해야 된다는 사고를 전개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노동법을 소유와 노동의 변증법적 합으로서 인간의 실질적 지위를 고양하는 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35) 이러한 맥락에서 Sinzheimer논 노동과 소유의 합으로서 인간 그 자체를 \"Menschentum\"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Menschentum은 \"인간성\" 또는 \"인간고유\"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는 소유(Eigentum)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H.Sinzheimer, Die Demokratisierung des Arbeitsverhaltnisses, ders., Arbeitsrecht und Rechtssoziologie, Bd I, 1976, S.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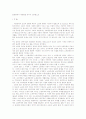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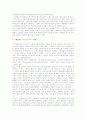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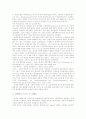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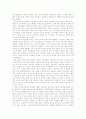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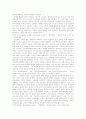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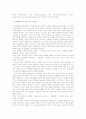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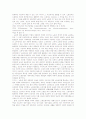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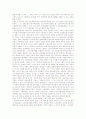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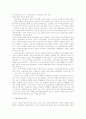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