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51)
주50) Duns Scotus, Opus Oxoniunse, IV. a. 21 : H. Welzel,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4. Aufl, 1962, S. 55에서 인용.
주51) 심헌섭, 위 논문, 193면.
_ 법철학에서도 슈탐러, 마이어(M. E. Mayer), 라드브루흐는 황금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페히너(E. Fechner), 마이호퍼(W. Maihofer)는 황금률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마이호퍼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역할과 입장에 서서 무엇을 기대하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를 묻게 하는 원리라고 하였다.주52) 슈펜델(G. Spendel)도 황금률을 \'모든 국가의 입법과 모든 개인의 행위가 따라야 하는 철칙(鐵則)과 같은 불문(不文)의 법원칙들\'의 하나로 보았다.주53)
주52) W. Maihofer, Von Sinn Menschlicher Ordnung, 1956, S. 86 87.
주53) G. Spendel, Die Goldene Regel, 앞의 책, S. 516.
_ 켈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이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도 나무람 받지 않는 결과에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황금률이 제대로 사회의 근본규범으로 이바지 하려면 다른 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바라야만 하는\'(soll)대로 다룰 것을 명하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주54) 벨첼(H. Welzel)도 켈젠 못지않게 비판적으로 이해하였다.주55)
주54) H. Kelsen, Die Normen der Gerechtigkeit, S. 363 368.
주55) H. Welzel,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S. 55.
_ 이러한 서양 법철학자들의 황금률 이해를 검토한 논문을 쓴 심헌섭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_ 황금률은 모든 \'법원리\'가 그러하듯 형식적이다. 위에서 황금률은 실질적인 면이 있다고 했으나 그것은 정의나 평등 원리에 비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황금률은 \'무엇\'이 우리가 다른 이로부터 바라지 않고(또는 바라고), 그리고 이에 따라 행하지 않아야 하는지(또는 행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황금률이 모든 법의 형성에 대해서 전제가 되는 원리이지만[117] 그것 안에서 벌써 생활현실의 질서에 필요한 모든 개개의 법규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황금률을 \'무의미\'하다고 결론지우는 것은 잘못이다. 황금률도 우선 개개인에게나 입법자에게 적어도 모두에 유해(有害)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또 그러한 행위를 입법함에 유념하라고 늘 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황금률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의 이른바 방향제시적 원리로서 기능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능도 공자(孔子)가 일찌기 제창했던 소극적 황금률이 더 잘 발휘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주56)
주56) 심헌섭, 위 논문, 201면.
_ 이처럼 \'방향제시적 원리\'는 적어도 법과 관련하여서는 실천이성에 속하게 되며, 여기에서 공자에게서 비롯된 동양적 윤리덕목들이 배경이 되어 법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_ 동양철학 내지 윤리학에서는 황금률과 같은 원리로 혈구지도(契矩之道)라 부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물건을 자(尺)로 재듯이 내 마음을 자로 삼아 남의 마음을 재고 내 처지를 생각해서 남의 처지를 아는 방법을 뜻한다. 공자가 \'서\'(恕)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듯이, 바로 내가 남과 상호교환할 수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혈구지도의 정신인 것이다. 동양인은 이러한 실천이성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지나친 권리주장이나 투쟁보다는 조화와 의무감을 먼저 생각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법의 생활화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긍정적 내지 부정적 역할을 하였는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하겠다.
결 론
_ 이상에서 우리는 동양에서 법과 실천이성의 관계를 실천과 이성, 법과 도덕의 공리로서의 예, 정명과 형명의 책임윤리, 황금률과 같은 혈구[118] 지도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결국 동양에서 법이라는 것, 즉 무엇이 바른 것(正義)인가를 이론이성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천이성의 지혜들을 통하여 바름의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면에서의 법철학은 없었지만, 실천적인 법철학을 전개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왜 그러했는가를 설명하려면, 다시 원점에서 서양인의 사고방식과 동양인의 멘탈리티의 기초와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이것은 법철학의 범위를 넘어서 광대한 작업이다.주57) 그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든, 분명한 것은 서양 법철학에서 이론이성적인 면으로 법(正義)을 찾으려고 하는 점에도 한계가 있어 실천이성에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양에서는 더욱 실천이성이 중요하며 그것이 집적되어 법철학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동양에서의 법이란 사실상 동양적 실천이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도를 키워나가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키워나가지 않는다\"(人能弘道 非道弘人)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단순한 선만으로는 정치에 부족하고, 단순한 법만으로는 저절로 시행되지 못한다\"(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는 맹자의 말이나, 심지어 석가의 \"모든 법(진리)은 뗏목과 같아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그 목적달성으로 존재가치를 다한 것처럼 법 또한 인간을 피안의 해탈에 이르게 하는 방편성을 다 수행하면 또한 마땅히 놓아주어야 한다\"는 교훈은 동양인의 법관념 실정법이든 자연법이든 진리이든 의 인간중심적이면서 실천이성과의 밀착성을 말해주는 증언이라고 하겠다.
주57) 金秉圭교수는 민족의 가치감정을 분석하여 서양인의 명예감정(Ehrenfefuhl)과 동양인의 책임감정(Verantwortungsgefuhl)의 관점에서, 중국인의 面子의식, 일본인의 羞恥의식, 한국인의 체면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김병규, 「法哲學의 根本問題」, 148 197면.
주50) Duns Scotus, Opus Oxoniunse, IV. a. 21 : H. Welzel,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4. Aufl, 1962, S. 55에서 인용.
주51) 심헌섭, 위 논문, 193면.
_ 법철학에서도 슈탐러, 마이어(M. E. Mayer), 라드브루흐는 황금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페히너(E. Fechner), 마이호퍼(W. Maihofer)는 황금률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마이호퍼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역할과 입장에 서서 무엇을 기대하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를 묻게 하는 원리라고 하였다.주52) 슈펜델(G. Spendel)도 황금률을 \'모든 국가의 입법과 모든 개인의 행위가 따라야 하는 철칙(鐵則)과 같은 불문(不文)의 법원칙들\'의 하나로 보았다.주53)
주52) W. Maihofer, Von Sinn Menschlicher Ordnung, 1956, S. 86 87.
주53) G. Spendel, Die Goldene Regel, 앞의 책, S. 516.
_ 켈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이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도 나무람 받지 않는 결과에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황금률이 제대로 사회의 근본규범으로 이바지 하려면 다른 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바라야만 하는\'(soll)대로 다룰 것을 명하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주54) 벨첼(H. Welzel)도 켈젠 못지않게 비판적으로 이해하였다.주55)
주54) H. Kelsen, Die Normen der Gerechtigkeit, S. 363 368.
주55) H. Welzel,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S. 55.
_ 이러한 서양 법철학자들의 황금률 이해를 검토한 논문을 쓴 심헌섭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_ 황금률은 모든 \'법원리\'가 그러하듯 형식적이다. 위에서 황금률은 실질적인 면이 있다고 했으나 그것은 정의나 평등 원리에 비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황금률은 \'무엇\'이 우리가 다른 이로부터 바라지 않고(또는 바라고), 그리고 이에 따라 행하지 않아야 하는지(또는 행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황금률이 모든 법의 형성에 대해서 전제가 되는 원리이지만[117] 그것 안에서 벌써 생활현실의 질서에 필요한 모든 개개의 법규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황금률을 \'무의미\'하다고 결론지우는 것은 잘못이다. 황금률도 우선 개개인에게나 입법자에게 적어도 모두에 유해(有害)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또 그러한 행위를 입법함에 유념하라고 늘 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황금률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의 이른바 방향제시적 원리로서 기능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능도 공자(孔子)가 일찌기 제창했던 소극적 황금률이 더 잘 발휘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주56)
주56) 심헌섭, 위 논문, 201면.
_ 이처럼 \'방향제시적 원리\'는 적어도 법과 관련하여서는 실천이성에 속하게 되며, 여기에서 공자에게서 비롯된 동양적 윤리덕목들이 배경이 되어 법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_ 동양철학 내지 윤리학에서는 황금률과 같은 원리로 혈구지도(契矩之道)라 부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물건을 자(尺)로 재듯이 내 마음을 자로 삼아 남의 마음을 재고 내 처지를 생각해서 남의 처지를 아는 방법을 뜻한다. 공자가 \'서\'(恕)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듯이, 바로 내가 남과 상호교환할 수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혈구지도의 정신인 것이다. 동양인은 이러한 실천이성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지나친 권리주장이나 투쟁보다는 조화와 의무감을 먼저 생각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법의 생활화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긍정적 내지 부정적 역할을 하였는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하겠다.
결 론
_ 이상에서 우리는 동양에서 법과 실천이성의 관계를 실천과 이성, 법과 도덕의 공리로서의 예, 정명과 형명의 책임윤리, 황금률과 같은 혈구[118] 지도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결국 동양에서 법이라는 것, 즉 무엇이 바른 것(正義)인가를 이론이성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천이성의 지혜들을 통하여 바름의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면에서의 법철학은 없었지만, 실천적인 법철학을 전개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왜 그러했는가를 설명하려면, 다시 원점에서 서양인의 사고방식과 동양인의 멘탈리티의 기초와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이것은 법철학의 범위를 넘어서 광대한 작업이다.주57) 그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든, 분명한 것은 서양 법철학에서 이론이성적인 면으로 법(正義)을 찾으려고 하는 점에도 한계가 있어 실천이성에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양에서는 더욱 실천이성이 중요하며 그것이 집적되어 법철학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동양에서의 법이란 사실상 동양적 실천이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도를 키워나가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키워나가지 않는다\"(人能弘道 非道弘人)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단순한 선만으로는 정치에 부족하고, 단순한 법만으로는 저절로 시행되지 못한다\"(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는 맹자의 말이나, 심지어 석가의 \"모든 법(진리)은 뗏목과 같아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그 목적달성으로 존재가치를 다한 것처럼 법 또한 인간을 피안의 해탈에 이르게 하는 방편성을 다 수행하면 또한 마땅히 놓아주어야 한다\"는 교훈은 동양인의 법관념 실정법이든 자연법이든 진리이든 의 인간중심적이면서 실천이성과의 밀착성을 말해주는 증언이라고 하겠다.
주57) 金秉圭교수는 민족의 가치감정을 분석하여 서양인의 명예감정(Ehrenfefuhl)과 동양인의 책임감정(Verantwortungsgefuhl)의 관점에서, 중국인의 面子의식, 일본인의 羞恥의식, 한국인의 체면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김병규, 「法哲學의 根本問題」, 148 197면.
키워드
추천자료
 민중교육론 -프레이리, 라이머, 일리치 요약, 사상 비교,
민중교육론 -프레이리, 라이머, 일리치 요약, 사상 비교, 실과 지도안 (실천적 문제해결 모형,공작적 문제해결 모형,프로젝트 접근법 모형)
실과 지도안 (실천적 문제해결 모형,공작적 문제해결 모형,프로젝트 접근법 모형) (사회복지 법제론)국민연금법
(사회복지 법제론)국민연금법 2011년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비교)
2011년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비교) 2012년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비교)
2012년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비교) 브루너의 지식구조론과 듀이의 경험중심교육 이론 비교
브루너의 지식구조론과 듀이의 경험중심교육 이론 비교 2013년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비교)
2013년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비교)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생존권, 기본권, 생존권의 의의, 권리의 개념, 헌법...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생존권, 기본권, 생존권의 의의, 권리의 개념, 헌법... [성인학습 및 상담론 공통] 에릭슨(Erikson), 레빈슨(Levinson), 로에빙거(Loevinger)의 발달...
[성인학습 및 상담론 공통] 에릭슨(Erikson), 레빈슨(Levinson), 로에빙거(Loevinger)의 발달... [성인학습및상담론 공통]행동주의 학습이론, 인본주의 학습이론,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비교·...
[성인학습및상담론 공통]행동주의 학습이론, 인본주의 학습이론,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비교·... [성인학습및상담론]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본주의 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 구성주의 학습이...
[성인학습및상담론]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본주의 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 구성주의 학습이... [아동권리와복지]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자신...
[아동권리와복지]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자신...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이념중 하나인 생종권의 개념과 내용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이념중 하나인 생종권의 개념과 내용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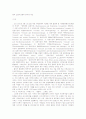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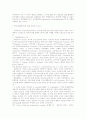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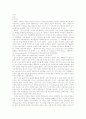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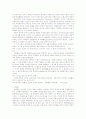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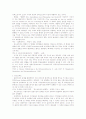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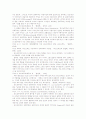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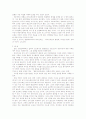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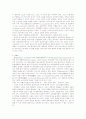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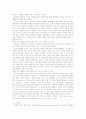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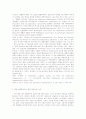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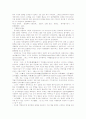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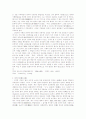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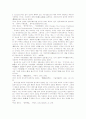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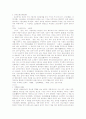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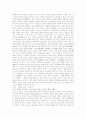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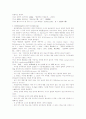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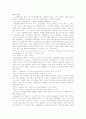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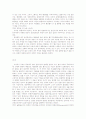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