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 序 言
제2. 西歐 法源論의 前史
제3. 알프 로스의 實證的 法源論
제4. 結 語
제2. 西歐 法源論의 前史
제3. 알프 로스의 實證的 法源論
제4. 結 語
본문내용
행하여 지는 것이다.
주49) A.Ross, TR, 338면.
_ 이와 같은 기초위에서 보면, 법학방법론상 흠결원리가 법원리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기존의 인식근거인 법률이 불충분하고, 다른 인식근거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관이 기존의 인식근거로부터 연역하는 것이 아니라, 법창조적으로 행위한다거나, 판결을 결정하는 다른 원천이 존재한다는[165] 것으로 이해된다, 흠결은 기존의 법-법률 혹은 관습법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규범이 발견될 수 없을 때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직 견해이고, 따라서 흠결의 기준은 당해 사건에서 법률의 적용가능성이 된다.
_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률은 항상 논리적 적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흠결이란 없다는 로스의 지적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법률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법률의 공백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되므로, 아무런 법적 의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흠결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정책적 개념이 된다고 한다. 즉 법적용 이전에 정책적 실질적 기준으로부터 법률의 흠결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주50) 그러나 의식적으로 법률에 일반조항이 쓰였거나, 추상적 범주만이 정해지고 판례에 그 구체화를 맡겨둔 이른바 \"의식적\"흠결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흠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주51) 그런데 법률의 배후에 있는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법을 찾는 시도가 가능하고, 거기에 법률의 흠결을 법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즉 흠결확정과 보충의 실질적 기준을 법률의 객관적 목적, 즉 법리ratio legis)에서 찾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이다.주52)
주50) A.Ross, TR, 343면.
주51) Zitelmann의 이른바 진정흠결, 그는 부진정흠결은 정책적, 법창조적 개념이지만, 진정흠결은 법적 개념이라 하였다 Zitelmann, Lucken im Recht, 1903, 25면 이하 로스도 진정흠결은 단지 법률의 불확실성에 해당한다고 한다. Ross, TR, 346면.
주52) K.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360면 이하 Ross, TR, 346면.
_ 그러나 로스에 의하면, 흠결은 법률문언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거기에서는 법률이 법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법률의 배후에 있는 법률의 목적을 확정하는 작업 자체가 널리 정책적이다. 즉 법률의 물리적 적용결과 그 판결의 모순이 생기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법률의 목적에 의하여 유추추론을 하는 것 자제가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 결과를 부인, 비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166] 인 것이 되고 말며, 이 경우의 법관활동은 법창조적이 되는 것이며, 그러한 한, 흠결보충과 법률수정과의 구별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_ 오늘날 많은 논자들이 법률보충과 법률수정의 구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전자는 법관에게 전적으로 허용되는데 비하여, 후자는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로스는 그 구별이 법이론적으로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그에 따르면 결정적인 것은 판결이 법률이 합치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법률을 변경하는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아니다. 즉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 판결은 법창조로서 새로운 법형성이지만 그 정당성은 체계로부터 나오고, 따라서 그것은 체계내재적이다. 단지 그 구별은 법 형성의 의의에 있어서 정책적 성격의 과도차이에 있다는 것이다.주53)
주53) A.Ross, TR, 345면; Zitelmann이 말한 바와 같이 不眞正흠결에서 유추는 법률변경적이다 결국 Larenz도 법률수정적 법형성도 contra legem이지만, intra ius이 질서의 내적 평가합치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의 요청을 들고 있다; Larenz, 전게서, 419 420면.
제4. 結 語
_ 이러한 관점에서 로스는 법적용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법관의 입장에서는 법원을 자신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법관의 판결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결에 의하여 적용되기 전의 법률(law in books)은 효력있는 법이 아니고, 단지 법규범에 대한 확실한 예측근거가 된다. 이러한 로스의 관념은 법관의 판결 자체나 혹은 그 예측을 법으로 보는 미국의 법현실주의 이론과 밀접히 연결된다. 그러나 로스에게 있어서 법은 법관의 구체적 법적용행위나 그 예측 자체가 아니라, 그행위에 전제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범이 법이고,[167] 그전에는 단지 법규범에 대한 개연성있는 예측만이 있게 된다.주54) 결국 그는 법개념을 체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용행위에서 찾고 사회적 全행위구조의 표결으로서의 규범체계라고 하면서, 그 체계를 궁극적 법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그가 이 체계를 생물학적 조직체에 비유하고
주54) A.Ross, On Law and Justice, 64면 이하 참조.
_ 있는 한편, 상위의 원천(예, 헌법)이 하위의 원천을 실현시키는 절차나 조건의 총합을 규정하고 이 절차나 조건을 이렇게 성립된 규범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최근에 독일의 루만(Luhmann)이 제창하는 체계이론과 절차적 정당화에 근접하고 있거나, 그 선험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_ 이러한 로스의 법원개념은 인식론적이면서도 단순한 법학적 법원개념을 넘어서서 실증적인 성격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 이론적 우수함이 있다. 그러한 관점하에서 로스는 법질서의 단계구조내에서 각 단계의 법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상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_ 한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인다면, 그의 법원론에서는 판례가 하위단계에서 귀납적으로 성립하는 법규범이며, 관습이 판례에 의하여 심사되고 승인되는 한, 법규범으로서의 관습법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학파의 영향아래 놓여 있는 전통적 법원론과 그 실무상 결과는 같더라도 이론적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주49) A.Ross, TR, 338면.
_ 이와 같은 기초위에서 보면, 법학방법론상 흠결원리가 법원리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기존의 인식근거인 법률이 불충분하고, 다른 인식근거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관이 기존의 인식근거로부터 연역하는 것이 아니라, 법창조적으로 행위한다거나, 판결을 결정하는 다른 원천이 존재한다는[165] 것으로 이해된다, 흠결은 기존의 법-법률 혹은 관습법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규범이 발견될 수 없을 때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직 견해이고, 따라서 흠결의 기준은 당해 사건에서 법률의 적용가능성이 된다.
_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률은 항상 논리적 적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흠결이란 없다는 로스의 지적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법률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법률의 공백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되므로, 아무런 법적 의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흠결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정책적 개념이 된다고 한다. 즉 법적용 이전에 정책적 실질적 기준으로부터 법률의 흠결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주50) 그러나 의식적으로 법률에 일반조항이 쓰였거나, 추상적 범주만이 정해지고 판례에 그 구체화를 맡겨둔 이른바 \"의식적\"흠결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흠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주51) 그런데 법률의 배후에 있는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법을 찾는 시도가 가능하고, 거기에 법률의 흠결을 법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즉 흠결확정과 보충의 실질적 기준을 법률의 객관적 목적, 즉 법리ratio legis)에서 찾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이다.주52)
주50) A.Ross, TR, 343면.
주51) Zitelmann의 이른바 진정흠결, 그는 부진정흠결은 정책적, 법창조적 개념이지만, 진정흠결은 법적 개념이라 하였다 Zitelmann, Lucken im Recht, 1903, 25면 이하 로스도 진정흠결은 단지 법률의 불확실성에 해당한다고 한다. Ross, TR, 346면.
주52) K.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360면 이하 Ross, TR, 346면.
_ 그러나 로스에 의하면, 흠결은 법률문언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거기에서는 법률이 법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법률의 배후에 있는 법률의 목적을 확정하는 작업 자체가 널리 정책적이다. 즉 법률의 물리적 적용결과 그 판결의 모순이 생기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법률의 목적에 의하여 유추추론을 하는 것 자제가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 결과를 부인, 비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166] 인 것이 되고 말며, 이 경우의 법관활동은 법창조적이 되는 것이며, 그러한 한, 흠결보충과 법률수정과의 구별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_ 오늘날 많은 논자들이 법률보충과 법률수정의 구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전자는 법관에게 전적으로 허용되는데 비하여, 후자는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로스는 그 구별이 법이론적으로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그에 따르면 결정적인 것은 판결이 법률이 합치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법률을 변경하는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아니다. 즉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 판결은 법창조로서 새로운 법형성이지만 그 정당성은 체계로부터 나오고, 따라서 그것은 체계내재적이다. 단지 그 구별은 법 형성의 의의에 있어서 정책적 성격의 과도차이에 있다는 것이다.주53)
주53) A.Ross, TR, 345면; Zitelmann이 말한 바와 같이 不眞正흠결에서 유추는 법률변경적이다 결국 Larenz도 법률수정적 법형성도 contra legem이지만, intra ius이 질서의 내적 평가합치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의 요청을 들고 있다; Larenz, 전게서, 419 420면.
제4. 結 語
_ 이러한 관점에서 로스는 법적용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법관의 입장에서는 법원을 자신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법관의 판결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결에 의하여 적용되기 전의 법률(law in books)은 효력있는 법이 아니고, 단지 법규범에 대한 확실한 예측근거가 된다. 이러한 로스의 관념은 법관의 판결 자체나 혹은 그 예측을 법으로 보는 미국의 법현실주의 이론과 밀접히 연결된다. 그러나 로스에게 있어서 법은 법관의 구체적 법적용행위나 그 예측 자체가 아니라, 그행위에 전제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범이 법이고,[167] 그전에는 단지 법규범에 대한 개연성있는 예측만이 있게 된다.주54) 결국 그는 법개념을 체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용행위에서 찾고 사회적 全행위구조의 표결으로서의 규범체계라고 하면서, 그 체계를 궁극적 법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그가 이 체계를 생물학적 조직체에 비유하고
주54) A.Ross, On Law and Justice, 64면 이하 참조.
_ 있는 한편, 상위의 원천(예, 헌법)이 하위의 원천을 실현시키는 절차나 조건의 총합을 규정하고 이 절차나 조건을 이렇게 성립된 규범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최근에 독일의 루만(Luhmann)이 제창하는 체계이론과 절차적 정당화에 근접하고 있거나, 그 선험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_ 이러한 로스의 법원개념은 인식론적이면서도 단순한 법학적 법원개념을 넘어서서 실증적인 성격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 이론적 우수함이 있다. 그러한 관점하에서 로스는 법질서의 단계구조내에서 각 단계의 법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상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_ 한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인다면, 그의 법원론에서는 판례가 하위단계에서 귀납적으로 성립하는 법규범이며, 관습이 판례에 의하여 심사되고 승인되는 한, 법규범으로서의 관습법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학파의 영향아래 놓여 있는 전통적 법원론과 그 실무상 결과는 같더라도 이론적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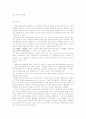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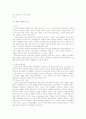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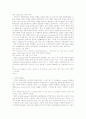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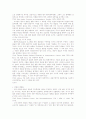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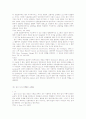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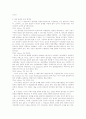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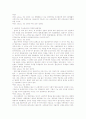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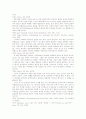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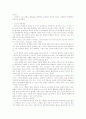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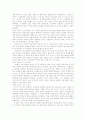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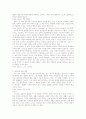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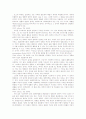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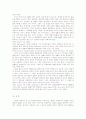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