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는 현상이 있다. 이를 첨가라 한다. '고치다'를 '곤치다'로 말하는 방언이 있는데 여기에 'ㄴ'이 삽입된 것은 바로 첨가의 예일 것이다. 오늘날의 '던지다'도 그 고형 '더디다' 와 비교해 보면 'ㄴ'이 삽입된 첨가 현상의 결과임을 볼 수 있다.
'소+아지' 처럼 모음이 직접 만나는 현상을 모음충돌이라 하는데 이 상태는 발음하기가 뻑뻑하므로 어떤 조처를 취하는 수가 많다. '소+아지>송아지'처럼 두 모음 사이에 자음을 삽입시키는 첨가 현상은 그러한 거북한 상태를 해소하는 조처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축약 및 기타
(1)축약
두 음이 한 음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축약이라 한다. 사적으로 '개'는 '가히>가이>개'의 과정을 밟아 된 것인데 여기에서 'ㅏ'와 'ㅣ'의 두 보음이 'ㅐ'의 한 모음으로 줄어든 것은 곧 축약의 예다. '보이다 뵈다', '누이다 뉘다'도 같은 현상이며, '세우다, 태우다'의 '세, 태' 도 '서-이우-다, 타-이우-다'의 '서+ㅣ'와 '타+ㅣ'가 축약된 결과로 분석된다.
두 모음이 위에서처럼 단모음으로 줄지 않고 앞의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이중모음으로 되는 현상도 흔히 축약의 일종으로 다룬다. '보-아라 봐라, 주-어라 줘라'의 'ㅗ'와 'ㅜ'가 반모음'w'로 바뀌면서 'ㅗ+ㅏ'가 'ㅘ'로, 'ㅜ+ㅓ'가 'ㅝ'로 준 것이라든가 '피-어서 펴서, 하-시-었-다 하셨다'에서 'ㅣ'가 반모음'j'로 바뀌면서 'ㅣ+ㅓ'가 'ㅕ'로 줄어든 것이 그 예들이다.
(2)음운도치
한 단어 안에 있는 두 음소, 또는 두 음절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현상을 음운도치라 한다. 어떤 방언에서는 '거품'을 '버쿰'이라고 하는데 이는 'k '에서 'k(ㄱ)'와 'p(ㅂ)' 가 서로 자리를 바꾼, 즉 음운도치의 결과일 것이다. 오늘날의 '배꼽'은 그 고형' 복'으로부터 '복'의 'ㅂ'과 'ㄱ'이 자리를 바꾸어 ' > >배꼽'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음운도치는 대체로 처음에는 부주의한 말에서 일어난 현상이던 것이 새로움을 주는 매력 때문에 굳어진 현상으로 해석된다. 흔히 농담으로 '밥에 입 들어간다' 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부주의로 인해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말하는 경우가 꽤 많다. 가령 '받아 갔니?'라고 할 것을 '갇아 방니?' 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음운도치는 실제로는 꽤 많은 현상인데 그것이 새 언어 형태로 굳어지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3)이화
서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하나를 다른 소리로 바꾸는 현상을 이화라 한다. 이는 동화와 대립되는 현상인데 발음의 단조로움을 깨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세국어의 '붚, 거붑'이 오늘날 '북, 거북'으로 바뀐 것은 대표적인 이화의 예다. 'ㅂ' 하나를 'ㄱ' 으로 바꿈으로써 두 'ㅂ'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깬 것이다.
이화는 음운도치와 마찬가지로 그리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두 현상 모두, 어떤 음과 어떤 음이 만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엄격한 규칙이 없고 같은 조건에 있는 단어 중에서도 특정 단어에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소+아지' 처럼 모음이 직접 만나는 현상을 모음충돌이라 하는데 이 상태는 발음하기가 뻑뻑하므로 어떤 조처를 취하는 수가 많다. '소+아지>송아지'처럼 두 모음 사이에 자음을 삽입시키는 첨가 현상은 그러한 거북한 상태를 해소하는 조처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축약 및 기타
(1)축약
두 음이 한 음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축약이라 한다. 사적으로 '개'는 '가히>가이>개'의 과정을 밟아 된 것인데 여기에서 'ㅏ'와 'ㅣ'의 두 보음이 'ㅐ'의 한 모음으로 줄어든 것은 곧 축약의 예다. '보이다 뵈다', '누이다 뉘다'도 같은 현상이며, '세우다, 태우다'의 '세, 태' 도 '서-이우-다, 타-이우-다'의 '서+ㅣ'와 '타+ㅣ'가 축약된 결과로 분석된다.
두 모음이 위에서처럼 단모음으로 줄지 않고 앞의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이중모음으로 되는 현상도 흔히 축약의 일종으로 다룬다. '보-아라 봐라, 주-어라 줘라'의 'ㅗ'와 'ㅜ'가 반모음'w'로 바뀌면서 'ㅗ+ㅏ'가 'ㅘ'로, 'ㅜ+ㅓ'가 'ㅝ'로 준 것이라든가 '피-어서 펴서, 하-시-었-다 하셨다'에서 'ㅣ'가 반모음'j'로 바뀌면서 'ㅣ+ㅓ'가 'ㅕ'로 줄어든 것이 그 예들이다.
(2)음운도치
한 단어 안에 있는 두 음소, 또는 두 음절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현상을 음운도치라 한다. 어떤 방언에서는 '거품'을 '버쿰'이라고 하는데 이는 'k '에서 'k(ㄱ)'와 'p(ㅂ)' 가 서로 자리를 바꾼, 즉 음운도치의 결과일 것이다. 오늘날의 '배꼽'은 그 고형' 복'으로부터 '복'의 'ㅂ'과 'ㄱ'이 자리를 바꾸어 ' > >배꼽'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음운도치는 대체로 처음에는 부주의한 말에서 일어난 현상이던 것이 새로움을 주는 매력 때문에 굳어진 현상으로 해석된다. 흔히 농담으로 '밥에 입 들어간다' 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부주의로 인해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말하는 경우가 꽤 많다. 가령 '받아 갔니?'라고 할 것을 '갇아 방니?' 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음운도치는 실제로는 꽤 많은 현상인데 그것이 새 언어 형태로 굳어지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3)이화
서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하나를 다른 소리로 바꾸는 현상을 이화라 한다. 이는 동화와 대립되는 현상인데 발음의 단조로움을 깨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세국어의 '붚, 거붑'이 오늘날 '북, 거북'으로 바뀐 것은 대표적인 이화의 예다. 'ㅂ' 하나를 'ㄱ' 으로 바꿈으로써 두 'ㅂ'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깬 것이다.
이화는 음운도치와 마찬가지로 그리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두 현상 모두, 어떤 음과 어떤 음이 만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엄격한 규칙이 없고 같은 조건에 있는 단어 중에서도 특정 단어에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추천자료
 제 9 장 동사의 시제(Tense)
제 9 장 동사의 시제(Tense) 국어의 모음충돌 회피현상
국어의 모음충돌 회피현상 한국어 변천사(구개음화)의 분석
한국어 변천사(구개음화)의 분석 음운현상에대해
음운현상에대해 러시아어(노어) 음운론
러시아어(노어) 음운론 교통기관 활동지,
교통기관 활동지,  [방언어휘][방언][어휘]방언어휘(방언의 어휘) 의미, 방언어휘(방언의 어휘) 특성, 황해도 방...
[방언어휘][방언][어휘]방언어휘(방언의 어휘) 의미, 방언어휘(방언의 어휘) 특성, 황해도 방... 한국어의 특징
한국어의 특징 영어 발음지도(발음교육) 목표와 요소, 영어 발음지도(발음교육)와 음의 전이, 영어 발음지도...
영어 발음지도(발음교육) 목표와 요소, 영어 발음지도(발음교육)와 음의 전이, 영어 발음지도... 우리말(우리글, 한글, 국어)의 특성, 우리말(우리글, 한글, 국어)의 구조, 우리말(우리글, 한...
우리말(우리글, 한글, 국어)의 특성, 우리말(우리글, 한글, 국어)의 구조, 우리말(우리글, 한... 표준발음법과 오용사례, 실태, 표준발음법규정, 해결방안
표준발음법과 오용사례, 실태, 표준발음법규정, 해결방안 근대 국어의 음운 현상 - 원순모음화(圓脣母音化) 현상에 대하여
근대 국어의 음운 현상 - 원순모음화(圓脣母音化) 현상에 대하여 시이론-탑재
시이론-탑재 영어 유치원 광고
영어 유치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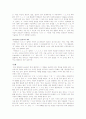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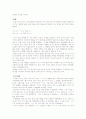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