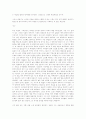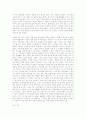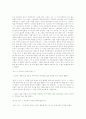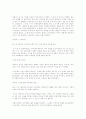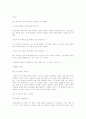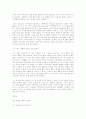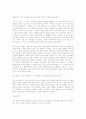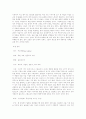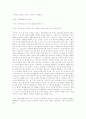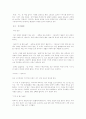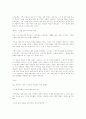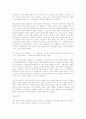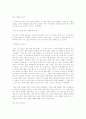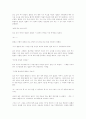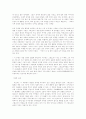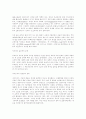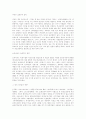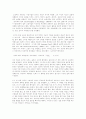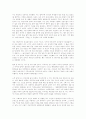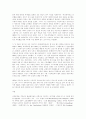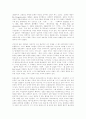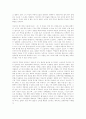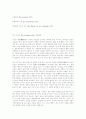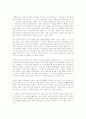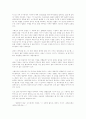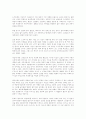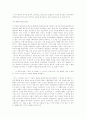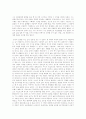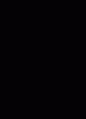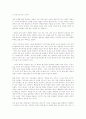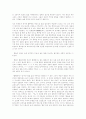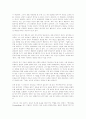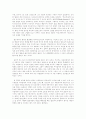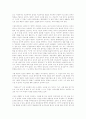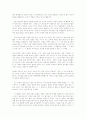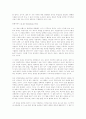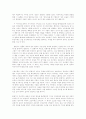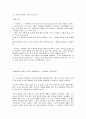-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본문내용
리고, 「벌레」「독충」이라고 번역되는 Ungeziefer라는 낱말에는 「기생충」이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카프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아버지 신세를 있던 기식자(寄食子)였음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 여러 가지 시사되는 점이 있다. 즉, 기사(騎士) 상호간의 싸움에서는, 쌍방이 모두 독립된 존재임에 반하여, 「독충의 싸움에서는 상대를 찌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병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피를 빤다」고 쓰고 있고, 또 겨우 문필에 의하여 독립한 자기를, 「꼬리를 발로 짓밟혀, 상체로 몸을 허둥대면서, 겨우 옆으로 질질 기어가는 벌레를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다」라고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 소설 『시골의 혼례 준비』의 1절에서 「나는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가끔 커다란 딱정벌레나 아니면 풍뎅이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다.
작자의 생애
카프카(Franz Kafka) 현대의 있어서 어쩌면 가장 국제적으로 알려진 독일 20세기의 작가의, 1883년 체코슬로바키아(당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속령(屬領)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정력적인 유태인의 상인의 장남으로서 태어났다. 프라하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고, 25살 때 「보헤미아 왕국 노동 재해 보험협회」의 직원이 되었고, 여가를 「글 쓰는 것」에 바쳤다. 1917년 39살 때,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투병 생활을 한 후, 1924년 비인 교외의 사나토리움에서, 40년 11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묘는 프라하 슈트라스니쯔의 신유태인 묘지에 있다.
카프카는 독일어를 하는 유태인이었다. 그가 학생이었던 1900년대, 프라하의 인구 45만명 중, 상층 계급을 차지하는 독일어 상용 인구는 고작 3만 4천명으로서, 말하자면 체코어(語)족의 외딴 섬이었다. 즉, 그는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특히 언어적으로 삼중의 겟트(유태인 동네, 원의(原義)는 「격리」)속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이며, 그의 독일어의 어휘(語彙)가 빈약하고, 문법적으로도 잘못이 있고, 이른바 조서(調書) 스타일의 즉물적 문체(卽物的文體)임은, 일반 대중과 격리된 그의 생활 환경에서 유래되는 것일 것이다.
인간 카프카가 무서운 부친(父親) 콤플렉스에 걸러 있었다는 것은, 그가 36살 때 쓴 무서운 기록『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명백히 보다도, 오히려 폭군과 노예의 관계에 가까웠다.
단편 『심판』은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익사(溺死)의 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자살하는 이야기이지만, 자기 단죄(自己斷罪)에서 그치는 작품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카프카 문학의 특색의 하나이다.
작가로서도 「자기를 말살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었음은, 학생 시절의 친구 막스 브로드에게, 자기가 쓴 것을 태워 버리도록 유언한 것으로 보아도 감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브로드가 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출판한 장편 『성(城)』이나 『심판』이 세계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여러 각도에서 빛을 일으키게 되어, 여러 각도에서 빛을 보는 유행작가가 된 것이다
명문구 낙수
「삼도내를 건너는 나의 배는 진로를 잘못 들었다…… 나의 배에는 노가 없는 것이다.」(단편『사냥꾼 그라쿠스』에서)
심화 자료
*「그라쿠스」는 까마귀의 뜻. 카프카의 자기 인식을 나타내는 단편. 사냥꾼 그라쿠스는 슈발쯔바르트(「검은 숲」)에서 추락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부(冥府)로 가는 배가 길을 잘못 들어, 결국 죽었으면서 왕생을 하지 못한다는, 말하자면 그네에 매달린「영원한 유태인」을 그리고 있다.
「잘못 울린 야밤의 벨 소리에, 한번 따르게 되면, 다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단편 『시골 의사』에서)
*겨울 날의 한밤중의 사건을 시골 의사가 회상하는 소설. 「현제의 마차를 타고, 초현세의
말들에 끌리어, 늙은 나는 돌고 있다」라는 종착역이 없는 「영원한 유태인」의 테마이다.
카프카는 프라하의 중앙 우체국에 편지를 내려고(일설에는 전보를 치려고) 갔는데, 많 은 직원들이 똑같이 책상에 마주 앉아 사무를 보고 있는 광경을 보고, 이상한 압박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용무를 보지 못하고 급히 바깥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카프카는 그가 지도하고 있던 젊은이 야노호에게 말하였다. 「나는 까마귀입니다. 나의 날개 위축되고 있습니다…… 빛나는 것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나는 돌산 속에 모습을 숨기고 싶어하는 까마귀입니다.」라고.
세계문학의 명작과 주인공 총해설에서 - 소봉파편- (일신사간)
--------------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다.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레고르 잠자는 잠자리 안에서 한 마리의 큼직한 독벌레로 변한 자신을 깨달았다." <변신>은 이렇게 시작한다.
카프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소설 속의 주인공을 괴상한 상황에 빠뜨린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다. 카프카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등장 인물에게 존재의 의미를 물으면서 그 물음을 다시 독자에게 던진다.
커다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아침 출근에 대해서 걱정한다. 외판원이 직업인 그는 착실한 가장이다.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삶의 특별한 기쁨이나 보람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산다. 그가 갑자기 벌레로 변하자 그는 그의 가족들을 걱정한다. 나 없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오히려 귀찮게 여긴다. 그의 모습에 기절하는 어머니. 사과를 그에게 마구 던지는 아버지. 그나마 다정하게 대했던 여동생 마저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을 싫어한다. 가족들은 그가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 그는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죽는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가족은 오히려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을 확신한다.
가장인 그레고르 잠자.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다. 가장, 그 힘든 역할에 있는 그는 외롭다. 가족들에게 그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무관심, 이것은 가장 놀라야 할 일임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카프카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 인간 소외와 무관심에 대해 고함치고 있다.
또, 소설 『시골의 혼례 준비』의 1절에서 「나는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가끔 커다란 딱정벌레나 아니면 풍뎅이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다.
작자의 생애
카프카(Franz Kafka) 현대의 있어서 어쩌면 가장 국제적으로 알려진 독일 20세기의 작가의, 1883년 체코슬로바키아(당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속령(屬領)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정력적인 유태인의 상인의 장남으로서 태어났다. 프라하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고, 25살 때 「보헤미아 왕국 노동 재해 보험협회」의 직원이 되었고, 여가를 「글 쓰는 것」에 바쳤다. 1917년 39살 때,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투병 생활을 한 후, 1924년 비인 교외의 사나토리움에서, 40년 11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묘는 프라하 슈트라스니쯔의 신유태인 묘지에 있다.
카프카는 독일어를 하는 유태인이었다. 그가 학생이었던 1900년대, 프라하의 인구 45만명 중, 상층 계급을 차지하는 독일어 상용 인구는 고작 3만 4천명으로서, 말하자면 체코어(語)족의 외딴 섬이었다. 즉, 그는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특히 언어적으로 삼중의 겟트(유태인 동네, 원의(原義)는 「격리」)속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이며, 그의 독일어의 어휘(語彙)가 빈약하고, 문법적으로도 잘못이 있고, 이른바 조서(調書) 스타일의 즉물적 문체(卽物的文體)임은, 일반 대중과 격리된 그의 생활 환경에서 유래되는 것일 것이다.
인간 카프카가 무서운 부친(父親) 콤플렉스에 걸러 있었다는 것은, 그가 36살 때 쓴 무서운 기록『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명백히 보다도, 오히려 폭군과 노예의 관계에 가까웠다.
단편 『심판』은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익사(溺死)의 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자살하는 이야기이지만, 자기 단죄(自己斷罪)에서 그치는 작품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카프카 문학의 특색의 하나이다.
작가로서도 「자기를 말살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었음은, 학생 시절의 친구 막스 브로드에게, 자기가 쓴 것을 태워 버리도록 유언한 것으로 보아도 감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브로드가 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출판한 장편 『성(城)』이나 『심판』이 세계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여러 각도에서 빛을 일으키게 되어, 여러 각도에서 빛을 보는 유행작가가 된 것이다
명문구 낙수
「삼도내를 건너는 나의 배는 진로를 잘못 들었다…… 나의 배에는 노가 없는 것이다.」(단편『사냥꾼 그라쿠스』에서)
심화 자료
*「그라쿠스」는 까마귀의 뜻. 카프카의 자기 인식을 나타내는 단편. 사냥꾼 그라쿠스는 슈발쯔바르트(「검은 숲」)에서 추락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부(冥府)로 가는 배가 길을 잘못 들어, 결국 죽었으면서 왕생을 하지 못한다는, 말하자면 그네에 매달린「영원한 유태인」을 그리고 있다.
「잘못 울린 야밤의 벨 소리에, 한번 따르게 되면, 다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단편 『시골 의사』에서)
*겨울 날의 한밤중의 사건을 시골 의사가 회상하는 소설. 「현제의 마차를 타고, 초현세의
말들에 끌리어, 늙은 나는 돌고 있다」라는 종착역이 없는 「영원한 유태인」의 테마이다.
카프카는 프라하의 중앙 우체국에 편지를 내려고(일설에는 전보를 치려고) 갔는데, 많 은 직원들이 똑같이 책상에 마주 앉아 사무를 보고 있는 광경을 보고, 이상한 압박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용무를 보지 못하고 급히 바깥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카프카는 그가 지도하고 있던 젊은이 야노호에게 말하였다. 「나는 까마귀입니다. 나의 날개 위축되고 있습니다…… 빛나는 것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나는 돌산 속에 모습을 숨기고 싶어하는 까마귀입니다.」라고.
세계문학의 명작과 주인공 총해설에서 - 소봉파편- (일신사간)
--------------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다.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레고르 잠자는 잠자리 안에서 한 마리의 큼직한 독벌레로 변한 자신을 깨달았다." <변신>은 이렇게 시작한다.
카프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소설 속의 주인공을 괴상한 상황에 빠뜨린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다. 카프카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등장 인물에게 존재의 의미를 물으면서 그 물음을 다시 독자에게 던진다.
커다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아침 출근에 대해서 걱정한다. 외판원이 직업인 그는 착실한 가장이다.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삶의 특별한 기쁨이나 보람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산다. 그가 갑자기 벌레로 변하자 그는 그의 가족들을 걱정한다. 나 없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오히려 귀찮게 여긴다. 그의 모습에 기절하는 어머니. 사과를 그에게 마구 던지는 아버지. 그나마 다정하게 대했던 여동생 마저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을 싫어한다. 가족들은 그가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 그는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죽는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가족은 오히려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을 확신한다.
가장인 그레고르 잠자.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다. 가장, 그 힘든 역할에 있는 그는 외롭다. 가족들에게 그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무관심, 이것은 가장 놀라야 할 일임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카프카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 인간 소외와 무관심에 대해 고함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