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1)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본론
(1)반대 의견
(2)현재의 상황
3.결론
(1)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본론
(1)반대 의견
(2)현재의 상황
3.결론
본문내용
것이며, 그렇게 일정 나이가 지날 경우 대체복무조차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무죄판결이 확정되려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으로써 2심, 3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하는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에 관한 법제정이 이루어져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킬 수 없다. 셋째, 대체복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대략 지뢰제거에서부터 평화외교활동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다. 넷째, 대체복무의 기간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의 1.5배의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복무와의 형평이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Ⅲ.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병역을 거부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만약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논리가 그릇됨을 깨닫게 된다면 그땐 비로소 병역거부를 철회하고 군대를 갈것이냐? 라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은 그들에게는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계에 불과하며 결코 자신의 오류나 자기주장의 변경, 자신의 양심적 결단의 수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토론 목적이‘ 양심에의 결단에 대한 반성적 성찰’ 이 아닌 ‘자기 양심의 관철’이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 그들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임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양심과 종교적 신념은 내심에 가지는 자유이며,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오히려 개인의 양심을 다원화시키기보다 나의 양심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주장을 사회에 관철시켜 개인의 양심에 대한 정의를 일원화 시키는 과정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군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은 살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을 펴고, 양심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즉 군대는 꼭 총만 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병은 펜을 들고 일하고, 위생병은 환자를 돌보고, 또 군대 안에도 목사 신부 승려님도 있다. 따라서 군내에서도 얼마든지, 평화와 사랑과 양심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도 추운 겨울에도 그들의 가장 좋은 시기를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들의 가족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60여만 군 복무 종사자들을 떠올리면 이러한 토론 자체를 미안하게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첫째, 무죄판결이 확정되려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으로써 2심, 3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하는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에 관한 법제정이 이루어져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킬 수 없다. 셋째, 대체복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대략 지뢰제거에서부터 평화외교활동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다. 넷째, 대체복무의 기간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의 1.5배의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복무와의 형평이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Ⅲ.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병역을 거부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만약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논리가 그릇됨을 깨닫게 된다면 그땐 비로소 병역거부를 철회하고 군대를 갈것이냐? 라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은 그들에게는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계에 불과하며 결코 자신의 오류나 자기주장의 변경, 자신의 양심적 결단의 수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토론 목적이‘ 양심에의 결단에 대한 반성적 성찰’ 이 아닌 ‘자기 양심의 관철’이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 그들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임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양심과 종교적 신념은 내심에 가지는 자유이며,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오히려 개인의 양심을 다원화시키기보다 나의 양심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주장을 사회에 관철시켜 개인의 양심에 대한 정의를 일원화 시키는 과정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군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은 살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을 펴고, 양심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즉 군대는 꼭 총만 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병은 펜을 들고 일하고, 위생병은 환자를 돌보고, 또 군대 안에도 목사 신부 승려님도 있다. 따라서 군내에서도 얼마든지, 평화와 사랑과 양심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도 추운 겨울에도 그들의 가장 좋은 시기를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들의 가족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60여만 군 복무 종사자들을 떠올리면 이러한 토론 자체를 미안하게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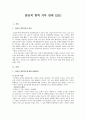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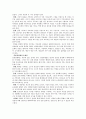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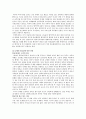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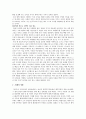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