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준말.
▶ 프로문학이란?
프로-문학의 특징
1. 형성과정
2. KAPF의 조직, 해체 과정
3. KAPF의 활동상
① 창립 당시 구성원
② 이들의 초기 활동(신경향파)
③ 본격적인 활동
④ 자체 내의 논의
【참고】 1925~35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의의
4. 프로 소설의 주요 작품
1) 낙동강
2) 과도기 (過渡期)
▶ 프로문학이란?
프로-문학의 특징
1. 형성과정
2. KAPF의 조직, 해체 과정
3. KAPF의 활동상
① 창립 당시 구성원
② 이들의 초기 활동(신경향파)
③ 본격적인 활동
④ 자체 내의 논의
【참고】 1925~35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의의
4. 프로 소설의 주요 작품
1) 낙동강
2) 과도기 (過渡期)
본문내용
, 간도 등의 농촌을 무대로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현실의 고통을 그렸고, 이 시기의 작품은 계급사상에 투철하여 다소 관념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문학 대중화론이 대두된 이후로는 ‘과도기’를 통해서 농촌 공동체의 해체와 산업화, 도시화 현상에 뒤따라 농민이 노동자로 계층 이동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소설은 카프 안에서도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았는데 박영희의 혹평과 임화의 “그 양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실로 그 정신에 있어서도 분명히 새 시대의 문학”이라는 긍정적 평가이다.
② 줄거리
창선은 간도로 이민을 갔다가 사년 만에 처자를 이끌고 함경도의 어촌인 창리 마을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 사이 고향에는 벽돌집과 공장이 들어서고 낯선 사람들만이 오고 간다. 그리고 살 길은 공장의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화전민으로 전락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 후 얼마 못 되어서 이 고장 백성들은 상투를 자르고 공장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써 주는 것이 아니다. 맨 힘차고 뼈 굵고 거슬거슬하고 나이 젊고 우둥퉁하고 미욱스럽게 생긴 사람만 뽑혔다. 그리고 거기서 까불여난 늙고 약한 사람이 개똥밭 농사나 짓고 은어 부스러기 고기잡이나 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은 온 가장을 보따리에 꾸둥쳐 지고 영원 장진으로 떠나갔다. 화전이나 해 먹을까 하는 것이다.
창선이는 요행 공장 노동자로 뽑혔다. 상투 자르고 감발 차고 부삽 들고 콘크리트 반죽하는 생소한 사람이 되었다.
③ 작품 이해 및 감상
프로문학이 생기고 나서 1929년에 발표된 이 작품에는 본격적으로 공업화의 단계에 들어선 시대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주인공 창선이 돌아간 고향에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식민지 조선이 자본주의화 함에 따라 농민이 몰락하고 노동계급이 대두하고 있음알 창선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농민층이 분해되어 공장 노동자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식민지의 공업화가 결국 농어촌의 착취와 몰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또한 농민과 노동자가 서로 다른 계층이 아닌 동맹적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과도기’는 이전의 프로문학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결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소설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전의 프로문학의 두 가지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서해의 현실 묘사에의 집착과 박영희의 관념성을 모두 뛰어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프로문학이 특히 송영(宋影, 1903-?)의 경우와 같이 공장주와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관계로 도식화되어서 설정되어 있었던 데 반해서 ‘과도기’는 폭넓은 시간적 관찰과 성찰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당대의 민중의 시선으로 사회의 변화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작가의 의식은 상당한 역량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창선을 통해서 보여지는 식민지 조선 민중의 계층 변화 과정은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그로 인한 간도 이주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유랑민이 되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공장의 노동자가 되는 수난의 연속이다. ‘과도기’의 작품이 뛰어난 형상력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계층 변화의 과정을 조금의 작위적인 주관성을 개입시키지 않고 면밀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의 프로문학이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지나치게 정형화시키느라 도식성을 많이 노출했던 데 반해서 ‘과도기’는 각 계층이 형성되기까지의 계층 분화의 과정을 역사적 안목에서 원인과 결과를 통찰해 내고 있다. 어린 시절의 공동체적 삶의 형태와 그것의 붕괴 이후 간도 이주 그리고 유랑민 생활, 그 뒤의 노동자로서의 생활의 시작이라는 작품 공간의 배열은 창선이라는 한 개인의 계층 이동 현상이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 변화, 역사 발전의 변화에 원인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인공 창선의 귀향이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작가 한설야의 새로운 전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창선에게 있어 고향은 중복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숙명적 공간이다. 어린 시절의 건강한 삶에 대한 추억이 묻혀 있는 그리운 곳, 그러나 지금은 황폐할 대로 황폐한 불행한 고향, 그렇지만 그 곳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고향인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고향에 남는다는 마지막 결말 처리는 식민지 조선 민중의 새로운 도약을 예시하는 것이다. 작품의 제목 ‘과도기’도 이러한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② 줄거리
창선은 간도로 이민을 갔다가 사년 만에 처자를 이끌고 함경도의 어촌인 창리 마을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 사이 고향에는 벽돌집과 공장이 들어서고 낯선 사람들만이 오고 간다. 그리고 살 길은 공장의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화전민으로 전락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 후 얼마 못 되어서 이 고장 백성들은 상투를 자르고 공장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써 주는 것이 아니다. 맨 힘차고 뼈 굵고 거슬거슬하고 나이 젊고 우둥퉁하고 미욱스럽게 생긴 사람만 뽑혔다. 그리고 거기서 까불여난 늙고 약한 사람이 개똥밭 농사나 짓고 은어 부스러기 고기잡이나 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은 온 가장을 보따리에 꾸둥쳐 지고 영원 장진으로 떠나갔다. 화전이나 해 먹을까 하는 것이다.
창선이는 요행 공장 노동자로 뽑혔다. 상투 자르고 감발 차고 부삽 들고 콘크리트 반죽하는 생소한 사람이 되었다.
③ 작품 이해 및 감상
프로문학이 생기고 나서 1929년에 발표된 이 작품에는 본격적으로 공업화의 단계에 들어선 시대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주인공 창선이 돌아간 고향에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식민지 조선이 자본주의화 함에 따라 농민이 몰락하고 노동계급이 대두하고 있음알 창선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농민층이 분해되어 공장 노동자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식민지의 공업화가 결국 농어촌의 착취와 몰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또한 농민과 노동자가 서로 다른 계층이 아닌 동맹적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과도기’는 이전의 프로문학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결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소설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전의 프로문학의 두 가지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서해의 현실 묘사에의 집착과 박영희의 관념성을 모두 뛰어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프로문학이 특히 송영(宋影, 1903-?)의 경우와 같이 공장주와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관계로 도식화되어서 설정되어 있었던 데 반해서 ‘과도기’는 폭넓은 시간적 관찰과 성찰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당대의 민중의 시선으로 사회의 변화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작가의 의식은 상당한 역량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창선을 통해서 보여지는 식민지 조선 민중의 계층 변화 과정은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그로 인한 간도 이주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유랑민이 되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공장의 노동자가 되는 수난의 연속이다. ‘과도기’의 작품이 뛰어난 형상력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계층 변화의 과정을 조금의 작위적인 주관성을 개입시키지 않고 면밀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의 프로문학이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지나치게 정형화시키느라 도식성을 많이 노출했던 데 반해서 ‘과도기’는 각 계층이 형성되기까지의 계층 분화의 과정을 역사적 안목에서 원인과 결과를 통찰해 내고 있다. 어린 시절의 공동체적 삶의 형태와 그것의 붕괴 이후 간도 이주 그리고 유랑민 생활, 그 뒤의 노동자로서의 생활의 시작이라는 작품 공간의 배열은 창선이라는 한 개인의 계층 이동 현상이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 변화, 역사 발전의 변화에 원인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인공 창선의 귀향이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작가 한설야의 새로운 전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창선에게 있어 고향은 중복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숙명적 공간이다. 어린 시절의 건강한 삶에 대한 추억이 묻혀 있는 그리운 곳, 그러나 지금은 황폐할 대로 황폐한 불행한 고향, 그렇지만 그 곳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고향인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고향에 남는다는 마지막 결말 처리는 식민지 조선 민중의 새로운 도약을 예시하는 것이다. 작품의 제목 ‘과도기’도 이러한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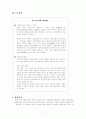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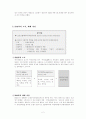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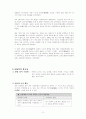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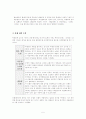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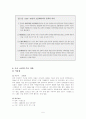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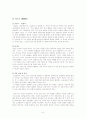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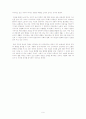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