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생활속의 가신신앙
Ⅱ. 가신의 개념
Ⅲ. 가신의 종류와 봉안위치
1) 성주신(城主神)
2) 조왕(徂往)
3) 삼신(三神)
4) 측신(廁神)
5) 장독신
6) 수문신(守門神)
7) 정신(井神)
8) 지신(地神)
9) 업(業)
Ⅳ. 가신의 성격과 역할
- 합리성과 과학성
Ⅴ. 결론
- 가신의 현대적 의의
- 생활속의 가신신앙
Ⅱ. 가신의 개념
Ⅲ. 가신의 종류와 봉안위치
1) 성주신(城主神)
2) 조왕(徂往)
3) 삼신(三神)
4) 측신(廁神)
5) 장독신
6) 수문신(守門神)
7) 정신(井神)
8) 지신(地神)
9) 업(業)
Ⅳ. 가신의 성격과 역할
- 합리성과 과학성
Ⅴ. 결론
- 가신의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이를 출산하면 21일간 금줄을 치고 산실(産室)을 성역화하여 치성을 드리는데 21일의 기간이면 산모나 신생아가 어는 정도 열상이 치유되고 면역성도 생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삼신은 3명인데 7일씩 3명이 돌아가며 21일 동안 아이와 산모를 보살피기 때문에 ‘삼신상’을 차려 놓을 때도 각각 상을 따로 차려놓아 잘 모셨다고 한다. 이는 꼭 자신의 며느리나 딸이 출산 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만약 가난하여 출산을 하고도 산미가 없어 굶어야하는 집에 산미를 보내 주게되면 삼신할머니가 이를 살펴 산미를 보내는 집의 며느리나 딸이 산고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믿음이 강하였다. “아무리 가난해도 저 먹을 것은 타고난다”는 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삼신 신앙의 바탕에는 이와 같은 격리의 합리성과 공동체 생활의 합리적인 사회신앙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4) 측신(神)
측신은 여성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가장 부끄럼을 잘 탄다고 한다. 늘 아흔 아혼자의 머리카락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출입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놀라서 동티를 내다고 한다. 이는 문이 없는 엉성한 구조의 측간 출입시 서로 조심하게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측간 사용에 주의를 주기 위함이었다.
또 앞서 조왕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측간에 다녀 온 후엔 꼭 정신을 만나고 와야만 했다. 이는 위생관념의 강조일 뿐 아니라 우리 민간 신앙 속에 깃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관찰 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5) 수문신(守門神)
승문장군이라고도 불리우면 이는 인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모르게 드나드는 잡귀(雜鬼), 병마(病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전염병이 돌 때는 가시나무를 대문에 걸쳐두거나 혹은 처용의 상을 그려 놓았다. 인간을 보살펴 주는 신들은 공중에서 날아들지만 잡귀나 잡신은 대문을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신(전염병)이 찾아들면 그 집을 성역화하여 집안 사람들의 바깥 출입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런 집을 도와 주게 하였다. 이는 문이 통과의 금지와 검역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소에는 집주인의 허락없이 남의 집 대문을 들락거리면 그런 행위(도둑질)를 한 사람이 망하고 대대로 그의 후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 방범의 역할과 동시에 공동체 생활에서 사회 교육적 효과를 가졌다.
6) 장독신
장은 계절식으로 시기를 놓치면 담을 수 없고 발효과정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며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격화 되어 모셔지는 신이 바로 장독신이다. 장독은 발효시킨 장을 보관하는 곳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후원 뒤뜰 혹은 앞마당 중앙에 배치하여 태양열의 직사광선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하고 정결하게 관리하였다.
장독소래(뚜껑)을 들때도 반드시 두 손으로 받쳐 들었야만 했다. 원활하지 못한 시장경제 하에서 한 번 뚜껑을 깨뜨리면 오랫동안 옹기장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남의 장독대에는 주인의 허락없이 올라가거나 해가 진 뒤에 올라 가는 것은 자기 집의 장맛이 바뀐다 하여 금기시 하였으며 장을 주면 복을 가져간다 하여 자신의 딸이라도 남에게 함부로 나눠주지 않았다. 발효와 소독을 위해 개방공간에 장을 비치해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금기는 방범의 역할을 하였으며 장이 계절식인 까닭에 제 시기에 장을 담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장을 남에게 나눠주면 며느리가 싫어할 뿐 아니라 장을 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게을러 장을 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딸에게 장을 나눠주면 친정의 복을 가져가게 됨으로 해서 친정이 망한다고 해서 금기로 여겼다.
7) 정신(井神)
우물신은 식수를 주관하는 신으로 청결을 요하기 때문에 물을 더럽히면 동티를 만난다고 믿어 항상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물을 뜰 때도 칠부로 떠서 우물에 직접 손을 담그는 것일 피했으며 부엌 뒤란에는 시궁창을 설치하여 취사의 오물을 정화하였으며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빨래하는 것을 금기시 해 식수의 확보를 꽤 하였다. 만약 이런 금기를 어기면 우물의 물맛이 변한다고 였겼다.
여기에는 모자라는 식수확보와 더불어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보호 사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8) 지신(地神)=터주
지신은 곡물 창고가 있는 뒤곁에 모셔 두어 가내의 무사와 풍작을 기원하며 수확한 곡식을 보관함에 있어 변질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지신 앞에서 주인 몰래 물건을 훔치면 자손 만대에 걸쳐 벌을 받고 가난해 진다고 하였다.
9) 업(業)
주로 쌀을 축내는 쥐를 잡거나 이로운 동물을 하는데 이러한 동물은 재산을 불어나게 핸준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소홀히 받들면 재물이 나간다고 생각하였다. 가난하여 먹여 살리기 어려우면 ‘애기’를 남의 집에 갔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애기를 받는 집에서는 ‘업동이=복덩이’가 들어왔다 하여 맞이 하였다. 이를 내치면 가산이 풍지박산 난다고 여겨 거둬 들였다.
불교 사상에서 ‘업’은 ‘부’ 혹은 ‘죄’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신의 업을 받아 들여 자신의 죄를 씻고 남을 도우며 봉사하라는 뜻에서 발전한 믿음이 아닌가 한다.
Ⅴ. 결론
- 가신의 현재적 의의
민간신앙의 두 개의 큰 줄기는 자연신숭배와 가신숭배이다. 소위 미신이라 치부해버려 가볍게 넘기기 쉬운 민간신앙에서의 금기는 당시의 생활 관습에 따른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연보호 사상과 합리적인 사고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그 당시와 같은 공동체 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경사회도 아니다.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의 민간신앙 속에 담겨 있던 서로의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가치일 것이다.
<<참고문헌>>
장용득, 명당론, 에밀레 미술관, 1973
장주근, 한국민속대관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2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그 외 외대 사학과 이은순 교수님의 수업자료 및 인터넷 자료 참고
그리고 삼신은 3명인데 7일씩 3명이 돌아가며 21일 동안 아이와 산모를 보살피기 때문에 ‘삼신상’을 차려 놓을 때도 각각 상을 따로 차려놓아 잘 모셨다고 한다. 이는 꼭 자신의 며느리나 딸이 출산 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만약 가난하여 출산을 하고도 산미가 없어 굶어야하는 집에 산미를 보내 주게되면 삼신할머니가 이를 살펴 산미를 보내는 집의 며느리나 딸이 산고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믿음이 강하였다. “아무리 가난해도 저 먹을 것은 타고난다”는 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삼신 신앙의 바탕에는 이와 같은 격리의 합리성과 공동체 생활의 합리적인 사회신앙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4) 측신(神)
측신은 여성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가장 부끄럼을 잘 탄다고 한다. 늘 아흔 아혼자의 머리카락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출입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놀라서 동티를 내다고 한다. 이는 문이 없는 엉성한 구조의 측간 출입시 서로 조심하게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측간 사용에 주의를 주기 위함이었다.
또 앞서 조왕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측간에 다녀 온 후엔 꼭 정신을 만나고 와야만 했다. 이는 위생관념의 강조일 뿐 아니라 우리 민간 신앙 속에 깃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관찰 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5) 수문신(守門神)
승문장군이라고도 불리우면 이는 인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모르게 드나드는 잡귀(雜鬼), 병마(病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전염병이 돌 때는 가시나무를 대문에 걸쳐두거나 혹은 처용의 상을 그려 놓았다. 인간을 보살펴 주는 신들은 공중에서 날아들지만 잡귀나 잡신은 대문을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신(전염병)이 찾아들면 그 집을 성역화하여 집안 사람들의 바깥 출입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런 집을 도와 주게 하였다. 이는 문이 통과의 금지와 검역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소에는 집주인의 허락없이 남의 집 대문을 들락거리면 그런 행위(도둑질)를 한 사람이 망하고 대대로 그의 후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 방범의 역할과 동시에 공동체 생활에서 사회 교육적 효과를 가졌다.
6) 장독신
장은 계절식으로 시기를 놓치면 담을 수 없고 발효과정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며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격화 되어 모셔지는 신이 바로 장독신이다. 장독은 발효시킨 장을 보관하는 곳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후원 뒤뜰 혹은 앞마당 중앙에 배치하여 태양열의 직사광선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하고 정결하게 관리하였다.
장독소래(뚜껑)을 들때도 반드시 두 손으로 받쳐 들었야만 했다. 원활하지 못한 시장경제 하에서 한 번 뚜껑을 깨뜨리면 오랫동안 옹기장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남의 장독대에는 주인의 허락없이 올라가거나 해가 진 뒤에 올라 가는 것은 자기 집의 장맛이 바뀐다 하여 금기시 하였으며 장을 주면 복을 가져간다 하여 자신의 딸이라도 남에게 함부로 나눠주지 않았다. 발효와 소독을 위해 개방공간에 장을 비치해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금기는 방범의 역할을 하였으며 장이 계절식인 까닭에 제 시기에 장을 담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장을 남에게 나눠주면 며느리가 싫어할 뿐 아니라 장을 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게을러 장을 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딸에게 장을 나눠주면 친정의 복을 가져가게 됨으로 해서 친정이 망한다고 해서 금기로 여겼다.
7) 정신(井神)
우물신은 식수를 주관하는 신으로 청결을 요하기 때문에 물을 더럽히면 동티를 만난다고 믿어 항상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물을 뜰 때도 칠부로 떠서 우물에 직접 손을 담그는 것일 피했으며 부엌 뒤란에는 시궁창을 설치하여 취사의 오물을 정화하였으며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빨래하는 것을 금기시 해 식수의 확보를 꽤 하였다. 만약 이런 금기를 어기면 우물의 물맛이 변한다고 였겼다.
여기에는 모자라는 식수확보와 더불어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보호 사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8) 지신(地神)=터주
지신은 곡물 창고가 있는 뒤곁에 모셔 두어 가내의 무사와 풍작을 기원하며 수확한 곡식을 보관함에 있어 변질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지신 앞에서 주인 몰래 물건을 훔치면 자손 만대에 걸쳐 벌을 받고 가난해 진다고 하였다.
9) 업(業)
주로 쌀을 축내는 쥐를 잡거나 이로운 동물을 하는데 이러한 동물은 재산을 불어나게 핸준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소홀히 받들면 재물이 나간다고 생각하였다. 가난하여 먹여 살리기 어려우면 ‘애기’를 남의 집에 갔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애기를 받는 집에서는 ‘업동이=복덩이’가 들어왔다 하여 맞이 하였다. 이를 내치면 가산이 풍지박산 난다고 여겨 거둬 들였다.
불교 사상에서 ‘업’은 ‘부’ 혹은 ‘죄’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신의 업을 받아 들여 자신의 죄를 씻고 남을 도우며 봉사하라는 뜻에서 발전한 믿음이 아닌가 한다.
Ⅴ. 결론
- 가신의 현재적 의의
민간신앙의 두 개의 큰 줄기는 자연신숭배와 가신숭배이다. 소위 미신이라 치부해버려 가볍게 넘기기 쉬운 민간신앙에서의 금기는 당시의 생활 관습에 따른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연보호 사상과 합리적인 사고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그 당시와 같은 공동체 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경사회도 아니다.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의 민간신앙 속에 담겨 있던 서로의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가치일 것이다.
<<참고문헌>>
장용득, 명당론, 에밀레 미술관, 1973
장주근, 한국민속대관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2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그 외 외대 사학과 이은순 교수님의 수업자료 및 인터넷 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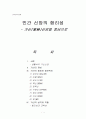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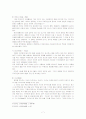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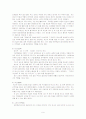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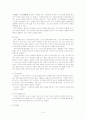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