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 骨品制 연구의 당위성과 연구 현황
본 론 : 1) 骨品制의 성립과정
2) 骨品制의 계급구성
3) 骨品制의 사회적 성격
결 론
본 론 : 1) 骨品制의 성립과정
2) 骨品制의 계급구성
3) 骨品制의 사회적 성격
결 론
본문내용
), 황색(黃色)의 복장을 하였는데 이는 신분에 따른 관등상한선으로 볼 때 진골(眞骨), 6두품(頭品), 5두품(頭品), 4두품(頭品)에 각기 상응하고 있다. 또한 같은 원료로 된 옷감이라도 골품의 차등에 따라 베의 고운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14) 김기흥 -새롭게 쓴 한국 고대사. 역사비평사. 1993 p.126~127
수레를 꾸미는 장식에도 골품(骨品)에 의하여 남녀에게 차등적 제한이 있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의 제질에도 제한이 있었다. 집과 방의 크기도 제한이 있었다. 834년(흥덕왕 9)때의 규정에 따르면, 진골의 경우라도 방의 길이와 너비가 24尺을 넘지 못하며 6두품(頭品)은 21尺, 5두품(頭品)은 18尺, 4두품(頭品)과 평민은 15尺을 각각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담장의 높이, 기와의 사용, 지붕에 설치하는 장식물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마굿간의 크기도 골품(骨品)의 차등에 따라 제한되었다. 6두품(頭品)은 말 5마리, 5두품(頭品)은 3마리, 그리고 4두품(頭品) 이하 백성(百姓)들은 2마리를 넣을 수 있는 마굿간을 지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신분 계급적인 신라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 최고의 특권(特權)을 누리고 있던 진골(眞骨)이었으므로, 골품제도(骨品制度)는 결국 왕족의 일반 귀족과 평민에 대한 지배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신라(新羅)의 골품제도(骨品制度)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배층(支配層)을 위한 그리고 그러한 귀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간과 할 수 없을 거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골품제가 가지는 폐단, 즉 지나친 폐쇄성 등이 신라 하대에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결국 신라멸망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골품제(骨品制)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인데 그것은 앞서 서론에서 거론했듯이 단순히 지배층(支配層) 유지를 위한 신분제도(身分制度)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시대상의 사회모습, 관습, 풍습,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史料)가 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신라의 신분제도(身分制度)인 골품제(骨品制)를 통하여 정치(政治)나 사회(社會)뿐만 아니라 사회체제(社會體制)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사료(史料)가 충분치않은 백제(百濟)나 고구려(高句麗)의 신분제도 에 대해 생각해보고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골품제(骨品制) 연구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겠다.
성골(聖骨)부터 1두품(1頭品)까지 나눠진 신분층을 가지고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제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시대상을 알수 있었던 골품제도(骨品制度)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또 진골(眞骨)과 성골(聖骨)의 구분, 그리고 각 두품(頭品)들의 차이점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의 연구 성과에 미진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점들은 차차 연구와 사료 발굴등을 통하여 더욱 정확한 시대상황, 사회체제, 정치체제를 알 수 있는 연구 성과에 근접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수레를 꾸미는 장식에도 골품(骨品)에 의하여 남녀에게 차등적 제한이 있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의 제질에도 제한이 있었다. 집과 방의 크기도 제한이 있었다. 834년(흥덕왕 9)때의 규정에 따르면, 진골의 경우라도 방의 길이와 너비가 24尺을 넘지 못하며 6두품(頭品)은 21尺, 5두품(頭品)은 18尺, 4두품(頭品)과 평민은 15尺을 각각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담장의 높이, 기와의 사용, 지붕에 설치하는 장식물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마굿간의 크기도 골품(骨品)의 차등에 따라 제한되었다. 6두품(頭品)은 말 5마리, 5두품(頭品)은 3마리, 그리고 4두품(頭品) 이하 백성(百姓)들은 2마리를 넣을 수 있는 마굿간을 지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신분 계급적인 신라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 최고의 특권(特權)을 누리고 있던 진골(眞骨)이었으므로, 골품제도(骨品制度)는 결국 왕족의 일반 귀족과 평민에 대한 지배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신라(新羅)의 골품제도(骨品制度)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배층(支配層)을 위한 그리고 그러한 귀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간과 할 수 없을 거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골품제가 가지는 폐단, 즉 지나친 폐쇄성 등이 신라 하대에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결국 신라멸망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골품제(骨品制)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인데 그것은 앞서 서론에서 거론했듯이 단순히 지배층(支配層) 유지를 위한 신분제도(身分制度)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시대상의 사회모습, 관습, 풍습,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史料)가 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신라의 신분제도(身分制度)인 골품제(骨品制)를 통하여 정치(政治)나 사회(社會)뿐만 아니라 사회체제(社會體制)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사료(史料)가 충분치않은 백제(百濟)나 고구려(高句麗)의 신분제도 에 대해 생각해보고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골품제(骨品制) 연구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겠다.
성골(聖骨)부터 1두품(1頭品)까지 나눠진 신분층을 가지고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제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시대상을 알수 있었던 골품제도(骨品制度)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또 진골(眞骨)과 성골(聖骨)의 구분, 그리고 각 두품(頭品)들의 차이점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의 연구 성과에 미진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점들은 차차 연구와 사료 발굴등을 통하여 더욱 정확한 시대상황, 사회체제, 정치체제를 알 수 있는 연구 성과에 근접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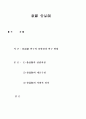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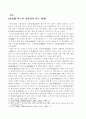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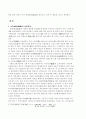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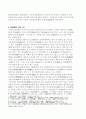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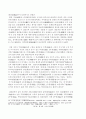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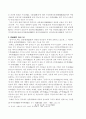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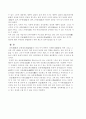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