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식문학론의 쟁점
[비내리는 품천역]의 문제점
원작, 개작, 정본
中野 원시의 쟁점사항 - 민족 에고이즘
임화의 화답 방식 - [우산받은 橫濱부두]
두 시인의 <시적 자질> 비교
[비내리는 품천역]의 문제점
원작, 개작, 정본
中野 원시의 쟁점사항 - 민족 에고이즘
임화의 화답 방식 - [우산받은 橫濱부두]
두 시인의 <시적 자질> 비교
본문내용
그냥 나를 떠내 보내는 스러움 사랑하는 산아희를 離別하는 작은 생각에 주저 안질 네가 아니다/네 사랑하는 나는 이 땅에서 좃겨 나지를 안는가/그 녀석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치 잇지를 안는가 이 생각으로 이 憤한 事實로/비달기 가튼 네 가슴을 발가게 물들려라/그리하야 하얀 네 말이 뜨거서 못 견딜 때/그것을 그대로 그 얼골에다 그 대가리에다 마음것 메다 처 버리어라.
그러면 그 때면 지금은 가는 나는 벌서 釜山 東京을 거처 동모와 가치 「요꼬하마」를 왓슬 때다/그리하여 오랫동안 서러웁든 생각 憤한 생각에/疲困한 네 귀여운 머리를/네 가슴에 파뭇고 울어도 보아라 우서도 보아라/港口의 내의 게집애야!/그만 「독크」를 뛰어오지 마러라/비는 연한 네 등에 나리우고 바람은 네 雨傘에 불고 있다.
임화의 이 작품이 中野의 것에 대한 화답 형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임화는 이 무렵 李北滿의 조직 속에 있었고 1930년 귀국시에 이북만의 누이 李貴禮와 결혼한 상태였다. 졸저, 『임화 연구』, 1989 참조). 한·일 근대문학사의 관련 양상의 한 가지 사례로 이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 <이식문학>이 아니라 쌍방적 관계의 한 가지 가능성의 열어보임이라 평가되어도 큰 무리는 아닐 터이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한국문학 측은 민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中野에의 <화답>이 가능한 조건이랄까 자질을 임화가 갖고 있음에 관련된다. 中野와 맞설 수 있는 임화의 <자질>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대표적인 <자질>과 조선의 대표적 <자질>이라 할 때 <자질>이란 물을 것도 없이 <시적 자질>을 가리킴이 아닐 수 없다.
<시적 자질>을 문제삼는 일은 「비내리는 品川驛」과 「우산받은 橫濱부두」의 비교에 막바로 이어진다. 두 작품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사항 중, 中野에 화답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1) 驛에 대한 항구(조선인의 실제 귀국과는 맞지 않는 시적 대응), (2) <비둘기>에 대한 시적 반응(이는 中野 쪽도 의외였지만, 임화는 이를 놓치지 않았음), (3) 일본에 다시 쳐들어오라는 中野에 대한 임화의 대응 방식 등이 될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식들은 외관상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시적 자질을 문제삼을진댄, 임화의 「우산받은 橫濱부두」는 단연 임화 독자성에 기초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로 말해질 수 있는 임화 특유의 시적 자질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설명이 요망된다.
조선의 발렌티노인 주연급 영화 배우이자 카프 시인 임화가 그 나름의 시적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 것은 「오리 오빠와 화로」(1929)와 이에 이어진 「네거리의 순이」(1929)에서이다. 김기진이 <단편서사시>(1929)로 규정, 카프시의 새로운 지평이라 평가된 임화의 이러한 시 형식의 창출은 한국 근대시사에서 획을 긋는 것이었다. 임화의 이러한 시 형식에 막바로 이어진 것이 「우산받은 橫濱부두」이다.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의 <누이>의 시선이 그대로 우산받고 나와 있는 이국의 근로여성으로 전이되었을 뿐이며, 남자 동생 영남이를 돌보는 누이의 심정이 그대로 옮아간 것이 일본 근로여성의 심성이었다. 「네거리의 순이」의 근로하는 여성이 그대로 근로하는 일본 여성이었고, 따라서 임화에겐 당초부터 두 나라 근로여성에 대한 일체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임화의 시적 자질엔 그 지독한 <민족 에고이즘>이 부재하고 있었다(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콤플렉스에 대해서는 졸저, 『임화 연구』 참조).
두 시인의 <시적 자질> 비교
<이식문학사>의 논쟁점의 극복은 가능한가. 이 물음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껏 긴 논의를 펼쳐 왔거니와 이제 한 가지 작은 결말을 짓는다면 어떠할까.
두 가지 점을 지적해 봐도 크게 망발이 아닐까 싶다. 첫째, 임화의 中野에 대한 화답의 성격에 관한 점. 「네거리의 순이」로 대표되는 임화의 시적 자질이 「우산받은 橫濱부두」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中野의 시적 자질에 화답할 수 있었던 것은 임화에게 그 독자의 시적 자질인 <단편서사시>의 형식에 의해서인 것이다.
둘째, 中野의 그 고유의 시적 자질에 관한 점. <민족 에고이즘>의 노출이 바로 그것이다. 中野는 <계급성>보다 더 깊고 원본적인 <민족 에고이즘>을 무의식 속에서도 기피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시적 자실의 일종이 아니겠는가.
임화와 中野, 그들의 <시적 자질>이란 이 점에서 비길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내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기로 한다. 두해 전 어떤 계기로 방한 중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 씨를 만난 적이 있다. 묻지도 않았는데,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 작품 속에 반한적(反韓的)인 표현이 있다고 지적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사실일지 모르겠다. 일본인인 내 무의식 속에 그러한 요소가 있었는지 모르지 않겠는가\"라고. 꼭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대강 그런 뜻으로 기억된다. 그때 내 머리를 스치는 것은 오래전에 읽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喩吉, 1835∼1901)의 자서전인 『福翁自傳』(岩波文庫, 1985, 제9쇄)의 후반부에 나오는 소제목의 하나였다. \"본번(本藩)에 대해서는 그 비열함이 조선인과 같다\"(p. 258)가 그것. 이 책의 초판(1897) 이래 여러 판형이 있었으며, 이런저런 곡절을 겪어 신분적 민족적 차별에 대한 대목은 한동안 XX로 표기했으나, 이젠 원문대로 적기로 했다는 것.
\"인권 평등의 이념과 자유 독립의 정신이란 후쿠자와의 평생을 꿰뚫는 사상의 근간이지만 그러한 자유 평등의 선구자의 저작에 있어서조차 설사 의식적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차별적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뿌리가 깊고 넓음을 알 수 있겠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되돌아볼 때의 자료로서도 될 수 있는 한 원형에 가깝게 남겨 놓는 쪽이 오늘날 차별이 있는 까닭을 똑바로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정정판도 구판 25쇄(1954)를 따르기로 했다.\"
이로써 구판 23∼24쇄에서는 XX로 했으나 25쇄부터 원문대로 적었고, 현재판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그만큼 <민족 에고이즘>의 정직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그 때면 지금은 가는 나는 벌서 釜山 東京을 거처 동모와 가치 「요꼬하마」를 왓슬 때다/그리하여 오랫동안 서러웁든 생각 憤한 생각에/疲困한 네 귀여운 머리를/네 가슴에 파뭇고 울어도 보아라 우서도 보아라/港口의 내의 게집애야!/그만 「독크」를 뛰어오지 마러라/비는 연한 네 등에 나리우고 바람은 네 雨傘에 불고 있다.
임화의 이 작품이 中野의 것에 대한 화답 형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임화는 이 무렵 李北滿의 조직 속에 있었고 1930년 귀국시에 이북만의 누이 李貴禮와 결혼한 상태였다. 졸저, 『임화 연구』, 1989 참조). 한·일 근대문학사의 관련 양상의 한 가지 사례로 이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 <이식문학>이 아니라 쌍방적 관계의 한 가지 가능성의 열어보임이라 평가되어도 큰 무리는 아닐 터이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한국문학 측은 민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中野에의 <화답>이 가능한 조건이랄까 자질을 임화가 갖고 있음에 관련된다. 中野와 맞설 수 있는 임화의 <자질>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대표적인 <자질>과 조선의 대표적 <자질>이라 할 때 <자질>이란 물을 것도 없이 <시적 자질>을 가리킴이 아닐 수 없다.
<시적 자질>을 문제삼는 일은 「비내리는 品川驛」과 「우산받은 橫濱부두」의 비교에 막바로 이어진다. 두 작품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사항 중, 中野에 화답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1) 驛에 대한 항구(조선인의 실제 귀국과는 맞지 않는 시적 대응), (2) <비둘기>에 대한 시적 반응(이는 中野 쪽도 의외였지만, 임화는 이를 놓치지 않았음), (3) 일본에 다시 쳐들어오라는 中野에 대한 임화의 대응 방식 등이 될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식들은 외관상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시적 자질을 문제삼을진댄, 임화의 「우산받은 橫濱부두」는 단연 임화 독자성에 기초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조선의 발렌티노인 주연급 영화 배우이자 카프 시인 임화가 그 나름의 시적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 것은 「오리 오빠와 화로」(1929)와 이에 이어진 「네거리의 순이」(1929)에서이다. 김기진이 <단편서사시>(1929)로 규정, 카프시의 새로운 지평이라 평가된 임화의 이러한 시 형식의 창출은 한국 근대시사에서 획을 긋는 것이었다. 임화의 이러한 시 형식에 막바로 이어진 것이 「우산받은 橫濱부두」이다.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의 <누이>의 시선이 그대로 우산받고 나와 있는 이국의 근로여성으로 전이되었을 뿐이며, 남자 동생 영남이를 돌보는 누이의 심정이 그대로 옮아간 것이 일본 근로여성의 심성이었다. 「네거리의 순이」의 근로하는 여성이 그대로 근로하는 일본 여성이었고, 따라서 임화에겐 당초부터 두 나라 근로여성에 대한 일체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임화의 시적 자질엔 그 지독한 <민족 에고이즘>이 부재하고 있었다(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콤플렉스에 대해서는 졸저, 『임화 연구』 참조).
두 시인의 <시적 자질> 비교
<이식문학사>의 논쟁점의 극복은 가능한가. 이 물음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껏 긴 논의를 펼쳐 왔거니와 이제 한 가지 작은 결말을 짓는다면 어떠할까.
두 가지 점을 지적해 봐도 크게 망발이 아닐까 싶다. 첫째, 임화의 中野에 대한 화답의 성격에 관한 점. 「네거리의 순이」로 대표되는 임화의 시적 자질이 「우산받은 橫濱부두」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中野의 시적 자질에 화답할 수 있었던 것은 임화에게 그 독자의 시적 자질인 <단편서사시>의 형식에 의해서인 것이다.
둘째, 中野의 그 고유의 시적 자질에 관한 점. <민족 에고이즘>의 노출이 바로 그것이다. 中野는 <계급성>보다 더 깊고 원본적인 <민족 에고이즘>을 무의식 속에서도 기피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시적 자실의 일종이 아니겠는가.
임화와 中野, 그들의 <시적 자질>이란 이 점에서 비길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내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기로 한다. 두해 전 어떤 계기로 방한 중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 씨를 만난 적이 있다. 묻지도 않았는데,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 작품 속에 반한적(反韓的)인 표현이 있다고 지적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사실일지 모르겠다. 일본인인 내 무의식 속에 그러한 요소가 있었는지 모르지 않겠는가\"라고. 꼭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대강 그런 뜻으로 기억된다. 그때 내 머리를 스치는 것은 오래전에 읽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喩吉, 1835∼1901)의 자서전인 『福翁自傳』(岩波文庫, 1985, 제9쇄)의 후반부에 나오는 소제목의 하나였다. \"본번(本藩)에 대해서는 그 비열함이 조선인과 같다\"(p. 258)가 그것. 이 책의 초판(1897) 이래 여러 판형이 있었으며, 이런저런 곡절을 겪어 신분적 민족적 차별에 대한 대목은 한동안 XX로 표기했으나, 이젠 원문대로 적기로 했다는 것.
\"인권 평등의 이념과 자유 독립의 정신이란 후쿠자와의 평생을 꿰뚫는 사상의 근간이지만 그러한 자유 평등의 선구자의 저작에 있어서조차 설사 의식적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차별적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뿌리가 깊고 넓음을 알 수 있겠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되돌아볼 때의 자료로서도 될 수 있는 한 원형에 가깝게 남겨 놓는 쪽이 오늘날 차별이 있는 까닭을 똑바로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정정판도 구판 25쇄(1954)를 따르기로 했다.\"
이로써 구판 23∼24쇄에서는 XX로 했으나 25쇄부터 원문대로 적었고, 현재판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그만큼 <민족 에고이즘>의 정직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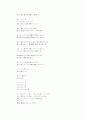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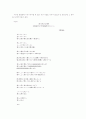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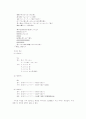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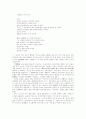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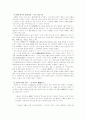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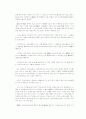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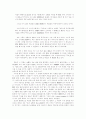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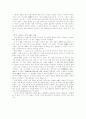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