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복한 망상 속의 삶을 사는 광인 - 완행댁과 조만득씨
자신속의 삶을 살아가는 광인 - 윤일섭
광인 같은 정상인 - 가수로씨
‘광인성’을 띠며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 지욱과 석구
미쳐 버릴 수 없어 죽음을 택한 사람 - 허운, 명식
자신속의 삶을 살아가는 광인 - 윤일섭
광인 같은 정상인 - 가수로씨
‘광인성’을 띠며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 지욱과 석구
미쳐 버릴 수 없어 죽음을 택한 사람 - 허운, 명식
본문내용
변장을 한 채 창 밖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상한 기벽이 있다. 그는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가면을 선택한 것이다.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얻지 못한 편안함과 안도감을 그는 가면 속에서 얻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가면 속에서도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며,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은 자신의 2층 방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는다. 그는 결국 삶 속에서 휴식처를 얻지 못하고 지친 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죽음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현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허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보다 더 파멸적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살을 택한다. 그들은 보통 너무나 정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미쳐 버릴 수도 없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쳐 버릴 수 없어 자살을 택한 사람들 역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살아내야 한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혹은 초현실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부정할 만한 논리는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삶의 진실성을 포함해서 삶의 많은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자) 그런 점에서 죽음은 최악의 선택이며 가장 ‘미친 짓’이다. 그것을 정상인들만이 선택한다는 점은 또 다른 아이러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작가 이청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광인과 정상인의 삶과 그 삶들의 진실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의 소설에는 광인이라는 문제적 인물을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광인의 정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살펴보았다. 이청준의 작품 속에서는 일상에서와는 달리 광인과 정상인이라 구분 짓는 경계조차도 애매해서 누구를 광인이라 할 수 있는지조차 쉽지 않음을 알았다. 스스로 미쳤다고 하는 광인이 없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가 미쳤다고 주장하던 <소문의 벽>의 박준의 경우도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이청준의 소설 속에서 광인들의 역할은 결국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정상인들의 삶을 단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건의 진실성이었다. 과연 광인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것은 우선 삶을 누릴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짊어져야 할 채무로 보는지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다. 누릴 권리라고 한다면 행복하게 미친 경우는 그 나름대로 행복한 상태를 진실로 보아 줄 수 있을 것이고, 채무라 한다면 허상은 허상일 뿐 진정한 삶은 현실의 삶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기준은 진실성을 주관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객관적인 잣대를 사용할 지이다. 전자라 한다면 역시 주관적인 자신만의 삶도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만이 의미 있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찬반을 논해 볼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자만, 진지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아무리 고민해본들 요즘 유행하는 우스개 소리처럼 ‘그때 그때 달라요’가 어쩔 수 없는 결론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죽음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현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허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보다 더 파멸적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살을 택한다. 그들은 보통 너무나 정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미쳐 버릴 수도 없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쳐 버릴 수 없어 자살을 택한 사람들 역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살아내야 한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혹은 초현실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부정할 만한 논리는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삶의 진실성을 포함해서 삶의 많은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자) 그런 점에서 죽음은 최악의 선택이며 가장 ‘미친 짓’이다. 그것을 정상인들만이 선택한다는 점은 또 다른 아이러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작가 이청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광인과 정상인의 삶과 그 삶들의 진실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의 소설에는 광인이라는 문제적 인물을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광인의 정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살펴보았다. 이청준의 작품 속에서는 일상에서와는 달리 광인과 정상인이라 구분 짓는 경계조차도 애매해서 누구를 광인이라 할 수 있는지조차 쉽지 않음을 알았다. 스스로 미쳤다고 하는 광인이 없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가 미쳤다고 주장하던 <소문의 벽>의 박준의 경우도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이청준의 소설 속에서 광인들의 역할은 결국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정상인들의 삶을 단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건의 진실성이었다. 과연 광인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것은 우선 삶을 누릴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짊어져야 할 채무로 보는지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다. 누릴 권리라고 한다면 행복하게 미친 경우는 그 나름대로 행복한 상태를 진실로 보아 줄 수 있을 것이고, 채무라 한다면 허상은 허상일 뿐 진정한 삶은 현실의 삶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기준은 진실성을 주관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객관적인 잣대를 사용할 지이다. 전자라 한다면 역시 주관적인 자신만의 삶도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만이 의미 있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찬반을 논해 볼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자만, 진지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아무리 고민해본들 요즘 유행하는 우스개 소리처럼 ‘그때 그때 달라요’가 어쩔 수 없는 결론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추천자료
 이청준 문학과 황석영 문학
이청준 문학과 황석영 문학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과 물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과 물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과 종교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과 종교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의 전통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의 전통 1950년대 남, 북한의 문학의 이해
1950년대 남, 북한의 문학의 이해 한국문학의 이해, 설화와 신화 연구
한국문학의 이해, 설화와 신화 연구  한국문학의 이해, 한문학 연구
한국문학의 이해, 한문학 연구  <북한문학의 이해>『높새바람』과『황진이』에 관한 비교연구
<북한문학의 이해>『높새바람』과『황진이』에 관한 비교연구 [문학교육A+] 고등학교 문학(상) 이청준의 &#65378;병신과 머저리&#65379; 줄거리와 ...
[문학교육A+] 고등학교 문학(상) 이청준의 &#65378;병신과 머저리&#65379; 줄거리와 ... [서양문학][서양문학 이해][서양문학과 리얼리즘(사실주의)][종교문학][동양문학][파우스트]...
[서양문학][서양문학 이해][서양문학과 리얼리즘(사실주의)][종교문학][동양문학][파우스트]... [아동문학] 아동문학의 장르 - 신화 (신화에 대한 이해, 유아들이 신화에 흥미를 갖는 이유, ...
[아동문학] 아동문학의 장르 - 신화 (신화에 대한 이해, 유아들이 신화에 흥미를 갖는 이유, ... 실존주의 문학의 이해 - 카뮈(Albert Camus)의 <이방인(L`Etranger)>을 바탕으로 한국의 실존...
실존주의 문학의 이해 - 카뮈(Albert Camus)의 <이방인(L`Etranger)>을 바탕으로 한국의 실존... 대중매체로서의 신화의 해석(단군신화해석, 신화의이해, 건국신화, 대중매체와문학)
대중매체로서의 신화의 해석(단군신화해석, 신화의이해, 건국신화, 대중매체와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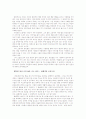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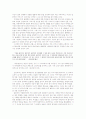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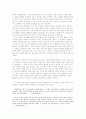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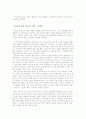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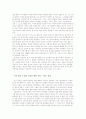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