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머리말
■ 본문
1. 농경문화의 전래
2. 백제문화의 첫 번째 물줄기
3.백제문화의 두 번째 물줄기
4. 백제문화의 세 번째 물줄기
5. 백제문화의 마지막 전파
■ 맺음말
■ 본문
1. 농경문화의 전래
2. 백제문화의 첫 번째 물줄기
3.백제문화의 두 번째 물줄기
4. 백제문화의 세 번째 물줄기
5. 백제문화의 마지막 전파
■ 맺음말
본문내용
제인들 거주지에는 신사가 건립되었는데, 아스카베신사외에 구다라 신사(百濟神社), 나라현 히노구마에 소재한 오미아시 신사와 무리히사군의 아니 신사는 아지사주(阿知使主)를 제사지내던 신사라고 한다. 아지사주는 방직공 등의 기술자를 데리고 일본열도로 건너가 왜의 방직, 도자기, 토목공사, 수리공사, 등에 기여한 백제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라쿠니 신사(辛國神社)는 오진천황 때 백제에서 왜로 건너간 진손왕(辰孫王)을 제사지내는 신사였고, 가스카 대사도 백제 계통 신사로서는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백제 문화의 마지막 전파
백제문화가 왜로 건너가게 된 마지막 계기는 백제의 멸망이었다. 백제는 660년 7월에 비록 국왕은 항복하였으나 부흥운동이 즉시 일어나 663년 9월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백강전투에서 부흥군과 왜에서 출병한 병력이 패함에 따라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백제 유민들은 대거 일본열도로 망명하였다. 665년에는 백제에서 망명해온 관인 400여 명을 시가현(滋賀懸)의 남부인 오미국(近江國) 칸지키군(神崎郡)에 옮겼고, 667년에 는 백제관인 700여 명의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은 왜 조정의 요직에 서 활약하였다. 즉 이들은 권력의 중추부에서 산성축조와 같은 토목기술, 병법, 의약, 교육,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백제유민의 활약은 쇼무천황(聖武天皇)이 헤이초코(平城京)의 동방(東方)에 건립한 거대한 관립사찰인 도다이지(東大寺) 창건에서도 발휘되었다. 752년 당시 일본의 전 국력을 동원한 대불인 비로자나불좌상(毘盧舍那佛坐像)에 대한 주조를 끝낼 즈음에 칠할 금이 부족하였다. 그렇지만 백제왕으로 봉해졌던 게이후쿠(敬福)는 지금의 아오모리현(靑森縣)인 무쓰국에서 역마로 달려와 고다군에서 나온 황금 900냥을 바쳤다. 일본측 문헌에 의하면 이때부터 일본열도에서 황금이 산출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대불주조의 책임자가 663년에 왜로 건너간 백제인 국골부(國骨富)의 손자인 구니나카노 키미마로(國中公麻呂)였고, 그 개안회(開眼會)의 악무(樂舞)에서도 한국계 후손들이 활약하였다.참고로 일본문헌에 적혀 있는 문화전래의 진원지 가운데 \'오 吳\'는 그 음이 \'구레\'이므로, \'구려\' 혹은 \'고려\'로 표기되거나 읽혀지는 고구려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고구려를 음이 비슷한 \'오 吳\'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서기》오진 39년 조에 의하면 \"아지사주 등이 고구려에 건너가 오(吳)로 가려고 하였다. 고구려에 이르렀으나 도로를 알지 못하여 길을 아는 자를 고구려에 요청하자, 고구려왕이 이에 구례파(久禮波)·구례지(久禮志) 등 두사람을 붙여 길잡이를 삼았다. 이로 인하여 오에 갈 수가 있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일본서기》의 오가 모조리 고구려일 리는 없다. 오가 중국의 양자강 이남지역을 가리키는 경우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맺음말
백제와 왜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현재 본토인 한반도에 있어서 자료의 결핍으로 인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제한적 자료관람으로, 백제사 연구의 한계를 더욱더 절감하게 한다. 한일 관계에 있어 백제사의 연구는 아직까지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어디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어용역사학자는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애써 축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나라의 국토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조차 지우기는 매우 힘든 듯 하다. 수천 년의 세월, 그 세월동안 일본 본토에 남겨진 백제인들의 자취는 어느덧 일본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기에 애써 들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일본 속의 백제문화가 아닌가 한다.
5. 백제 문화의 마지막 전파
백제문화가 왜로 건너가게 된 마지막 계기는 백제의 멸망이었다. 백제는 660년 7월에 비록 국왕은 항복하였으나 부흥운동이 즉시 일어나 663년 9월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백강전투에서 부흥군과 왜에서 출병한 병력이 패함에 따라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백제 유민들은 대거 일본열도로 망명하였다. 665년에는 백제에서 망명해온 관인 400여 명을 시가현(滋賀懸)의 남부인 오미국(近江國) 칸지키군(神崎郡)에 옮겼고, 667년에 는 백제관인 700여 명의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은 왜 조정의 요직에 서 활약하였다. 즉 이들은 권력의 중추부에서 산성축조와 같은 토목기술, 병법, 의약, 교육,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백제유민의 활약은 쇼무천황(聖武天皇)이 헤이초코(平城京)의 동방(東方)에 건립한 거대한 관립사찰인 도다이지(東大寺) 창건에서도 발휘되었다. 752년 당시 일본의 전 국력을 동원한 대불인 비로자나불좌상(毘盧舍那佛坐像)에 대한 주조를 끝낼 즈음에 칠할 금이 부족하였다. 그렇지만 백제왕으로 봉해졌던 게이후쿠(敬福)는 지금의 아오모리현(靑森縣)인 무쓰국에서 역마로 달려와 고다군에서 나온 황금 900냥을 바쳤다. 일본측 문헌에 의하면 이때부터 일본열도에서 황금이 산출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대불주조의 책임자가 663년에 왜로 건너간 백제인 국골부(國骨富)의 손자인 구니나카노 키미마로(國中公麻呂)였고, 그 개안회(開眼會)의 악무(樂舞)에서도 한국계 후손들이 활약하였다.참고로 일본문헌에 적혀 있는 문화전래의 진원지 가운데 \'오 吳\'는 그 음이 \'구레\'이므로, \'구려\' 혹은 \'고려\'로 표기되거나 읽혀지는 고구려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고구려를 음이 비슷한 \'오 吳\'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서기》오진 39년 조에 의하면 \"아지사주 등이 고구려에 건너가 오(吳)로 가려고 하였다. 고구려에 이르렀으나 도로를 알지 못하여 길을 아는 자를 고구려에 요청하자, 고구려왕이 이에 구례파(久禮波)·구례지(久禮志) 등 두사람을 붙여 길잡이를 삼았다. 이로 인하여 오에 갈 수가 있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일본서기》의 오가 모조리 고구려일 리는 없다. 오가 중국의 양자강 이남지역을 가리키는 경우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맺음말
백제와 왜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현재 본토인 한반도에 있어서 자료의 결핍으로 인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제한적 자료관람으로, 백제사 연구의 한계를 더욱더 절감하게 한다. 한일 관계에 있어 백제사의 연구는 아직까지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어디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어용역사학자는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애써 축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나라의 국토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조차 지우기는 매우 힘든 듯 하다. 수천 년의 세월, 그 세월동안 일본 본토에 남겨진 백제인들의 자취는 어느덧 일본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기에 애써 들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일본 속의 백제문화가 아닌가 한다.
추천자료
 교육 실습 과정의 구조적 재생산에 관한 연구-학교의 지배적 헤게모니와 교생들의 일상적 삶...
교육 실습 과정의 구조적 재생산에 관한 연구-학교의 지배적 헤게모니와 교생들의 일상적 삶... 교육과정 정책변화와 효과적인 학교연구의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교육과정 정책변화와 효과적인 학교연구의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태도에 관한 연구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활동을 통해본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연구
교육활동을 통해본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연구 초등교육의 의의. 성격. 대상. 연구방법.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초등교육의 의의. 성격. 대상. 연구방법.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보건교육사의 이해와 운영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사의 이해와 운영에 대한 연구 8년 연구- 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선 사례
8년 연구- 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선 사례 [전학과] [유아교육평가 E형] 질적연구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것을 실시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
[전학과] [유아교육평가 E형] 질적연구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것을 실시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 2001년(2000년대) 교육사업, 2001년(2000년대) 국제교육과 원격교육, 2001년(2000년대) 영어...
2001년(2000년대) 교육사업, 2001년(2000년대) 국제교육과 원격교육, 2001년(2000년대) 영어... [유아교육평가 B형] 표집의 개념과 의의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입장에서 설명, 각 입장에 ...
[유아교육평가 B형] 표집의 개념과 의의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입장에서 설명, 각 입장에 ... 유아교육평가 - 표집의 개념과 의의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입장에 적합...
유아교육평가 - 표집의 개념과 의의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입장에 적합... [유아교육평가] 표집의 개념과 의의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각 입장에 ...
[유아교육평가] 표집의 개념과 의의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각 입장에 ... [기업 개발][공동기술개발][예절교육프로그램개발][공동기술개발]기업 공동연구개발, 기업 직...
[기업 개발][공동기술개발][예절교육프로그램개발][공동기술개발]기업 공동연구개발, 기업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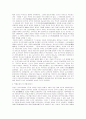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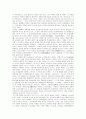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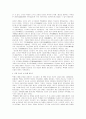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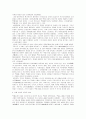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