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家」의 의미와 시·공간적 배경
2. 아버지의 상징인 「家」
1) 아버지의 일화를 통한 회상
2) 여인들을 통한 회상
3) 산키치를 통한 회상
3. 속박의 상징인「家」
1) 舊家의 의미
2) 新家의 의미
Ⅲ. 結論
【參考文獻】
Ⅱ. 本論
1.「家」의 의미와 시·공간적 배경
2. 아버지의 상징인 「家」
1) 아버지의 일화를 통한 회상
2) 여인들을 통한 회상
3) 산키치를 통한 회상
3. 속박의 상징인「家」
1) 舊家의 의미
2) 新家의 의미
Ⅲ.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설이 유행했다. 1900년 초기에 이르면 모리오가이가 이룩한 번역과 창작의 영향으로 낭만주의와 이런 서구주의에 반발하는 의고전주의운동이 함께 나타났다. 소설만이 아니라 시부문에서도 새로운 인간성을 요구하며, 이상을 추구하는 낭만주의 시인이 활약하게 되었다. 당시 藤村도 그러한 낭만주의적 영향을 받아,「初戀」라는 대표적인 일본낭만시를 쓰기고 했다. 1910년대에 이르면 청일전쟁 뒤에 반봉건적인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관념소설과 심각소설이 나타났다. 그리고 러일전쟁으로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모순속에서 프랑스 자연주의 소설이 일본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서양의 자연주의는 자연과학의 방법에 의해 인간의 생활을 해부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유전과 환경을 존중하고 유전적인 기질과 환경의 변화가 인긴생활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자아고백을 통해 인생의 진실을 파헤치는 독자적인 자연주의 문학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島崎藤村의「破戒」나 「家」, 田山花袋의 「蒲 」을 들 수 있다.
島崎藤村에게 있어 「家」라는 것은 아버지의 상징임과 동시에 舊家로서의 속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소설을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를 통하여 본 고이즈마家의 몰락사를 그린 것이라 한다면, 그 숨겨진 주제로는 광사한 아버지를 매개로 한 동서 문명의 갈등의 역사를 들 수 있다.
사실 아버지, 코이즈미 타다노리는 속박의 근원인 舊家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발광의 원인이 아내 오누이의 간통과 그것을 책할 수 없는 자신의 근친상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이즈미의 광사(狂死)를 흑선(黑船)의 출현이라는 근대화를 상징하는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것은 자기 개인에게 작용하는 舊家의 속박요인을 그 근원부터 파고들어 한편으로는 그 실생활을 고백함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그 시선을 사회적 제도로, 시대적 흐름으로 점차 거시적으로 확대시켜 나간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혈통의 문제는 그 근원을 생각하는 작가의 눈을 통해 키소라는 폐쇄적 산촌의 풍토 문제로, 또 사회적인 봉건적 가족제도의 문제로 확대해석되어 파악됨으로써 개인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이 한 시대의 희생자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고, 경제적으로 그를 옭아매던 舊家의 인물들 또한 변혁의 시대의 희생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개인적 차원의 운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산키치를 통해 藤村의 자기자신과 현실세계와의 갈등을 나타냄과 동시에 봉건적 가족제도와 타락한 혈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정신을 수용하고 지향했음에도, 현실적인 舊家의 경제적 억압과 타락한 핏줄에 대한 번민 그리고 이러한 속박으로 이상이었던 新家에 안주할 수 없었기에 架空의 세계(문학)을 선택하였다.
家라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안식처이지만 한편으로는 운명적 가족공동체 나아가 폐쇄적 봉건성을 갖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사유재산 상속의 수단이고 계급적 위치를 부여하여 계급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중심적 제도이자 하나의 경제체계이다. 따라서 그곳에는 권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갈등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즉, 가족은 양면성(ambivalence)이 존재하는 곳이다.
한국도 가정이나 가족의 공동체적 삶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근대화 이전의 한국의 가족도「家」의 舊家와 같이 봉건적인 형태의 종속관계와 퇴폐 문화가 존재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를 요구한다.
소설「家」에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藤村 자신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더불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희생된 아버지나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모습이 몰락해 가는 가족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일본의 明治期에 있어서의 家에 대한 의미와 藤村의 삶에 대한 자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參考文獻】
「島崎藤村의 家 고찰」-속박 그리고 자유사이에서- 석사논문 李鉉沃 1997.
「시마자키 도오손(島崎藤村)의 家에 나타난 자유에의 갈망」석사논문 이현옥.
「島崎藤村論」 龜井勝一郞. 1965.
「아버지란 무엇인가」-島崎藤村의 문학세계- 노영희. 1992.
「일본문학의 이해」 이토세이. 1993.
「시마자키 도송」-고향과 아버지의 문학적 형상화- 노영희. 1995.
「日本近代小說 入門」 김정혜. 1998.
島崎藤村에게 있어 「家」라는 것은 아버지의 상징임과 동시에 舊家로서의 속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소설을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를 통하여 본 고이즈마家의 몰락사를 그린 것이라 한다면, 그 숨겨진 주제로는 광사한 아버지를 매개로 한 동서 문명의 갈등의 역사를 들 수 있다.
사실 아버지, 코이즈미 타다노리는 속박의 근원인 舊家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발광의 원인이 아내 오누이의 간통과 그것을 책할 수 없는 자신의 근친상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이즈미의 광사(狂死)를 흑선(黑船)의 출현이라는 근대화를 상징하는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것은 자기 개인에게 작용하는 舊家의 속박요인을 그 근원부터 파고들어 한편으로는 그 실생활을 고백함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그 시선을 사회적 제도로, 시대적 흐름으로 점차 거시적으로 확대시켜 나간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혈통의 문제는 그 근원을 생각하는 작가의 눈을 통해 키소라는 폐쇄적 산촌의 풍토 문제로, 또 사회적인 봉건적 가족제도의 문제로 확대해석되어 파악됨으로써 개인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이 한 시대의 희생자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고, 경제적으로 그를 옭아매던 舊家의 인물들 또한 변혁의 시대의 희생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개인적 차원의 운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산키치를 통해 藤村의 자기자신과 현실세계와의 갈등을 나타냄과 동시에 봉건적 가족제도와 타락한 혈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정신을 수용하고 지향했음에도, 현실적인 舊家의 경제적 억압과 타락한 핏줄에 대한 번민 그리고 이러한 속박으로 이상이었던 新家에 안주할 수 없었기에 架空의 세계(문학)을 선택하였다.
家라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안식처이지만 한편으로는 운명적 가족공동체 나아가 폐쇄적 봉건성을 갖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사유재산 상속의 수단이고 계급적 위치를 부여하여 계급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중심적 제도이자 하나의 경제체계이다. 따라서 그곳에는 권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갈등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즉, 가족은 양면성(ambivalence)이 존재하는 곳이다.
한국도 가정이나 가족의 공동체적 삶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근대화 이전의 한국의 가족도「家」의 舊家와 같이 봉건적인 형태의 종속관계와 퇴폐 문화가 존재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를 요구한다.
소설「家」에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藤村 자신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더불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희생된 아버지나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모습이 몰락해 가는 가족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일본의 明治期에 있어서의 家에 대한 의미와 藤村의 삶에 대한 자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參考文獻】
「島崎藤村의 家 고찰」-속박 그리고 자유사이에서- 석사논문 李鉉沃 1997.
「시마자키 도오손(島崎藤村)의 家에 나타난 자유에의 갈망」석사논문 이현옥.
「島崎藤村論」 龜井勝一郞. 1965.
「아버지란 무엇인가」-島崎藤村의 문학세계- 노영희. 1992.
「일본문학의 이해」 이토세이. 1993.
「시마자키 도송」-고향과 아버지의 문학적 형상화- 노영희. 1995.
「日本近代小說 入門」 김정혜.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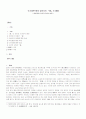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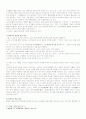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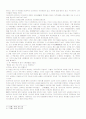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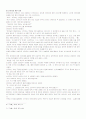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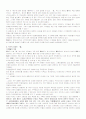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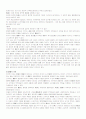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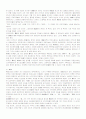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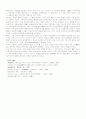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