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극의 탄생
2. 영화의 탄생
3. 연극과 영화의 관계
2. 영화의 탄생
3. 연극과 영화의 관계
본문내용
가 있다.
그래서 영화 텍스트의 경우 한 줄거리의 경과는 불연속적인 입장들의 연속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해결되는 반면에, 극적 텍스트의 경우 한 줄거리의 경과는 공간적-시간적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완결된 장면의 통일내에서 제시된다. 연극의 경우 하나의 선택된 장면내에서의 시간적-공간적 계속성과 동질성은 매개체를 통해 확정되어져 있는 반면에, 영화의 경우 개개의 입장은 조리개의 크기, 조리개의 전망, 조리개의 연접(절단면, 간막이 등등), 필름의 노출(조명장치) 그리고 카메라의 이동과 관련하여 변화될 수 있다. 그 결과 극장에서 관객은 불변의 거리와 전망 속에서 사건을 수용하며, 영화의 경우 이러한 관계들은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영화의 몽타주 기법(각각 쇼트를 이어 붙여 또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법)을 통해 공간적-시간적으로 계속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진 줄거리의 경과는(연극에서도 그러한 줄거리의 경과로 제시되어져야 했을지도 모르는) 여러 장소에서의 전망과 시간상으로 불연속성에서 결과하는 개개의 입장들로 분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시간적으로 연속체가 다른 공간적-시간적 위치의 입장들의 삽입을 통해 중단될 수 있다.
극적 텍스트와는 달리 우리들이 설화적 텍스트에서 공간적-시간적 취급을 가능케하는 \"중개하는 의사소통체계\"를 인식할 수 있듯이 영화에서는 변하기 쉽고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를 통해 이야기된 것의 시간상의 도치(전치)들(예를들어 \"Rueckblende\"의 기술), 시간을 낚아챔과 시간의 연장, 지형적 끼워 맞추기, 사진의 절단과 묘사 전망의 변경들이 가능하다. 영화에서는 변하기 쉽고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가 중재하는 의사소통체계를 표현하며, 설화적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허구적 화자가 실현하는 이야기 기능을 성취한다.
설화적 텍스트의 독자처럼 영화 관람객은 연극에서처럼 묘사된 자와 직접적으로 대면되지 않고, 카메라 내지 화자(전망하고, 선택하고, 강조하고, 분철하는 중개매개체인)의 역할을 뛰어 넘는다. 설화적 텍스트의 영화와의 이러한 구조적 친화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영화는 흔히 광학적(카메라 렌즈를 통한) 이야기 기능 이외에도 언어상으로도 명백한 이야기매개체들을 삽입한다는 사실(서면에 의한 이야기 제목,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의 목소리)과 - 연극과 반대로 - 영화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은 공간들에 관한 \"기술적인\" 묘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화는 극적 텍스트와 설화적 텍스트의 구조요소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형식임이 증명된다; 영화에 있어 생산과 수용이라는 다양한 중간 형식성과 집합성은 연극과의 관련성을, 중재하는 의사소통체계를 소유하고 있음은 설화적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장르의 순수성과 무혼합성을 강조하는 정화주의자의 이론에 의하면 영화의 이러한 겹침(간섭)은 미학적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영화제작자에게는 이러한 겹침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전들, 도관들 그리고 구조화 방법들에 관한 레파토리의 긍적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영화 텍스트의 경우 한 줄거리의 경과는 불연속적인 입장들의 연속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해결되는 반면에, 극적 텍스트의 경우 한 줄거리의 경과는 공간적-시간적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완결된 장면의 통일내에서 제시된다. 연극의 경우 하나의 선택된 장면내에서의 시간적-공간적 계속성과 동질성은 매개체를 통해 확정되어져 있는 반면에, 영화의 경우 개개의 입장은 조리개의 크기, 조리개의 전망, 조리개의 연접(절단면, 간막이 등등), 필름의 노출(조명장치) 그리고 카메라의 이동과 관련하여 변화될 수 있다. 그 결과 극장에서 관객은 불변의 거리와 전망 속에서 사건을 수용하며, 영화의 경우 이러한 관계들은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영화의 몽타주 기법(각각 쇼트를 이어 붙여 또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법)을 통해 공간적-시간적으로 계속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진 줄거리의 경과는(연극에서도 그러한 줄거리의 경과로 제시되어져야 했을지도 모르는) 여러 장소에서의 전망과 시간상으로 불연속성에서 결과하는 개개의 입장들로 분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시간적으로 연속체가 다른 공간적-시간적 위치의 입장들의 삽입을 통해 중단될 수 있다.
극적 텍스트와는 달리 우리들이 설화적 텍스트에서 공간적-시간적 취급을 가능케하는 \"중개하는 의사소통체계\"를 인식할 수 있듯이 영화에서는 변하기 쉽고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를 통해 이야기된 것의 시간상의 도치(전치)들(예를들어 \"Rueckblende\"의 기술), 시간을 낚아챔과 시간의 연장, 지형적 끼워 맞추기, 사진의 절단과 묘사 전망의 변경들이 가능하다. 영화에서는 변하기 쉽고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가 중재하는 의사소통체계를 표현하며, 설화적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허구적 화자가 실현하는 이야기 기능을 성취한다.
설화적 텍스트의 독자처럼 영화 관람객은 연극에서처럼 묘사된 자와 직접적으로 대면되지 않고, 카메라 내지 화자(전망하고, 선택하고, 강조하고, 분철하는 중개매개체인)의 역할을 뛰어 넘는다. 설화적 텍스트의 영화와의 이러한 구조적 친화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영화는 흔히 광학적(카메라 렌즈를 통한) 이야기 기능 이외에도 언어상으로도 명백한 이야기매개체들을 삽입한다는 사실(서면에 의한 이야기 제목,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의 목소리)과 - 연극과 반대로 - 영화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은 공간들에 관한 \"기술적인\" 묘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화는 극적 텍스트와 설화적 텍스트의 구조요소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형식임이 증명된다; 영화에 있어 생산과 수용이라는 다양한 중간 형식성과 집합성은 연극과의 관련성을, 중재하는 의사소통체계를 소유하고 있음은 설화적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장르의 순수성과 무혼합성을 강조하는 정화주의자의 이론에 의하면 영화의 이러한 겹침(간섭)은 미학적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영화제작자에게는 이러한 겹침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전들, 도관들 그리고 구조화 방법들에 관한 레파토리의 긍적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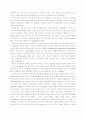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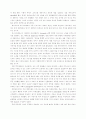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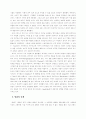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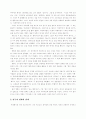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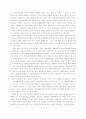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