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상호관계법
II. 인간의 실존
III. 그리스도의 실재
IV. 새로운 존재
V. 그리스도와 프로테스탄트 원리
VI. 결론
II. 상호관계법
II. 인간의 실존
III. 그리스도의 실재
IV. 새로운 존재
V. 그리스도와 프로테스탄트 원리
VI. 결론
본문내용
앙의 진리의 기준이고 그것은 우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러한 이유로 십자가의 \"부정\"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유한한 존재는 자신을 부정함이 없이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 그는 세상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의 지혜와 힘이 십자가에서 부서졌다.
틸리히는 부활을 같은 방법으로 사건과 상징 양자로서 이해한다. 여기서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와는 달리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경험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의 못박힘의 상징보다 좀더 신비적이고 보다 불확실하다. \"실제 경험으로서 부활의 상징은 제자들이 예수에게 알려진 부활의 상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Ibid., 154.
부르스 카메론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모습은 이와 같이 자기부정을 통하여 완성의 원리의 구체적 표명이며 이것은 틸리히의 프로테스탄트 원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Bruce J. R. Cameron, \"The Hegelian Christology of Paul Tilli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29 (1976), 38.
두 상징 뿐만 아니라 기독론 역시 프로테스탄트 원리의 상징이다. George Tavar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조직신학 2권에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소외의 어떠한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소외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한의 흔적을아직 지니고 있고 그는 실존의 비극적 요소에 참여한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은 분명하다. 연합안에서 그는 존재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함이 없이 받아들인다. 이것은 연합의 힘안에서 그것들을 초월함으로서 행해진다. 새로운 존재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로 성서적 모습안에 나타난다. 프로테스탄트 원리는 가르치는 것은 부정이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안에서 이미 초월되었기 때문이다.
George H. Tavard, \"The Kingdom of God as Utopia,\" Paul Tillich: A New Catholic Assessment, eds. R. Bulman and F. J. Parrella.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4) 102.
틸리히는 그의 조직신학 3권에서 영적 기독론을 설명한다. 영적 기독론은 무엇인가? 틸리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왜곡됨이 없이 그리스도로서 예수안에 현존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존재는 과거나 지금이나 영적 체험의 기준으로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로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왜냐하면 신의 영은 전적으로 인간 정신을 붙잡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한다는 것은 영적 현존에 의해 모호함이 없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진 존재의 상태이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두 신학적 적용이 영적 기독론에 따른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만든 것은 나사렛 예수 인간의 영이 아니라 신의 현존이다. 예수안에 하나님 그는 그의 개인적 영을 사로잡고 몰아갔다. 이와같이 예수신학의 어려움을 피하게 된다. 둘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드는 신의 영, 신의 현존은 창조적을 구원과 계시의 역사안에 나타난다. 여기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것은 그안에 새로운 존재 실존적 만남 이전을 의미한다.
ST 2, 146-47.
틸리히에게 있어서 인간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길은 프로테스탄트 원리에 있다고본다. 프로테스탄트 원리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며 그 원리는 재료도 자료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존재를 알고 새로운 존재를 신의 현존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왜곡되지 않은 신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원리에 비추어서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마지막 계시이고, 신의 현존의 궁극성이고, 모든 계시의 기준이 된다.
VI. 결론
틸리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역사안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실존적 인간은 유한한 범주안에 있고 이러한 유한성은 그를 소외된 상태에 놓이게 하며, 이 소외가 개인적인 행위로 드러날 때 죄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궁지를 극복할 새로운 존재를 요청하게 된다. 이 새로운 존재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인간의 연합이 아니었다. 소외된 실존은 실존의 극복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본질에서의 연합이 아닌 실존에서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으로 새로운 존재가 출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존재의 출현은 역사의 궁극적인 사건이 되며, 최종적 계시가 된다.
그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난다. 새로운 존재가 최종적 계시이고 신의 현존의 궁극성이고 그리고 역사의 한 중앙에 서 있다면 왜 틸리히는 기독교 메시지(진리)로서 케뤼그마를 거부했는가이다. 만일 그가 새로운 존재를 기독교 불변의 메시지(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마지막 계시는 무엇이고 유일성과 역사의 중앙은 무엇을 뜻하는가? 케뤼그마가 단지 기독교 메시지의 형태가 아니라 내용으로 말해질 때에 틸리히가 말하는 새로운 존재와 케뤼그마의 차이는 무엇인가?
틸리히는 기독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교리에서 떠나 있다. 그의 기독론은 프로테스탄트 원리에 의존한다. 그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새로운 존재를 말한다. 새로운 존재는 그리스도로서 예수 안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역사안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이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의 일부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를 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이며 이 상징의 역사적 구현체가 예수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기독론이 새로운 존재의 등장으로 모호성에 빠지게 되는 것을 느낀다. 틸리히에게서 새로운 존재는 기독교 전통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Christ above Christ)가 된다. 성서적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철학적 그리스도론(성서적 역사적 예수)으로 희석되고 결국은 역사성과 구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사상은 훗날 그의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는 방향으로 옮겨갔고 타종교와의 대화로 나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틸리히는 부활을 같은 방법으로 사건과 상징 양자로서 이해한다. 여기서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와는 달리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경험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의 못박힘의 상징보다 좀더 신비적이고 보다 불확실하다. \"실제 경험으로서 부활의 상징은 제자들이 예수에게 알려진 부활의 상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Ibid., 154.
부르스 카메론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모습은 이와 같이 자기부정을 통하여 완성의 원리의 구체적 표명이며 이것은 틸리히의 프로테스탄트 원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Bruce J. R. Cameron, \"The Hegelian Christology of Paul Tilli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29 (1976), 38.
두 상징 뿐만 아니라 기독론 역시 프로테스탄트 원리의 상징이다. George Tavar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조직신학 2권에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소외의 어떠한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소외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한의 흔적을아직 지니고 있고 그는 실존의 비극적 요소에 참여한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은 분명하다. 연합안에서 그는 존재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함이 없이 받아들인다. 이것은 연합의 힘안에서 그것들을 초월함으로서 행해진다. 새로운 존재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로 성서적 모습안에 나타난다. 프로테스탄트 원리는 가르치는 것은 부정이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안에서 이미 초월되었기 때문이다.
George H. Tavard, \"The Kingdom of God as Utopia,\" Paul Tillich: A New Catholic Assessment, eds. R. Bulman and F. J. Parrella.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4) 102.
틸리히는 그의 조직신학 3권에서 영적 기독론을 설명한다. 영적 기독론은 무엇인가? 틸리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왜곡됨이 없이 그리스도로서 예수안에 현존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존재는 과거나 지금이나 영적 체험의 기준으로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로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왜냐하면 신의 영은 전적으로 인간 정신을 붙잡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한다는 것은 영적 현존에 의해 모호함이 없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진 존재의 상태이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두 신학적 적용이 영적 기독론에 따른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만든 것은 나사렛 예수 인간의 영이 아니라 신의 현존이다. 예수안에 하나님 그는 그의 개인적 영을 사로잡고 몰아갔다. 이와같이 예수신학의 어려움을 피하게 된다. 둘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드는 신의 영, 신의 현존은 창조적을 구원과 계시의 역사안에 나타난다. 여기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것은 그안에 새로운 존재 실존적 만남 이전을 의미한다.
ST 2, 146-47.
틸리히에게 있어서 인간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길은 프로테스탄트 원리에 있다고본다. 프로테스탄트 원리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며 그 원리는 재료도 자료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존재를 알고 새로운 존재를 신의 현존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왜곡되지 않은 신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원리에 비추어서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마지막 계시이고, 신의 현존의 궁극성이고, 모든 계시의 기준이 된다.
VI. 결론
틸리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역사안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실존적 인간은 유한한 범주안에 있고 이러한 유한성은 그를 소외된 상태에 놓이게 하며, 이 소외가 개인적인 행위로 드러날 때 죄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궁지를 극복할 새로운 존재를 요청하게 된다. 이 새로운 존재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인간의 연합이 아니었다. 소외된 실존은 실존의 극복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본질에서의 연합이 아닌 실존에서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으로 새로운 존재가 출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존재의 출현은 역사의 궁극적인 사건이 되며, 최종적 계시가 된다.
그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난다. 새로운 존재가 최종적 계시이고 신의 현존의 궁극성이고 그리고 역사의 한 중앙에 서 있다면 왜 틸리히는 기독교 메시지(진리)로서 케뤼그마를 거부했는가이다. 만일 그가 새로운 존재를 기독교 불변의 메시지(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마지막 계시는 무엇이고 유일성과 역사의 중앙은 무엇을 뜻하는가? 케뤼그마가 단지 기독교 메시지의 형태가 아니라 내용으로 말해질 때에 틸리히가 말하는 새로운 존재와 케뤼그마의 차이는 무엇인가?
틸리히는 기독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교리에서 떠나 있다. 그의 기독론은 프로테스탄트 원리에 의존한다. 그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새로운 존재를 말한다. 새로운 존재는 그리스도로서 예수 안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역사안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이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의 일부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를 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이며 이 상징의 역사적 구현체가 예수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기독론이 새로운 존재의 등장으로 모호성에 빠지게 되는 것을 느낀다. 틸리히에게서 새로운 존재는 기독교 전통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Christ above Christ)가 된다. 성서적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철학적 그리스도론(성서적 역사적 예수)으로 희석되고 결국은 역사성과 구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사상은 훗날 그의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는 방향으로 옮겨갔고 타종교와의 대화로 나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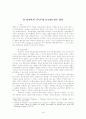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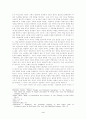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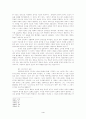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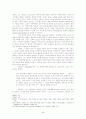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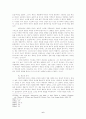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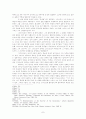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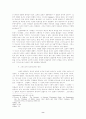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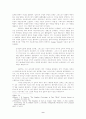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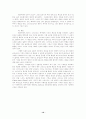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