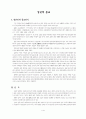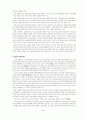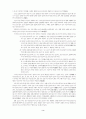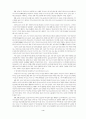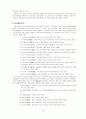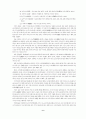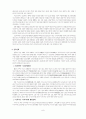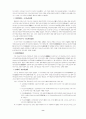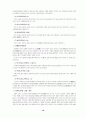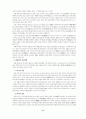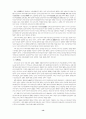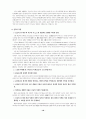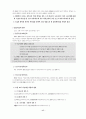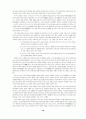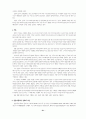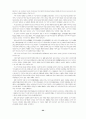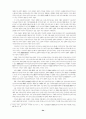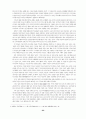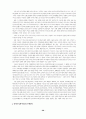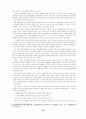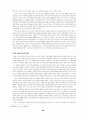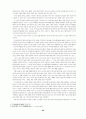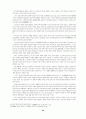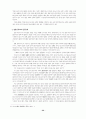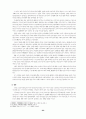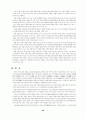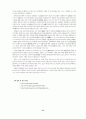-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목차
일본인의 종교의식
신 도
기독교
불 교
신 도
기독교
불 교
본문내용
확장하는 기독교회의 정체성은, 사회운동이나 시민연대의 가치지향 보다 우선하는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을 인식하는데에 일본기독교의 가장 큰 과제가 놓여 있다.
불 교
불교가 처음 일본에 전해진 것은 6세기경(544년)으로, 백제의 성왕이 특사를 파견하여 금동석가불상 1구와 깃발 그리고 가사와 경론을 전해 성실종(成實宗)의 개조가 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백제는 일본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관륵(觀勒)은 역법(曆法)·천문·지리·술수(術數) 등을 일본에 전하였고, 혜총(惠聰)·도림(道琳)·담혜(曇慧)·혜미(慧彌) 등 많은 고승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와 문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일본에 전해진 불교는 여러 호족(豪族)들의 지지를 얻어 마침내는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불교장려책을 쓰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를 굳혔다. 또한 불교의 교리 그 자체는 수준 높은 학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족계층이나 도래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불교는 유교 등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일본 국내에 확대 보급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배경은 첫째로, 현세 이익적인 면과 사후의 명복을 보증한다고 하는 주술적인 면이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6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 백제를 통해 경험하게 된 일본의 불교는 고도로 발달된 중국의 불교문화도 함께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아스카 시대라고 부르며, 여기서 말하는 아스카란 바로 나라의 옛 이름이다.
7세기초 당시의 황태자이며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쇼오토쿠태자(574~622년)가 불교문화를 전파하는데 있어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왕실의 섭정이자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는 이 새로운 종교와 불교에 관련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또한 불교가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불교는 12세기경까지는 귀족을 위한 종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3세기에 접어들면서 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번성함과 동시에 무사계층에게는 선이 보급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일본인의 종교의 중심이 되어 있다.
나라[奈良] 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와의 연관을 더욱 굳혀 고쿠분사[國分寺]의 제도도 이 무렵의 산물이다. 이 시대는 중국불교가 황금시대를 이룬 때였으므로 그들의 여러 종지(宗旨)가 차례로 건너와 삼론(三論)·법상·성실·구사(俱舍)·율·화엄 등 이른바 남부6종(宗)이 성립하였다.
헤이안[平安] 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천태(天台)·진언(眞言)의 2종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다. 천태종의 사이초[最澄], 진언종의 구카이[空海] 등은 모두 입당(入唐)하여 새로운 불법을 구한 개조들이다. 남부6종은 이들 2개 종파의 발전에 따라 점차로 그 세력을 잃게 되었고, 특히 사이초가 대승계단(大乘戒壇)을 개설하고 그가 죽자 이것이 국가의 공인을 얻음으로써 남부6종의 몰락은 결정적으로 되었다. 또 헤이안불교는 귀족들의 열성적인 귀의와 보호를 받아 귀족불교라 일컬어졌는데, 귀족들은 조정의 본을 떠 조사(造寺)·조탑(造塔)에 힘쓰는 한편 기도(祈禱)와 법회를 자주 열어 그 권세를 자랑하였다. 한편 이렇게 귀족들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된 승려들은 세속적 권위와 결탁하게 되었고, 절은 귀족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를 지키기 위하여 승병(僧兵)을 두게 됨으로써 많은 폐단을 낳게 되는 근원이 되었다.
일본불교가 민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가마쿠라[鎌倉] 시대이다. 말법사상(末法思想)을 배경으로 일어난 정토종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는 일만이 정토왕생(淨土往生)의 정정업(正定業)이라고 설하면서 급속히 교세를 넓히다가 기성종파의 반감을 사고 박해를 받게 되었다. 정토종을 확립한 겐쿠[源空:法然]의 문하에는 많은 인재가 모여 여러 종파로 분립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토진종(淨土眞宗)을 개설한 신란[親鸞]이다. 그도 스승과 마찬가지로 유형에 처해졌으나 그는 유형지에서 저술과 포교에 주력하였다. 한편 에이사이[榮西]·도겐[道元] 등에 의하여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禪宗)은 계율에 엄격한 수양의 교법으로서 무사계급과 결부되어 발전하였다. 가마쿠라불교의 최후를 장식한 것은 니치렌종[日蓮宗]이다. 니치렌은 처음 진언밀교(眞言密敎)를 배우고 이어 천태(天台)를 배워 《법화경》의 진리를 깨닫고 니치렌종을 개종하였다. 이 종파는 천태 이외의 종파를 부정하는 도전적인 언동 때문에 자주 법난(法難)을 받았다. 그러나 후에 민중들 사이에 교세가 확장되어 지금은 진종(眞宗)과 나란히 대종파를 이루고 있다.
무로마치[室町] 시대 이후 불교는 점차 쇠퇴하다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천하를 통일하자 완전히 교세가 꺾였으며, 에도[江戶] 시대에는 정권의 도구로 타락하였다. 이렇게 침체·부패한 불교에 대하여 비난·배척의 운동도 자주 일어났으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뜻있는 불제자들에 의하여 혁신의 기운도 높아지고 여러 종파의 부흥운동도 추진되어 근대적 종교로서의 불교발전이 이룩되었다.
불교는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오도를 궁극의 경지로 삼는다. 또한, 모든 것이 무상인데도 불구하고 항상이라 생각하며, 모든 것은 실체를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착을 버리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불교에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증오나 원망을 버리는 것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광신을 배척하고 관용을 베풀며, 동시에 평등을 관철하고자 한다.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교와의 관련이 상당히 크며, 신도가 아니더라도 절을 찾아 참배하고 장례식 또한 거의 대부분이 불교 식으로 행하며, 사후에는 불교상의 이름인 계명을 붙인다. 이 밖에도 일본의 예술, 문학, 건축은 물론 일본인의 사상, 도덕등 문화전반에 걸쳐 불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출처 및 참고사이트
▷ http://www2.sungsim.ac.kr/park
▷ http://www.kr108.net/qjaans/902일본불교.htm
▷ http://members.tripod.lycos.co.kr/wblee2/album.html
불 교
불교가 처음 일본에 전해진 것은 6세기경(544년)으로, 백제의 성왕이 특사를 파견하여 금동석가불상 1구와 깃발 그리고 가사와 경론을 전해 성실종(成實宗)의 개조가 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백제는 일본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관륵(觀勒)은 역법(曆法)·천문·지리·술수(術數) 등을 일본에 전하였고, 혜총(惠聰)·도림(道琳)·담혜(曇慧)·혜미(慧彌) 등 많은 고승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와 문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일본에 전해진 불교는 여러 호족(豪族)들의 지지를 얻어 마침내는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불교장려책을 쓰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를 굳혔다. 또한 불교의 교리 그 자체는 수준 높은 학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족계층이나 도래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불교는 유교 등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일본 국내에 확대 보급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배경은 첫째로, 현세 이익적인 면과 사후의 명복을 보증한다고 하는 주술적인 면이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6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 백제를 통해 경험하게 된 일본의 불교는 고도로 발달된 중국의 불교문화도 함께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아스카 시대라고 부르며, 여기서 말하는 아스카란 바로 나라의 옛 이름이다.
7세기초 당시의 황태자이며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쇼오토쿠태자(574~622년)가 불교문화를 전파하는데 있어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왕실의 섭정이자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는 이 새로운 종교와 불교에 관련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또한 불교가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불교는 12세기경까지는 귀족을 위한 종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3세기에 접어들면서 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번성함과 동시에 무사계층에게는 선이 보급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일본인의 종교의 중심이 되어 있다.
나라[奈良] 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와의 연관을 더욱 굳혀 고쿠분사[國分寺]의 제도도 이 무렵의 산물이다. 이 시대는 중국불교가 황금시대를 이룬 때였으므로 그들의 여러 종지(宗旨)가 차례로 건너와 삼론(三論)·법상·성실·구사(俱舍)·율·화엄 등 이른바 남부6종(宗)이 성립하였다.
헤이안[平安] 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천태(天台)·진언(眞言)의 2종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다. 천태종의 사이초[最澄], 진언종의 구카이[空海] 등은 모두 입당(入唐)하여 새로운 불법을 구한 개조들이다. 남부6종은 이들 2개 종파의 발전에 따라 점차로 그 세력을 잃게 되었고, 특히 사이초가 대승계단(大乘戒壇)을 개설하고 그가 죽자 이것이 국가의 공인을 얻음으로써 남부6종의 몰락은 결정적으로 되었다. 또 헤이안불교는 귀족들의 열성적인 귀의와 보호를 받아 귀족불교라 일컬어졌는데, 귀족들은 조정의 본을 떠 조사(造寺)·조탑(造塔)에 힘쓰는 한편 기도(祈禱)와 법회를 자주 열어 그 권세를 자랑하였다. 한편 이렇게 귀족들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된 승려들은 세속적 권위와 결탁하게 되었고, 절은 귀족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를 지키기 위하여 승병(僧兵)을 두게 됨으로써 많은 폐단을 낳게 되는 근원이 되었다.
일본불교가 민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가마쿠라[鎌倉] 시대이다. 말법사상(末法思想)을 배경으로 일어난 정토종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는 일만이 정토왕생(淨土往生)의 정정업(正定業)이라고 설하면서 급속히 교세를 넓히다가 기성종파의 반감을 사고 박해를 받게 되었다. 정토종을 확립한 겐쿠[源空:法然]의 문하에는 많은 인재가 모여 여러 종파로 분립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토진종(淨土眞宗)을 개설한 신란[親鸞]이다. 그도 스승과 마찬가지로 유형에 처해졌으나 그는 유형지에서 저술과 포교에 주력하였다. 한편 에이사이[榮西]·도겐[道元] 등에 의하여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禪宗)은 계율에 엄격한 수양의 교법으로서 무사계급과 결부되어 발전하였다. 가마쿠라불교의 최후를 장식한 것은 니치렌종[日蓮宗]이다. 니치렌은 처음 진언밀교(眞言密敎)를 배우고 이어 천태(天台)를 배워 《법화경》의 진리를 깨닫고 니치렌종을 개종하였다. 이 종파는 천태 이외의 종파를 부정하는 도전적인 언동 때문에 자주 법난(法難)을 받았다. 그러나 후에 민중들 사이에 교세가 확장되어 지금은 진종(眞宗)과 나란히 대종파를 이루고 있다.
무로마치[室町] 시대 이후 불교는 점차 쇠퇴하다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천하를 통일하자 완전히 교세가 꺾였으며, 에도[江戶] 시대에는 정권의 도구로 타락하였다. 이렇게 침체·부패한 불교에 대하여 비난·배척의 운동도 자주 일어났으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뜻있는 불제자들에 의하여 혁신의 기운도 높아지고 여러 종파의 부흥운동도 추진되어 근대적 종교로서의 불교발전이 이룩되었다.
불교는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오도를 궁극의 경지로 삼는다. 또한, 모든 것이 무상인데도 불구하고 항상이라 생각하며, 모든 것은 실체를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착을 버리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불교에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증오나 원망을 버리는 것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광신을 배척하고 관용을 베풀며, 동시에 평등을 관철하고자 한다.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교와의 관련이 상당히 크며, 신도가 아니더라도 절을 찾아 참배하고 장례식 또한 거의 대부분이 불교 식으로 행하며, 사후에는 불교상의 이름인 계명을 붙인다. 이 밖에도 일본의 예술, 문학, 건축은 물론 일본인의 사상, 도덕등 문화전반에 걸쳐 불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출처 및 참고사이트
▷ http://www2.sungsim.ac.kr/park
▷ http://www.kr108.net/qjaans/902일본불교.htm
▷ http://members.tripod.lycos.co.kr/wblee2/albu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