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形態素의 槪念
Ⅲ. 形態素의 意味와 機能
Ⅳ. 形態素의 類型
1. 自立形態素와 依存形態素
2. 語彙形態素와 文法形態素
3. 核心形態素와 附加形態素
4. 音韻交替와 形態素 類型
Ⅴ. 結 論
☆參考文獻☆
Ⅱ. 形態素의 槪念
Ⅲ. 形態素의 意味와 機能
Ⅳ. 形態素의 類型
1. 自立形態素와 依存形態素
2. 語彙形態素와 文法形態素
3. 核心形態素와 附加形態素
4. 音韻交替와 形態素 類型
Ⅴ.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7) 길이에 따른 의미와 기능의 차이
ㄱ. 산 : 사람(살아있는 사람)
산 : 신령(살아있는 신령)
ㄴ. 산사람(산에서 생활하는 사람)
산신령(산을 주관하는 신령)
(8) 강세에 따른 의미와 기능의 차이
ㄱ. 밥을 먹고 오너라(다른 음식아 아닌 꼭 밥을 먹고)
ㄴ. 밥을 먹고 오너라(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움직임을 하고)
ㄷ. 밥을 먹고 오너라( 오는 행위를 꼭 하여라)
문장 (6)∼(8)에서와 같이 의미나 기능을 분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데에 운소가 관여하는 현상이 있다.
Ⅴ. 結 論
형태소란 언어형식에서 최소의 有意的 단위이다. 이것은 의미를 가지는 단위로서 가장 작은 단위라는 뜻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의미의 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나무, 그릇, 책, 어느, 벌써, 퍽, 또\' \'눈, 웃-, -음, -어라\'는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갠 마지막 조각들 즉 최소의 有意的 단위인 형태소이다.
형태소를 의미나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다고 하면 의미가 같은 형식이나, 기능이 같은 형식을 같은 형태소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른바 문법적인 기능이나 의미가 같은 형식이라면 모양이 달라도 하나의 체계에 속하는 형태소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가 같은 형식을 하나의 형태소로 설정할 경우 (진지)와 (밥)과 같이 형식의 쓰임이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들 형식의 쓰임이 같지 않으므로 다른 형태소로 설정한다.
또 (졸졸), (솔솔), (탕탕)과 같은 흉내말은 같은 모양의 형식이 두 번 겹쳐서 쓰인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졸)과 (솔)의 의미나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졸졸)이나 (솔솔)을 두 개의 형태소가 배합된 언어형식으로 설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른바 흉내말에 있어서 형태소 분석은 의미나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오르락내리락), (들락날락),(할락말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락)이라는 형식이 두 번 이상 쓰였으므로 (락)을 하나의 형태소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 이른바 네 개의 형태소가 배합된 형식이므로 네 개의 의미나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의미나 기능을 지시하는 것이다.
형태소의 유형에는 자립여부, 의미 특성, 구성에서 중심의미를 가지는가에 따라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어휘형태소, 문법형태소, 핵심형태소, 부가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자립형태소는 (풀), (밭), (속), (잎) 등과 같이 다른 형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은 형태소를 말하며, 상대적으로 (-에),(-고), (나-), (-에) 등과 같이 다른 형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형태소는 의존형태소라 한다.
어휘형태소는 (풀), (밭), (속), (잎)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로서 체언,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간이 속하고, 문법형태소는 (-에),(-고), (나-), (-에) 등과 같이 어휘형태소에 붙어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표시하는 형태소로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가 속한다.
또 핵심형태소는 낱말이나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나 기능을 지니고 있는 형식을, 부가형태소는 핵심형태소에 덧붙어서 의미나 기능을 보태 주는 형식을 말한다.
이밖에도 의미나 기능을 분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데에 운소가 관여하는 현상에 따라 형태소를 나눌 수 있다.
☆參考文獻☆
이기백, 『국어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8.
안병희외,『국어문법론Ⅱ』,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2.
이익섭, 남기심, 『국어문법론Ⅱ』,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2.
민현식, 『국어문법연구』, 도서출판 역락, 1999.
김영배, 신현숙 『현대한국어문법』, 한신문화사, 1987.
ㄱ. 산 : 사람(살아있는 사람)
산 : 신령(살아있는 신령)
ㄴ. 산사람(산에서 생활하는 사람)
산신령(산을 주관하는 신령)
(8) 강세에 따른 의미와 기능의 차이
ㄱ. 밥을 먹고 오너라(다른 음식아 아닌 꼭 밥을 먹고)
ㄴ. 밥을 먹고 오너라(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움직임을 하고)
ㄷ. 밥을 먹고 오너라( 오는 행위를 꼭 하여라)
문장 (6)∼(8)에서와 같이 의미나 기능을 분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데에 운소가 관여하는 현상이 있다.
Ⅴ. 結 論
형태소란 언어형식에서 최소의 有意的 단위이다. 이것은 의미를 가지는 단위로서 가장 작은 단위라는 뜻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의미의 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나무, 그릇, 책, 어느, 벌써, 퍽, 또\' \'눈, 웃-, -음, -어라\'는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갠 마지막 조각들 즉 최소의 有意的 단위인 형태소이다.
형태소를 의미나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다고 하면 의미가 같은 형식이나, 기능이 같은 형식을 같은 형태소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른바 문법적인 기능이나 의미가 같은 형식이라면 모양이 달라도 하나의 체계에 속하는 형태소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가 같은 형식을 하나의 형태소로 설정할 경우 (진지)와 (밥)과 같이 형식의 쓰임이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들 형식의 쓰임이 같지 않으므로 다른 형태소로 설정한다.
또 (졸졸), (솔솔), (탕탕)과 같은 흉내말은 같은 모양의 형식이 두 번 겹쳐서 쓰인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졸)과 (솔)의 의미나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졸졸)이나 (솔솔)을 두 개의 형태소가 배합된 언어형식으로 설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른바 흉내말에 있어서 형태소 분석은 의미나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오르락내리락), (들락날락),(할락말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락)이라는 형식이 두 번 이상 쓰였으므로 (락)을 하나의 형태소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 이른바 네 개의 형태소가 배합된 형식이므로 네 개의 의미나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의미나 기능을 지시하는 것이다.
형태소의 유형에는 자립여부, 의미 특성, 구성에서 중심의미를 가지는가에 따라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어휘형태소, 문법형태소, 핵심형태소, 부가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자립형태소는 (풀), (밭), (속), (잎) 등과 같이 다른 형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은 형태소를 말하며, 상대적으로 (-에),(-고), (나-), (-에) 등과 같이 다른 형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형태소는 의존형태소라 한다.
어휘형태소는 (풀), (밭), (속), (잎)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로서 체언,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간이 속하고, 문법형태소는 (-에),(-고), (나-), (-에) 등과 같이 어휘형태소에 붙어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표시하는 형태소로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가 속한다.
또 핵심형태소는 낱말이나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나 기능을 지니고 있는 형식을, 부가형태소는 핵심형태소에 덧붙어서 의미나 기능을 보태 주는 형식을 말한다.
이밖에도 의미나 기능을 분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데에 운소가 관여하는 현상에 따라 형태소를 나눌 수 있다.
☆參考文獻☆
이기백, 『국어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8.
안병희외,『국어문법론Ⅱ』,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2.
이익섭, 남기심, 『국어문법론Ⅱ』,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2.
민현식, 『국어문법연구』, 도서출판 역락, 1999.
김영배, 신현숙 『현대한국어문법』, 한신문화사,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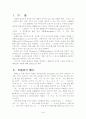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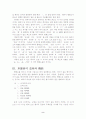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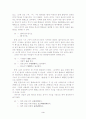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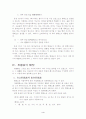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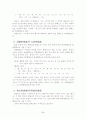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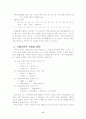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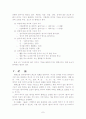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