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식읍의 기원과 성격
3. 식읍의 전개와 변천
4. 녹읍의 성격과 변화
5. 전주전객제의 확립과 식읍의 쇠퇴
6. 결론
2. 식읍의 기원과 성격
3. 식읍의 전개와 변천
4. 녹읍의 성격과 변화
5. 전주전객제의 확립과 식읍의 쇠퇴
6. 결론
본문내용
士에 이르기까지 祭祀의 俸供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지였고 세전되었다. 우리의 세록전인 役分田 田柴科 科田은 규전의 세전성과 채지의 分茅土및 王室藩屛의 정신이 결부되어 마련된 전지였다. 녹읍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제 전지는 모두 수조지로서의 분급전지였고, 전주전객제를 기본구성으로 하여 성립되는 토지였다. 식읍의 쇠퇴와 녹읍의 출현, 그것은 제가가 하호를 지배하던 식의 농민지배에서 토지를 매개로 전주가 농민을 전객으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사회단계가 변동되어감을 반영하는 단초였다. 식읍은 전주전객제 그리고 地主佃戶制내에서 잔존할 뿐이었다.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대에서 중세에 걸친 식읍과 녹읍의 구조 및 그 변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식읍은 왕족이나 척신 그리고 공훈이 있는 고위관료들이 지급받았다. 지급범위로는 고을 전체나 고을 내의 일부에 그치기도 하는 형태였지만 정해진 부실호의 봉호는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상속은 불가했다. 그리고 식읍주는 직접 식읍민으로부터 수입을 거둘 수 있었지만 가신이나 고을 지방관의 협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식읍의 수입은 대단한 것이었다. 수조권자라는 공인된 토지지배자로서 조용조의 징수를 독점하여 부세제도의 운영권을 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농민지배를 가능케 하였다. 식읍주는 봉호의 인력을 동원하여 신전의 개척, 개발을 통해 전지를 매득하거나 소유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몰락한 식읍민을 노비로 흡수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식읍이 회수된 뒤에도 그 자손들이 해당 고을 일대에서 문벌세력, 대토호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식읍은 삼국시기 3세기 이후부터 일반적인 토지제도가 아니었으며 매우 소수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관료나 왕족만이 이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후 통일신라고려시기로 접어들면서 식읍의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다. 사실 식읍의 비중이 크고 또 이의 존재가 우리 나라에서 큰 의미를 갖던 때는 이전 시기였다. 이 제도는 제가가 하호를 수취하고 읍락을 지배하던 국가사회의 소산이었다. 사실 식읍주가 식읍민을 수취함은 형태상 제가가 하호를 수취함과 다를게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가 중앙관료로 신속되었을 때 본래부터 지배하고 있던 지역 내에서 일정수의 민호를 떼어 계속 수취를 허용하거나, 혹은 공훈관료들에게 제가가 별도로 통주하고 수취하던 지역과 같은 형태로 분급하거나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속지정복지가 사여의 대상이었겠다. 이 당시 식읍주의 식읍민에 대한 수취는 제가가 하호에게서 부세를 징수하는 정도가 노비와 같다고 지적할 만큼 혹심하였음으로 보아, 이 정도거나 혹은 그 이상이었겠다. 요컨대 식읍은 제가와 하호 사이의 노예제적 생산관계 그리고 그러한 사회관계를 기초로 한 위에서 출현한 제도였다.
식읍은 통일전쟁이 격화되는 6세기 이후 점차 쇠퇴의 양상을 보인다. 즉 제가의 하호지배가 종식단계에 이르고 순장제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제 군현제가 일층 정비되고 토지를 중심으로 한 지배예속관계가 부상하면서 야기되는 변동이었다. 공훈자들에 대한 포상은 주로 식읍에 비해 소규모 범위의 사전을 통해 행해졌다. 하지만 이런 변화양상은 곧 사회의 경제기반재정기초농민지배는 토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녹읍의 등장은 그 지표였다. 이제 관료들 일반에 대한 대우도 토지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녹읍은 조의 징수권 곧 수조권을 분급하여주는 제도였다. 식읍이 그러하였듯이, 일정 고을 내에서 일부 토지에 설정되었다. 또한 고을 내에도 여러 관료들의 녹읍이 혼재되도록 배정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 시기 녹읍은 골품귀족이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 독점화되는 경향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말여초시기의 후기녹읍은 지방호족들의 근거지로서 영지에 가까운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식읍과 달리 녹읍주의 토지지배력은 국가의 집권적 체제 아래 존재해야했으며 또한 그 권한도 식읍주보다는 적었다. 즉 국가의 수조권적 지배는 한층 강화되었으며 이 속에서 녹읍은 식읍주와 식읍민이라는 직접적인 인적지배와 녹읍은 토지제도와 부세제도의 지배권을 놓고 식읍과 같이 국가와 별개의 운영조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였다. 즉 녹읍을 지정해주는 국가와 수조권을 지닌 녹읍주 그리고 실제 소유권을 가진 녹읍민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제고되었다.
고려전기에 대부분의 식읍들은 경제적 의미가 상실되어 있었다. 외면상 식읍 수득자의 절대 다수였던 왕족들의 경우, 실제는 전지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식읍으로 대처시키고 있었다. 전지의 분급이 식읍의 급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역분전전시과 그리고 과전 등은 식읍이 가진 본래의 정신, 곧 分茅土王室藩屛의 정신에 세록의 의미를 지닌 圭田의 정신이 합쳐져 마련되고 있던 전토였다. 녹읍도 마찬가지였다. 식읍의 명분 및 실질은 분급토지로 옮겨져 발현되고 있는 것이었다.
식읍의 쇠퇴와 녹읍의 시행은 곧 전근대 한국사회의 토지제도의 큰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진보였고 토지를 바탕으로 한 부세제도가 가능할 만큼의 생산력증가와 농업기술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역량의 축적과 발전을 의미했다. 굳이 식읍의 쇠퇴와 녹읍의 시행이 고대 중세사회의 종점과 기점의 논리로 이용되지 않더라도 전근대 한국사회의 의미있는 발전적 변화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1. 史料
三國史記
高麗史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2. 單行本
백남운, 1937,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 p.3, pp, 228~230, p.350
하현강, l965, 고려식읍고, 역사학보, 26
강진철, 1980, 고려토지제도사연구, pp.14~15 및 164~172
허종호, 1991, 토지제도 발달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p.105~107, pp.146~150, pp.223~225
김기흥, 1991, 삼국 및 통일신라세제연구, 역사비평사
이희관, 1999, 통일신라 토지제도연구, 일조각
3. 論文
강진철, 1969, 신라의 녹읍에 대하여, 이홍식 환력논총
강진철, 1987, 신라 녹읍에 대한 약간의 재점검, 불교와 제과학
이인재, 1995, 신라통일기 토지제도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대에서 중세에 걸친 식읍과 녹읍의 구조 및 그 변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식읍은 왕족이나 척신 그리고 공훈이 있는 고위관료들이 지급받았다. 지급범위로는 고을 전체나 고을 내의 일부에 그치기도 하는 형태였지만 정해진 부실호의 봉호는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상속은 불가했다. 그리고 식읍주는 직접 식읍민으로부터 수입을 거둘 수 있었지만 가신이나 고을 지방관의 협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식읍의 수입은 대단한 것이었다. 수조권자라는 공인된 토지지배자로서 조용조의 징수를 독점하여 부세제도의 운영권을 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농민지배를 가능케 하였다. 식읍주는 봉호의 인력을 동원하여 신전의 개척, 개발을 통해 전지를 매득하거나 소유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몰락한 식읍민을 노비로 흡수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식읍이 회수된 뒤에도 그 자손들이 해당 고을 일대에서 문벌세력, 대토호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식읍은 삼국시기 3세기 이후부터 일반적인 토지제도가 아니었으며 매우 소수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관료나 왕족만이 이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후 통일신라고려시기로 접어들면서 식읍의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다. 사실 식읍의 비중이 크고 또 이의 존재가 우리 나라에서 큰 의미를 갖던 때는 이전 시기였다. 이 제도는 제가가 하호를 수취하고 읍락을 지배하던 국가사회의 소산이었다. 사실 식읍주가 식읍민을 수취함은 형태상 제가가 하호를 수취함과 다를게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가 중앙관료로 신속되었을 때 본래부터 지배하고 있던 지역 내에서 일정수의 민호를 떼어 계속 수취를 허용하거나, 혹은 공훈관료들에게 제가가 별도로 통주하고 수취하던 지역과 같은 형태로 분급하거나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속지정복지가 사여의 대상이었겠다. 이 당시 식읍주의 식읍민에 대한 수취는 제가가 하호에게서 부세를 징수하는 정도가 노비와 같다고 지적할 만큼 혹심하였음으로 보아, 이 정도거나 혹은 그 이상이었겠다. 요컨대 식읍은 제가와 하호 사이의 노예제적 생산관계 그리고 그러한 사회관계를 기초로 한 위에서 출현한 제도였다.
식읍은 통일전쟁이 격화되는 6세기 이후 점차 쇠퇴의 양상을 보인다. 즉 제가의 하호지배가 종식단계에 이르고 순장제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제 군현제가 일층 정비되고 토지를 중심으로 한 지배예속관계가 부상하면서 야기되는 변동이었다. 공훈자들에 대한 포상은 주로 식읍에 비해 소규모 범위의 사전을 통해 행해졌다. 하지만 이런 변화양상은 곧 사회의 경제기반재정기초농민지배는 토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녹읍의 등장은 그 지표였다. 이제 관료들 일반에 대한 대우도 토지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녹읍은 조의 징수권 곧 수조권을 분급하여주는 제도였다. 식읍이 그러하였듯이, 일정 고을 내에서 일부 토지에 설정되었다. 또한 고을 내에도 여러 관료들의 녹읍이 혼재되도록 배정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 시기 녹읍은 골품귀족이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 독점화되는 경향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말여초시기의 후기녹읍은 지방호족들의 근거지로서 영지에 가까운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식읍과 달리 녹읍주의 토지지배력은 국가의 집권적 체제 아래 존재해야했으며 또한 그 권한도 식읍주보다는 적었다. 즉 국가의 수조권적 지배는 한층 강화되었으며 이 속에서 녹읍은 식읍주와 식읍민이라는 직접적인 인적지배와 녹읍은 토지제도와 부세제도의 지배권을 놓고 식읍과 같이 국가와 별개의 운영조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였다. 즉 녹읍을 지정해주는 국가와 수조권을 지닌 녹읍주 그리고 실제 소유권을 가진 녹읍민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제고되었다.
고려전기에 대부분의 식읍들은 경제적 의미가 상실되어 있었다. 외면상 식읍 수득자의 절대 다수였던 왕족들의 경우, 실제는 전지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식읍으로 대처시키고 있었다. 전지의 분급이 식읍의 급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역분전전시과 그리고 과전 등은 식읍이 가진 본래의 정신, 곧 分茅土王室藩屛의 정신에 세록의 의미를 지닌 圭田의 정신이 합쳐져 마련되고 있던 전토였다. 녹읍도 마찬가지였다. 식읍의 명분 및 실질은 분급토지로 옮겨져 발현되고 있는 것이었다.
식읍의 쇠퇴와 녹읍의 시행은 곧 전근대 한국사회의 토지제도의 큰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진보였고 토지를 바탕으로 한 부세제도가 가능할 만큼의 생산력증가와 농업기술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역량의 축적과 발전을 의미했다. 굳이 식읍의 쇠퇴와 녹읍의 시행이 고대 중세사회의 종점과 기점의 논리로 이용되지 않더라도 전근대 한국사회의 의미있는 발전적 변화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1. 史料
三國史記
高麗史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2. 單行本
백남운, 1937,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 p.3, pp, 228~230, p.350
하현강, l965, 고려식읍고, 역사학보, 26
강진철, 1980, 고려토지제도사연구, pp.14~15 및 164~172
허종호, 1991, 토지제도 발달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p.105~107, pp.146~150, pp.223~225
김기흥, 1991, 삼국 및 통일신라세제연구, 역사비평사
이희관, 1999, 통일신라 토지제도연구, 일조각
3. 論文
강진철, 1969, 신라의 녹읍에 대하여, 이홍식 환력논총
강진철, 1987, 신라 녹읍에 대한 약간의 재점검, 불교와 제과학
이인재, 1995, 신라통일기 토지제도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추천자료
 분배중심적 토지정책과 시장지향적 토지정책의 비교
분배중심적 토지정책과 시장지향적 토지정책의 비교 토지규제 정책과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고찰
토지규제 정책과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고찰 토지사유론과 아시아적 토지소유론
토지사유론과 아시아적 토지소유론 [헨리 조지][토지논쟁][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토지가치세]헨리 조지와 토지논쟁의 시작, 헨...
[헨리 조지][토지논쟁][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토지가치세]헨리 조지와 토지논쟁의 시작, 헨... 종합부동산세 제정 개정에 관한 분석 -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제정 개정에 관한 분석 -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 -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 -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 [토지가치세][헨리조지][조지스트][쉬라마이어][환수][간사이공항]토지가치세와 헨리조지, 토...
[토지가치세][헨리조지][조지스트][쉬라마이어][환수][간사이공항]토지가치세와 헨리조지, 토... [토지가치세, 토지가치세 토지법, 토지가치세 정당성, 토지가치세 효과]토지가치세의 토지법,...
[토지가치세, 토지가치세 토지법, 토지가치세 정당성, 토지가치세 효과]토지가치세의 토지법,... [생산성][토지생산성][노동생산성][정보기술생산성][공공부문생산성][공장생산성][은행생산성...
[생산성][토지생산성][노동생산성][정보기술생산성][공공부문생산성][공장생산성][은행생산성... 토지조사사업 - 구한말 일제초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토지조사사업 - 구한말 일제초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영국의 사회 보장 제도
영국의 사회 보장 제도  [학기말 레포트] 에스크로(Escrow) 제도 & 보금자리주택 (에스크로의 개념과 특징 및 필...
[학기말 레포트] 에스크로(Escrow) 제도 & 보금자리주택 (에스크로의 개념과 특징 및 필... 토지시장, 입찰지대설, 입찰지대곡선, 차액지대설, 지대이론, 토지이론, 토지정책, 우발이익 ...
토지시장, 입찰지대설, 입찰지대곡선, 차액지대설, 지대이론, 토지이론, 토지정책, 우발이익 ... 방통대 중간과제, 숲과 삶 B형,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제도
방통대 중간과제, 숲과 삶 B형,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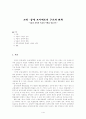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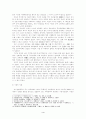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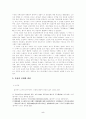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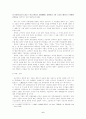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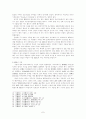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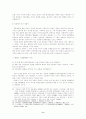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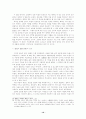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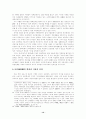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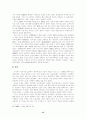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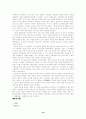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