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1) 이항로의 생애
2) 이항로의 관직생활
3) 이항로의 학문과 사상
4) 이항로의 근대적 평가
5) 이항로의 저서
6) 이항로의 묘
Ⅲ 맺은말
Ⅳ 느낀점
<참고문헌>
Ⅱ
1) 이항로의 생애
2) 이항로의 관직생활
3) 이항로의 학문과 사상
4) 이항로의 근대적 평가
5) 이항로의 저서
6) 이항로의 묘
Ⅲ 맺은말
Ⅳ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집보(朱子大全集箚疑輯補)』이 있다.
6) 이항로의 묘
벽계 남쪽 정보의 서산 손좌원. 양평군 서종면 논문리 535번지에 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지정되어 있다 신도비의 비명 은 문인인 최익현이 썼다. 노문리산 69의 7번지에 위치한 사당 노산사는 경기도 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다. http://100.naver.com/100.php?id=128639
Ⅲ 맺음말
조선 말기 성품이 강직한 성리학자로 위정척사사상을 실천케 하여 외세침략에 대한 치열한 의병운동으로 저항, 국권을 지키게 한 이항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항로는 조선왕조 말기 성리학의 대가이다. 이항로는 기정진, 이상진과 함께 침체되어가는 성리학, 그들 중에서도 특히 주리철학에 활기를 불어넣은 대학자였다. 그의 철학은 조선말기 민족사상인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고, 일본에 국권이 침탈된 후에는 민족운동의 실천적 지도이념으로 작용했다.
조선말기 사상계의 중심축이었던 이항로는 경기도 노론 가문의 서열출신이었다. 서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항로의 학문을 숭앙하는 양반들이 사방에서 모였들었다. 최익현 등 당대의 쟁쟁한 양반들이 그의 분하에서 수학했고, 이들이 바로 위정척사파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항로는 서얼이라 하여 천대받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학문, 그중에서도 성리학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은 양반으로 인정하는 풍토가 있었다. 신문이 무엇이든간에 도학으로 대성하면 그 사람은 양반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주리철학으로 최고봉에 선 이항로는 서얼이라 해도 이미 양반과 다를 바 없었다. 또 조선후기 이후 서얼차별이 완화되어 서얼의 양반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이항로가 살던 조선말기에 이르러 서얼이 양반이 되는 일이 흔해서 서얼과 양반의 신분 구분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8 개화와 수구의 갈등』, P.217, 1999
이항로 자신은 학분과 성취와 시대적 변화로 서얼의 서러움을 받지 않으면서 조선의 문화적 우위를 전제로 문화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탈종속의 자주적 이념을 강력하게 시사했던 화서의 위정척사론은 그것이 비록 보수적이기 하였지만 19세기 중엽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은연중에 민족적 자존을 내포하고 서양열강의 침투에 대해 일종의 민족주의적 반응을 보였던 이항로의 대해 역사적 역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Ⅳ 느낀점
위정척사론의 대두 이항로에 대해 알아본 결과 발표제로 만들었을 때 간략하게 조사해왔던 이항로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이항로는 관직의 욕심보다 학문에 열진하였다. 자신의 길을 학문의 길로 나아갔던 이항로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연구했던 철학적 사상을 알아보는데 있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읽던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았는데 그의 사상을 100% 이해하기에는 내 지식의 부족함과 용어의 어려움이 많았었다.
조선왕조 말기 성리학의 대가였던 이항로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과 조선왕조의 혼란된 역사 속에서 성리학을 일으켰던 이항로의 업적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위정척사사상을 조사하면서 이항로 외 최익현·기정진·김평묵의 인물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알아보아 그들의 사상적 진리를 알아보고 싶다.
『 참고문헌』
김당택, 『우리한국사』, 푸른역사, 2002
김덕진, 『연표로 보는 한국역사』,선인, 2002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38 개화와 수구의 갈등』,1999
박성순, 『조선후기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경인문화사, 2003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17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세계열강17』, 한길사, 2003
한영우, 『우리역사 제3권 근대·현대』,경세원, 1998
6) 이항로의 묘
벽계 남쪽 정보의 서산 손좌원. 양평군 서종면 논문리 535번지에 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지정되어 있다 신도비의 비명 은 문인인 최익현이 썼다. 노문리산 69의 7번지에 위치한 사당 노산사는 경기도 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다. http://100.naver.com/100.php?id=128639
Ⅲ 맺음말
조선 말기 성품이 강직한 성리학자로 위정척사사상을 실천케 하여 외세침략에 대한 치열한 의병운동으로 저항, 국권을 지키게 한 이항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항로는 조선왕조 말기 성리학의 대가이다. 이항로는 기정진, 이상진과 함께 침체되어가는 성리학, 그들 중에서도 특히 주리철학에 활기를 불어넣은 대학자였다. 그의 철학은 조선말기 민족사상인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고, 일본에 국권이 침탈된 후에는 민족운동의 실천적 지도이념으로 작용했다.
조선말기 사상계의 중심축이었던 이항로는 경기도 노론 가문의 서열출신이었다. 서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항로의 학문을 숭앙하는 양반들이 사방에서 모였들었다. 최익현 등 당대의 쟁쟁한 양반들이 그의 분하에서 수학했고, 이들이 바로 위정척사파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항로는 서얼이라 하여 천대받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학문, 그중에서도 성리학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은 양반으로 인정하는 풍토가 있었다. 신문이 무엇이든간에 도학으로 대성하면 그 사람은 양반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주리철학으로 최고봉에 선 이항로는 서얼이라 해도 이미 양반과 다를 바 없었다. 또 조선후기 이후 서얼차별이 완화되어 서얼의 양반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이항로가 살던 조선말기에 이르러 서얼이 양반이 되는 일이 흔해서 서얼과 양반의 신분 구분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8 개화와 수구의 갈등』, P.217, 1999
이항로 자신은 학분과 성취와 시대적 변화로 서얼의 서러움을 받지 않으면서 조선의 문화적 우위를 전제로 문화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탈종속의 자주적 이념을 강력하게 시사했던 화서의 위정척사론은 그것이 비록 보수적이기 하였지만 19세기 중엽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은연중에 민족적 자존을 내포하고 서양열강의 침투에 대해 일종의 민족주의적 반응을 보였던 이항로의 대해 역사적 역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Ⅳ 느낀점
위정척사론의 대두 이항로에 대해 알아본 결과 발표제로 만들었을 때 간략하게 조사해왔던 이항로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이항로는 관직의 욕심보다 학문에 열진하였다. 자신의 길을 학문의 길로 나아갔던 이항로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연구했던 철학적 사상을 알아보는데 있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읽던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았는데 그의 사상을 100% 이해하기에는 내 지식의 부족함과 용어의 어려움이 많았었다.
조선왕조 말기 성리학의 대가였던 이항로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과 조선왕조의 혼란된 역사 속에서 성리학을 일으켰던 이항로의 업적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위정척사사상을 조사하면서 이항로 외 최익현·기정진·김평묵의 인물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알아보아 그들의 사상적 진리를 알아보고 싶다.
『 참고문헌』
김당택, 『우리한국사』, 푸른역사, 2002
김덕진, 『연표로 보는 한국역사』,선인, 2002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38 개화와 수구의 갈등』,1999
박성순, 『조선후기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경인문화사, 2003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17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세계열강17』, 한길사, 2003
한영우, 『우리역사 제3권 근대·현대』,경세원,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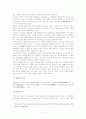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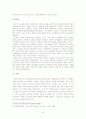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