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고대 조선종족의 언어
3. 한국어의 형성 과정
4.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의 공통성
5. 나가는 말
2. 고대 조선종족의 언어
3. 한국어의 형성 과정
4.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의 공통성
5. 나가는 말
본문내용
하였다. 신라와 고려와의 계승관계에서 민족상의 이질적인 전환이 없었던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삼국은 민족으로 달리 구분해야 할 만큼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력사적으로 서로 달랐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였다.
그리고 이승녕(1967)교수는 \'한국방언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한자음을 비교하였는데 이 표에 나타난 한자는 고구려의 경우 총 48자였는데 세 나라에 공통으로 쓰인 자가 15자이고 두 나라에 공통으로 쓰인 자가 14자 이므로 모두 29자가 함께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제는 총 33자 중 세 나라 공통이 15자, 두 나라 공통이 14자, 모두 29자 이다. 신라는 총 44자 중에서 세 나라 공통이 15자, 두 나라 공통이 12자 도합 27자로서 두 나라 이상 공통으로 쓰인 것은 고구려가 약 60%, 백제 약 88%, 신라가 약 61%가 된다. 그리하여 세 나라 평균은 약 70%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같은 민족이라고 보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김영황(1978)교수와 류렬(1983)교수, 김수경(1989)교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문헌에 나타난 사람이름, 땅이름, 벼슬이름을 광범위하게 연구 분석하여 밝히고 있다. 특히 류렬 교수는 <세나라 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 사람, 벼슬, 고장이름 표기를 통해서 - >를 통하여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리두식 표기 자료를 800여개 해독했고 고구려어 150개, 백제어 100개, 신라어 150개씩을 찾아내었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국어의 형성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계통이나 형성을 밝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가 남방계와 북방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일본학자 쯔보이구마조 이래 여럿이 있었다.
둘째, 일본학자들의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어를 부여계와 한계로 고착시킨 학자는 이기문(1961) 교수이며 이승녕, 김완진, 강길운, 박병채, 김영배 교수 등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셋째, 이기문 교수는 일본말과 고구려 말의 동계설과 신라 말이 국어형성에 근간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신라의 경주 말이 한반도 국어를 통일했다는 라티움 현상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신라어 근간설이다.
넷째, 이러한 주장에 비판한 북한의 학자는 김병제, 홍기문, 김영황, 류렬, 김수경 등이었으며, 이들은 이기문 교수 등이 민족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일본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방계와 북방계 언어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비판하였고, 민족어 단일기원설과 고구려어 근간설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이영철(1974), 김영환(1993), 김종택(1993) 교수도 남방계와 북방계를 비판하고 나섰으며, 한국어의 형성문제는 국어학계의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여섯째, 이 논문은 이 두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백제어가 국어 형성에 큰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방언과 성조 및 역사적 사실을 들어 제시하였다. 그 가설로 백제어 근간설을 주장하였고 이는 백제가 -마한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1201년 동안 한강유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뒷받침 해 준다.
결국 한강 유역을 500여년 이상 다스리던 백제어가 고려 중앙어에 연결되고 그것이 중세 국어의 바탕을 이루며 근대 국어로 이어져서 오늘의 현대 국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료가 부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 형성과정에서 백제어의 위치를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참고문헌
최기호, 1993, 한국어의 계통 연구, 한국몽골학회
최기호, 1994, 한국어의 형성 연구,
그리고 이승녕(1967)교수는 \'한국방언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한자음을 비교하였는데 이 표에 나타난 한자는 고구려의 경우 총 48자였는데 세 나라에 공통으로 쓰인 자가 15자이고 두 나라에 공통으로 쓰인 자가 14자 이므로 모두 29자가 함께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제는 총 33자 중 세 나라 공통이 15자, 두 나라 공통이 14자, 모두 29자 이다. 신라는 총 44자 중에서 세 나라 공통이 15자, 두 나라 공통이 12자 도합 27자로서 두 나라 이상 공통으로 쓰인 것은 고구려가 약 60%, 백제 약 88%, 신라가 약 61%가 된다. 그리하여 세 나라 평균은 약 70%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같은 민족이라고 보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김영황(1978)교수와 류렬(1983)교수, 김수경(1989)교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문헌에 나타난 사람이름, 땅이름, 벼슬이름을 광범위하게 연구 분석하여 밝히고 있다. 특히 류렬 교수는 <세나라 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 사람, 벼슬, 고장이름 표기를 통해서 - >를 통하여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리두식 표기 자료를 800여개 해독했고 고구려어 150개, 백제어 100개, 신라어 150개씩을 찾아내었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국어의 형성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계통이나 형성을 밝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가 남방계와 북방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일본학자 쯔보이구마조 이래 여럿이 있었다.
둘째, 일본학자들의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어를 부여계와 한계로 고착시킨 학자는 이기문(1961) 교수이며 이승녕, 김완진, 강길운, 박병채, 김영배 교수 등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셋째, 이기문 교수는 일본말과 고구려 말의 동계설과 신라 말이 국어형성에 근간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신라의 경주 말이 한반도 국어를 통일했다는 라티움 현상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신라어 근간설이다.
넷째, 이러한 주장에 비판한 북한의 학자는 김병제, 홍기문, 김영황, 류렬, 김수경 등이었으며, 이들은 이기문 교수 등이 민족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일본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방계와 북방계 언어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비판하였고, 민족어 단일기원설과 고구려어 근간설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이영철(1974), 김영환(1993), 김종택(1993) 교수도 남방계와 북방계를 비판하고 나섰으며, 한국어의 형성문제는 국어학계의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여섯째, 이 논문은 이 두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백제어가 국어 형성에 큰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방언과 성조 및 역사적 사실을 들어 제시하였다. 그 가설로 백제어 근간설을 주장하였고 이는 백제가 -마한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1201년 동안 한강유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뒷받침 해 준다.
결국 한강 유역을 500여년 이상 다스리던 백제어가 고려 중앙어에 연결되고 그것이 중세 국어의 바탕을 이루며 근대 국어로 이어져서 오늘의 현대 국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료가 부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 형성과정에서 백제어의 위치를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참고문헌
최기호, 1993, 한국어의 계통 연구, 한국몽골학회
최기호, 1994, 한국어의 형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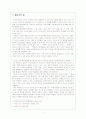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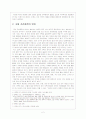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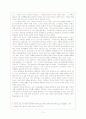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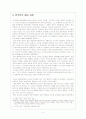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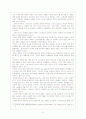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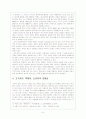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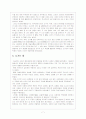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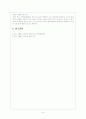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