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화학결합
1-1. 화학결합
2. 친수성과 소수성
3. 원소의 규칙성과 주기율표
4. 신소재와 물질의 화학적 특징
5. 몰 개념과 아보가드로 법칙
6. 이상기체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7. 극성·무극성과 분자간의 힘
8. 탄소화합물
9. 물의 특성
10. 확산과 삼투
11. 수질오염
1-1. 화학결합
2. 친수성과 소수성
3. 원소의 규칙성과 주기율표
4. 신소재와 물질의 화학적 특징
5. 몰 개념과 아보가드로 법칙
6. 이상기체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7. 극성·무극성과 분자간의 힘
8. 탄소화합물
9. 물의 특성
10. 확산과 삼투
11. 수질오염
본문내용
이 철의 녹는점은 1천5백40℃인데 비해 구리의 녹는점은 1천83℃ 밖에 안된다. 거의 5백℃나 되는 이 차이는 고대인에게는 엄청난 기술적 장벽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구하기 쉽고 녹는점이 낮아서 다루기 쉬운 구리가 먼저 사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연한 구리에 아연이나 주석 같은 다른 금속을 섞어주면 무기나 도구의 재료로서 훨씬 쓸모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청동기시대가 도래했다.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면, 즉 환원시키면 철이 얻어진다. 그런데 이 환원기술이 쉽지 않다. 아마도 청동기시대 후기에 우연히 산화철을 포함한 광석이 숯 성분(탄소)과 섞여있는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되면 철이 분리돼 나오는 모습이 관찰됐을 것이다. 요즘도 포항제철에서는 탄소로 이루어진 코크스와 철광석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철을 얻는다. (왜 산소는 철과 결합한 상태로 그냥 있지 않고 탄소로 자리를 옮기는 것일까?) 그런데 일단 얻은 철은 구리보다 녹는점이 높은 대신 강도가 높아서 무기의 재료로서 구리에 견줄 정도가 아니다. 청동기시대가 철기시대로 대치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왜 지구에는 철이 구리보다 많은가?
아무리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기술과 철의 장점을 터득했다 하더라도 자연에 철이 많지 않다면 철은 그림의 떡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됐다 하더라도 건축 자재나 각종 도구의 재료로서 철의 사용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일단 철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왜 자연에는 철이 많을까.
웬만해서는 한 종류의 원소는 다른 원소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애초에 원소들이 만들어질 때 철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진다. 철의 원자핵이 안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철이 쉽게 산화된다, 즉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과 배치되지 않는다. 원소의 종류가 바뀌는 것은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철의 원자핵이 안정하기 때문에 원자핵 주위의 전자를 내줘 산화는 쉽게 될지언정 원자핵 속의 양성자 수는 좀처럼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원자핵의 안정도에 대한 단서는 어떻게 찾아 볼 수 있을까. 일단 이 문제는 원자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핵의 변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핵변환에는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다. 오토 한과 리제 마이트너가 핵분열을 발견한 이후 엔리코 페르미는 핵분열을 실용화하는 길을 열어놓았고,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탄은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가져왔다. 지금도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핵분열이 이용된다. 핵융합을 이용하는 수소 폭탄은 1950년대 미소 냉전 하에서 개발돼 시험에 성공했다. 그러나 핵융합을 이용하는 발전은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핵분열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이 원자번호가 높은 무거운 원소가 사용된다. 무거운 원자핵이 분열해서 가벼운 원자핵이 될 때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핵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많은 수의 양성자 사이의 쿨롱 법칙에 따른 반발 때문이다. 반면 핵융합 폭탄을 수소 폭탄이라고 부르는데서 알 수 있듯이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 사이에서 일으키는 것이 유리하다. 반발력 때문에 양전하가 큰 무거운 원자핵들을 융합할 수 있는 거리로 가져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튼 핵융합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가벼운 원소의 경우에는 융합해서 무거워지는 편이 안정해지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양에는 아시아와 미 대륙 양쪽에서 물이 흘러들어 오듯이 어느 중간에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있다는 말이다. 그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바로 철이다. 그래서 자연에는 철이 많다.
태양과 같은 초기 단계의 별에서는 약 1백억년에 걸쳐 주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탄소를 거쳐 철의 합성까지 이어진다. 수소에서 철까지는 에너지 면에서 내리막길이다. 그 다음부터는 오르막길이다. 이런 원리를 따라 어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철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다가 다시 모여들어 다른 원소들과 함께 태양계와 지구를 만들었다. 철은 철기 문명뿐 아니라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으로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몸의 구석구석에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철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은 이래저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식혜가 단 이유는?
식혜 제작 3단계를 바꾸면 식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식혜를 만드는 순서를 알아보자. 우선 껍질째 빻은 엿기름가루를 고운 체로 거른 다음, 물을 부어놓으면 2시간쯤 지나 아래의 뿌연 물과 위의 맑은 물로 분리된다. 그런 다음 밥을 되게 지어 항아리에 담고 엿기름의 맑은 물만을 붓는다. 그 뒤 4-5시간이 지나 밥알이 삭아 동동 떠오르면 조리로 건져 찬물에 헹군 뒤 다른 그릇에 담고 나머지 식혜 물을 끓인다. 마실 때는 식힌 식혜에 밥알을 띄우고 생강, 유자 등을 넣어 맛과 모양을 내기도 한다.
식혜가 단맛을 내는 것은 엿기름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밥알 속의 탄수화물을 분해시켜 당분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엿기름이란 엿으로 만든 기름이 아니라 맥아(麥芽), 즉 보리싹을 틔운 것을 말한다. 보리가 싹을 틔울 때는 씨 속에 들어있는 녹말을 아밀라아제로 분해시켜 맥아당이라 불리는 말토오스란 당을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것도 사람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가 같은 작용을 해서다.
아말라아제와 같은 효소는 생명체의 각종 화학반응에서 촉매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혜를 만들 때에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만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섭씨 60-70도가 적당한 온도다.
그런데 만드는 순서를 바꾸면 식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서울대 화학부 김희준 교수는 이를 효소작용의 기본은 효소 단백질의 화학적 구조에 달려 있는데 계란을 반숙할 때 볼 수 있듯이 단백질 구조는 열에 의해 쉽게 바뀐다. 그러니까 식혜를 만들 때에도 엿기름의 효소가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바꾼 다음 끓여야지, 만일 먼저 끓이면 효소의 구조가 바뀌어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 식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면, 즉 환원시키면 철이 얻어진다. 그런데 이 환원기술이 쉽지 않다. 아마도 청동기시대 후기에 우연히 산화철을 포함한 광석이 숯 성분(탄소)과 섞여있는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되면 철이 분리돼 나오는 모습이 관찰됐을 것이다. 요즘도 포항제철에서는 탄소로 이루어진 코크스와 철광석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철을 얻는다. (왜 산소는 철과 결합한 상태로 그냥 있지 않고 탄소로 자리를 옮기는 것일까?) 그런데 일단 얻은 철은 구리보다 녹는점이 높은 대신 강도가 높아서 무기의 재료로서 구리에 견줄 정도가 아니다. 청동기시대가 철기시대로 대치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왜 지구에는 철이 구리보다 많은가?
아무리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기술과 철의 장점을 터득했다 하더라도 자연에 철이 많지 않다면 철은 그림의 떡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됐다 하더라도 건축 자재나 각종 도구의 재료로서 철의 사용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일단 철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왜 자연에는 철이 많을까.
웬만해서는 한 종류의 원소는 다른 원소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애초에 원소들이 만들어질 때 철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진다. 철의 원자핵이 안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철이 쉽게 산화된다, 즉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과 배치되지 않는다. 원소의 종류가 바뀌는 것은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철의 원자핵이 안정하기 때문에 원자핵 주위의 전자를 내줘 산화는 쉽게 될지언정 원자핵 속의 양성자 수는 좀처럼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원자핵의 안정도에 대한 단서는 어떻게 찾아 볼 수 있을까. 일단 이 문제는 원자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핵의 변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핵변환에는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다. 오토 한과 리제 마이트너가 핵분열을 발견한 이후 엔리코 페르미는 핵분열을 실용화하는 길을 열어놓았고,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탄은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가져왔다. 지금도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핵분열이 이용된다. 핵융합을 이용하는 수소 폭탄은 1950년대 미소 냉전 하에서 개발돼 시험에 성공했다. 그러나 핵융합을 이용하는 발전은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핵분열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이 원자번호가 높은 무거운 원소가 사용된다. 무거운 원자핵이 분열해서 가벼운 원자핵이 될 때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핵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많은 수의 양성자 사이의 쿨롱 법칙에 따른 반발 때문이다. 반면 핵융합 폭탄을 수소 폭탄이라고 부르는데서 알 수 있듯이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 사이에서 일으키는 것이 유리하다. 반발력 때문에 양전하가 큰 무거운 원자핵들을 융합할 수 있는 거리로 가져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튼 핵융합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가벼운 원소의 경우에는 융합해서 무거워지는 편이 안정해지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양에는 아시아와 미 대륙 양쪽에서 물이 흘러들어 오듯이 어느 중간에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있다는 말이다. 그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바로 철이다. 그래서 자연에는 철이 많다.
태양과 같은 초기 단계의 별에서는 약 1백억년에 걸쳐 주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탄소를 거쳐 철의 합성까지 이어진다. 수소에서 철까지는 에너지 면에서 내리막길이다. 그 다음부터는 오르막길이다. 이런 원리를 따라 어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철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다가 다시 모여들어 다른 원소들과 함께 태양계와 지구를 만들었다. 철은 철기 문명뿐 아니라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으로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몸의 구석구석에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철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은 이래저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식혜가 단 이유는?
식혜 제작 3단계를 바꾸면 식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식혜를 만드는 순서를 알아보자. 우선 껍질째 빻은 엿기름가루를 고운 체로 거른 다음, 물을 부어놓으면 2시간쯤 지나 아래의 뿌연 물과 위의 맑은 물로 분리된다. 그런 다음 밥을 되게 지어 항아리에 담고 엿기름의 맑은 물만을 붓는다. 그 뒤 4-5시간이 지나 밥알이 삭아 동동 떠오르면 조리로 건져 찬물에 헹군 뒤 다른 그릇에 담고 나머지 식혜 물을 끓인다. 마실 때는 식힌 식혜에 밥알을 띄우고 생강, 유자 등을 넣어 맛과 모양을 내기도 한다.
식혜가 단맛을 내는 것은 엿기름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밥알 속의 탄수화물을 분해시켜 당분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엿기름이란 엿으로 만든 기름이 아니라 맥아(麥芽), 즉 보리싹을 틔운 것을 말한다. 보리가 싹을 틔울 때는 씨 속에 들어있는 녹말을 아밀라아제로 분해시켜 맥아당이라 불리는 말토오스란 당을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것도 사람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가 같은 작용을 해서다.
아말라아제와 같은 효소는 생명체의 각종 화학반응에서 촉매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혜를 만들 때에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만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섭씨 60-70도가 적당한 온도다.
그런데 만드는 순서를 바꾸면 식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서울대 화학부 김희준 교수는 이를 효소작용의 기본은 효소 단백질의 화학적 구조에 달려 있는데 계란을 반숙할 때 볼 수 있듯이 단백질 구조는 열에 의해 쉽게 바뀐다. 그러니까 식혜를 만들 때에도 엿기름의 효소가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바꾼 다음 끓여야지, 만일 먼저 끓이면 효소의 구조가 바뀌어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 식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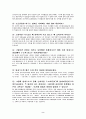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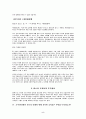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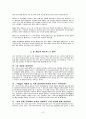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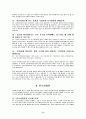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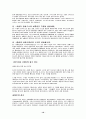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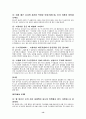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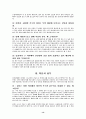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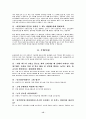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