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망묘루
2.향대청
3.공민왕신당
4.어숙실
5.정전
6.남신문
7.동문
8.서문
9.공신당
10.칠사당
11.수복방
12.제정
13.전사청
14.악공청
15.영녕전
2.향대청
3.공민왕신당
4.어숙실
5.정전
6.남신문
7.동문
8.서문
9.공신당
10.칠사당
11.수복방
12.제정
13.전사청
14.악공청
15.영녕전
본문내용
이르러 정종이 승하하고 3년 상이 지나자 종묘의 신실에 여유가 없어, 정종의 신위를 봉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논의를 거듭하여, 중국 송나라의 제도(별묘를 세워 추존 4조를 봉사함)가 시의(時宜)에 적절하다고 하여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정전 서쪽에 별묘를 새로 지어 그 이름을 영녕전이라 하였다. ‘永寧’이라는 이름은 조종과 자손이 길이 평안하라는 의미이다. 세종 3년 10월에 창건된 영녕전의 규모는 태실 4칸에 좌우 익실 각 1칸씩으로 모두 6칸이었다.
영녕전 역시 임진왜란 때 불에 타 광해군 즉위년(1608년)에 중건되었다. 이때는 태실 4칸에 동서 익실 3칸씩 모두 10칸 규모였다. 현종 8년(1667년)에 다시 좌우 익실 각 1칸씩을 중건하여 12칸 건물이 되었다. 현종 2년(1836년)에 역시 중건되었는데, 이때도 좌우 익실을 각각 2칸씩 늘렸다. 이 규모, 즉 태실 4칸 좌우 익실 각각 6칸씩 모두 16칸이 영녕전의 현재 규모이다.
영녕정의 구성은 정전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네 면을 담장으로 둘러막아 의례를 거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정면인 남쪽에 삼문 형식의 신문을, 동쪽에는 3칸 규모의 동문을, 그리고 서쪽에는 1칸짜리 서문을 두었다. 다만, 정전의 문 배치와 다른 점은 서쪽 담장의 남쪽 방향 끝과 동문의 북쪽 방향에 자그마한 일각문 하나씩이 나 있다는 것이다.
남쪽 신문을 들어서면 장대석 두 벌을 쌓아 하월대를 조성하고 그 가운데 신로를 형성하였다. 신로 끝에는 다시 단을 높여 상월대를 쌓았다. 이 상월대 위에 장대석 한 벌의 기단을 놓고 가운데 태실 4칸, 좌우에 익실 각각 6칸씩을 두어 모두 16칸의 건물을 조성하였으며, 익실 양끝에 툇간을 덧붙여서 동월랑과 서월랑 5칸씩을 연결하였다.
영녕전 건물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두리기둥의 열과 태실 및 좌우 익실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 거대한 지붕면에 의하여 간결하고도 장중한 느낌이 우러나오게 형성되었다. 즉, 건물의 지지체인 초석과 두리기둥은 두툼하고 굵게 만들었으며, 그 위에 가장 간결한 공포 형식인 초익공을 얹어 거대한 지붕을 받쳤고, 가운데 계단의 소맷돌과 문설주의 양옆에는 태극 문양 조각하였다. 홑처마에 맞배지붕 건물이며, 지붕마루는 양성을 하여 취두와 용두, 잡상을 얹었다. 전체적으로 정전 건물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정전 뒷면이 모든 기둥을 벽 속에 숨긴 대해 영녕전 뒷면은 두리기둥을 노출시켜서 벽을 분절하고 있다.
영녕전 역시 임진왜란 때 불에 타 광해군 즉위년(1608년)에 중건되었다. 이때는 태실 4칸에 동서 익실 3칸씩 모두 10칸 규모였다. 현종 8년(1667년)에 다시 좌우 익실 각 1칸씩을 중건하여 12칸 건물이 되었다. 현종 2년(1836년)에 역시 중건되었는데, 이때도 좌우 익실을 각각 2칸씩 늘렸다. 이 규모, 즉 태실 4칸 좌우 익실 각각 6칸씩 모두 16칸이 영녕전의 현재 규모이다.
영녕정의 구성은 정전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네 면을 담장으로 둘러막아 의례를 거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정면인 남쪽에 삼문 형식의 신문을, 동쪽에는 3칸 규모의 동문을, 그리고 서쪽에는 1칸짜리 서문을 두었다. 다만, 정전의 문 배치와 다른 점은 서쪽 담장의 남쪽 방향 끝과 동문의 북쪽 방향에 자그마한 일각문 하나씩이 나 있다는 것이다.
남쪽 신문을 들어서면 장대석 두 벌을 쌓아 하월대를 조성하고 그 가운데 신로를 형성하였다. 신로 끝에는 다시 단을 높여 상월대를 쌓았다. 이 상월대 위에 장대석 한 벌의 기단을 놓고 가운데 태실 4칸, 좌우에 익실 각각 6칸씩을 두어 모두 16칸의 건물을 조성하였으며, 익실 양끝에 툇간을 덧붙여서 동월랑과 서월랑 5칸씩을 연결하였다.
영녕전 건물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두리기둥의 열과 태실 및 좌우 익실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 거대한 지붕면에 의하여 간결하고도 장중한 느낌이 우러나오게 형성되었다. 즉, 건물의 지지체인 초석과 두리기둥은 두툼하고 굵게 만들었으며, 그 위에 가장 간결한 공포 형식인 초익공을 얹어 거대한 지붕을 받쳤고, 가운데 계단의 소맷돌과 문설주의 양옆에는 태극 문양 조각하였다. 홑처마에 맞배지붕 건물이며, 지붕마루는 양성을 하여 취두와 용두, 잡상을 얹었다. 전체적으로 정전 건물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정전 뒷면이 모든 기둥을 벽 속에 숨긴 대해 영녕전 뒷면은 두리기둥을 노출시켜서 벽을 분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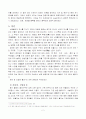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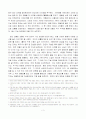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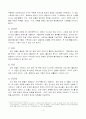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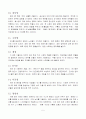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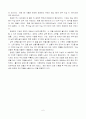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