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들어가며
본론: 1. 인더스 문명의 개관
2. 인더스 문명의 자연 환경
3. 모헨조다로의 위치와 발굴 과정
4. 모헨조다로의 성립
5. 모헨조다로의 도시 유적
ㄱ. 성채 유적
ㄴ. 시가지 유적
ㄷ. 그 밖의 유물
6. 모헨조다로의 멸망
7. 모헨조다로 유적과 그 밖의 문명과의 연관성
결론: 모헨조다로의 건립자와 유적의 특성, 의의
본론: 1. 인더스 문명의 개관
2. 인더스 문명의 자연 환경
3. 모헨조다로의 위치와 발굴 과정
4. 모헨조다로의 성립
5. 모헨조다로의 도시 유적
ㄱ. 성채 유적
ㄴ. 시가지 유적
ㄷ. 그 밖의 유물
6. 모헨조다로의 멸망
7. 모헨조다로 유적과 그 밖의 문명과의 연관성
결론: 모헨조다로의 건립자와 유적의 특성, 의의
본문내용
주카르 문화 사이에는 2m에 미치는 퇴적층이 있어, 이 양자의 시간적인 간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카르 문화의 분포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만일 주카르 문화를 아리아인이 남긴 것이라 한다면 아리아인이 진출해간 갠지스강 유역에서도 주카르 문화가 발견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시기상의 일치로 기원전 2000년경에 일어났던 아리아인의 침입을 인더스 문명의 멸망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모헨조다로, 더 나아가 인더스 문명의 멸망은 도시를 정점으로 한 사회 기구의 붕괴일 뿐, 인더스 문명을 담당하던 삶들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환경 변화가 없었던 구자라트와 동부 펀자브 등에서는 인더스 문명의 요소들이 문명 멸망 후에도 오래 존속, 그 지방에 녹아들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본론 7. 모헨조다로와 그 밖의 문명과의 연관성
인더스문명의 존재는 1922~23년에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을 발굴로 명백해
지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의 연관성에 대해 학자들은 주목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의 이민자가 고도의 문명을 형성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토우나 토기, 인장 등의 독특한 유물이 발굴 됨으
로써, 초기의 그러한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되었다. 토기를 구워내던 가마도 메
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달리 벽돌로 제작하였으며, 사용되었던 문자도 상당히 다
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양 문명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 만은 확실하다. 최근. 양 문명의 해상
교류에 페르시아만 앞의 바하렌 섬과 파이라카섬이 중계지점으로 큰 역할은 수
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쪽을 향해 해상 교역의 짐을 싣던 곳인 인
더스 문명의 항만도시, \'로탈\'의 존재도 양 문명간의 교류를 증명해 주고 있다.
분명, 상호교류적인 면에서,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방적으로 모헨조다로에게 문명의 요소를 전수했다는 식의 주장은 상당히 무리
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하라파 문명 하라파는 모헨조다로에서 북동 방향으로 600km, 파키스탄 동부의 펀자브 주에 위치한 인더스 문명의 도시유적
과 모헨조다로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광대한 문명판도를 고려하고 인도사의 다른 예를 통해 볼때, 2대 도시에 의한 2
원적 지배, 지역별 지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견해에 대해 모헨조다로에서 하라파로 천도했다는 학설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설단계이긴 하나, 문명의 후기 또는 말기에 모헨조
다로를 포기했다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결론: 모헨조다로의 건립자와 유적의 특성, 의의
먼저, 글의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아직까지 인더스 상형 문자 해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론이 어디까지나 가설임을 밝혀 두도록 하겠다.
“모헨조다로는 어떤 성격의 도시였는가?” 란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다른 4대 문명과의 비교를 통해 모헨조다로만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정치적으로 타 문명권들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 그것에 기반해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강력한 왕권의 존재는 거대한 건축물(피라미드, 왕릉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에 비해 모헨조다로는 강력한 왕권의 존재 유무가 뚜렷하지 않다. 아직까지 문자가 해독되지 않아, 속단하기엔 이를지 모르나, 강력한 왕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완벼한 도시 게획의 수립과 그것의 실현은 강력한 통치체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계획에 투여된 막대한 노동력은 강력한 통치체제가 없었다면 통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과 달리 제정 분리가 이루어졌던 사회로 추측된다.
그럼, 이러한 특색있는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이는 생물학적인 방법과 사회 문화적인 방법 두 가지로 알 수 있다. 발굴된 유골을 탐구한 결과, 오늘날의 펀자브와 신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골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문화적인 방법은 언어를 규명하는 일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명, 모헨조다로 문명의 산하에 있었던 도시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특정한 언어와 문자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듯하다. 출토된 인장, 부적, 토기 조각에 남아있는 상형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더스 문자는 약 400종의 상형문자가 존재하며, 현재까지 컴퓨터를 동원, 해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개 국어를 같이 기록한 경우가 없기에 해독이 아주 난해하다. 다만, 오늘의 남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라비다계 여러 언어의 조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헨조다로 더 나아가 인더스 문명은 인도 문명이 대부분이 침입 민족(아리안 족)에 의해 건립된 것과 별개로 인도의 초기 국가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에 성립되는 인도의 힌두교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정되는데, 초기 인더스 종교의 상징적 표현과 현대 힌두교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 그 예이다.
참고 문헌
곤도 히데오 지음, 양억관 옮김, 문명의 기둥, 1997, 푸른숲
모리노 다쿠미, 마쓰시로 모리히로 지음, 이만옥 옮김, 2001, 들녘
김희보 지음, 세계사 101장면, 2002, 가람기획
마이클 우드 지음, 강주헌 옮김, 인류최초의 문명들, 2002,중앙M&B
브라이언 페이건 지음, 이희준 올김, 이류의 선사 문화, 2000, 사회평론
http://www.homoreligio년.net/travel/india17html
http://dragon.dju.ac.kr%7Etu41505/se-84html
http://blog.naver.com/ssmin4/9964328
http://www.kopion.or.kr/en_kopion/info/20_0518_1.html
http://my.dreamwiz.com/bsw7509/bsw/re49.html
http://www.chungdong.or.kr/middroom/syshim/%C0%CE%B5%B5.html
그러나 모헨조다로, 더 나아가 인더스 문명의 멸망은 도시를 정점으로 한 사회 기구의 붕괴일 뿐, 인더스 문명을 담당하던 삶들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환경 변화가 없었던 구자라트와 동부 펀자브 등에서는 인더스 문명의 요소들이 문명 멸망 후에도 오래 존속, 그 지방에 녹아들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본론 7. 모헨조다로와 그 밖의 문명과의 연관성
인더스문명의 존재는 1922~23년에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을 발굴로 명백해
지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의 연관성에 대해 학자들은 주목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의 이민자가 고도의 문명을 형성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토우나 토기, 인장 등의 독특한 유물이 발굴 됨으
로써, 초기의 그러한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되었다. 토기를 구워내던 가마도 메
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달리 벽돌로 제작하였으며, 사용되었던 문자도 상당히 다
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양 문명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 만은 확실하다. 최근. 양 문명의 해상
교류에 페르시아만 앞의 바하렌 섬과 파이라카섬이 중계지점으로 큰 역할은 수
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쪽을 향해 해상 교역의 짐을 싣던 곳인 인
더스 문명의 항만도시, \'로탈\'의 존재도 양 문명간의 교류를 증명해 주고 있다.
분명, 상호교류적인 면에서,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방적으로 모헨조다로에게 문명의 요소를 전수했다는 식의 주장은 상당히 무리
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하라파 문명 하라파는 모헨조다로에서 북동 방향으로 600km, 파키스탄 동부의 펀자브 주에 위치한 인더스 문명의 도시유적
과 모헨조다로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광대한 문명판도를 고려하고 인도사의 다른 예를 통해 볼때, 2대 도시에 의한 2
원적 지배, 지역별 지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견해에 대해 모헨조다로에서 하라파로 천도했다는 학설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설단계이긴 하나, 문명의 후기 또는 말기에 모헨조
다로를 포기했다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결론: 모헨조다로의 건립자와 유적의 특성, 의의
먼저, 글의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아직까지 인더스 상형 문자 해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론이 어디까지나 가설임을 밝혀 두도록 하겠다.
“모헨조다로는 어떤 성격의 도시였는가?” 란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다른 4대 문명과의 비교를 통해 모헨조다로만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정치적으로 타 문명권들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 그것에 기반해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강력한 왕권의 존재는 거대한 건축물(피라미드, 왕릉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에 비해 모헨조다로는 강력한 왕권의 존재 유무가 뚜렷하지 않다. 아직까지 문자가 해독되지 않아, 속단하기엔 이를지 모르나, 강력한 왕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완벼한 도시 게획의 수립과 그것의 실현은 강력한 통치체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계획에 투여된 막대한 노동력은 강력한 통치체제가 없었다면 통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과 달리 제정 분리가 이루어졌던 사회로 추측된다.
그럼, 이러한 특색있는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이는 생물학적인 방법과 사회 문화적인 방법 두 가지로 알 수 있다. 발굴된 유골을 탐구한 결과, 오늘날의 펀자브와 신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골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문화적인 방법은 언어를 규명하는 일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명, 모헨조다로 문명의 산하에 있었던 도시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특정한 언어와 문자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듯하다. 출토된 인장, 부적, 토기 조각에 남아있는 상형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더스 문자는 약 400종의 상형문자가 존재하며, 현재까지 컴퓨터를 동원, 해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개 국어를 같이 기록한 경우가 없기에 해독이 아주 난해하다. 다만, 오늘의 남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라비다계 여러 언어의 조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헨조다로 더 나아가 인더스 문명은 인도 문명이 대부분이 침입 민족(아리안 족)에 의해 건립된 것과 별개로 인도의 초기 국가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에 성립되는 인도의 힌두교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정되는데, 초기 인더스 종교의 상징적 표현과 현대 힌두교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 그 예이다.
참고 문헌
곤도 히데오 지음, 양억관 옮김, 문명의 기둥, 1997, 푸른숲
모리노 다쿠미, 마쓰시로 모리히로 지음, 이만옥 옮김, 2001, 들녘
김희보 지음, 세계사 101장면, 2002, 가람기획
마이클 우드 지음, 강주헌 옮김, 인류최초의 문명들, 2002,중앙M&B
브라이언 페이건 지음, 이희준 올김, 이류의 선사 문화, 2000, 사회평론
http://www.homoreligio년.net/travel/india17html
http://dragon.dju.ac.kr%7Etu41505/se-84html
http://blog.naver.com/ssmin4/9964328
http://www.kopion.or.kr/en_kopion/info/20_0518_1.html
http://my.dreamwiz.com/bsw7509/bsw/re49.html
http://www.chungdong.or.kr/middroom/syshim/%C0%CE%B5%B5.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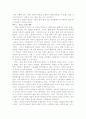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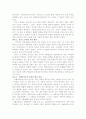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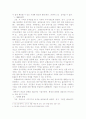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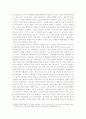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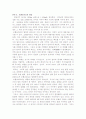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