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앙정치구조의 변화
Ⅲ. 佛敎의 공인과 祭儀體系의 변화
Ⅲ. 지방 통치 체제의 변화
Ⅳ. 고구려의 대외진출
Ⅴ. 결론
Ⅱ. 중앙정치구조의 변화
Ⅲ. 佛敎의 공인과 祭儀體系의 변화
Ⅲ. 지방 통치 체제의 변화
Ⅳ. 고구려의 대외진출
Ⅴ. 결론
본문내용
고국원왕대에 이르면 전연의 침입시 정병 5만을 포함한 5만이상의 병력으로 방어하였고 342년 대 전연전에서는 병력동원규모의 증가 및 성 중심 방어체계의 정비라는 양상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군사동원체계가 확립되었음을 시사한다.
3세기 후반~4세기 전반부터 정비된 역역동원체계는 나부체계가 해체 되면서 전사단이 해체되고 일정 연령 이상은 모두 군역이 부과되는 개병제로 전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천왕 3년에 3만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현도군을 공격할 수 있었고, 광개토왕대에의 보기 5만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4세기의 병력 동원 규모는 3세기의 2만명에 비해 2.5배 ~ 3배 증가 하였다.
전사단의 해체는 군사권이 왕권하에 일원화 된 것을 의미한다. 일원화 과정을 살펴보면 국상재의 실시로 제 1대 국상이 되는 명림답부가 內外兵馬事를 담당하여 전쟁에도 참여하고 있고 중천왕대 국상 명림어수가 서울과 지방의 군대의 일을 겸직한 것에까지 이어진다. 이후 서천왕 11년(280)에는 왕제인 달가가 전쟁에서 공을 세워 군사의 일을 맡아보게 되는데 이는 국상의 병마권이 왕권에 귀속되어가는 과정을 알 수 있고, 곧 달가가 봉상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또한 왕제에 의한 병마권 행사가 제한되고 군권이 왕에게 일원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병제 초기에는 전투력이 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근거는 고국원왕의 병력의 대부분이 정병이 아닌 새로 편입된 병사였고, 훈련기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전연에 패하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유적에 남아있는 고분벽화를 보면 4~5세기의 보병과 기병의 비율을 대등하지만 동천왕대에 보병과 기병이 3대 1 정도이고, 무기로는 창, 도끼, 활, 칼 등의 순서로 고구려 군이 기병과 보병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4세기가 되면 병력 중 기병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 지방에 좋은 말이 많이
있음과 관련이 있다. 또한 낙랑 대방군의 점령으로 이군 고지에서 생산되는 철이 병력 확대와 맞물려 전투력이 고양되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국원왕대에 이르면 병력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성의 축조도 이루어 졌다. 축성 사업은 단순히 지방지배의 거점과 군사 방어선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정복민을 민으로 편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는 이군고지에는 평양성을 쌓고 나라의 북쪽으로는 新城을 쌓았는데 낙랑지방을 복속시킴에 있어 이 지역의 田作中心의 곡창지대를 장악했다는 의의가 있다. 金峰淑 “4世紀 高句麗의 中央集權力强化와 體制整備”
또한 신성이 축조된 요동지방에서는 철의 생산이 이루어져 요동지방의 지역적 중요성 이외에도 철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고구려사를 4세기의 1~3세기의 나부체제에서 5세기의 강력한 왕권중심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변화의 시대로서 전후시대와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본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고구려의 초기의 국정운영은 나부세력에 기반을 둔 좌우보제가 중심이 되었다. 이것이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국상제로 바뀌어 제가회의를 운영하며 국정을 운영하였으나 국상의 임기가 종신이었고, 국정과 군무를 총괄하고 있어 왕권을 상당 부분 견제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4세기 이후에는 나부제가 방위제로 변화하고 제가들이 중앙귀족화 하여 국상의 관직도 미천왕대부터 보이지 않게 되고 국상의 관직상의 기능을 대대로가 맡게 되었다. 대대로는 국상에 비해 왕권 중심적인 관료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
초기의 나부 중심의 이원적 관직체계 또한 봉상왕대 말기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나부계 관직인 패자, 우태, 조의를 없애고 국왕중심의 관직인 대로, 주부, 사자를 중심으로 관계가 분화되었고 우태가 형계 관직으로 편재되어 국왕중심의 일원적 관계로 정비 되었다.
인재 등용 방식 또한 나부의 유력자나 국상에 의한 추천 방식이 아닌 소수림왕대의 율령 반포를 계기로 중외대부가 국왕직속의 중리부로 제도화 되며, 태학의 설립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의 양성이 시작되었다.
4세기에 접어들면서 불교가 전진, 전연으로부터 유입이 되고 공식적으로 소수림왕대에 전지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하게 된다. 이로써 사상적 일원화의 틀을 마련하여 국가적 신앙체계로서의 불교를 장려하게 된다. 또한 제의체계를 정비하여 소노부의 종묘 사직 제의를 금지시키며 계루부 왕실이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실이라는 것을 공식화 하였다.
대외적인 주변국들의 변동에 맞추어 고구려는 대외진출에 성공하였으며 한반도내의 중국세력인 낙랑, 대방군을 축출하였으며 요동지역을 확보하였고, 남진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국왕에 의한 군사권의 장악과 영토 확장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와 거점지에 성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서 왕권에 의한 일원적 지방 지배 방식이 성립되었다. 한편 낙랑, 대방군 지역에는 토착 한인세력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위해 망명한인세력에게 일정한 관직을 주고 거주민들을 통치하게 하는 특수한 지배방식이 적용되었다. 낙랑, 대방군 점령은 영토 확장에 따른 토지 생산력의 증가와 함께 철 생산지를 확보함으로서 병력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병력 동원 규모의 변화로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으로 진출하는데는 중국(晉)세력의 약화라고 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 진의 세력 약화로 요동지방에 대한 행정적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요동 주변지역의 모용씨와 고구려가 요동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는데 요동지방을 먼저 점령한 것은 모용씨였다. 그후에 고구려에 대한 투쟁이 시작되어 342년 전연의 대대적 침공으로 요동진출 의욕이 좌절 되기도 했지만, 後燕代에 들어서면서 고구려는 내적인 체제정비를 바탕으로 요동지방 진출을 재개하였다. 후연과의 치열한 접전끝에 광개토대왕을 전후하여 요동지방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고구려가 멸망할때까지 영역으로 유지 되었다. 백제와는 예성강~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이던 형태였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4세기의 고구려는 내, 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치었고, 왕권중심의 체제정비와 활발한 정복사업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다.
3세기 후반~4세기 전반부터 정비된 역역동원체계는 나부체계가 해체 되면서 전사단이 해체되고 일정 연령 이상은 모두 군역이 부과되는 개병제로 전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천왕 3년에 3만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현도군을 공격할 수 있었고, 광개토왕대에의 보기 5만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4세기의 병력 동원 규모는 3세기의 2만명에 비해 2.5배 ~ 3배 증가 하였다.
전사단의 해체는 군사권이 왕권하에 일원화 된 것을 의미한다. 일원화 과정을 살펴보면 국상재의 실시로 제 1대 국상이 되는 명림답부가 內外兵馬事를 담당하여 전쟁에도 참여하고 있고 중천왕대 국상 명림어수가 서울과 지방의 군대의 일을 겸직한 것에까지 이어진다. 이후 서천왕 11년(280)에는 왕제인 달가가 전쟁에서 공을 세워 군사의 일을 맡아보게 되는데 이는 국상의 병마권이 왕권에 귀속되어가는 과정을 알 수 있고, 곧 달가가 봉상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또한 왕제에 의한 병마권 행사가 제한되고 군권이 왕에게 일원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병제 초기에는 전투력이 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근거는 고국원왕의 병력의 대부분이 정병이 아닌 새로 편입된 병사였고, 훈련기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전연에 패하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유적에 남아있는 고분벽화를 보면 4~5세기의 보병과 기병의 비율을 대등하지만 동천왕대에 보병과 기병이 3대 1 정도이고, 무기로는 창, 도끼, 활, 칼 등의 순서로 고구려 군이 기병과 보병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4세기가 되면 병력 중 기병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 지방에 좋은 말이 많이
있음과 관련이 있다. 또한 낙랑 대방군의 점령으로 이군 고지에서 생산되는 철이 병력 확대와 맞물려 전투력이 고양되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국원왕대에 이르면 병력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성의 축조도 이루어 졌다. 축성 사업은 단순히 지방지배의 거점과 군사 방어선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정복민을 민으로 편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는 이군고지에는 평양성을 쌓고 나라의 북쪽으로는 新城을 쌓았는데 낙랑지방을 복속시킴에 있어 이 지역의 田作中心의 곡창지대를 장악했다는 의의가 있다. 金峰淑 “4世紀 高句麗의 中央集權力强化와 體制整備”
또한 신성이 축조된 요동지방에서는 철의 생산이 이루어져 요동지방의 지역적 중요성 이외에도 철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고구려사를 4세기의 1~3세기의 나부체제에서 5세기의 강력한 왕권중심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변화의 시대로서 전후시대와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본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고구려의 초기의 국정운영은 나부세력에 기반을 둔 좌우보제가 중심이 되었다. 이것이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국상제로 바뀌어 제가회의를 운영하며 국정을 운영하였으나 국상의 임기가 종신이었고, 국정과 군무를 총괄하고 있어 왕권을 상당 부분 견제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4세기 이후에는 나부제가 방위제로 변화하고 제가들이 중앙귀족화 하여 국상의 관직도 미천왕대부터 보이지 않게 되고 국상의 관직상의 기능을 대대로가 맡게 되었다. 대대로는 국상에 비해 왕권 중심적인 관료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
초기의 나부 중심의 이원적 관직체계 또한 봉상왕대 말기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나부계 관직인 패자, 우태, 조의를 없애고 국왕중심의 관직인 대로, 주부, 사자를 중심으로 관계가 분화되었고 우태가 형계 관직으로 편재되어 국왕중심의 일원적 관계로 정비 되었다.
인재 등용 방식 또한 나부의 유력자나 국상에 의한 추천 방식이 아닌 소수림왕대의 율령 반포를 계기로 중외대부가 국왕직속의 중리부로 제도화 되며, 태학의 설립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의 양성이 시작되었다.
4세기에 접어들면서 불교가 전진, 전연으로부터 유입이 되고 공식적으로 소수림왕대에 전지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하게 된다. 이로써 사상적 일원화의 틀을 마련하여 국가적 신앙체계로서의 불교를 장려하게 된다. 또한 제의체계를 정비하여 소노부의 종묘 사직 제의를 금지시키며 계루부 왕실이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실이라는 것을 공식화 하였다.
대외적인 주변국들의 변동에 맞추어 고구려는 대외진출에 성공하였으며 한반도내의 중국세력인 낙랑, 대방군을 축출하였으며 요동지역을 확보하였고, 남진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국왕에 의한 군사권의 장악과 영토 확장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와 거점지에 성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서 왕권에 의한 일원적 지방 지배 방식이 성립되었다. 한편 낙랑, 대방군 지역에는 토착 한인세력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위해 망명한인세력에게 일정한 관직을 주고 거주민들을 통치하게 하는 특수한 지배방식이 적용되었다. 낙랑, 대방군 점령은 영토 확장에 따른 토지 생산력의 증가와 함께 철 생산지를 확보함으로서 병력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병력 동원 규모의 변화로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으로 진출하는데는 중국(晉)세력의 약화라고 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 진의 세력 약화로 요동지방에 대한 행정적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요동 주변지역의 모용씨와 고구려가 요동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는데 요동지방을 먼저 점령한 것은 모용씨였다. 그후에 고구려에 대한 투쟁이 시작되어 342년 전연의 대대적 침공으로 요동진출 의욕이 좌절 되기도 했지만, 後燕代에 들어서면서 고구려는 내적인 체제정비를 바탕으로 요동지방 진출을 재개하였다. 후연과의 치열한 접전끝에 광개토대왕을 전후하여 요동지방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고구려가 멸망할때까지 영역으로 유지 되었다. 백제와는 예성강~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이던 형태였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4세기의 고구려는 내, 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치었고, 왕권중심의 체제정비와 활발한 정복사업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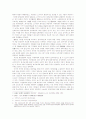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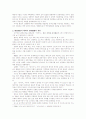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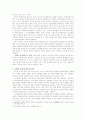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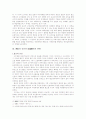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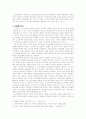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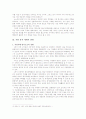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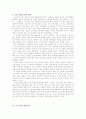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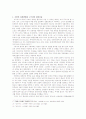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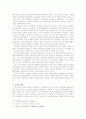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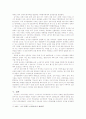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