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햄릿은 자기 통제를 잘하는 인물이다. 그는 삼촌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클라우디우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자신을 떠보러 온 폴로니우스나 길든스턴(Guildenstern)을 매끄럽게 다룰 줄 아는 인물로, 마음만 먹으면 자기의 의도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자기 통제를 잃고 감정에 휩쓸리는 장면들은 거투르드와의 closet scene과 오필리아와의 nunnery scene으로, 이는 역으로 그가 이들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그리고 이 극의 여성들이 그에게 갖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오필리아와의 이 nunnery scene에서도 햄릿의 그녀에 대한 심한 언어 폭력은 오필리아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런 그녀를 포기하고 더불어 자기 삶의 긍정적 잠재력까지 포기한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여준다.
햄릿의 오필리아에 대한 사랑은 5막 1장에서 은밀하게 돌아온 햄릿이 오필리아의 장례식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레어티스가 오필리아의 무덤에 뛰어들며 슬픔을 토로하자, 갑자기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오필리아의 무덤으로 함께 뛰어들며 외치는 장면에도 나타나 있다.
Bears such an emphasis, whose phrase of sorrow Conjures the wand\'ring stars and makes them stand Like wonder-wounded hearers? This is I,
Hamlet the Dane. (5. 1. 247-51)
이 말이 나온 앞 뒤 정황을 보면, 이 대사는 오필리아의 죽음을 더 슬퍼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는 의미인데, 햄릿이 이것을 자신이 \"덴마크 왕, 햄릿\"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선언이다.
앞에서 선왕의 갑작스런 죽음과 거투르드의 재혼으로 정체의 위기를 겪었던 왕자 햄릿은 이제 자신을 덴마크의 진정한 왕으로 천명하는 것이며, 이는 그가 클라우디스를 어머니와 간음한 자라는 사적인 적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벗어나 덴마크의 거짓 왕으로, 덴마크를 병들게 한 \"병균\"(canker)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을 다른 데가 아닌 오필리아의 무덤에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Why, I will fight with him upon this theme/Until my eyelids will no longer wag\"(5. 1. 261-2)라고 한다.
그리고 \"O my son, what theme?\"(263)이라는 거투르드의 질문에, 놀랍게도 \"I lov\'d Ophelia\"라고 답한다. 그가 앞에서 오필리아에게 \"I love you not.\"(3. 1. 119)라고 자신의 사랑을 부정하고 \"We will have no more marriage.\"(3. 1. 149)라며 오필리아에게 \"Get thee to the nunnery.\"(3. 1. 121)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놀라운 변화이다.
거트루드로 인한 여성 혐오가 오필리아에게도 적용되었고 그녀를 사랑하지만 복수를 위해 그녀를 포기해야 했던 햄릿은 거트루드의 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 후 자신의 복수의 의미도 정립하면서 다시 오필리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오필리아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는 것은 그녀를 포기하면서 함께 포기했던 자신의 삶의 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회복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나는 덴마크 왕, 햄릿이요.\"라는 당당한 정체성 선언으로 나온 것이다.
햄릿에게 클라우디스는 이 세상을 좀먹는 \"병균\"으로 이 세상을 정화하자면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클라우디스는 비극에 언제나 있어온 외부의 \"한계\", 주인공이 반드시 싸워야하고 비록 그 과정에 패배하더라도 그 싸움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한계이다. 그런데 햄릿은 클라우디스와 싸우기 전에 먼저 여성에 대한 혐오를 극복해야 했다.
이제 햄릿은 가부장 체제의 의식 속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체성의 혼돈을 극복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서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햄릿의 여성 혐오와 셰익스피어의 그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햄릿의 여성 혐오는 그가 싸워야할 \"한계\"로 셰익스피어에 의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극 진행의 어느 단계에 가면 없어진다.
5막에서 햄릿이 죽기 직전에 어머니와 화해하고, 그 이전에 정신적으로 오필리아와의 화해를 통해서 비로소 우주의 섭리를 인정하고 자연의 질서에 자신을 부합시키는 마음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여성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햄릿이 마지막 비극의 주인공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그의 정체성 선언은 오필리아에 대한 사랑의 천명과 함께 나왔다. 햄릿이 버렸던 오필리아를 다시 인정하고, 더불어 그녀와 함께 버렸던 자신의 어떤 부분도 다시 인정함으로써 그는 온전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여성 혐오에 일정한 거리를 둔다. 또한 이 극에서 실제로 나오는 여성들이 그런 혐오를 받을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셰익스피어의 여성 혐오를 말할 때 염두에 두어야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여성 문제에서 Hamlet이 다른 Jacobean tragedy와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King Lear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Hamlet이 비록 말기라고는 하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극시기에 쓰였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Works Cited
Dunsinberre, Juliet.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Women. London: Macmillian, 1975.
Howard, J. E. ed. Engendering a Nation: A Feminist Account of Shakespeare\'s English Historise. London: Routledge, 1997.
Shakespeare, William. Hamlet. Ed. Harold Jenkins. London: Methuen, 1982.
그런 그가 자기 통제를 잃고 감정에 휩쓸리는 장면들은 거투르드와의 closet scene과 오필리아와의 nunnery scene으로, 이는 역으로 그가 이들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그리고 이 극의 여성들이 그에게 갖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오필리아와의 이 nunnery scene에서도 햄릿의 그녀에 대한 심한 언어 폭력은 오필리아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런 그녀를 포기하고 더불어 자기 삶의 긍정적 잠재력까지 포기한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여준다.
햄릿의 오필리아에 대한 사랑은 5막 1장에서 은밀하게 돌아온 햄릿이 오필리아의 장례식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레어티스가 오필리아의 무덤에 뛰어들며 슬픔을 토로하자, 갑자기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오필리아의 무덤으로 함께 뛰어들며 외치는 장면에도 나타나 있다.
Bears such an emphasis, whose phrase of sorrow Conjures the wand\'ring stars and makes them stand Like wonder-wounded hearers? This is I,
Hamlet the Dane. (5. 1. 247-51)
이 말이 나온 앞 뒤 정황을 보면, 이 대사는 오필리아의 죽음을 더 슬퍼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는 의미인데, 햄릿이 이것을 자신이 \"덴마크 왕, 햄릿\"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선언이다.
앞에서 선왕의 갑작스런 죽음과 거투르드의 재혼으로 정체의 위기를 겪었던 왕자 햄릿은 이제 자신을 덴마크의 진정한 왕으로 천명하는 것이며, 이는 그가 클라우디스를 어머니와 간음한 자라는 사적인 적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벗어나 덴마크의 거짓 왕으로, 덴마크를 병들게 한 \"병균\"(canker)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을 다른 데가 아닌 오필리아의 무덤에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Why, I will fight with him upon this theme/Until my eyelids will no longer wag\"(5. 1. 261-2)라고 한다.
그리고 \"O my son, what theme?\"(263)이라는 거투르드의 질문에, 놀랍게도 \"I lov\'d Ophelia\"라고 답한다. 그가 앞에서 오필리아에게 \"I love you not.\"(3. 1. 119)라고 자신의 사랑을 부정하고 \"We will have no more marriage.\"(3. 1. 149)라며 오필리아에게 \"Get thee to the nunnery.\"(3. 1. 121)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놀라운 변화이다.
거트루드로 인한 여성 혐오가 오필리아에게도 적용되었고 그녀를 사랑하지만 복수를 위해 그녀를 포기해야 했던 햄릿은 거트루드의 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 후 자신의 복수의 의미도 정립하면서 다시 오필리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오필리아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는 것은 그녀를 포기하면서 함께 포기했던 자신의 삶의 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회복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나는 덴마크 왕, 햄릿이요.\"라는 당당한 정체성 선언으로 나온 것이다.
햄릿에게 클라우디스는 이 세상을 좀먹는 \"병균\"으로 이 세상을 정화하자면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클라우디스는 비극에 언제나 있어온 외부의 \"한계\", 주인공이 반드시 싸워야하고 비록 그 과정에 패배하더라도 그 싸움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한계이다. 그런데 햄릿은 클라우디스와 싸우기 전에 먼저 여성에 대한 혐오를 극복해야 했다.
이제 햄릿은 가부장 체제의 의식 속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체성의 혼돈을 극복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서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햄릿의 여성 혐오와 셰익스피어의 그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햄릿의 여성 혐오는 그가 싸워야할 \"한계\"로 셰익스피어에 의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극 진행의 어느 단계에 가면 없어진다.
5막에서 햄릿이 죽기 직전에 어머니와 화해하고, 그 이전에 정신적으로 오필리아와의 화해를 통해서 비로소 우주의 섭리를 인정하고 자연의 질서에 자신을 부합시키는 마음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여성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햄릿이 마지막 비극의 주인공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그의 정체성 선언은 오필리아에 대한 사랑의 천명과 함께 나왔다. 햄릿이 버렸던 오필리아를 다시 인정하고, 더불어 그녀와 함께 버렸던 자신의 어떤 부분도 다시 인정함으로써 그는 온전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여성 혐오에 일정한 거리를 둔다. 또한 이 극에서 실제로 나오는 여성들이 그런 혐오를 받을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셰익스피어의 여성 혐오를 말할 때 염두에 두어야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여성 문제에서 Hamlet이 다른 Jacobean tragedy와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King Lear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Hamlet이 비록 말기라고는 하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극시기에 쓰였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Works Cited
Dunsinberre, Juliet.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Women. London: Macmillian, 1975.
Howard, J. E. ed. Engendering a Nation: A Feminist Account of Shakespeare\'s English Historise. London: Routledge, 1997.
Shakespeare, William. Hamlet. Ed. Harold Jenkins. London: Methuen, 1982.
추천자료
 영화 베스트맨에 내재한 햄릿의 현재적 재구성과 심리비평
영화 베스트맨에 내재한 햄릿의 현재적 재구성과 심리비평 셰익스피어 희극에서 극중극의 구조와 기능
셰익스피어 희극에서 극중극의 구조와 기능 햄릿 감상문
햄릿 감상문 연극 햄릿을 보고나서...
연극 햄릿을 보고나서... 햄릿 작품에 대해서
햄릿 작품에 대해서 William Shakespeare 에 대한 레포트
William Shakespeare 에 대한 레포트 Hamlet, Laertes, Fortinbras의 인간형 비교와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셰익스피어의 시대
Hamlet, Laertes, Fortinbras의 인간형 비교와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셰익스피어의 시대 '햄릿' 관극평
'햄릿' 관극평 셰익스피어의 비관론적 관점
셰익스피어의 비관론적 관점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읽고 독후감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읽고 독후감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희극 감상문 및 느낀점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희극 감상문 및 느낀점 William Shakespeare - The Tempest(폭풍우)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 The Tempest(폭풍우) (셰익스피어) [★평가우수자료★][햄릿(Hamlet)에 나타난 르네상스] 햄릿소개, 햄릿의 르네상스, 햄릿의 재창...
[★평가우수자료★][햄릿(Hamlet)에 나타난 르네상스] 햄릿소개, 햄릿의 르네상스, 햄릿의 재창...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을 읽고, 서평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을 읽고,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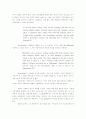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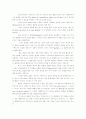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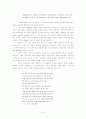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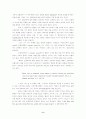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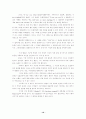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