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배아줄기세포 용어
III. 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 역사
IV. 국내 배아복제 연구 현황
IV. 줄기세포 치료이용 및 사례
V.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Ⅵ. 배아복제 찬성 입장
Ⅶ. 배아복제 반대 입장
ⅦI.배아복제의 대안으로서의 성체줄기세포
Ⅸ. 맺으며
II. 배아줄기세포 용어
III. 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 역사
IV. 국내 배아복제 연구 현황
IV. 줄기세포 치료이용 및 사례
V.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Ⅵ. 배아복제 찬성 입장
Ⅶ. 배아복제 반대 입장
ⅦI.배아복제의 대안으로서의 성체줄기세포
Ⅸ. 맺으며
본문내용
각각의 장기로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캐나다 토론토 의대 존 딕 박사는 이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딕 박사는 “장기에 자리를 잡는 줄기세포는 따로 있다”며 “따라서 줄기세포를 몸에 많이 넣는다고 치료율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줄기세포의 양을 늘리기 위해 성장호르몬 등을 이용하면 오히려 자리 잡는 능력이 떨어져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딕 박사는 백혈병과 같은 암에도 줄기세포가 따로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딕 박사는 “지금까지는 항암제나 수술로 암세포덩어리, 즉 결과물을 제거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며 “그러나 연구결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인 줄기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암이 재발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의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소장인 오일환교수는 “암 줄기세포가 있다는 가설이 있었지만 그동안 증명되지 못했다”며 “암세포 중 줄기세포를 찾아내 작동을 멈추게하거나 제거한다면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 치료=1999년 세포 수준에서 혈액줄기세포가 간(肝) 세포로도 분화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최근엔 이를 통해 간 치료에 근접한 연구결과들이 나왔다. 한국 출신의 의학자 오세훈박사와 미국 플로리다 의대브라이언 피터슨 박사는 80% 이상 간이 손상된 쥐에게 혈액줄기세포를 이식한 결과 20∼40%의 간이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쥐에 주입한 혈액줄기세포가 간에 자리를 잡아 간세포로 바뀐 것이다.강남성모병원 내과 배시현 교수는 “앞으로 환자가 간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 중간단계 치료법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뇨병 치료=피터슨 박사는 사람의 골수에서 채취한 혈액줄기세포를 이용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피터슨 박사는 “골수에서 혈액줄기세포를 뽑아 성장을 멈추도록 조작한 뒤 고농도의 포도당을 준 결과 인슐린을만드는 세포로 변했다”고 말했다. 강남성모병원 내과 윤건호 교수는 “인슐린이 고장 난 당뇨병 환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췌장이나 돼지의 췌장세포를 이용한 췌장이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면역거부 반응이 문제가 됐다”며 “이번 줄기세포는 본인의 것을 사용하므로 면역거부반응 없이 치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실제이용되려면 3, 4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골수내 줄기세포 이식법’ 첫선=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존의 골수 이식법과는 다른 획기적인치료법이 이번 심포지엄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골수이식이란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해 뼛속에 있는 골수세포를 거의 없앤 뒤 다른 사람에게 기증받은 골수세포로 이식하는 것이다. 일본 간사이 의대 이케하라 스스무 교수(사진)는 원숭이 뼈에서 얻은 골수세포를 폐기종, 류머티즘 등 난치성 질환에 걸린 원숭이들의 뼈 속에 직접 넣는 ‘골수 내 줄기세포 이식법’을 이용한 결과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치료가 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기존의 골수 이식법은 골수세포를 환자의 혈관에 넣어 주는 것이다. 혈관 속에 들어간 골수세포는 이틀 동안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뼛속에 정착한다. 반면 새로운 이식법은 골수세포를 뼛속에 바로 넣어 주므로 치료시간이 단축되고 다른 혈액 세포와 섞여 오염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케하라 교수는 “기존 골수 이식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폐기종이나 뼈엉성증(골다공증), 전신홍반루푸스(SLE)와 같은 자가면역질환 등에 치료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의대 성모병원 내과 김동욱 교수는 “골수 내 줄기세포 이식법은 사실 1950년대에 시행됐지만 면역거부반응 때문에 사라진 시술법”이라며 “이러한 시술법을 다시 살린 이케하라 박사의 생각은 콜럼버스의 달걀만큼이나 간단하면서도 기발하다”고 평가했다.
Ⅸ. 맺으며
법안이 통과된 지 한달반 만인 1980년대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생명공학육성법을 과학기술부는 만들었는데, 이는 특히 한국이 국민에게 과학만능을 부추기고 세계화 시대에서의 무한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대한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특히 과학자 등에 생명윤리 교육을 강화해, 생명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강화시키는 풍토를 조성해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배아 줄기 세포가 많은 장점을 지님에도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은 배아가 엄연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뤄지는 수정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 배아의 지위를 주장하기 때문인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체간세포의 연구를 자기세포를 사용하고 복제과정을 생략하므로 배아복제 반대의 근거가 되는 생명과 관련된 윤리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실험결과를 보면 각막이식, 뇌암치료, 유방암치료, 난소암치료, 간질환치료, 백혈병, 관절염, 심장병 등등 여러가지로 배아줄기 세포이용 못지 않은 희망적인사례가 많다. 따라서 국가적차원에서 되도록 성체간세포에 대한 연구가 장려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차별한 배아복제로 인한 사람들의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걱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존엄성은 한 번 무너져 내리면 다시 추스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학의 유용성은 그 정해진 규칙을 지킬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법칙은 생명 존중의 원칙이다. 과학의 궁극적이 목표가 인류 복지에 이바지 하는 것임에 모두 공감할 것인데, 인류 복지는 생명 존중의 전제 아래 출발하는 것이다. 당장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 논리로 배아복제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우리사회는 미래에 엄청난 대가와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다. 지난 1월에 공포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으로 인해 4여년간의 종교계, 의료계, 과학계 등의 사회적 토의와 갈등이 결론적으로는 합의된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서 원칙적인 배아복제는 금지시키고, 난치병 치료를 위한 제한적인배아복제 사용은 심의를 통해서 엄격히 허용하고 있는데, 생명의 존엄성이 바탕이 되는 법안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연구를 억제시키고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행해져야 할 것이다.
Ⅸ. 맺으며
법안이 통과된 지 한달반 만인 1980년대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생명공학육성법을 과학기술부는 만들었는데, 이는 특히 한국이 국민에게 과학만능을 부추기고 세계화 시대에서의 무한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대한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특히 과학자 등에 생명윤리 교육을 강화해, 생명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강화시키는 풍토를 조성해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배아 줄기 세포가 많은 장점을 지님에도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은 배아가 엄연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뤄지는 수정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 배아의 지위를 주장하기 때문인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체간세포의 연구를 자기세포를 사용하고 복제과정을 생략하므로 배아복제 반대의 근거가 되는 생명과 관련된 윤리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실험결과를 보면 각막이식, 뇌암치료, 유방암치료, 난소암치료, 간질환치료, 백혈병, 관절염, 심장병 등등 여러가지로 배아줄기 세포이용 못지 않은 희망적인사례가 많다. 따라서 국가적차원에서 되도록 성체간세포에 대한 연구가 장려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차별한 배아복제로 인한 사람들의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걱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존엄성은 한 번 무너져 내리면 다시 추스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학의 유용성은 그 정해진 규칙을 지킬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법칙은 생명 존중의 원칙이다. 과학의 궁극적이 목표가 인류 복지에 이바지 하는 것임에 모두 공감할 것인데, 인류 복지는 생명 존중의 전제 아래 출발하는 것이다. 당장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 논리로 배아복제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우리사회는 미래에 엄청난 대가와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다. 지난 1월에 공포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으로 인해 4여년간의 종교계, 의료계, 과학계 등의 사회적 토의와 갈등이 결론적으로는 합의된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서 원칙적인 배아복제는 금지시키고, 난치병 치료를 위한 제한적인배아복제 사용은 심의를 통해서 엄격히 허용하고 있는데, 생명의 존엄성이 바탕이 되는 법안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연구를 억제시키고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행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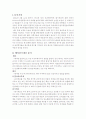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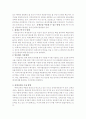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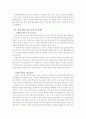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