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진대(秦代)의 윤리사상
Ⅱ. 전한(前漢)의 윤리사상
Ⅲ. 후한(後漢)의 윤리사상
Ⅳ. 육조시대(六朝時代)의 윤리사상
Ⅴ. 수대(隋代)의 윤리사상
Ⅵ. 당대(唐代)의 윤리사상
Ⅱ. 전한(前漢)의 윤리사상
Ⅲ. 후한(後漢)의 윤리사상
Ⅳ. 육조시대(六朝時代)의 윤리사상
Ⅴ. 수대(隋代)의 윤리사상
Ⅵ. 당대(唐代)의 윤리사상
본문내용
하였다. 이처럼 도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급속히 융성하였으나 당시 사람들은 도교를 단지 하나의 종교로 믿었을 뿐, 학문으로 인정하여 연구하는 자들은 거의 없었다.
가. 담초(譚)
자는 경승(景升)이며, 국자사업(國子司業)인 수(洙)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뛰어나 모든 책을 섭렵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였다. 아버지가 진사(進士)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담초는 하고 싶지 않아 오로지 뜻을 도교에 두고 종남산(終南山)에 은거하여 버렸다. 후에 남악(南嶽)으로 옮겨 연단(煉丹)을 통한 양생술(養生術)을 연구하였고, 청성산(淸城山)에 들어가 있다가 죽었다.
담초는 노자(老子)의 설을 따라 도(道)를 우주의 본체로 보고, 도는 허무(虛無)요 신명(神命)이요, 만물의 진성(眞性)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도가 만물의 진성(眞性)이 되는 까닭에 일체의 만물은 서로 교통할 수 있다. 이를 대동(大同)이라 부른다. 담초는 도를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ㆍ신(信)을 낳는 소이연이 된다고 말하였다. 즉 “텅비고 무위(無爲)하니, 이것을 도(道)라 한다. 도(道)는 스스로 능히 지키니, 이를 덕(德)이라 부른다. 또 덕(德)이 만물을 낳으니, 이를 인(仁)이라 부른다. 인(仁)은 안위(安危)를 구하니 이를 의(義)라 부른다. 의(義)는 나아가 취하니, 이를 예(禮)라 한다. 예(禮)는 변통함이 있으니, 이것을 지(智)라 부른다. 지(智)는 성실함이 있으니, 이를 신(信)이라 부른다. 이상을 통용하여 성(聖)이라 이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담초의 말은 다음과 같은 노자의 말과는 정반대다. 즉 노자는 “도(道)를 잃은 후에 덕(德)이 되고, 덕(德)을 잃은 후에 인(仁)이 되고, 인(仁)을 잃은 후의 의(義)가 되고, 의(義)를 잃은 후에 예(禮)가 된다. 그러므로 예(禮)는 충신(忠信)을 핍박하고 어지럽히는 우두머리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마 노자는 소극적으로 유교를 배척하였다면, 담초는 적극적으로 도교와 유교의 조화를 꾀하고 있었던 것 같다.
3. 당대의 불교
당대에 가장 최고로 융성한 것은 불교였다. 그 세력을 도교와 유교는 미칠 수가 없었다. 신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승 또한 계속 배출되었고, 혹자는 경론을 저작하고 번역하기도 하였고 혹자는 새로운 종파를 창업하기도 하였다.
불교가 이처럼 보급되자, 머리를 삭발하고 승이나 비구니가 되는 자가 점차 많아졌고, 그 중에는 군역을 피하여 삭발하는 폐습도 있었다. 이에 무종(武宗)은 국가를 크게 해롭게 하는 일이라 보고 완전히 그것을 없애려고 하였다. 그래서 무종(武宗)이후 백년동안 불교는 자연히 쇠락해져 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교가 각인되어 있었고, 선종(禪宗)의 경우는 더욱 융성하여 유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 철학을 발생시키는 단서를 열기도 하였다.
가. 두순(杜順)
화엄(華嚴)의 진리를 발휘하기 위하여 『화엄법계관문』(華嚴法界觀門)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그는 우주를 진여계(眞如界)와 현상계(現象界)로 나누고, 진여계(眞如界)를 이(理), 현상계(現象界)를 색(色) 혹은 사(事)라 하였다. 진여계(眞如界)와 현상계(現象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일체의 현상계(現象界)에는 실체도 없고 자성(自性)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현상(現象)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것이다.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고로 일체의 현상은 진여(眞如)가 된다. 현상(現象)은 곧 진여(眞如)이고 진여(眞如)는 곧 현상(現象)으로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종밀(宗蜜)
유교와 도교는 천지만물이 하나의 큰 원기(元氣)로부터 생긴다고 보았다. 소승불교는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몸은 지(地)ㆍ수(水)ㆍ화(火)ㆍ풍(風)이 되고, 마음은 수(受)ㆍ상(相)ㆍ행(行)ㆍ식(識)이 되어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종밀(宗蜜)은 『원인론』(原人論)에서 이상의 제 교의 해석들은 일면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나, 역시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 편견일 뿐이라고 한다. 아울러 일체의 유정(有情)은 시작이 없는 이래부터 밝디 밝은 진심(眞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불성(佛性)이요, 여래장(如來藏)이다. 망상으로 인하여 그것이 가려져서 그 진심(眞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보기를 하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이 생겨나고 생사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 담초(譚)
자는 경승(景升)이며, 국자사업(國子司業)인 수(洙)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뛰어나 모든 책을 섭렵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였다. 아버지가 진사(進士)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담초는 하고 싶지 않아 오로지 뜻을 도교에 두고 종남산(終南山)에 은거하여 버렸다. 후에 남악(南嶽)으로 옮겨 연단(煉丹)을 통한 양생술(養生術)을 연구하였고, 청성산(淸城山)에 들어가 있다가 죽었다.
담초는 노자(老子)의 설을 따라 도(道)를 우주의 본체로 보고, 도는 허무(虛無)요 신명(神命)이요, 만물의 진성(眞性)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도가 만물의 진성(眞性)이 되는 까닭에 일체의 만물은 서로 교통할 수 있다. 이를 대동(大同)이라 부른다. 담초는 도를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ㆍ신(信)을 낳는 소이연이 된다고 말하였다. 즉 “텅비고 무위(無爲)하니, 이것을 도(道)라 한다. 도(道)는 스스로 능히 지키니, 이를 덕(德)이라 부른다. 또 덕(德)이 만물을 낳으니, 이를 인(仁)이라 부른다. 인(仁)은 안위(安危)를 구하니 이를 의(義)라 부른다. 의(義)는 나아가 취하니, 이를 예(禮)라 한다. 예(禮)는 변통함이 있으니, 이것을 지(智)라 부른다. 지(智)는 성실함이 있으니, 이를 신(信)이라 부른다. 이상을 통용하여 성(聖)이라 이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담초의 말은 다음과 같은 노자의 말과는 정반대다. 즉 노자는 “도(道)를 잃은 후에 덕(德)이 되고, 덕(德)을 잃은 후에 인(仁)이 되고, 인(仁)을 잃은 후의 의(義)가 되고, 의(義)를 잃은 후에 예(禮)가 된다. 그러므로 예(禮)는 충신(忠信)을 핍박하고 어지럽히는 우두머리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마 노자는 소극적으로 유교를 배척하였다면, 담초는 적극적으로 도교와 유교의 조화를 꾀하고 있었던 것 같다.
3. 당대의 불교
당대에 가장 최고로 융성한 것은 불교였다. 그 세력을 도교와 유교는 미칠 수가 없었다. 신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승 또한 계속 배출되었고, 혹자는 경론을 저작하고 번역하기도 하였고 혹자는 새로운 종파를 창업하기도 하였다.
불교가 이처럼 보급되자, 머리를 삭발하고 승이나 비구니가 되는 자가 점차 많아졌고, 그 중에는 군역을 피하여 삭발하는 폐습도 있었다. 이에 무종(武宗)은 국가를 크게 해롭게 하는 일이라 보고 완전히 그것을 없애려고 하였다. 그래서 무종(武宗)이후 백년동안 불교는 자연히 쇠락해져 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교가 각인되어 있었고, 선종(禪宗)의 경우는 더욱 융성하여 유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 철학을 발생시키는 단서를 열기도 하였다.
가. 두순(杜順)
화엄(華嚴)의 진리를 발휘하기 위하여 『화엄법계관문』(華嚴法界觀門)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그는 우주를 진여계(眞如界)와 현상계(現象界)로 나누고, 진여계(眞如界)를 이(理), 현상계(現象界)를 색(色) 혹은 사(事)라 하였다. 진여계(眞如界)와 현상계(現象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일체의 현상계(現象界)에는 실체도 없고 자성(自性)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현상(現象)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것이다.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고로 일체의 현상은 진여(眞如)가 된다. 현상(現象)은 곧 진여(眞如)이고 진여(眞如)는 곧 현상(現象)으로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종밀(宗蜜)
유교와 도교는 천지만물이 하나의 큰 원기(元氣)로부터 생긴다고 보았다. 소승불교는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몸은 지(地)ㆍ수(水)ㆍ화(火)ㆍ풍(風)이 되고, 마음은 수(受)ㆍ상(相)ㆍ행(行)ㆍ식(識)이 되어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종밀(宗蜜)은 『원인론』(原人論)에서 이상의 제 교의 해석들은 일면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나, 역시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 편견일 뿐이라고 한다. 아울러 일체의 유정(有情)은 시작이 없는 이래부터 밝디 밝은 진심(眞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불성(佛性)이요, 여래장(如來藏)이다. 망상으로 인하여 그것이 가려져서 그 진심(眞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보기를 하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이 생겨나고 생사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추천자료
 제 7차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대한 평가
제 7차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대한 평가 윤리와 사상 정리
윤리와 사상 정리 도덕, 윤리와 사상, 시민윤리, 전통윤리 교과서 中 한국유학사상 부분 발췌 요약정리
도덕, 윤리와 사상, 시민윤리, 전통윤리 교과서 中 한국유학사상 부분 발췌 요약정리 [과학기술시대][실천철학][정치사회][윤리학][과학기술시대의 과제]과학기술시대의 실천철학,...
[과학기술시대][실천철학][정치사회][윤리학][과학기술시대의 과제]과학기술시대의 실천철학,... 생태학의 전개과정과 모델 및 환경윤리 사상가, 생명의 의미와 개념
생태학의 전개과정과 모델 및 환경윤리 사상가, 생명의 의미와 개념 고려시대 사상
고려시대 사상  [세계관][도교][기독교][동서양][동양과 서양][고구려시대]도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
[세계관][도교][기독교][동서양][동양과 서양][고구려시대]도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 현시대 관점에서 바람직한 보육을 위해 필요한 보육사상을 자세히 정리하고 그 사상을 바탕으...
현시대 관점에서 바람직한 보육을 위해 필요한 보육사상을 자세히 정리하고 그 사상을 바탕으... 헤이안시대 이후 각 시대의 중심사상
헤이안시대 이후 각 시대의 중심사상  책요약 -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 Ⅳ. 중세 기독교 시대(590-1517) 부분 요약
책요약 -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 Ⅳ. 중세 기독교 시대(590-1517) 부분 요약  중국사회경제사 정리,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의 정치,경제,사회의 특징과 대표되는 제자...
중국사회경제사 정리,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의 정치,경제,사회의 특징과 대표되는 제자... 몸의 정치와 정치공동체 패러다임 - 이제마(李濟馬)의 사상(四象)철학과 생활세계 재건을 위...
몸의 정치와 정치공동체 패러다임 - 이제마(李濟馬)의 사상(四象)철학과 생활세계 재건을 위... 실학사상 [實學思想] (조선의 시대적 배경, 문제제기, 실학의 발생 배경, 실학의 특성, 실학...
실학사상 [實學思想] (조선의 시대적 배경, 문제제기, 실학의 발생 배경, 실학의 특성, 실학... [공학윤리] 윤리학자의 사상과 생애 - 맹자의 사상
[공학윤리] 윤리학자의 사상과 생애 - 맹자의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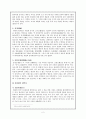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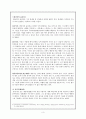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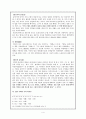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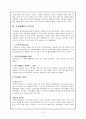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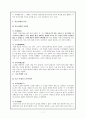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