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않는 시들도 여럿 존재하였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으나 이것이 읽는 이로 하여금 한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시의 생동성과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장치이다.
7. 박형준의 댄스 교본 (시집의 제목이 춤인 이유 )
이 시집을 펼쳐들고 시를 한 편, 두 편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궁금증 중 하나가 바로 시집의 제목인 <춤>일 것이다. 사실 시들은 대부분 \'빛\'에 대해 노래하거나, \'일상의 흔적\'들을 조명하고 있다. 정작 시집의 제목인 \'춤\'에 대한 언급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집은 <춤>이라는 제목으로 엮인 것일까?
그래서 시집의 제목과 일치하는 시, <춤>에 대해서 조명해 보았다. 이 시는 그냥 읽으면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친절한 작가가 제목 옆에 조그맣게 달아준 \"첫 비행이 죽음이 될 수 있으나, 어린 송골매는 절벽의 꽃을 따는 것으로 비행 연습을 한다.\"라는 해설에서 우리는 해석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처음 연의 \"근육은 날자마자 / 고독으로 오므라든다\"란 구절은 어린 송골매의 첫 비행의 두려움을 나타낸다. 송골매가 넓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과 함께 혼자라는 사실의 고독이 엄습해 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도 잠시, \'내리꽂혔다 솟구\'치는 어린 송골매는 오므라졌던 근육이 펴지는 \'쾌감\'을 느끼게 된다. \'날개 밑에 부풀어오르는 하늘\'과 \'絶海孤島\'의 전율 사이에 핀 꽃을 송골매는 무사히 딴 것이다. \'살을 상상하\'며 꽃을 딴 어린 송골매는 더 이상 \'발 아래 움켜쥔 고독\'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된다. 두렵기만 했던 첫 비행에서의 공포를 밀어낸, 순간적인 삶의 에너지를 발산한 것이다. 그렇게 죽음의 첫 비행을 성공한 송골매는 \'상공에 날개를 활짝펴\' 날면서 \'절해를 찢어놓\'을 듯한 외침을 지르며 \'천길 절벽 아래\'의, 고독이 아닌 \'꽃파도\'를 보며 하늘을 날아오른다.
그저 이 시를 새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린 송골매가 푸른 창공을 멋지게 날아서 거대한 파도와 그 사이에 우뚝 선 절벽에 핀 꽃을 절묘하게 따는 모습의 이미지에 불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멋진 이미지(춤)를 보여주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멋진 춤 속에는 송골매의 삶의 중요한 시기가 녹아있고, 넓디넓은 새파란 창공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으며 하늘을 나는 송골매의 고독이 서려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꽃을 따낸 송골매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사생결단의 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 <춤>에서는 단순한 어린 송골매의 화려한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다. 화려한 모습 속에 숨겨진 송골매의 치열함 삶이 어려있는 것이다. 시집 <춤>의 다른 시들도 그렇다. 시인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들 속에서, 어린 송골매의 치열한 삶에서 춤 같은 것을 찾은 것이다.
\'노래에 맞춰 추는 춤\'이 아닌 \'삶에서 춤추는 느낌과 감정\', 삶을 살면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그리고 싶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이러한 작가의 말처럼 각 시들은 삶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들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박형준의 네 번째 시집의 시들은 우리 삶 속에서의 \'춤\'으로 엮인 것이다.
8. 마무리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박형준의 네 번째 시집<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춤>에서 읽을 수 있는 작가의 시선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어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밝음에 다른 것을 가미해서 빛의 이미지를 재창조했고 자신의 감동과 정서를 자연의 소재 속에서 나타내었다. 그의 어린시절과 삶이 시 곳곳에 엿보이는 것 또한 그의 시의 특징이다. 박형준, 그의 안경은 서늘한 빛과 자연과 낮은 곳을 담은 도수로 맞춰져 있다. 그가 보는 세상에는 서늘하고 은은한 빛이 비치며 자연이 숨쉬고 낮은 곳을 향한 눈길과 기억의 소중함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것이 삭막해져가는 요즘 세상에서 삶을 자연 속에 옮겨와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또한 소외된 계층에 보내는 연민의 눈 또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꼭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어린시절의 기억 하나쯤 되돌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를 잘 느끼고 읽어낸 것일 것이다. 빛은 늘 밝고 내리쬐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즉, 강한 빛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쓸쓸하고도 은은한 빛에 투영된 삶의 묘사,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춤이라는 것! 우리가 시집을 통해 읽어낸 것이자 얻은 것이다.
7. 박형준의 댄스 교본 (시집의 제목이 춤인 이유 )
이 시집을 펼쳐들고 시를 한 편, 두 편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궁금증 중 하나가 바로 시집의 제목인 <춤>일 것이다. 사실 시들은 대부분 \'빛\'에 대해 노래하거나, \'일상의 흔적\'들을 조명하고 있다. 정작 시집의 제목인 \'춤\'에 대한 언급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집은 <춤>이라는 제목으로 엮인 것일까?
그래서 시집의 제목과 일치하는 시, <춤>에 대해서 조명해 보았다. 이 시는 그냥 읽으면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친절한 작가가 제목 옆에 조그맣게 달아준 \"첫 비행이 죽음이 될 수 있으나, 어린 송골매는 절벽의 꽃을 따는 것으로 비행 연습을 한다.\"라는 해설에서 우리는 해석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처음 연의 \"근육은 날자마자 / 고독으로 오므라든다\"란 구절은 어린 송골매의 첫 비행의 두려움을 나타낸다. 송골매가 넓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과 함께 혼자라는 사실의 고독이 엄습해 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도 잠시, \'내리꽂혔다 솟구\'치는 어린 송골매는 오므라졌던 근육이 펴지는 \'쾌감\'을 느끼게 된다. \'날개 밑에 부풀어오르는 하늘\'과 \'絶海孤島\'의 전율 사이에 핀 꽃을 송골매는 무사히 딴 것이다. \'살을 상상하\'며 꽃을 딴 어린 송골매는 더 이상 \'발 아래 움켜쥔 고독\'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된다. 두렵기만 했던 첫 비행에서의 공포를 밀어낸, 순간적인 삶의 에너지를 발산한 것이다. 그렇게 죽음의 첫 비행을 성공한 송골매는 \'상공에 날개를 활짝펴\' 날면서 \'절해를 찢어놓\'을 듯한 외침을 지르며 \'천길 절벽 아래\'의, 고독이 아닌 \'꽃파도\'를 보며 하늘을 날아오른다.
그저 이 시를 새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린 송골매가 푸른 창공을 멋지게 날아서 거대한 파도와 그 사이에 우뚝 선 절벽에 핀 꽃을 절묘하게 따는 모습의 이미지에 불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멋진 이미지(춤)를 보여주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멋진 춤 속에는 송골매의 삶의 중요한 시기가 녹아있고, 넓디넓은 새파란 창공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으며 하늘을 나는 송골매의 고독이 서려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꽃을 따낸 송골매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사생결단의 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 <춤>에서는 단순한 어린 송골매의 화려한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다. 화려한 모습 속에 숨겨진 송골매의 치열함 삶이 어려있는 것이다. 시집 <춤>의 다른 시들도 그렇다. 시인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들 속에서, 어린 송골매의 치열한 삶에서 춤 같은 것을 찾은 것이다.
\'노래에 맞춰 추는 춤\'이 아닌 \'삶에서 춤추는 느낌과 감정\', 삶을 살면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그리고 싶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이러한 작가의 말처럼 각 시들은 삶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들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박형준의 네 번째 시집의 시들은 우리 삶 속에서의 \'춤\'으로 엮인 것이다.
8. 마무리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박형준의 네 번째 시집<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춤>에서 읽을 수 있는 작가의 시선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어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밝음에 다른 것을 가미해서 빛의 이미지를 재창조했고 자신의 감동과 정서를 자연의 소재 속에서 나타내었다. 그의 어린시절과 삶이 시 곳곳에 엿보이는 것 또한 그의 시의 특징이다. 박형준, 그의 안경은 서늘한 빛과 자연과 낮은 곳을 담은 도수로 맞춰져 있다. 그가 보는 세상에는 서늘하고 은은한 빛이 비치며 자연이 숨쉬고 낮은 곳을 향한 눈길과 기억의 소중함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것이 삭막해져가는 요즘 세상에서 삶을 자연 속에 옮겨와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또한 소외된 계층에 보내는 연민의 눈 또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꼭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어린시절의 기억 하나쯤 되돌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를 잘 느끼고 읽어낸 것일 것이다. 빛은 늘 밝고 내리쬐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즉, 강한 빛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쓸쓸하고도 은은한 빛에 투영된 삶의 묘사,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춤이라는 것! 우리가 시집을 통해 읽어낸 것이자 얻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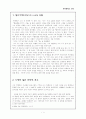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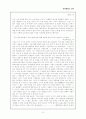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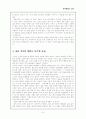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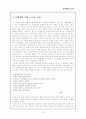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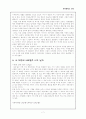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