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문
▲ 줄거리 (의존화소)
▲ 올드보이(Old Boy)의 의미
▲ 영화속 의도
▲ 대사로 보는 사건의 흐름과 함축적 의미
▲ 오대수와 몬스터
▲ 복수의 결말과 비극의 파국적 구성
▲ 후기
▲ 줄거리 (의존화소)
▲ 올드보이(Old Boy)의 의미
▲ 영화속 의도
▲ 대사로 보는 사건의 흐름과 함축적 의미
▲ 오대수와 몬스터
▲ 복수의 결말과 비극의 파국적 구성
▲ 후기
본문내용
달력이고, 학교이고 집이며 교회이자 친구이며 애인이다.” 친구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TV는 슬쩍 프랑켄슈타인을 비추고 애인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민혜경이 비친다. 정말 오대수는 풀려나서 사람을 만나자마자, 제임스 웨일의 영화 <프랑켄슈타인>에서처럼 사람들을 신기한 듯 만지고 그의 말을 따라한다.
오대수가 남자의 넥타이를 잡고 바라보던 장면과.. 이우진이 누나의 손을 잡고 바라보던 장면은 시선이 일치한다. 이우진은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온힘을 다해 잡지만. 결국 놓쳐버리고 만다. 하지만, 오대수는 여유롭게 잡고 있으며 \'조금 있다 죽어라\'라고까지 말한다. <올드보이>의 끝부분에 이우진이 말한다. “정말 내가 최면을 걸어서 니가 기억을 못했다고 생각해? 넌 그냥 잊은거야. 그냥”
“남의 일이니까“
오대수는, 그 남자가 자살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려온다. \'남의 일이니까\'
그는 말한다. “난 이제 괴물이 돼버렸다. 이 복수가 끝나면 난 오대수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자신이 포기하고 만다. 최면술의 선택에서 그는 괴물-몬스터를 택한다. 사실 알고 보면 오대수의 진정한 모습은 몬스터일지도 모른다. 남의일과 나의일을 철저히 구분 짓는 오대수. 처음부터 경찰서에 자아를 감금시킨 것처럼 말이다.
▲ 복수의 결말과 비극의 파국적 구성
장소를 알수 없는 방에서 15년간이나 감금된 대수에게 있어 탈출과 감금자에 대한 복수는 삶의 전부이다. 오직 탈출만을 위해 버텨왔으며 복수를 위해 15년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왔다. 권투연습을 하는것과 젓가락으로 벽을 파서 탈출하려는 계획은 모두 복수를 위해서이다. 그에게 있어 탈출과 복수는 이상이다. 한편, 이우진은 자신과 친누나였던 이수아와의 근친사실이 오대수에 의해 발각이 되면서 수아는 자살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자 혈육을 잃은 슬픔은 우진으로 하여금 복수심에 불타게 하고 오대수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난 다음 치밀한 복수극을 시작한다. 결국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두사람의 줄다리기는 밀고당기면서 미묘한 긴장을 지탱한다.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려는 우진은 혀를 자르고 잘못을 비는 대수를 보며 의미모를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복수의 끝이 이것이었던가. 통쾌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씻지 못할 상처를 대수에게 준 것으로나마 만족을 하며 자살을 한다. 복수를 위한 일념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다. 우진 자신에게는 정말 잘못이 없었는가. 손을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수아의 말을 듣고 손을 놓아준 그도 괴로워한다. 그때 손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죄책감이다. 복수가 삶의 전부였다면 그것을 이룬 그에게 이상은 없다. 결과는 자살이다.
대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간 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싸움에서 이겼다는 나르시즘에 취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친딸이었던 미도와의 섹스를 녹음해놓은 테이프를 재생하는 버튼이었고 대수는 괴로워한다. 끝까지 우진의 계획에 놀아난 것이다. 우진이 자살하고 사실은 감춰졌으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비극이다. 미도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는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알면서 사랑해야하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괴로운, 어느쪽을 택하더라도 비극적인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오대수식 복수의 끝은 역시나 이상이 아니었다.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준다. <올드보이>는 복수와 복수가 낳은 비극의 순환인 파국적 구성이다.
▲ 후기
<올드보이>는 재미는 물론이지만 영화 자체로 충격이었다. 소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소한 근친상간을 다루고 있으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랬다. 사는 것이 죽는 것 보다 고통스럽다고. 어떻게 보면 이우진은 멋지게 복수를 한 셈이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물려주었으니 말이다. 사랑하는 누이와의 은밀한 관계로 인한 불안감, 죄의식. 잔혹한 자신의 사랑을 떠맡지 못한 채 누이의 손을 놔야 했을 고통. 그 고통의 끝을 오대수에게 넘겨주고 죽음을 선택했다. 오대수는 자신의 혀끝 실수로 인하여 15년을 희생해야 했고 아내를 잃어야 했고, 친구도 잃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자식과의 이성적 사랑이라는 진실 앞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될 고통을 안게 된다. 그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 복수의 대상이 죽었는데도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복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수의 끝은 행복인가, 이상인가, 안식인가, 아니면 또다른 비극이자 허무인가. 미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린 대수는 절망에 빠져 절규하지만 우진의 복수는 멈추지 않는다. 미도에게 대수가 누구인지 밝혀버림으로써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려는 우진. 여기서 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진의 신발을 개처럼 핥는가 하면, 급기야 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 여긴 자신의 혀를 잘라버린다. 이 모든 복수를 행하고 난 우진은 잠시 누나가 죽던 날을 회상하는가 싶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권총을 머리에 대고는 방아쇠를 당긴다. 그렇다면 오대수는 목적을 이룬 것인가.
“모래알이든 바윗돌이든 가라앉는 것은 같다.”라는 이우진의 말은 <올드보이>에서 섬뜩하면서도 명백한 진리로 자리 잡았다. 지울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고 고통을 맛보게 된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사회적 현실과 고통에 대해 어떤 명확한 결론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피엔딩은 더욱 아니다. 우리가 받은 무엇이 있다면 복수를 말미암은 사회적인 금기에의 목격이다. 비극으로 끝났지만 영화는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나 <복수는 나의것>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영화도 금기를 건드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보게 하는 그런 영화다. “우리는 알면서도 사랑했지만 너희들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좀 더 구체적인 가정을 오대수뿐만 아니라 우리들 앞에 던져 놓고 고민하게 만든다. 굳이 윤리적 덕목들로 잣대를 재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에서 <올드보이>가 던져놓은 사회적 금기와 그것의 의미들을 이번 기회에 고민해볼 수 있다면 나름의 영화적 가치는 다한 셈이다.
오대수가 남자의 넥타이를 잡고 바라보던 장면과.. 이우진이 누나의 손을 잡고 바라보던 장면은 시선이 일치한다. 이우진은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온힘을 다해 잡지만. 결국 놓쳐버리고 만다. 하지만, 오대수는 여유롭게 잡고 있으며 \'조금 있다 죽어라\'라고까지 말한다. <올드보이>의 끝부분에 이우진이 말한다. “정말 내가 최면을 걸어서 니가 기억을 못했다고 생각해? 넌 그냥 잊은거야. 그냥”
“남의 일이니까“
오대수는, 그 남자가 자살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려온다. \'남의 일이니까\'
그는 말한다. “난 이제 괴물이 돼버렸다. 이 복수가 끝나면 난 오대수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자신이 포기하고 만다. 최면술의 선택에서 그는 괴물-몬스터를 택한다. 사실 알고 보면 오대수의 진정한 모습은 몬스터일지도 모른다. 남의일과 나의일을 철저히 구분 짓는 오대수. 처음부터 경찰서에 자아를 감금시킨 것처럼 말이다.
▲ 복수의 결말과 비극의 파국적 구성
장소를 알수 없는 방에서 15년간이나 감금된 대수에게 있어 탈출과 감금자에 대한 복수는 삶의 전부이다. 오직 탈출만을 위해 버텨왔으며 복수를 위해 15년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왔다. 권투연습을 하는것과 젓가락으로 벽을 파서 탈출하려는 계획은 모두 복수를 위해서이다. 그에게 있어 탈출과 복수는 이상이다. 한편, 이우진은 자신과 친누나였던 이수아와의 근친사실이 오대수에 의해 발각이 되면서 수아는 자살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자 혈육을 잃은 슬픔은 우진으로 하여금 복수심에 불타게 하고 오대수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난 다음 치밀한 복수극을 시작한다. 결국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두사람의 줄다리기는 밀고당기면서 미묘한 긴장을 지탱한다.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려는 우진은 혀를 자르고 잘못을 비는 대수를 보며 의미모를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복수의 끝이 이것이었던가. 통쾌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씻지 못할 상처를 대수에게 준 것으로나마 만족을 하며 자살을 한다. 복수를 위한 일념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다. 우진 자신에게는 정말 잘못이 없었는가. 손을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수아의 말을 듣고 손을 놓아준 그도 괴로워한다. 그때 손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죄책감이다. 복수가 삶의 전부였다면 그것을 이룬 그에게 이상은 없다. 결과는 자살이다.
대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간 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싸움에서 이겼다는 나르시즘에 취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친딸이었던 미도와의 섹스를 녹음해놓은 테이프를 재생하는 버튼이었고 대수는 괴로워한다. 끝까지 우진의 계획에 놀아난 것이다. 우진이 자살하고 사실은 감춰졌으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비극이다. 미도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는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알면서 사랑해야하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괴로운, 어느쪽을 택하더라도 비극적인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오대수식 복수의 끝은 역시나 이상이 아니었다.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준다. <올드보이>는 복수와 복수가 낳은 비극의 순환인 파국적 구성이다.
▲ 후기
<올드보이>는 재미는 물론이지만 영화 자체로 충격이었다. 소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소한 근친상간을 다루고 있으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랬다. 사는 것이 죽는 것 보다 고통스럽다고. 어떻게 보면 이우진은 멋지게 복수를 한 셈이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물려주었으니 말이다. 사랑하는 누이와의 은밀한 관계로 인한 불안감, 죄의식. 잔혹한 자신의 사랑을 떠맡지 못한 채 누이의 손을 놔야 했을 고통. 그 고통의 끝을 오대수에게 넘겨주고 죽음을 선택했다. 오대수는 자신의 혀끝 실수로 인하여 15년을 희생해야 했고 아내를 잃어야 했고, 친구도 잃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자식과의 이성적 사랑이라는 진실 앞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될 고통을 안게 된다. 그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 복수의 대상이 죽었는데도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복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수의 끝은 행복인가, 이상인가, 안식인가, 아니면 또다른 비극이자 허무인가. 미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린 대수는 절망에 빠져 절규하지만 우진의 복수는 멈추지 않는다. 미도에게 대수가 누구인지 밝혀버림으로써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려는 우진. 여기서 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진의 신발을 개처럼 핥는가 하면, 급기야 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 여긴 자신의 혀를 잘라버린다. 이 모든 복수를 행하고 난 우진은 잠시 누나가 죽던 날을 회상하는가 싶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권총을 머리에 대고는 방아쇠를 당긴다. 그렇다면 오대수는 목적을 이룬 것인가.
“모래알이든 바윗돌이든 가라앉는 것은 같다.”라는 이우진의 말은 <올드보이>에서 섬뜩하면서도 명백한 진리로 자리 잡았다. 지울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고 고통을 맛보게 된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사회적 현실과 고통에 대해 어떤 명확한 결론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피엔딩은 더욱 아니다. 우리가 받은 무엇이 있다면 복수를 말미암은 사회적인 금기에의 목격이다. 비극으로 끝났지만 영화는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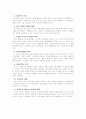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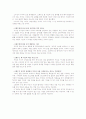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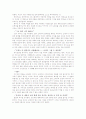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