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法古'와 '創新'의 두 개념 - 『楚亭集序』의 분석
3. 法古創新論
(1) 法古重視論
(2) 創新自寫論
4. 朴趾源 詩評의 法古創新論
1). 현실관
5. 맺음말
2. '法古'와 '創新'의 두 개념 - 『楚亭集序』의 분석
3. 法古創新論
(1) 法古重視論
(2) 創新自寫論
4. 朴趾源 詩評의 法古創新論
1). 현실관
5. 맺음말
본문내용
면한 것은 非儒敎的이라기 보다 儒敎精神의 生活理念에 따라 排擊한 것이다. 經學의 本道에서 벗어난다고 朴南壽가 「熱河日記」를 빼앗아 촛불에 태우려 한 후에 燕巖이 이야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호가인할 수 있다.
\"由如야, 내 앞으로 오너라. 나는 세상에서 궁하게 지낸지 오래다. 마음 속의 꼭두각시 같은 불평을 모두 文章에 의탁하여 제 멋대로 쓴 것일 뿐이다. 난들 그런 글을 쓰는 것이 기뻐서 썼겠는가. 그대와 公轍은 모두 젊고 제질이 풍부하니 文章을 배우더라도 내 것을 닮지 마라. 그리하여 正學의 振興에 힘써 나라의 명문장가인 신하가 되라. 이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벌주를 들겠다\"고 하면서 큰 잔을 귀울여 취하고 말았다.
) 金陵居士文集, 卷17, 『朴山如墓誌銘』(思想界 1958年 10月號), 李家源譯, 撲趾源의 思想과 世界.
이렇게 燕巖은 家族들과 함께 經濟的으로 潤澤한 生活을 위해 現實을 重視한 선비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여러 가지 문학양식으로 소설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경각외전』에 실려 있는 일련의 소설화된 양식들은 그 작자 논의와는 무관하게 연암 사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허생전』에서는 \"도둑질이라도 해오라\"는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양반전』에서는 \"아이구 그만우셔유. 참 맹량합니다. 그려. 당신네들이 나를 도둑놈이 되라 하시우\"
) 朴趾源·李鈺, 『燕巖·文無子小說精選』, 博英社, 1989, p79
라고 한 천민의 입을 통해서, 『예덕선생전』에서는 꾸밈없는 평민의 모습을 통해서 연암은 당시 양반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진실한 인간상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모습은 『허생전』의 허생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공과의 대화 중에 허생은 士大夫들이 겉치레 예법에 물들어 실속을 잃는 것에 대하여 칼을 찾아 찌르려 할 만큼 분노한다.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연암 사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5. 맺음말
擬古 風潮에 대한 비판은 고문의 가치에 대한 全面的 不定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危險性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것을 창안해 내는 것이 옳은가? 이리하여 세상에는 荒誕하고 괴벽한 소리를 늘어놓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임기응변의 조치를 통상의 떳떳한 법전보다 더 훌륭한 양 여기고, 일시 유행하는 가곡을 傳來의 古典音樂과 같이 대우하는 격이다.
) 연암집 권1, 「초정집서」; \'然則?新可乎 世遂有?誕淫僻而不知懼者 是三丈之木 賢於關石而延年之聲 可登淸廟矣\'
陽貨와 같이 옛것만을 볼받는 어리석음도 문제지만 새것 創案을 주장하는 자는 그것이 황탄하고 괴벽한 소리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흠이라고 했다. \"옛것을 본받은 사람들은 그 옛것에 拘泥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병통이고, 새것을 창안해 내는 사람들은 不經한 것이 병통이다.\"
) 앞의 책; \'法古者病泥跡 ?新者患不經\'
라고 盲目的인 法古와 法古를 무시한 創新을 둘 다 否定ㄹ하면서 이의 解決策을 \"참으로 옛것을 본받으면서 變通할 줄 알고, 새것을 創案해 내면서 根據가 있다면 이 時代의 글이 옛 時代의 글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 앞의책 ; \'苟能法古而知變 ?新而能典 今之文 猶古之文也\'
라고 제시하였다. 古文에 바탕을 두면서 現實에 適合하게 創造的으로 變容시키는, 곧 善變시키는 것이 創新이라는 것이다.
옛글을 배우되 現實에 알맞게 變通할 때 그것은 훌륭한 글 곧 古文이 이루얼질 수 있다는 것이 燕巖의 생각이었다.
) 그가 지은 墓地銘이 통상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求心的, 力動的 양식구조로 된 것으로 보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동권, 「박연암의 홍덕보묘지명에 대하여」, (이조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창작과 비평사, 1983, p84)
古文이 된 것이다. 그러나 歲月의 흐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變化를 가져오고 따라서 文章도 變化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지가 아무리 長久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萬物을 生成해 가고, 日月이 아무리 長久하다 하더라도 光輝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요 …(中略) … 책이라고 해서 할 말이 다 씌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라고 해서 뜻이 다 表現한 것은 아니다.
) 燕巖集 卷一, 「楚亭集序」; \'天地雖久 不斷生生 日月雖久 光輝日新 …… 書不盡言 圖不盡意\'
天地萬物은 끊임엇이 生成死滅을 계속하는 存在이며, 시간의 흐름은 어제의 光輝와 오늘의 光輝가 다르다는 사실을 强調하고 있다. 이런 變化에 맞추어 문장도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獨創的으로 글을 쓰기에는 荒誕하고 괴벽한 소리에 빠질 우려가 많으므로 글을 과거 聖賢들의 글 곧 古文의 典據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法古以知變 하고 創新而能典\'이 文章을 쓰는 데 原則이라고 연암은 강조하고 있다.
前代 聖人들의 생각이 百世後 聖人이 다시 出現하기까지에는 終焉되지 않으리라는 자세로 開創되기 위해서는 古文에 바탕을 둔 善變의 創新이 계승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후대 聖人에 의해 계승 발전된 것을 前代 聖人이 다시 살아나와서도 異議를 가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옛것에의 악착스런 墨守도 주제넘은 無視도 君子는 따르지 않는다 하면서 朴齊家에게 古文에 抱泥되지 않는 것을 칭찬하면서도 立論이 지나치게 높아 不經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忠告하여 차라리 옛것을 본받으려다가 固陋하게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를 권할 만큼 創新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1. 具敎賢, 『중국어문학논집 』제22호 「公安派와 朴趾源의 文學理論 比較 」, 中國語文學硏究會, 2003
2. 吳壽京, 『漢文學硏究 』10 「法古創新論의 개념에 대한 검토 :朴齊家의 \'詩學論\'과 관련하여 」, 啓明大學校啓明漢文學會, 1995
3. 申蘭秀, 『燕巖小說의 敍述技法 硏究』, 中央大 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中央大 敎育大學院, 1987
4. 宋永淑, 『조선후기 시평의 전개양상 : 민족의식을 중심으로』, 檀國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檀國大 大學院, 1995
5. 문정자, 『이서와 이광사의 예술론 연구』, 檀國大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檀國大 大學院, 1999
\"由如야, 내 앞으로 오너라. 나는 세상에서 궁하게 지낸지 오래다. 마음 속의 꼭두각시 같은 불평을 모두 文章에 의탁하여 제 멋대로 쓴 것일 뿐이다. 난들 그런 글을 쓰는 것이 기뻐서 썼겠는가. 그대와 公轍은 모두 젊고 제질이 풍부하니 文章을 배우더라도 내 것을 닮지 마라. 그리하여 正學의 振興에 힘써 나라의 명문장가인 신하가 되라. 이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벌주를 들겠다\"고 하면서 큰 잔을 귀울여 취하고 말았다.
) 金陵居士文集, 卷17, 『朴山如墓誌銘』(思想界 1958年 10月號), 李家源譯, 撲趾源의 思想과 世界.
이렇게 燕巖은 家族들과 함께 經濟的으로 潤澤한 生活을 위해 現實을 重視한 선비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여러 가지 문학양식으로 소설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경각외전』에 실려 있는 일련의 소설화된 양식들은 그 작자 논의와는 무관하게 연암 사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허생전』에서는 \"도둑질이라도 해오라\"는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양반전』에서는 \"아이구 그만우셔유. 참 맹량합니다. 그려. 당신네들이 나를 도둑놈이 되라 하시우\"
) 朴趾源·李鈺, 『燕巖·文無子小說精選』, 博英社, 1989, p79
라고 한 천민의 입을 통해서, 『예덕선생전』에서는 꾸밈없는 평민의 모습을 통해서 연암은 당시 양반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진실한 인간상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모습은 『허생전』의 허생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공과의 대화 중에 허생은 士大夫들이 겉치레 예법에 물들어 실속을 잃는 것에 대하여 칼을 찾아 찌르려 할 만큼 분노한다.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연암 사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5. 맺음말
擬古 風潮에 대한 비판은 고문의 가치에 대한 全面的 不定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危險性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것을 창안해 내는 것이 옳은가? 이리하여 세상에는 荒誕하고 괴벽한 소리를 늘어놓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임기응변의 조치를 통상의 떳떳한 법전보다 더 훌륭한 양 여기고, 일시 유행하는 가곡을 傳來의 古典音樂과 같이 대우하는 격이다.
) 연암집 권1, 「초정집서」; \'然則?新可乎 世遂有?誕淫僻而不知懼者 是三丈之木 賢於關石而延年之聲 可登淸廟矣\'
陽貨와 같이 옛것만을 볼받는 어리석음도 문제지만 새것 創案을 주장하는 자는 그것이 황탄하고 괴벽한 소리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흠이라고 했다. \"옛것을 본받은 사람들은 그 옛것에 拘泥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병통이고, 새것을 창안해 내는 사람들은 不經한 것이 병통이다.\"
) 앞의 책; \'法古者病泥跡 ?新者患不經\'
라고 盲目的인 法古와 法古를 무시한 創新을 둘 다 否定ㄹ하면서 이의 解決策을 \"참으로 옛것을 본받으면서 變通할 줄 알고, 새것을 創案해 내면서 根據가 있다면 이 時代의 글이 옛 時代의 글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 앞의책 ; \'苟能法古而知變 ?新而能典 今之文 猶古之文也\'
라고 제시하였다. 古文에 바탕을 두면서 現實에 適合하게 創造的으로 變容시키는, 곧 善變시키는 것이 創新이라는 것이다.
옛글을 배우되 現實에 알맞게 變通할 때 그것은 훌륭한 글 곧 古文이 이루얼질 수 있다는 것이 燕巖의 생각이었다.
) 그가 지은 墓地銘이 통상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求心的, 力動的 양식구조로 된 것으로 보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동권, 「박연암의 홍덕보묘지명에 대하여」, (이조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창작과 비평사, 1983, p84)
古文이 된 것이다. 그러나 歲月의 흐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變化를 가져오고 따라서 文章도 變化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지가 아무리 長久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萬物을 生成해 가고, 日月이 아무리 長久하다 하더라도 光輝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요 …(中略) … 책이라고 해서 할 말이 다 씌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라고 해서 뜻이 다 表現한 것은 아니다.
) 燕巖集 卷一, 「楚亭集序」; \'天地雖久 不斷生生 日月雖久 光輝日新 …… 書不盡言 圖不盡意\'
天地萬物은 끊임엇이 生成死滅을 계속하는 存在이며, 시간의 흐름은 어제의 光輝와 오늘의 光輝가 다르다는 사실을 强調하고 있다. 이런 變化에 맞추어 문장도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獨創的으로 글을 쓰기에는 荒誕하고 괴벽한 소리에 빠질 우려가 많으므로 글을 과거 聖賢들의 글 곧 古文의 典據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法古以知變 하고 創新而能典\'이 文章을 쓰는 데 原則이라고 연암은 강조하고 있다.
前代 聖人들의 생각이 百世後 聖人이 다시 出現하기까지에는 終焉되지 않으리라는 자세로 開創되기 위해서는 古文에 바탕을 둔 善變의 創新이 계승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후대 聖人에 의해 계승 발전된 것을 前代 聖人이 다시 살아나와서도 異議를 가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옛것에의 악착스런 墨守도 주제넘은 無視도 君子는 따르지 않는다 하면서 朴齊家에게 古文에 抱泥되지 않는 것을 칭찬하면서도 立論이 지나치게 높아 不經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忠告하여 차라리 옛것을 본받으려다가 固陋하게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를 권할 만큼 創新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1. 具敎賢, 『중국어문학논집 』제22호 「公安派와 朴趾源의 文學理論 比較 」, 中國語文學硏究會, 2003
2. 吳壽京, 『漢文學硏究 』10 「法古創新論의 개념에 대한 검토 :朴齊家의 \'詩學論\'과 관련하여 」, 啓明大學校啓明漢文學會, 1995
3. 申蘭秀, 『燕巖小說의 敍述技法 硏究』, 中央大 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中央大 敎育大學院, 1987
4. 宋永淑, 『조선후기 시평의 전개양상 : 민족의식을 중심으로』, 檀國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檀國大 大學院, 1995
5. 문정자, 『이서와 이광사의 예술론 연구』, 檀國大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檀國大 大學院,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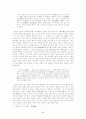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