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 3
II. 본 론 ----------------------------- 3
1. 불상의 발생 및 전래 --------------- 3
2. 불상의 종류 ---------------------- 3
3. 삼국의 불상 ---------------------- 5
4. 통일신라시대의 불상 --------------- 12
III. 결 론 ---------------------------- 20
II. 본 론 ----------------------------- 3
1. 불상의 발생 및 전래 --------------- 3
2. 불상의 종류 ---------------------- 3
3. 삼국의 불상 ---------------------- 5
4. 통일신라시대의 불상 --------------- 12
III. 결 론 ---------------------------- 20
본문내용
서 풍기는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신비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 1913년 중수 때 비도와 본존불사이에 있는 좌우 돌기둥을 연결하는 아치형의 양석(梁石)을 가로질러 놓아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는 본존불의 시야를 가리고 말았다. 성낙주,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개마고원, 1999, p.68-72
(3) 9세기
9세기 후반의 연대가 확실한 불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꼭 집어 말하기는 힘드나, 8세기 불(佛)의 잔영을 남기면서 얼굴, 몸이 모두 편평하게 만들어진 소형 동상들은 대체로 8세기 말경에서 9세기 전 기간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또한 대일여래(大日如來)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재료 면에서는 필시 동 부족에서 오는 철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 9세기는 중국 자체에서도 급격한 퇴보기로 들어가 5세기에서 8세기에 걸친 중국 불교조각의 발전기는 영원히 막을 내린 상태였으며, 영향, 자극원으로서의 중국의 소멸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불교조각에 대해 한쪽으로는 민족양식의 발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불교조각의 쇠퇴, 타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나 미술의 발전은 외국의 그것과의 부단한 접촉, 교류를 통해서만 박차가 가해지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민족양식으로 돌아가면서도 결국은 쇠퇴한다는 이론이 되는 것이며, 9세기 신라조각은 결국은 그러한 길을 밟은 것이라 하겠다.
①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좌상
강원도 철원군 도피안사에 봉안도니 철조 여래상의 뒷면에 100여 자의 긴 명문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불상은 신라 경문왕 5년 그 지방의 신도 1,500여 명이 결연(結緣)하여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얼굴은 갸름하며 머리는 나발인데 육계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 통견의 대의 전체에는 층단으로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어서 도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좌도 철제이다. 이 시대 이후에 조성된 상은 이상적인 양식이 사라지며 친밀감 있고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강우방, 한국 불교 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p.323
②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불좌상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의 대적광전에 모셔진 철로 만든 불상으로, 현재 대좌(臺座)와 광배(光背)를 잃고 불신(佛身)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불상의 왼팔 뒷면에 신라 헌안왕 2년(858) 무주장사(지금의 광주와 장흥)의 부관이었던 김수종이 시주하여 불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어서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달걀형의 얼굴에는 약간 살이 올라 있다. 오똑한 콧날, 굳게 다문 입 등에서 약간의 위엄을 느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소 추상화된 모습이다.
팽창된 체구와 가슴의 표현 등은 당당해 보이면서도 긴장감과 탄력성이 줄어들었고, 몸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손과 넓은 무릎은 불상의 전체적인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양어깨에 걸쳐 입은 옷은 가슴 앞에서 U자형으로 모아지며, 다시 두 팔에 걸쳐 무릎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옷주름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지만 탄력을 잃은 모습이다. 이런 형태의 표현은 신라 불상에서 보여주던 이상적인 조형감각이 후퇴하고 도식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9세기 후반 불상 양식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손은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 모양이다.
이 작품은 만든 연대가 확실하여 당시 유사한 비로자나불상의 계보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걸쳐 유행한 철로 만든 불상의 첫 번째 예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http://www.ocp.go.kr/
문화재청 홈페이지
III. 결 론
이상으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불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살펴 본 결과 삼국시대 때 각각 독자적으로 서로 닮기는 하나, 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의 불상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고구려는 백제나 신라에 비해 화려함이 많이 떨어져 보였으나, 백제와 신라는 화려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화려함은 더더욱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통일신라시대 8세기에 석굴암은 예술성과 과학성의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을 나 역시도 느낄 수가 있었다.
9세기에 들어서 철불이 제작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회기적이라고는 생각했으나, 그동안의 불상과는 사뭇 달라보였다. 오히려 내가 볼 때도 이 전의 불상들이 더 아름다워 보였고, 9세기의 불상은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 중국으로부터 불상 양식이 들어왔다고는 하나 중국 불상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불상은 아주 훌륭하게 발전되어 왔다고 느낀다.
조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신라의 불상에 비해 고구려나 백제의 불상은 찾기가 쉽지가 않았고, 어느 불상들은 그 제작 국가가 어딘지를 몰라 추정하는 것이 3개국이 모두 다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양식으로 본다면 어디지만 출토지를 보았을 때는 또 다른 어느 나라였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몇몇 불상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일본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럴 때 과거로 가서 이것이 정말 어느 나라의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가장 큰 반성 할 점은 시간이 촉박해 참고문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준비가 미비했던 것 같고, 나 자신으로 인해 다른 학우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바쁘게 준비해서 좀 힘이 들었지만 이 계기로 우리나라의 삼국과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을 나라별로, 시대별로 평소보다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약간이나마 뿌듯하다. 또한 아쉬운 점 역시 더욱 공부해야 하겠다는 자세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나 자신과 약속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원용, 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강우방, 한국 불교 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성낙주,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개마고원, 1999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ocp.go.kr/
http://myhome.naver.com/banya75/sukgulam/sukgulam4.html
(3) 9세기
9세기 후반의 연대가 확실한 불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꼭 집어 말하기는 힘드나, 8세기 불(佛)의 잔영을 남기면서 얼굴, 몸이 모두 편평하게 만들어진 소형 동상들은 대체로 8세기 말경에서 9세기 전 기간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또한 대일여래(大日如來)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재료 면에서는 필시 동 부족에서 오는 철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 9세기는 중국 자체에서도 급격한 퇴보기로 들어가 5세기에서 8세기에 걸친 중국 불교조각의 발전기는 영원히 막을 내린 상태였으며, 영향, 자극원으로서의 중국의 소멸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불교조각에 대해 한쪽으로는 민족양식의 발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불교조각의 쇠퇴, 타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나 미술의 발전은 외국의 그것과의 부단한 접촉, 교류를 통해서만 박차가 가해지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민족양식으로 돌아가면서도 결국은 쇠퇴한다는 이론이 되는 것이며, 9세기 신라조각은 결국은 그러한 길을 밟은 것이라 하겠다.
①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좌상
강원도 철원군 도피안사에 봉안도니 철조 여래상의 뒷면에 100여 자의 긴 명문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불상은 신라 경문왕 5년 그 지방의 신도 1,500여 명이 결연(結緣)하여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얼굴은 갸름하며 머리는 나발인데 육계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 통견의 대의 전체에는 층단으로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어서 도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좌도 철제이다. 이 시대 이후에 조성된 상은 이상적인 양식이 사라지며 친밀감 있고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강우방, 한국 불교 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p.323
②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불좌상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의 대적광전에 모셔진 철로 만든 불상으로, 현재 대좌(臺座)와 광배(光背)를 잃고 불신(佛身)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불상의 왼팔 뒷면에 신라 헌안왕 2년(858) 무주장사(지금의 광주와 장흥)의 부관이었던 김수종이 시주하여 불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어서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달걀형의 얼굴에는 약간 살이 올라 있다. 오똑한 콧날, 굳게 다문 입 등에서 약간의 위엄을 느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소 추상화된 모습이다.
팽창된 체구와 가슴의 표현 등은 당당해 보이면서도 긴장감과 탄력성이 줄어들었고, 몸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손과 넓은 무릎은 불상의 전체적인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양어깨에 걸쳐 입은 옷은 가슴 앞에서 U자형으로 모아지며, 다시 두 팔에 걸쳐 무릎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옷주름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지만 탄력을 잃은 모습이다. 이런 형태의 표현은 신라 불상에서 보여주던 이상적인 조형감각이 후퇴하고 도식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9세기 후반 불상 양식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손은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 모양이다.
이 작품은 만든 연대가 확실하여 당시 유사한 비로자나불상의 계보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걸쳐 유행한 철로 만든 불상의 첫 번째 예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http://www.ocp.go.kr/
문화재청 홈페이지
III. 결 론
이상으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불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살펴 본 결과 삼국시대 때 각각 독자적으로 서로 닮기는 하나, 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의 불상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고구려는 백제나 신라에 비해 화려함이 많이 떨어져 보였으나, 백제와 신라는 화려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화려함은 더더욱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통일신라시대 8세기에 석굴암은 예술성과 과학성의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을 나 역시도 느낄 수가 있었다.
9세기에 들어서 철불이 제작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회기적이라고는 생각했으나, 그동안의 불상과는 사뭇 달라보였다. 오히려 내가 볼 때도 이 전의 불상들이 더 아름다워 보였고, 9세기의 불상은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 중국으로부터 불상 양식이 들어왔다고는 하나 중국 불상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불상은 아주 훌륭하게 발전되어 왔다고 느낀다.
조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신라의 불상에 비해 고구려나 백제의 불상은 찾기가 쉽지가 않았고, 어느 불상들은 그 제작 국가가 어딘지를 몰라 추정하는 것이 3개국이 모두 다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양식으로 본다면 어디지만 출토지를 보았을 때는 또 다른 어느 나라였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몇몇 불상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일본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럴 때 과거로 가서 이것이 정말 어느 나라의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가장 큰 반성 할 점은 시간이 촉박해 참고문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준비가 미비했던 것 같고, 나 자신으로 인해 다른 학우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바쁘게 준비해서 좀 힘이 들었지만 이 계기로 우리나라의 삼국과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을 나라별로, 시대별로 평소보다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약간이나마 뿌듯하다. 또한 아쉬운 점 역시 더욱 공부해야 하겠다는 자세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나 자신과 약속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원용, 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강우방, 한국 불교 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성낙주,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개마고원, 1999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ocp.go.kr/
http://myhome.naver.com/banya75/sukgulam/sukgulam4.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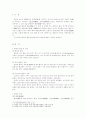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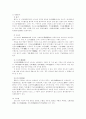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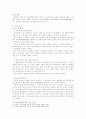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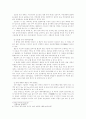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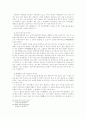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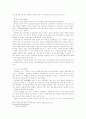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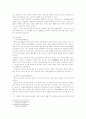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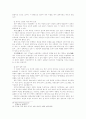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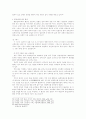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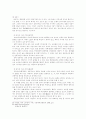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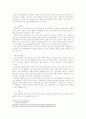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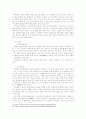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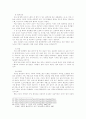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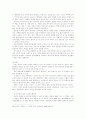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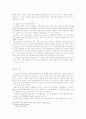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