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석기시대
(1) 구석기시대의 개관
(2) 자연환경
(3) 인류의 발달과 문화
(4) 사회
(5) 문화
(6) 유물과 유적
2. 중석기시대
(1) 중석기시대의 개관
(2) 유적
3. 신석기시대
(1) 신석기시대의 개관
(2) 자연환경
(3) 문화의 기원과 주민
(4) 문화
(5) 사냥
(6) 고기잡이
(7) 식물채집
4. 문화
(1) 집터
(2) 의식과 예술행위
(3) 신석기 유물
5. 고인돌
(1) 무덤형성의 의의
(2) 고인돌이란
(3) 우리나라 고인돌의 분포
(4) 한국 고인돌의 특징
(5) 옛 문헌에서의 고인돌 발견
(6) 지역적 특징
(7) 고인돌의 구조
(8) 고인돌의 유물
(9) 유물부장의 이유
(10) 고인돌의 설립배경
(11) 고인돌 시대의 사회
(1) 구석기시대의 개관
(2) 자연환경
(3) 인류의 발달과 문화
(4) 사회
(5) 문화
(6) 유물과 유적
2. 중석기시대
(1) 중석기시대의 개관
(2) 유적
3. 신석기시대
(1) 신석기시대의 개관
(2) 자연환경
(3) 문화의 기원과 주민
(4) 문화
(5) 사냥
(6) 고기잡이
(7) 식물채집
4. 문화
(1) 집터
(2) 의식과 예술행위
(3) 신석기 유물
5. 고인돌
(1) 무덤형성의 의의
(2) 고인돌이란
(3) 우리나라 고인돌의 분포
(4) 한국 고인돌의 특징
(5) 옛 문헌에서의 고인돌 발견
(6) 지역적 특징
(7) 고인돌의 구조
(8) 고인돌의 유물
(9) 유물부장의 이유
(10) 고인돌의 설립배경
(11) 고인돌 시대의 사회
본문내용
사해 준다.
(6) 지역적 특성
① 탁자식 고인돌 : 넓은 판석으로 된 무덤방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형식을, 판석 4매로 짜 맞춘 무덤방 위에 납작한 덮개돌이 올려진 것이다. 책상처럼 생겨서 탁자식이라 하고 주로 한강 이북부터 중국 요령지방까지 집중 분포되어 북방식으로도 불린다. 규모가 크고 선진적인 권력자가 출현한 고조선의 위치와 일치한다. 남쪽으로 올수록 분포 양상이 희박해지고, 덮개돌도 기반식과 같이 두터워지며 받침돌도 매우 낮아진다.
ex) 강화 부근리 탁자식(최대규모), 전북 고창 도산리 탁자식, 전남 나주 회진 고인돌
② 기반식 고인돌 : 판돌이나 깬 돌로 무덤방을 지하에 만들고, 그 주위에 받침돌 4~8개를 돌린 후 덮개돌을 올린 형식이다. 덮개돌은 괴석형태를 한 것이 많고, 무덤방과 덮개돌 사이에는 받침돌로 인한 공간이 있다. 바둑판처럼 생긴 탓에 기반식이라 하고 이 형태는 호남과 영남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남방식이라고 한다. 거의 무덤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집단의 공공 목적으로 건립된 제단과 같은 기념물로 본다.
ex) 전남 여수 적량동, 봉계동
③ 개석식 고인돌 : 판돌이나 깬 돌로 만들어진 무덤방이 지하에 있고, 덮개돌이 무덤방의 뚜껑 역할을 하는 형식이다. 이 형식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가장 보편적인 고인돌 형태로 요동반도, 한반도, 일본구주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④ 제주식 고인돌 : 무덤방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ex) 제주 용담동 4호 고인돌
=> 차이는 사회발전 정도와 지배자 권력의 규모와 범위가 달랐음을 의미하고 비파형 동검, 동모, 동촉 등 값비싼 청동기나 장신구 소유에 따라 신분차이가 난다.
(7) 고인돌의 구조
- 받침돌
- 묘역시설 무덤방 주위에 납작한 돌을 깔거나 작은 깬돌을 쌓아 무덤의 영역을 구회하고 무덤방을 덮개돌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이곳에서 토기 조각들이 흩어진 상태로 발견되는 것을 보아 고인돌을 축조한 후에도 지상에 드러나 있으며, 제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문답으로 엮은 한국고대사 산책-한국역사연구회 1994 , 고인돌 이야기- 이영문 지음 다지리 2001 p88-95
- 뚜껑돌
- 무덤방
- 바닥시설
(8) 고인돌의 유물
① 부장용 유물 : 무덤방 안에 넣어두며 무기류, 공헌토기류, 장신구류 등이 있다. 부장용은 유물의 형태가 완전한 것이 대부분이고, 죽은이가 소유했거나 그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것을 주검과 함께 무덤방에 넣어준 유물이다.
ex) 무기류(석기) : 간돌검, 간돌화살촉/ 무기류(청동기) : 비파형동검/ 고헌토기 : 붉은간토기, 가지문토기/ 장신구 : 천하석제 곱은옥, 벽옥제 대롱옥, 환옥, 소옥
② 의례용 유물 :무덤방 주위나 묘역시설에 발견되고 죽은이를 애도하는 의미의 장송용, 제사와 관련된 제의용, 생활용 유물이 있다. 의례용 유물은 죽은이에 대한 애도의 뜻이거나 의례행위의 소산물이다. 실제 석기를 깨서 주위에 던지거나, 토기편을 뿌린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당시 장송의례가 성행하였던 것으로 본다.
(9) 유물 부장의 이유
① 지위와 권위의 상징 : 무기류는 현세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과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 청동기시대의 무기는 유력한 소수집단의 지배자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ex) 간돌검, 청동검, 비파형 동검
② 내세관(來世觀)과 조영관(祖靈觀)을 반영 : 간돌검을 세워두고 이를 향해 기원하는 것은 죽은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미와 살았을 당시의 사회적 권위와 신분을 죽은 후에도 누리라는 염원에서 주검 곁에 넣어둔다. 죽은 후의 내세관을 엿볼 수 있으며 장신구인 옥을 통해서도 자기 조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
③ 재생(再生)과 부활(復活)의 의미 : 붉은 간토기를 통해 현생과 내세를 연결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갖도록 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사용되었다.
(10) 고인돌 설립배경
① 거석이 지니는 신앙 : 당시의 사람들은 거목이나 거석에 대한 숭배는 자연발생적이었고 영원불멸한 자연에 대한 숭배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징성과 의미를 지닌 바위를 이용하여 만든 고인돌은 죽은 이의 혼령이 안식하는 곳이자, 죽은 이의 혼령이 끼칠지도 모를 위해(危害)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또 영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사회적인 배경 : 고인돌은 벼농사를 위시한 농경사회, 일정한 영역권이 형성된 정착생활,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집단의 의례 행위로 축조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생계자원의 전제가 되는 농경지의 확보가 우선되고 더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집단 간의 경쟁이 불가피했는데 종족간의 영역 설정이 요구되고, 이 영역의 점유표시로서 고인돌을 축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11) 고인돌 시대의 사회
① 집단 간의 갈등 심화 : 고인돌 축조 과정에서 거석을 채석하여 운반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는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는 정착 생활이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의 농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농경지의 확대에 따른 집단 간의 경쟁이 점차 심하게 되어 공동체간의 영역 설정이 요구되며 이 영역의 점유 표시로서 조상 무덤인 고인돌을 축조하게 되었다.
② 전문인의 존재와 교역 : 전문 집단이 존재하고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는데 전문인은 특수한 기술적인 능력의 소유자이며, 지배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분의 소유자이다. 지배층의 부장유물은 숙련된 전문인에 의해 제작되어졌다고 보고,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집단 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지배집단의 출현 : 고인돌 군집 안에서의 집단의 규모나 축조 기간에 따라 세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조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력한 집단이나 신분의 소유자가 존재했다고 본다. 그리고 각 묘역간의 차이는 집단 간의 성격 차이를 보여주고 더욱 다양하고 뚜렷한 유물을 소유한 집단의 존재는 집단 간의 전문화 또는 신분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6) 지역적 특성
① 탁자식 고인돌 : 넓은 판석으로 된 무덤방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형식을, 판석 4매로 짜 맞춘 무덤방 위에 납작한 덮개돌이 올려진 것이다. 책상처럼 생겨서 탁자식이라 하고 주로 한강 이북부터 중국 요령지방까지 집중 분포되어 북방식으로도 불린다. 규모가 크고 선진적인 권력자가 출현한 고조선의 위치와 일치한다. 남쪽으로 올수록 분포 양상이 희박해지고, 덮개돌도 기반식과 같이 두터워지며 받침돌도 매우 낮아진다.
ex) 강화 부근리 탁자식(최대규모), 전북 고창 도산리 탁자식, 전남 나주 회진 고인돌
② 기반식 고인돌 : 판돌이나 깬 돌로 무덤방을 지하에 만들고, 그 주위에 받침돌 4~8개를 돌린 후 덮개돌을 올린 형식이다. 덮개돌은 괴석형태를 한 것이 많고, 무덤방과 덮개돌 사이에는 받침돌로 인한 공간이 있다. 바둑판처럼 생긴 탓에 기반식이라 하고 이 형태는 호남과 영남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남방식이라고 한다. 거의 무덤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집단의 공공 목적으로 건립된 제단과 같은 기념물로 본다.
ex) 전남 여수 적량동, 봉계동
③ 개석식 고인돌 : 판돌이나 깬 돌로 만들어진 무덤방이 지하에 있고, 덮개돌이 무덤방의 뚜껑 역할을 하는 형식이다. 이 형식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가장 보편적인 고인돌 형태로 요동반도, 한반도, 일본구주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④ 제주식 고인돌 : 무덤방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ex) 제주 용담동 4호 고인돌
=> 차이는 사회발전 정도와 지배자 권력의 규모와 범위가 달랐음을 의미하고 비파형 동검, 동모, 동촉 등 값비싼 청동기나 장신구 소유에 따라 신분차이가 난다.
(7) 고인돌의 구조
- 받침돌
- 묘역시설 무덤방 주위에 납작한 돌을 깔거나 작은 깬돌을 쌓아 무덤의 영역을 구회하고 무덤방을 덮개돌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이곳에서 토기 조각들이 흩어진 상태로 발견되는 것을 보아 고인돌을 축조한 후에도 지상에 드러나 있으며, 제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문답으로 엮은 한국고대사 산책-한국역사연구회 1994 , 고인돌 이야기- 이영문 지음 다지리 2001 p88-95
- 뚜껑돌
- 무덤방
- 바닥시설
(8) 고인돌의 유물
① 부장용 유물 : 무덤방 안에 넣어두며 무기류, 공헌토기류, 장신구류 등이 있다. 부장용은 유물의 형태가 완전한 것이 대부분이고, 죽은이가 소유했거나 그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것을 주검과 함께 무덤방에 넣어준 유물이다.
ex) 무기류(석기) : 간돌검, 간돌화살촉/ 무기류(청동기) : 비파형동검/ 고헌토기 : 붉은간토기, 가지문토기/ 장신구 : 천하석제 곱은옥, 벽옥제 대롱옥, 환옥, 소옥
② 의례용 유물 :무덤방 주위나 묘역시설에 발견되고 죽은이를 애도하는 의미의 장송용, 제사와 관련된 제의용, 생활용 유물이 있다. 의례용 유물은 죽은이에 대한 애도의 뜻이거나 의례행위의 소산물이다. 실제 석기를 깨서 주위에 던지거나, 토기편을 뿌린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당시 장송의례가 성행하였던 것으로 본다.
(9) 유물 부장의 이유
① 지위와 권위의 상징 : 무기류는 현세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과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 청동기시대의 무기는 유력한 소수집단의 지배자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ex) 간돌검, 청동검, 비파형 동검
② 내세관(來世觀)과 조영관(祖靈觀)을 반영 : 간돌검을 세워두고 이를 향해 기원하는 것은 죽은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미와 살았을 당시의 사회적 권위와 신분을 죽은 후에도 누리라는 염원에서 주검 곁에 넣어둔다. 죽은 후의 내세관을 엿볼 수 있으며 장신구인 옥을 통해서도 자기 조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
③ 재생(再生)과 부활(復活)의 의미 : 붉은 간토기를 통해 현생과 내세를 연결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갖도록 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사용되었다.
(10) 고인돌 설립배경
① 거석이 지니는 신앙 : 당시의 사람들은 거목이나 거석에 대한 숭배는 자연발생적이었고 영원불멸한 자연에 대한 숭배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징성과 의미를 지닌 바위를 이용하여 만든 고인돌은 죽은 이의 혼령이 안식하는 곳이자, 죽은 이의 혼령이 끼칠지도 모를 위해(危害)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또 영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사회적인 배경 : 고인돌은 벼농사를 위시한 농경사회, 일정한 영역권이 형성된 정착생활,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집단의 의례 행위로 축조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생계자원의 전제가 되는 농경지의 확보가 우선되고 더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집단 간의 경쟁이 불가피했는데 종족간의 영역 설정이 요구되고, 이 영역의 점유표시로서 고인돌을 축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11) 고인돌 시대의 사회
① 집단 간의 갈등 심화 : 고인돌 축조 과정에서 거석을 채석하여 운반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는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는 정착 생활이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의 농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농경지의 확대에 따른 집단 간의 경쟁이 점차 심하게 되어 공동체간의 영역 설정이 요구되며 이 영역의 점유 표시로서 조상 무덤인 고인돌을 축조하게 되었다.
② 전문인의 존재와 교역 : 전문 집단이 존재하고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는데 전문인은 특수한 기술적인 능력의 소유자이며, 지배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분의 소유자이다. 지배층의 부장유물은 숙련된 전문인에 의해 제작되어졌다고 보고,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집단 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지배집단의 출현 : 고인돌 군집 안에서의 집단의 규모나 축조 기간에 따라 세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조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력한 집단이나 신분의 소유자가 존재했다고 본다. 그리고 각 묘역간의 차이는 집단 간의 성격 차이를 보여주고 더욱 다양하고 뚜렷한 유물을 소유한 집단의 존재는 집단 간의 전문화 또는 신분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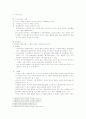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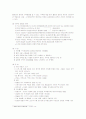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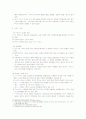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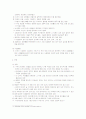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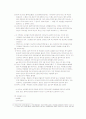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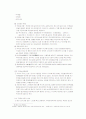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