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삼국사기》초기 기록의 문제점
2) 성립
(1) 사로 6촌의 위치와 성격
(2) 사로국의 형성
3) 발전
(1) 내부체제의 정비
(2) 복속 소국에 대한 통제의 강화
1)《삼국사기》초기 기록의 문제점
2) 성립
(1) 사로 6촌의 위치와 성격
(2) 사로국의 형성
3) 발전
(1) 내부체제의 정비
(2) 복속 소국에 대한 통제의 강화
본문내용
국이나 압독국의 경우처럼 무력을 사용한 정벌을 행하고 그 餘衆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극단적인 방법도 동원되었겠지만, 이 경우에도 徒民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일부 반란의 주동자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押督國의 故地인 慶山 林堂洞 古墳에서 5세기대의 금동관이 출토되는 것은 압독국의 지배세력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동관들은 대개 5세기를 경계로 해서 그 이전의 것을 古式, 그 이후의 것을 出字形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5세기 이후에 발견되는 금동관들 중 경주에 가까운 경상북도 지역의 것들은 대개 출자형으로 형식이 통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 진한 맹주국이었던 신라가 그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던 정치세력에게 금동관을 분배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 보는 견해와 그러한 金工品을 생산하는「工人集團」을 신라세력이 직접 통제. 장악한 결과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어쨋든 5세기대의 금동관이 경북지역 각지에서 출토된다는 사실은 이 때까지 경상북도 각지의 진한계 소국들이 그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압독국의 故地라 생각되는 경산군 임당동의 고분에서 5세기의 금동관이 출토되는 것을 보면, 위의 사료 B-②. C-②. C-③에서 보듯이 파사니사금대와 지마니사금대에 복속된 압독국이 일성니사금 13년(146)에 반란을 일으키자 그 세력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 餘衆을 남쪽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압독국의 지배계층은 5세기까지 그 세력을 온존하고 있음을 아 수 있는 것이다.
첨해니사금대의 達伐城의 축조는 사로국과 비산-내당동 세력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달벌성의 위치는 대구지방으로 비정되는데, 그 명칭으로 보아 지금의 達成임에 틀림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비산-내당동지역의 고분군은 바로 달성과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여기에서 첨해니사금대에 달벌성을 쌓고 柰麻 克宗을 城主로 삼았다는 것을 지방관의 파견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5세기까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여 상당한 규모의 석실묘를 축조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지역에 3세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克宗은 사로국의 인물이 아니라 대구지역의 인물, 즉 비산-내당동지역의 다벌국 국읍의 主師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 3세기 중엽의 달벌성의 축조는 이 지역에서 비산-내당동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누르고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로국의 입장에서는 진한연맹체의 방위를 위해 변경지역의 축성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국내의 특정한 세력과 결탁함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산동의 석실묘에서 발견된 금동관의 존재는 다벌국의 지배계층이 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이들이 사로국과의 관계를 통해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복속 초기의 조공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 복속된 소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로국이 취한 증동적인 조치 중 가장 이름 시기부터 나타나는 것이 왕의 巡幸이다. 지방관의 파견이 불가능했던 당시로는 왕이 직접 복속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배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의 왕의 순행에는 적지 않은 臣僚와 군대가 수행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러한 순행은 일종의 무력의 시위라는 성격도 있었을 것이다. 또 비슷한 시기의 기록에 散見되는 閱兵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지방에 대한 통치가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정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확보한 지역을 수시로 순행함으로써 새로이 복속한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복속민에 대한 민심수습을 꾀하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순행을 통하여 사로국의 왕이 복속된 소국의 지배자임을 과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에게 하나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국가의식을 주입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파사니사금대에는 使臣을 10道에 나누어 보냈다는 기록이 두 차례 보이는데, 여기서 10도가 어떤 종류의 행정구역인지 아니면 도로망을 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지방관의 부재를 증명하는 동시에 그러한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금동관들은 대개 5세기를 경계로 해서 그 이전의 것을 古式, 그 이후의 것을 出字形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5세기 이후에 발견되는 금동관들 중 경주에 가까운 경상북도 지역의 것들은 대개 출자형으로 형식이 통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 진한 맹주국이었던 신라가 그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던 정치세력에게 금동관을 분배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 보는 견해와 그러한 金工品을 생산하는「工人集團」을 신라세력이 직접 통제. 장악한 결과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어쨋든 5세기대의 금동관이 경북지역 각지에서 출토된다는 사실은 이 때까지 경상북도 각지의 진한계 소국들이 그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압독국의 故地라 생각되는 경산군 임당동의 고분에서 5세기의 금동관이 출토되는 것을 보면, 위의 사료 B-②. C-②. C-③에서 보듯이 파사니사금대와 지마니사금대에 복속된 압독국이 일성니사금 13년(146)에 반란을 일으키자 그 세력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 餘衆을 남쪽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압독국의 지배계층은 5세기까지 그 세력을 온존하고 있음을 아 수 있는 것이다.
첨해니사금대의 達伐城의 축조는 사로국과 비산-내당동 세력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달벌성의 위치는 대구지방으로 비정되는데, 그 명칭으로 보아 지금의 達成임에 틀림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비산-내당동지역의 고분군은 바로 달성과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여기에서 첨해니사금대에 달벌성을 쌓고 柰麻 克宗을 城主로 삼았다는 것을 지방관의 파견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5세기까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여 상당한 규모의 석실묘를 축조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지역에 3세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克宗은 사로국의 인물이 아니라 대구지역의 인물, 즉 비산-내당동지역의 다벌국 국읍의 主師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 3세기 중엽의 달벌성의 축조는 이 지역에서 비산-내당동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누르고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로국의 입장에서는 진한연맹체의 방위를 위해 변경지역의 축성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국내의 특정한 세력과 결탁함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산동의 석실묘에서 발견된 금동관의 존재는 다벌국의 지배계층이 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이들이 사로국과의 관계를 통해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복속 초기의 조공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 복속된 소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로국이 취한 증동적인 조치 중 가장 이름 시기부터 나타나는 것이 왕의 巡幸이다. 지방관의 파견이 불가능했던 당시로는 왕이 직접 복속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배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의 왕의 순행에는 적지 않은 臣僚와 군대가 수행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러한 순행은 일종의 무력의 시위라는 성격도 있었을 것이다. 또 비슷한 시기의 기록에 散見되는 閱兵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지방에 대한 통치가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정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확보한 지역을 수시로 순행함으로써 새로이 복속한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복속민에 대한 민심수습을 꾀하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순행을 통하여 사로국의 왕이 복속된 소국의 지배자임을 과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에게 하나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국가의식을 주입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파사니사금대에는 使臣을 10道에 나누어 보냈다는 기록이 두 차례 보이는데, 여기서 10도가 어떤 종류의 행정구역인지 아니면 도로망을 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지방관의 부재를 증명하는 동시에 그러한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추천자료
 한국기업의외국인채용의현황과문제점
한국기업의외국인채용의현황과문제점 [한국사 고려시대]고려초기의 왕권강화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사 고려시대]고려초기의 왕권강화 정책에 대한 고찰 교육의역사와발전정리
교육의역사와발전정리 [중소기업][대기업][환경변화][협력][비교][중소기업과 대기업 발전 전망][기업경영]중소기업...
[중소기업][대기업][환경변화][협력][비교][중소기업과 대기업 발전 전망][기업경영]중소기업... 인물을 위주로 알아본 신라 유교의 고찰
인물을 위주로 알아본 신라 유교의 고찰 [장례식][상복][장례방법][장묘][화장][장례문화 문제점][전통장례식과 현대장례식 비교][장...
[장례식][상복][장례방법][장묘][화장][장례문화 문제점][전통장례식과 현대장례식 비교][장... [복식문화][의복문화]삼국시대의 복식문화(의복문화), 통일신라시대의 복식문화(의복문화), ...
[복식문화][의복문화]삼국시대의 복식문화(의복문화), 통일신라시대의 복식문화(의복문화), ... [보험][농작물재해보험][보험의 원리][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보험의 종류, 보험의 원리, ...
[보험][농작물재해보험][보험의 원리][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보험의 종류, 보험의 원리, ... 부산아이파크의 문제점 분석과 전략 방안
부산아이파크의 문제점 분석과 전략 방안 경상북도발전방안,지역발전
경상북도발전방안,지역발전 [일본영화, 일본, 영화, 일본영화 형식과 발전과정, 일본영화 시대적 흐름, 일본영화 대표감...
[일본영화, 일본, 영화, 일본영화 형식과 발전과정, 일본영화 시대적 흐름, 일본영화 대표감... [언어발달검사] 언어학습능력 진단검사(ITPA), 피바디 그림어휘검사(피바디 그림어휘력검사),...
[언어발달검사] 언어학습능력 진단검사(ITPA), 피바디 그림어휘검사(피바디 그림어휘력검사),... [세계 호텔산업의 역사] 숙박산업의 역사적 배경, 근대 호텔산업의 발전(유럽과 미국의 호텔...
[세계 호텔산업의 역사] 숙박산업의 역사적 배경, 근대 호텔산업의 발전(유럽과 미국의 호텔... 2017년 2학기 한국복식문화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공복제도)
2017년 2학기 한국복식문화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공복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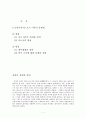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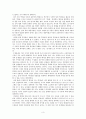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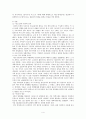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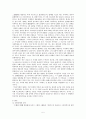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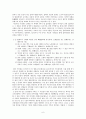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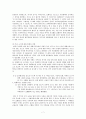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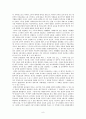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