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게 보존될 수가 있었다.
《고려사》에는 당시 최씨정권의 집권자들인 최이(崔怡)와 최항(崔沆) 부자와 함께 정안이 대장경 조판 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종 42(1255)년 국왕은 대장경판 조성에 최이 부자가 세운 공로를 기리는 조서를 내렸는데, 그에 따르면 최이는 사재를 기울여 대장경을 거의 절반이나 조판하였고, 최항도 재산을 시주하고 대장경판조판을 마무리하는 일을 감독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안도 사재를 내어 대장경조판의 절반가량을 조판할 것을 약속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모든 비용을 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경판의 맨 끝부분을 보면 대개 한 명에서 십여 명에 이르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경판을 만들거나 새기는 데 재산을 시주한 사람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의 예만 보면,《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권 3의 맨 끝장(제34장)에는 천태산인(天台山人) 요원(了源)이 “이 공덕의 힘에 의지하여 영원히 윤회의 과보를 벗어나고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극락향(極樂鄕)에 편안히 살게 되옵소서!”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여신도 김씨가 부모를 위해서’ 라든지, ‘사미 백우가 부모를 위해서’ 등등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미루어 재가신자들과 승려들이 발원하며 경판을 시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장경판을 조판하는 데 관리로부터 지식인, 승려, 사녀(士女), 일반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인물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팔만대장경은 몽고군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국가적 사업의 산물인 동시에 국가와 개인적인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고려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문화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목판인쇄기술의 최종 목표는 금속활자의 발명에 있었다. 왜냐하면 금속활자의 발명은 인쇄술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권의 책을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책과 정보의 전달을 손쉽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금속활자 인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깨끗한 종이와 인쇄에 적합한 먹, 금속 활자의 주조 기술 등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려는 뛰어나고 다양한 한지를 송나라 등 해외로 수출해 명성을 얻은 바 있었고, 고려의 먹 하면 송의 선비들도 기회만 되면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구입하고 애지중지 보관하며 아끼어 쓰던 명품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게다가 신라 이래로 합금술과 금속 주조술이 발달한 결과 고려시대에는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수준에 올라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발명할 수 있게 된 듯하다.
역사상 가장 먼저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알려진 책은 서기 1234년에 강화도에서 인쇄된 여덟 부의 《고금상정예문》으로 , 당시 집권자 최우가 서문을 쓰고 최윤의가 지은 예법서였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책은 서양 금속활자 인쇄술의 선구자라 일컬어지는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서 인쇄된 것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은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직지심경이다. 이 책은 우왕 3년인 1377년에 충북 청주에 있던 흥덕사란 절에서 인쇄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고려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속활자 인쇄 기술을 발명하고 고려 상감청자란 당시 최첨단의 공예 기술을 발명하여 세계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룩했던 경험은 20세기 후반의 불과 40년 의 기간에 세계적인 철강과 조선국으로 거듭나고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휴대 전화기의 강국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려사》에는 당시 최씨정권의 집권자들인 최이(崔怡)와 최항(崔沆) 부자와 함께 정안이 대장경 조판 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종 42(1255)년 국왕은 대장경판 조성에 최이 부자가 세운 공로를 기리는 조서를 내렸는데, 그에 따르면 최이는 사재를 기울여 대장경을 거의 절반이나 조판하였고, 최항도 재산을 시주하고 대장경판조판을 마무리하는 일을 감독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안도 사재를 내어 대장경조판의 절반가량을 조판할 것을 약속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모든 비용을 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경판의 맨 끝부분을 보면 대개 한 명에서 십여 명에 이르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경판을 만들거나 새기는 데 재산을 시주한 사람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의 예만 보면,《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권 3의 맨 끝장(제34장)에는 천태산인(天台山人) 요원(了源)이 “이 공덕의 힘에 의지하여 영원히 윤회의 과보를 벗어나고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극락향(極樂鄕)에 편안히 살게 되옵소서!”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여신도 김씨가 부모를 위해서’ 라든지, ‘사미 백우가 부모를 위해서’ 등등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미루어 재가신자들과 승려들이 발원하며 경판을 시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장경판을 조판하는 데 관리로부터 지식인, 승려, 사녀(士女), 일반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인물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팔만대장경은 몽고군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국가적 사업의 산물인 동시에 국가와 개인적인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고려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문화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목판인쇄기술의 최종 목표는 금속활자의 발명에 있었다. 왜냐하면 금속활자의 발명은 인쇄술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권의 책을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책과 정보의 전달을 손쉽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금속활자 인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깨끗한 종이와 인쇄에 적합한 먹, 금속 활자의 주조 기술 등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려는 뛰어나고 다양한 한지를 송나라 등 해외로 수출해 명성을 얻은 바 있었고, 고려의 먹 하면 송의 선비들도 기회만 되면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구입하고 애지중지 보관하며 아끼어 쓰던 명품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게다가 신라 이래로 합금술과 금속 주조술이 발달한 결과 고려시대에는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수준에 올라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발명할 수 있게 된 듯하다.
역사상 가장 먼저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알려진 책은 서기 1234년에 강화도에서 인쇄된 여덟 부의 《고금상정예문》으로 , 당시 집권자 최우가 서문을 쓰고 최윤의가 지은 예법서였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책은 서양 금속활자 인쇄술의 선구자라 일컬어지는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서 인쇄된 것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은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직지심경이다. 이 책은 우왕 3년인 1377년에 충북 청주에 있던 흥덕사란 절에서 인쇄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고려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속활자 인쇄 기술을 발명하고 고려 상감청자란 당시 최첨단의 공예 기술을 발명하여 세계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룩했던 경험은 20세기 후반의 불과 40년 의 기간에 세계적인 철강과 조선국으로 거듭나고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휴대 전화기의 강국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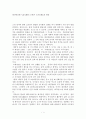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