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칠불암
칠불암 마애삼존불
칠불암 사방불
신선암 마애보살상
칠불암 마애삼존불
칠불암 사방불
신선암 마애보살상
본문내용
어깨 위에 보기 좋게 드려져 있다. 살결이 풍성한 둥근 얼굴에는 하현달 모양으로 패어진 고운 눈썹에 연결되어 갸름한 코가 알맞은 맵시로 솟아있다. 넓은 눈시울 아래 긴 눈이 가늘게 새겨져 있고 그 아래로 부드럽게 언덕을 이룬 두 뺨과 큰 턱이 어울려 둥글고 풍성한 덕성스러운 얼굴을 형성하고 있다. 이 얼굴에서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입의 표정이라 하겠다. 신라의 보살들은 대개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감싸는 듯 표현되고 입술 양가가 패어져 이지적인 미소가 나타나는데 비해 이 보살의 얼굴에는 그것이 없고 윗입술 보다 아랫입술이 더 크게 표현되어 누구에게나 정다움을 느끼게 하는 낯익은 얼굴이다. 두 귀에는 화려한 귀고리가 달려 있고 목에는 구슬 목걸이가 걸려있다. 두 어깨 위에는 연꽃송이로 장식된 수발(垂髮)이 덮여져 있는데 수발에 연꽃을 장식한 것은 다른 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예이다.
오른손에는 화려한 보상화 당초(唐草) 무늬의 주제로 사용된 오판화(五瓣花). 불교에서 이상화한 꽃임.
가지를 들었고 왼손은 설법인을 표시하여 왼쪽 가슴에 들었는데 다정하고 부드러운 얼굴의 표정은 다시 이 손에 반복되고 있다. 중지와 넷째 손가락을 굽혀 엄지와 마주잡고 둘째와 셋째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여 들었는데, 손가락들의 변화도 다양하지만 맑은 피가 도는 듯 따스함을 느끼게 한 조각 수법도 재치스럽다. 손목에는 팔찌가 끼어 있으며 손과 손 사이로 승기지(僧祇支)자락이 보인다. 허리에는 치마끈이 매여지고 그 자락이 의자 위로 흘러내렸는데 왼쪽 발을 그 자락 위에 편안히 얹어놓고 오른발은 의자 아래로 내려 걸터앉아 있다. 구름 속에서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나와 드려진 오른발을 받들고 있다.
이 보살이 걸터앉은 자세를 반가상이라 부르는 이들이 많은데 틀린 말이다. 반가상이란 결가부좌의 자세에서 한 발을 풀어놓은 상을 말하는데 이 보살의 왼쪽 발은 의자 위에 얹혀 있을 뿐 무릎 위에 얹혀져 있지 않다. 결가(結跏)를 모두 풀어놓은 자세이니 부처의 이러한 앉음자세를 유희좌(遊戱坐)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보살은 부담없는 자세로 편안히 앉아서 인간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면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
이 보살의 어깨에 걸쳐진 천의의 표현이 재미있다. 두 어깨에서 흘러내려 두 팔목에 걸쳐 힘차게 흘러내리다가 두 무릎 아래서 감돌아 다시 무릎 위로 올라간다. 무릎 위로 올라갔던 천의 자락은 의자의 양가로 흘러내려 구름으로 융화되어 사라져버리니, 보살의 몸체를 감고 도는 율동감은 오묘하고 신비롭다. 몸체 뒤에는 무지개 모양으로 신광이 나타나 있고 머리 뒤에는 달무리 같이 둥근 두광이 부드럽게 어려 있다. 패어진 얇은 감실은 그대로 주형광배(舟形光背)이니 어느 것 하나 재치있게 표현되지 않은 것이 없다.
광배 위에는 너비 8.2cm 길이 127cm 되는 홈이 일직선으로 가로 패어져 있는데 이 곳은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차양(遮陽)을 달았던 자리로 짐작된다. 차양홈 위에 또 차양과 삼각으로 홈이 패어져 있는데, 이 홈은 바위 위에서 흘러오는 물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석등 자리에서 정상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널찍한 큰 바위가 가로놓여 있는데, 그 위에 돌축대로 보충하여 5m×3m 되는 평지를 만들어 앞뜰을 삼고 다시 1.25m 높이의 돌축대를 쌓아 7.8m×8m 되는 넓이의 건축터를 마련하였다. 칠불암 사원에 예속된 암자로 짐작되는데 근래에까지 이곳에 신선암(神仙庵)이라는 암자가 있었으므로 이 보살상을 신선암 마애불로 부르고 있으나, 신라 때에는 무슨 절 무슨 불상이라 불렀는지 알 길이 없다.
참고문헌]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겨레의땅 부처님의 땅,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오른손에는 화려한 보상화 당초(唐草) 무늬의 주제로 사용된 오판화(五瓣花). 불교에서 이상화한 꽃임.
가지를 들었고 왼손은 설법인을 표시하여 왼쪽 가슴에 들었는데 다정하고 부드러운 얼굴의 표정은 다시 이 손에 반복되고 있다. 중지와 넷째 손가락을 굽혀 엄지와 마주잡고 둘째와 셋째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여 들었는데, 손가락들의 변화도 다양하지만 맑은 피가 도는 듯 따스함을 느끼게 한 조각 수법도 재치스럽다. 손목에는 팔찌가 끼어 있으며 손과 손 사이로 승기지(僧祇支)자락이 보인다. 허리에는 치마끈이 매여지고 그 자락이 의자 위로 흘러내렸는데 왼쪽 발을 그 자락 위에 편안히 얹어놓고 오른발은 의자 아래로 내려 걸터앉아 있다. 구름 속에서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나와 드려진 오른발을 받들고 있다.
이 보살이 걸터앉은 자세를 반가상이라 부르는 이들이 많은데 틀린 말이다. 반가상이란 결가부좌의 자세에서 한 발을 풀어놓은 상을 말하는데 이 보살의 왼쪽 발은 의자 위에 얹혀 있을 뿐 무릎 위에 얹혀져 있지 않다. 결가(結跏)를 모두 풀어놓은 자세이니 부처의 이러한 앉음자세를 유희좌(遊戱坐)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보살은 부담없는 자세로 편안히 앉아서 인간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면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
이 보살의 어깨에 걸쳐진 천의의 표현이 재미있다. 두 어깨에서 흘러내려 두 팔목에 걸쳐 힘차게 흘러내리다가 두 무릎 아래서 감돌아 다시 무릎 위로 올라간다. 무릎 위로 올라갔던 천의 자락은 의자의 양가로 흘러내려 구름으로 융화되어 사라져버리니, 보살의 몸체를 감고 도는 율동감은 오묘하고 신비롭다. 몸체 뒤에는 무지개 모양으로 신광이 나타나 있고 머리 뒤에는 달무리 같이 둥근 두광이 부드럽게 어려 있다. 패어진 얇은 감실은 그대로 주형광배(舟形光背)이니 어느 것 하나 재치있게 표현되지 않은 것이 없다.
광배 위에는 너비 8.2cm 길이 127cm 되는 홈이 일직선으로 가로 패어져 있는데 이 곳은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차양(遮陽)을 달았던 자리로 짐작된다. 차양홈 위에 또 차양과 삼각으로 홈이 패어져 있는데, 이 홈은 바위 위에서 흘러오는 물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석등 자리에서 정상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널찍한 큰 바위가 가로놓여 있는데, 그 위에 돌축대로 보충하여 5m×3m 되는 평지를 만들어 앞뜰을 삼고 다시 1.25m 높이의 돌축대를 쌓아 7.8m×8m 되는 넓이의 건축터를 마련하였다. 칠불암 사원에 예속된 암자로 짐작되는데 근래에까지 이곳에 신선암(神仙庵)이라는 암자가 있었으므로 이 보살상을 신선암 마애불로 부르고 있으나, 신라 때에는 무슨 절 무슨 불상이라 불렀는지 알 길이 없다.
참고문헌]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겨레의땅 부처님의 땅, 두산세계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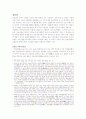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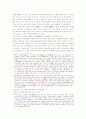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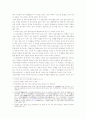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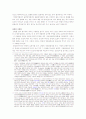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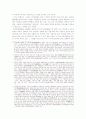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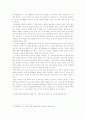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