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 꼬마 거인의 비어있는 정신
<본 론>
1. 숭고란 무엇인가
(1) 롱기누스의 숭고의 개념
(2) 칸트의 숭고의 개념
2. 숭고를 찾아 헤매던 언어들
(1) 해방이전의 시
(2) 해방이후의 시
3. 2005년, 우리에게 숭고는 무엇인가
(1) 자신의 슬픔을 찾는 시
(2) 타자의 슬픔과 만나는 시
<나 오 며> - 너의 슬픔과 대면하는 시의 숭고
<본 론>
1. 숭고란 무엇인가
(1) 롱기누스의 숭고의 개념
(2) 칸트의 숭고의 개념
2. 숭고를 찾아 헤매던 언어들
(1) 해방이전의 시
(2) 해방이후의 시
3. 2005년, 우리에게 숭고는 무엇인가
(1) 자신의 슬픔을 찾는 시
(2) 타자의 슬픔과 만나는 시
<나 오 며> - 너의 슬픔과 대면하는 시의 숭고
본문내용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을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이성부 <벼> <百濟行> 이성부 시집. 22p
벼는 서로 기대고 사는 민중이 되었다. 민중은 피흘리는 존재다. 그러나 넉넉한 힘을 가진 존재다. 그 힘은 슬픔의 힘이 분명하다. 시인은 슬픔의 힘을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게 표출한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묻음 그리움 이 넉넉한 힘” 계속 해서 쓰러지고 피 흘리는 민중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함께 할 때에만 그 힘을 알 수 있다. 그 힘은 정신의 크기이고 곧 높은 진짜 숭고이다.
서울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올해에 자주 볼 수 있었다. 그 농사가 생(生)에 마지막 농사가 된 농민도 있었다. 세계화 시대에 더 큰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소시민들이 대부분이 되어 이제 한 사람의 목숨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민중은 없어지고 시민만 남은 것이다. 게다가 시민은 국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글쟁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숭고의 글쓰기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아픔과 만나야 한다. 타고난 정신의 크기가 있으면 그러할 것이고 강렬한 파토스가 정신의 크기를 안내할 것이다. 후천적인 숭고는 쓰면서 익혀야 한다. 정신이 부자인 시인은 결코 가난할 수 없다.
시 한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됫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함민복 <긍정적인 밥>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함민복 시집 62p
시는 편리한 도구다. 사람들 지나다니는 큰길가에 똥을 싸놓고는 사람들이 나무라면 똥도 예술이라 주장하면 된다.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김상봉 226p
현대 사회에 시인은 똥을 싸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원태연 <그냥 좋은 것> 어느 인터넷 사이트
부끄럽게도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시중에 하나인 이 시는 ‘똥’이다. 아무렇게나 쓰고 나서 예술이라고 서점에 진열되는 ‘똥’ 반(反)지성주의에 젖은 젊은이들은 안 읽는 게 나을 이런 시를 읽고 다닌다. 정신의 크기와 파토스는 정말 설 자리가 없는 것일까.
더 이상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 시대의 부조리에 날카로운 칼끝을 대는 시인을 세상은 기대하지 않는다. 문학의 지형을 소설에게 내주고 팔리지도 않는 시집은 꾸역꾸역 출판된다. 모든 독자는 시인이고 시인 스스로가 독자가 된다. 스스로 귀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양 철학이 빠져있는 나르시스의 꿈에서 빠져 침을 질질 흘리며 편한 세월 보내고 있다. 시의 위기다. 큰 위기다.
<나 오 며> - 만남을 꿈꾸는 詩
우리는 만나야 한다. 시가 사람들을 만나 슬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시의 예술성을 포기하고 대중문화의 천박함으로 매몰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의 비극을 다루며 자기연민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시. 그러나 거대한 슬픔의 뿌리를 찾아 번득이는 시안(詩眼)을 가지고 대면(對面)하는 시. 위대하고 고결한 정신과 열정을 가진 시가 시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풀> <김수영 다시 읽기> 김승희 편. 106p
우리는 이제까지 롱기누스와 칸트의 안내에 따라 숭고를 알아보고 한국 현대시에서 숭고를 찾는 여행을 했다. 큰 정신과 열정을 담은 시도 있었고 거짓된 숭고를 숭고라 말하는 시도 있었고 똥 같은 시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다룬 시들을 가지고 숭고를 찾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우리가 배우고 사유한 숭고는 서양의 개념에 가깝지 아직 완연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과연 숭고의 글쓰기가 가능할까? 오늘날의 인간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신적인 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 과거에는 자연이 인간을 압도하는 숭고한 현상이었지만 오늘날은 인간이 오히려 자연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더구나 자본주의적 산문성에 묻혀 사는 현대인의 정신은 고대인과 달리 너무나 냉정하고, 게다가 오늘날과 같은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숭고의 도덕적 바탕을 이루는 귀족주의적 이상은 별로 적합해 보이지도 않는다. <앙겔루스 노부스> 진중권. 85p
그러나 숭고의 글쓰기는 필요하다. 그리고 숭고의 글쓰기는 우리에게 있어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 슬픔에서 비롯되는 숭고, 슬픔이 슬픔과 만나 삶의 진실을 밝히는 숭고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산문성에 젖어 경직되고 대중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마지막 남은 예술의 존재 미학으로서 숭고의 절실함은 존재한다.
마치 풀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듯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우리를 보듬을 시를 기대해본다.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을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이성부 <벼> <百濟行> 이성부 시집. 22p
벼는 서로 기대고 사는 민중이 되었다. 민중은 피흘리는 존재다. 그러나 넉넉한 힘을 가진 존재다. 그 힘은 슬픔의 힘이 분명하다. 시인은 슬픔의 힘을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게 표출한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묻음 그리움 이 넉넉한 힘” 계속 해서 쓰러지고 피 흘리는 민중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함께 할 때에만 그 힘을 알 수 있다. 그 힘은 정신의 크기이고 곧 높은 진짜 숭고이다.
서울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올해에 자주 볼 수 있었다. 그 농사가 생(生)에 마지막 농사가 된 농민도 있었다. 세계화 시대에 더 큰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소시민들이 대부분이 되어 이제 한 사람의 목숨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민중은 없어지고 시민만 남은 것이다. 게다가 시민은 국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글쟁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숭고의 글쓰기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아픔과 만나야 한다. 타고난 정신의 크기가 있으면 그러할 것이고 강렬한 파토스가 정신의 크기를 안내할 것이다. 후천적인 숭고는 쓰면서 익혀야 한다. 정신이 부자인 시인은 결코 가난할 수 없다.
시 한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됫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함민복 <긍정적인 밥>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함민복 시집 62p
시는 편리한 도구다. 사람들 지나다니는 큰길가에 똥을 싸놓고는 사람들이 나무라면 똥도 예술이라 주장하면 된다.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김상봉 226p
현대 사회에 시인은 똥을 싸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원태연 <그냥 좋은 것> 어느 인터넷 사이트
부끄럽게도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시중에 하나인 이 시는 ‘똥’이다. 아무렇게나 쓰고 나서 예술이라고 서점에 진열되는 ‘똥’ 반(反)지성주의에 젖은 젊은이들은 안 읽는 게 나을 이런 시를 읽고 다닌다. 정신의 크기와 파토스는 정말 설 자리가 없는 것일까.
더 이상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 시대의 부조리에 날카로운 칼끝을 대는 시인을 세상은 기대하지 않는다. 문학의 지형을 소설에게 내주고 팔리지도 않는 시집은 꾸역꾸역 출판된다. 모든 독자는 시인이고 시인 스스로가 독자가 된다. 스스로 귀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양 철학이 빠져있는 나르시스의 꿈에서 빠져 침을 질질 흘리며 편한 세월 보내고 있다. 시의 위기다. 큰 위기다.
<나 오 며> - 만남을 꿈꾸는 詩
우리는 만나야 한다. 시가 사람들을 만나 슬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시의 예술성을 포기하고 대중문화의 천박함으로 매몰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의 비극을 다루며 자기연민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시. 그러나 거대한 슬픔의 뿌리를 찾아 번득이는 시안(詩眼)을 가지고 대면(對面)하는 시. 위대하고 고결한 정신과 열정을 가진 시가 시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풀> <김수영 다시 읽기> 김승희 편. 106p
우리는 이제까지 롱기누스와 칸트의 안내에 따라 숭고를 알아보고 한국 현대시에서 숭고를 찾는 여행을 했다. 큰 정신과 열정을 담은 시도 있었고 거짓된 숭고를 숭고라 말하는 시도 있었고 똥 같은 시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다룬 시들을 가지고 숭고를 찾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우리가 배우고 사유한 숭고는 서양의 개념에 가깝지 아직 완연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과연 숭고의 글쓰기가 가능할까? 오늘날의 인간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신적인 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 과거에는 자연이 인간을 압도하는 숭고한 현상이었지만 오늘날은 인간이 오히려 자연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더구나 자본주의적 산문성에 묻혀 사는 현대인의 정신은 고대인과 달리 너무나 냉정하고, 게다가 오늘날과 같은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숭고의 도덕적 바탕을 이루는 귀족주의적 이상은 별로 적합해 보이지도 않는다. <앙겔루스 노부스> 진중권. 85p
그러나 숭고의 글쓰기는 필요하다. 그리고 숭고의 글쓰기는 우리에게 있어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 슬픔에서 비롯되는 숭고, 슬픔이 슬픔과 만나 삶의 진실을 밝히는 숭고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산문성에 젖어 경직되고 대중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마지막 남은 예술의 존재 미학으로서 숭고의 절실함은 존재한다.
마치 풀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듯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우리를 보듬을 시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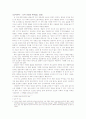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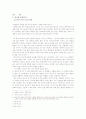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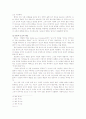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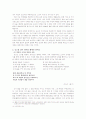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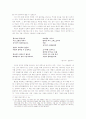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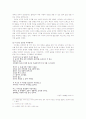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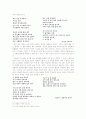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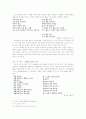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