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시간의 역사
II. ‘세기말’ 유럽의 이중적인 변주곡
1. 부르주아 체제와 가치관의 위기로서의 세기말
2. ‘아름다운 시절’로서의 세기말
III.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II. ‘세기말’ 유럽의 이중적인 변주곡
1. 부르주아 체제와 가치관의 위기로서의 세기말
2. ‘아름다운 시절’로서의 세기말
III.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본문내용
II.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세기말’ 유럽의 야누스적 모습이 20세기말의 꼬리에 매어 달려 있는 ‘나’의 고단한 일상적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거대담론’이 쇠퇴하고 역사에서의 객관적인 사실탐구의 허구성이 논의되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세기말’ 유럽은 감히 어떤 건방진 ‘역사적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셀 수 없는 과거의 편린들을 선택하고 여과시키는 작업이다. 절대적보편적인 기준 없이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그물을 던져 어떤 과거를 잡거나 버릴 것인가. 어쩌면 에코(Umberto Eco)의 우려처럼, 목전으로 다가온 새로운 세기에는 개인 각자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과거사건을 읽고 세계를 해석하는 “각자의 역사”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움베르토 에코 외,『시간의 종말: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네가지 논의』(끌리오, 1999), 248쪽. 문지영박재환 옮김.
위와 같은 황량한 탈역사주의적 시대를 사는 ‘역사가로서의 나’는 (머리말에서 약속했던) ‘세기말 유럽의 경험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어떻게 독자들과 함께 곱씹어 볼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필자는 ‘세기말’ 유럽을 어느 누구보다도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혹은 ‘미친 듯이’ 살다간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의 흉내를 내면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니체야말로 19세기말의 모더니즘과 20세기말의 포스트모더니즘을 관통하며 자신의 예언대로 “죽어서 다시 태어난” 인물이다. 그러므로 19세기말과 20세기말을 되새김질하면서 21세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산에서 내려온 짜라투스트라가 가라사대, “역사는 때로는 변화하고 때로는 지속되며 마침내는 반복되니, 이는 모두 개인이 바라보기 나름이니라.” 그러면 과연 어떤 변화지속반복적 현상을 ‘세기말’ 유럽과 오늘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변화. 자유주의가 쇠퇴하고 사회주의가 합법적으로 팽창하던 ‘세기말’ 유럽과 비교하면, 동구권의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고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역사의 종말”이 선언된 20세기말의 현상을 우리는 ‘변화’라고 부른다. 19세기말의 사회주의를 20세기말의 사회주의와 구별짓는 “가장 현저한 차이”는 구원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이다. 전자가 인간관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메시아적이며 유토피아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신봉했다면, 후자는 계몽주의적 이성이 성숙한 결과로서의 점진적이며 부분적인 사회적 개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Martin Jay, Fin-de-Siecle Socialism and Other Essays(New York: Routledge, 1988), p. 11-13.
그러면, 자유주의의 자신 찬 목소리를 견디며 ‘공동체적 삶’을 요청하는 사회주의가 새로운 세기에도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이상 ‘사회적 스캔들’을 야기하지 못하는 ‘죽은 개’로 사회주의는 머물고 말 것인가.
지속. 실증적이고 진보주의합리주의적인 세상 읽기에 반발했던 ‘세기말’의 모더니즘이, 언어와 경험의 유리(遊離)와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실체를 주장하는 20세기말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만나는 것을 우리는 ‘지속’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새로운 세기에도 여전히 상대주의적인 복수(複數)의 ‘진실들’만 존재하며, 사망신고 된 거대담론들이 잿더미 속에서 부활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발칸반도와 티모르 등지에서 최근에 발생한 인종민족적 분규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거대담론의 잠재력과 21세기에서의 재등장을 부채질하는 기미가 아닌가. 그리고, 이성은 더 이상 도구적 구속이 아니라 해방의 언어로 새 세기에 새롭고 새롭게 해체될 것인가.
그리고 반복. ‘세기말’ 유럽을 사로잡았던 레저골프의 열풍과 ‘문화의 숭배’가 20세기말 한국에서 콘도에서 주말 보내기, ‘서민도 즐기는’ 골프장 건설, 건전한 ‘목욕탕 문화’의 확립 등의 구호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격세적(隔世的) ‘반복’이라고 부른다. 19세기말 유럽의 ‘아름다운 시절’이 대부분 노동자계층들을 제외한 부르주아지의 배타적인 축제였다면, 20세기말 한국에서 ‘일찍 터트린 샴페인’은 천민자본주의가 부추긴 벼락부자들의 난장판은 혹시 아닐까. ‘팔팔 서울올림픽’ 이후, 정부가 앞장서고 벼락부자들이 맞장구치며 ‘세계적인’ 혹은 ‘아시아 최대규모의’ 호화로운 엑스포와 문화이벤트를 개최했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이런 행사들은 ‘신흥중진국’으로 겨우 발돋움한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보내는 근거 없는 우월감과 ‘선진국’들에게 품은 질 낮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다. 마치 백년 전 유럽의 부르주아지가 상류층의 귀족적 삶을 부러워 모방하며 중하류층을 경멸했듯이. 또한, 20세기말 한국에서 제철을 만난 듯한 해외여행과 레저산업의 번창, 각종 고급문화공연행사의 범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돈과 시간밖에 없다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들이 창출해 낸 문화적 쓰레기일 수도 있다. 건강한 가치관과 물질적인 자족(自足)으로 무장한 진정한 중산층의 성장은 새로운 세기를 앞 둔 한국의 풀 수 없는 과제인가. 그렇다면, IMF라는 이름의 경제불황을 영양분 삼아 반갑게 달려오는 ‘한국적인’ 나찌즘의 출현을 우리는 21세기에도 반복하여 목격해야만 할 것인가.
…시장에서의 그의 가르침을 외면한 군중들을 뒤로하고 짜라투스트라는 다시 깊은 산 속으로 향했다. 석양 무렵 그의 긴 그림자는 절망과 축복의 빛깔로 번쩍였다. “저녁을 향해 가는 길은 새로운 아침을 향해 가는 길” Nietzsche, Thus Spoke Zarathustra: A Book For Everyone and No One(New York: Penguin Books, 1983), p. 104. trans by R. J. Hollingdale.
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기말은 또 다른 종류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세기말은 “도달해야 할 시간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인 것이다.
‘세기말’ 유럽의 야누스적 모습이 20세기말의 꼬리에 매어 달려 있는 ‘나’의 고단한 일상적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거대담론’이 쇠퇴하고 역사에서의 객관적인 사실탐구의 허구성이 논의되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세기말’ 유럽은 감히 어떤 건방진 ‘역사적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셀 수 없는 과거의 편린들을 선택하고 여과시키는 작업이다. 절대적보편적인 기준 없이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그물을 던져 어떤 과거를 잡거나 버릴 것인가. 어쩌면 에코(Umberto Eco)의 우려처럼, 목전으로 다가온 새로운 세기에는 개인 각자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과거사건을 읽고 세계를 해석하는 “각자의 역사”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움베르토 에코 외,『시간의 종말: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네가지 논의』(끌리오, 1999), 248쪽. 문지영박재환 옮김.
위와 같은 황량한 탈역사주의적 시대를 사는 ‘역사가로서의 나’는 (머리말에서 약속했던) ‘세기말 유럽의 경험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어떻게 독자들과 함께 곱씹어 볼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필자는 ‘세기말’ 유럽을 어느 누구보다도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혹은 ‘미친 듯이’ 살다간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의 흉내를 내면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니체야말로 19세기말의 모더니즘과 20세기말의 포스트모더니즘을 관통하며 자신의 예언대로 “죽어서 다시 태어난” 인물이다. 그러므로 19세기말과 20세기말을 되새김질하면서 21세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산에서 내려온 짜라투스트라가 가라사대, “역사는 때로는 변화하고 때로는 지속되며 마침내는 반복되니, 이는 모두 개인이 바라보기 나름이니라.” 그러면 과연 어떤 변화지속반복적 현상을 ‘세기말’ 유럽과 오늘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변화. 자유주의가 쇠퇴하고 사회주의가 합법적으로 팽창하던 ‘세기말’ 유럽과 비교하면, 동구권의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고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역사의 종말”이 선언된 20세기말의 현상을 우리는 ‘변화’라고 부른다. 19세기말의 사회주의를 20세기말의 사회주의와 구별짓는 “가장 현저한 차이”는 구원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이다. 전자가 인간관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메시아적이며 유토피아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신봉했다면, 후자는 계몽주의적 이성이 성숙한 결과로서의 점진적이며 부분적인 사회적 개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Martin Jay, Fin-de-Siecle Socialism and Other Essays(New York: Routledge, 1988), p. 11-13.
그러면, 자유주의의 자신 찬 목소리를 견디며 ‘공동체적 삶’을 요청하는 사회주의가 새로운 세기에도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이상 ‘사회적 스캔들’을 야기하지 못하는 ‘죽은 개’로 사회주의는 머물고 말 것인가.
지속. 실증적이고 진보주의합리주의적인 세상 읽기에 반발했던 ‘세기말’의 모더니즘이, 언어와 경험의 유리(遊離)와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실체를 주장하는 20세기말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만나는 것을 우리는 ‘지속’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새로운 세기에도 여전히 상대주의적인 복수(複數)의 ‘진실들’만 존재하며, 사망신고 된 거대담론들이 잿더미 속에서 부활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발칸반도와 티모르 등지에서 최근에 발생한 인종민족적 분규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거대담론의 잠재력과 21세기에서의 재등장을 부채질하는 기미가 아닌가. 그리고, 이성은 더 이상 도구적 구속이 아니라 해방의 언어로 새 세기에 새롭고 새롭게 해체될 것인가.
그리고 반복. ‘세기말’ 유럽을 사로잡았던 레저골프의 열풍과 ‘문화의 숭배’가 20세기말 한국에서 콘도에서 주말 보내기, ‘서민도 즐기는’ 골프장 건설, 건전한 ‘목욕탕 문화’의 확립 등의 구호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격세적(隔世的) ‘반복’이라고 부른다. 19세기말 유럽의 ‘아름다운 시절’이 대부분 노동자계층들을 제외한 부르주아지의 배타적인 축제였다면, 20세기말 한국에서 ‘일찍 터트린 샴페인’은 천민자본주의가 부추긴 벼락부자들의 난장판은 혹시 아닐까. ‘팔팔 서울올림픽’ 이후, 정부가 앞장서고 벼락부자들이 맞장구치며 ‘세계적인’ 혹은 ‘아시아 최대규모의’ 호화로운 엑스포와 문화이벤트를 개최했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이런 행사들은 ‘신흥중진국’으로 겨우 발돋움한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보내는 근거 없는 우월감과 ‘선진국’들에게 품은 질 낮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다. 마치 백년 전 유럽의 부르주아지가 상류층의 귀족적 삶을 부러워 모방하며 중하류층을 경멸했듯이. 또한, 20세기말 한국에서 제철을 만난 듯한 해외여행과 레저산업의 번창, 각종 고급문화공연행사의 범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돈과 시간밖에 없다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들이 창출해 낸 문화적 쓰레기일 수도 있다. 건강한 가치관과 물질적인 자족(自足)으로 무장한 진정한 중산층의 성장은 새로운 세기를 앞 둔 한국의 풀 수 없는 과제인가. 그렇다면, IMF라는 이름의 경제불황을 영양분 삼아 반갑게 달려오는 ‘한국적인’ 나찌즘의 출현을 우리는 21세기에도 반복하여 목격해야만 할 것인가.
…시장에서의 그의 가르침을 외면한 군중들을 뒤로하고 짜라투스트라는 다시 깊은 산 속으로 향했다. 석양 무렵 그의 긴 그림자는 절망과 축복의 빛깔로 번쩍였다. “저녁을 향해 가는 길은 새로운 아침을 향해 가는 길” Nietzsche, Thus Spoke Zarathustra: A Book For Everyone and No One(New York: Penguin Books, 1983), p. 104. trans by R. J. Hollingdale.
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기말은 또 다른 종류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세기말은 “도달해야 할 시간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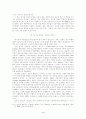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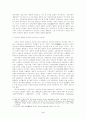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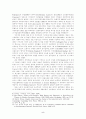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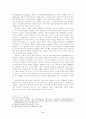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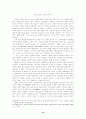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