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명대 외교정책
(1) 조공과 해금정책
(2) 조공관계-한중관계를 중심으로
3. 명초 동아시아 3국의 관계
(1) 倭寇
(2) 일본의 명에 대한 조공무역
(3) 고려, 조선과의 관계
4. 임진왜란-동아시아 3국의 전쟁
(1) 명군의 참전목적
(2) 출병과 전투 과정
5. 맺음말
2. 명대 외교정책
(1) 조공과 해금정책
(2) 조공관계-한중관계를 중심으로
3. 명초 동아시아 3국의 관계
(1) 倭寇
(2) 일본의 명에 대한 조공무역
(3) 고려, 조선과의 관계
4. 임진왜란-동아시아 3국의 전쟁
(1) 명군의 참전목적
(2) 출병과 전투 과정
5. 맺음말
본문내용
남병 출신 총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이여송과 송응창은 서로 미묘한 갈등과 알력을 빚으면서 1593년 1월 평양전투를 치르고, 강화협상을 시작하는 등 임진왜란 초반의 상황을 주도해 나갔다.
명은 애초 전쟁이 장기화되리라고 예측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실제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의 본진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전세는 대번에 역전되었다. 따라서 명이나 조선이나 모두 전쟁은 일본군 철수로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하지만 후퇴하는 일본군은 파주까지 추격했던 이여송 휘하의 병력이 벽제관전투에서 일본군에 대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군을 금방이라도 몰아낼 듯이 보였던 명군은 기세가 꺾였고,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명군 지휘부는 이제 태도를 바꾸었다. 결전이 아닌 강화협상을 통해 일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비지출을 우려한 목소리가 높아간 데다가 명군 내부에서는 “왜 속국 조선을 위해 끝까지 피를 흘려야 하는가?”, “한강 이북지역을 탈환한 것만으로도 명은 조선에 대해 할 만큼 했다.”는 식의 인식이 퍼져갔다. 명조정은 심유경을 통해 고시니와 본격적으로 강화협상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하지만 강화협상은 시간만 끌었다. 일본군은 남해안 일대로 물러갔지만 철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명군은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철수할 수도, 무작정 주둔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 임진왜란의 성격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非戰非和)’ 어정쩡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그 같은 상황은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난 뒤에까지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5. 맺음말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중국-한국-일본의 동아시아 3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으며 명대에도 3국이 함께 전쟁에 휘말리는 등 3국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국의 대외관계의 변화는 주로 왜구에 의해 변하였으나 대외적 우월과 주도권은 명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국의 대외관계는 주로 조공관계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16세기 말, 3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했던 임진왜란 또한, 조공관계라는 ‘예’의 명분 때문에 명군이 조선을 도와 출병하였다고는 하나, 사실 전쟁의 과정은 3국이 각각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명은 조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여진의 누루하치가 세운 후금(청)에 의한 압박을 받는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당시 도와주었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고,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1만여 명의 응원군을 파견한다. 그러나 중립정책을 펴고 있던 조선군은 명군에게 별 도움이 안 되었고, 17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후금과의 대립과 내부의 폐단으로 인해 1644년에 멸망하였다.
☆ 참고문헌
董德模, 『朝鮮初의 國際關係』, 博英社 , 1990
박원호, 『明初朝鮮關係史硏究』, 一潮閣, 2002
申採湜, 『東洋史槪論』, 三英社, 1993
한명기, 「임진왜란과 명나라 군대」,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2001.
명은 애초 전쟁이 장기화되리라고 예측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실제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의 본진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전세는 대번에 역전되었다. 따라서 명이나 조선이나 모두 전쟁은 일본군 철수로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하지만 후퇴하는 일본군은 파주까지 추격했던 이여송 휘하의 병력이 벽제관전투에서 일본군에 대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군을 금방이라도 몰아낼 듯이 보였던 명군은 기세가 꺾였고,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명군 지휘부는 이제 태도를 바꾸었다. 결전이 아닌 강화협상을 통해 일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비지출을 우려한 목소리가 높아간 데다가 명군 내부에서는 “왜 속국 조선을 위해 끝까지 피를 흘려야 하는가?”, “한강 이북지역을 탈환한 것만으로도 명은 조선에 대해 할 만큼 했다.”는 식의 인식이 퍼져갔다. 명조정은 심유경을 통해 고시니와 본격적으로 강화협상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하지만 강화협상은 시간만 끌었다. 일본군은 남해안 일대로 물러갔지만 철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명군은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철수할 수도, 무작정 주둔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 임진왜란의 성격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非戰非和)’ 어정쩡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그 같은 상황은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난 뒤에까지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5. 맺음말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중국-한국-일본의 동아시아 3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으며 명대에도 3국이 함께 전쟁에 휘말리는 등 3국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국의 대외관계의 변화는 주로 왜구에 의해 변하였으나 대외적 우월과 주도권은 명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국의 대외관계는 주로 조공관계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16세기 말, 3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했던 임진왜란 또한, 조공관계라는 ‘예’의 명분 때문에 명군이 조선을 도와 출병하였다고는 하나, 사실 전쟁의 과정은 3국이 각각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명은 조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여진의 누루하치가 세운 후금(청)에 의한 압박을 받는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당시 도와주었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고,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1만여 명의 응원군을 파견한다. 그러나 중립정책을 펴고 있던 조선군은 명군에게 별 도움이 안 되었고, 17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후금과의 대립과 내부의 폐단으로 인해 1644년에 멸망하였다.
☆ 참고문헌
董德模, 『朝鮮初의 國際關係』, 博英社 , 1990
박원호, 『明初朝鮮關係史硏究』, 一潮閣, 2002
申採湜, 『東洋史槪論』, 三英社, 1993
한명기, 「임진왜란과 명나라 군대」,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2001.
추천자료
 중국의 최근 무역현황 : 중국무역 중국경제
중국의 최근 무역현황 : 중국무역 중국경제 다각무역, 구상무역, 삼각무역 자료
다각무역, 구상무역, 삼각무역 자료 우리나라의 중국무역의 필요성과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중국무역의 필요성과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관하여 중국의무역정책 및 무역제도의 변화
중국의무역정책 및 무역제도의 변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우리의 대응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우리의 대응 미국 무역 정책의 역사와 무역 정책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미국 무역 정책의 역사와 무역 정책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무역의 종류와 무역관리제도
무역의 종류와 무역관리제도 무역의 형태에 대한 무역의 종류
무역의 형태에 대한 무역의 종류 [통상정책(무역정책)][한국 통상정책(무역정책)][미국 통상정책(무역정책)][중국 통상정책][...
[통상정책(무역정책)][한국 통상정책(무역정책)][미국 통상정책(무역정책)][중국 통상정책][... [한중일FTA]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필요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필요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지역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무역] 무역의 형태(종류)와 수출입공고의 표시방식 및 수출입품목의 분류방식
[무역] 무역의 형태(종류)와 수출입공고의 표시방식 및 수출입품목의 분류방식 북미자유무역협정, ASEAN과 AFTA, APEC,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통상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 ASEAN과 AFTA, APEC,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통상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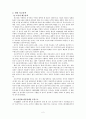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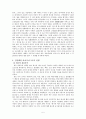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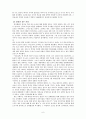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