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1. 정조의 생애
1.1 정조의 출생
1.2 정조 즉위 전 시대적 상황
1.3 인간정조 (효심)
1.4 정조의 죽음
2. 정조의 업적
2.1 개혁정치
2.1.1 탕평책
2.1.2 장용영
2.1.3 화성축조
2.1.4 인사정책
2.1.5 규장각
3. 정조와 규장각
3.1 규장각의 효시
3.2 규장각의 성격
3.3 규장각의 관리조직도
3.3.1 초기 인적구성
3.3.2 각신과 검서
3.3.3 초계문신(抄啓文臣)
3.3.4 규장각 각신의 권한
4. 규장각과 출판문화
4.1 규장각 소장자료
4.1.1 소장자료의 종류 및 가치
4.2 대표적 출판문화
4.2.1 규장각 출판물(정치, 사회, 제도 분야)
4.2.2 규장각 소장 활자
5. 규장각이 출판문화에 있어 갖는 의미
6. 정조 사후의 규장각
7. 오늘날의 규장각과 그 교훈
나오는 말
1. 정조의 생애
1.1 정조의 출생
1.2 정조 즉위 전 시대적 상황
1.3 인간정조 (효심)
1.4 정조의 죽음
2. 정조의 업적
2.1 개혁정치
2.1.1 탕평책
2.1.2 장용영
2.1.3 화성축조
2.1.4 인사정책
2.1.5 규장각
3. 정조와 규장각
3.1 규장각의 효시
3.2 규장각의 성격
3.3 규장각의 관리조직도
3.3.1 초기 인적구성
3.3.2 각신과 검서
3.3.3 초계문신(抄啓文臣)
3.3.4 규장각 각신의 권한
4. 규장각과 출판문화
4.1 규장각 소장자료
4.1.1 소장자료의 종류 및 가치
4.2 대표적 출판문화
4.2.1 규장각 출판물(정치, 사회, 제도 분야)
4.2.2 규장각 소장 활자
5. 규장각이 출판문화에 있어 갖는 의미
6. 정조 사후의 규장각
7. 오늘날의 규장각과 그 교훈
나오는 말
본문내용
nu.ac.kr/ 규장각 정조 그 시대와 문화, 05 출판문화
『비변사 등록』,『승정원일기』,『일성록』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규장각, 승정원, 비변사 등 부서에서 일일 단위, 심지어 시간 단위로 발생한 일들을 기술하여 놓은 엄청난 양의 일기들을 대하면서, 우선 그와 같은 기록 업무가 몇 세기에 걸쳐 지속되었고, 일단 기록된 자료들은 철저히 보존되어 온 사실에 놀라고 감탄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규장각에서 출판 된 책들과 소장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선조들의 사상과 생활 모습 등 조선시대에 기록된 조선조의 역사로서 사료적 가치와 함께 그 책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식 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다.
6. 정조 사후의 규장각
1800년(정조 24)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규장각을 통해 양성된 정조의 친위세력은 1801년(순조 1)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거의 와해되었다. 이에 따라 규장각의 정치적 성격은 거의 사라지고 그저 어제의 간행, ‘일성록’의 기록을 담당하고 역대 선왕들의 글그림 등과 책을 관리하는 기능만 가지게 되었다. 1864년(고종 1) 고종이 즉위하자 흥선대원군은 규장각의 기능을 종친부와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세도정권이 장악하였던 규장각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친의 위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868년(고종 5)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규장각은 경복궁으로 이전되었고, 1874년(고종 11) 고종이 친정(親征)하면서 규장각의 위상은 정조대의 수준으로 복구되었다. 규장각 도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각고관서목』(閣古觀書目)과『서고사목』(西庫事目) 등의 목록이 작성되었으며, 발음을 기준으로 한 색인집인『내장각장서휘편』(內閣藏書彙編)이 만들어졌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궁내부와 정부가 분리되면서 규장각은 궁내부에 귀속되었고, 다음해 4월 규장원으로 개칭되어 궁내부 산하 소속기관으로 격하되었다. 대한제국기인 1897년 규장원이 규장각으로 환원되고, 궁내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근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책들을 많이 구입하였다. 순종이 즉위한 1907년에는 식민통치를 위한 자료정리의 필요에 의해 일제는 규장각의 기능을 크게 확대하였다. 본래 소장도서 외에 홍문관시강원집옥재지방사고의 도서를 함께 관리하게 되어『조선왕조실록』『일성록』『승정원일기』와 같은 국보급 자료가 규장각 도서로 편입되었다. 또한 북한산 행궁 경기사고의 장서와 경판각의 판본 및 활자, 강화 정족산성과 봉화 태백산성 및 평창 오대산성 그리고 무주 적상산성의 장서까지 관리하게 되었다. 1909년 11월 규장각 도서의 총량은 5,493부 103,680책에 이르렀다.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규장각은 폐지되었고 규장각도서는 1911년 6월 조선총독부 취조국으로 넘어갔다. 창덕궁 내에 일본식 건물로 장서각을 지어 이왕직(李王職, 참사관실의 관리) 산하로 관리권을 넘겼다. 1922년 11월 총독부의 학무국에서 관리하던 규장각 도서는 1928~1930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161,561책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이 기간 동안 창덕궁 안에 있던 규장각 건물은 수난이 많았는데, 이문원 자리에는 창덕궁 경찰서가 들어섰고, 이안각은 순종비(純宗妃)가 누에를 치는 장소로 변했으며, 열고관, 개유와, 서고 등의 건물은 헐리고 말았다. 1946년에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규장각 도서는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규장각 도서는 1950년 6.25 전란으로 다시금 위기를 맞이하였다. 한국전쟁의 발발로『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일성록』『승정원일기』등 국보급 도서 8,657책이 전란을 피해 부산으로 긴급 대피되었는데, 규장각 도서가 일부나마 한강을 건넌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머지 도서들은 폭격등으로 인해 소실될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유엔군은 규장각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동숭동을 폭격대상에서 제외하여 책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 부산으로 옮겨진 도서는 관재처 창고, 대한부인회 창고, 경남도청 창고 등을 옮겨 다니다가 1954년 6월에 서울대학교로 돌아왔다.
1975년에 서울대학교가 현재의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규장각의 도서도 관악으로 옮겨졌다. 또한 서울대학교 도서관내에 ‘규장각 도서 관리실’이 설치되면서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의 회랑에 방치되어 있던 1만 8천여 장의 규장각 책판(冊板)을 옮겨왔다. 규장각은 1990년 7월에 현재의 독립 건물로 이전하면서 학예연구직을 두어 본격적인 연구 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1992년 3월에 규장각 관리실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중흥기를 맞았다. 정조사후의 규장각 : 역사기록의 보고 규장각, 201~203p.
7. 오늘날의 규장각과 그 교훈
정조는 재위기간 24년이라는 짧은 통치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르네상스”, “문화군주 정조”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었다. 정조가 만든 규장각 그것은 단지 왕실도서관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정조 시대의 규장각, 그것은 혁신을 위한 조선의 브레인이였으며, 그 바탕은 인류의 지혜를 담은 문헌이 중심이 된 사회였다. 규장각은 조선후기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핵심기관이자 문치를 꿈꾸는 정조의 꿈이었다.
당시 문화적으로 강성하던 중국의 책을 수입하고, 우리자체만의 문화를 만들려 고자 노력하고 변화하는 조선의 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려 했던 정조의 규장각의 꿈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규장각이 남긴 방대하고 우수한 자료들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문화적 자부심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아직도 규장각에 어떠한 자료가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양이 방대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규장각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해온 산실이며, 규장각 자료는 전통시대 기록문화의 정신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이제 규장각을 한국을 대표하는 국학기관으로서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교 두부 역할을 할 것이다. 기록은 역사의 얼굴이자 자원이다. 선조들이 이룬 장인정신과 창조정신을 계승하여 21세기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비변사 등록』,『승정원일기』,『일성록』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규장각, 승정원, 비변사 등 부서에서 일일 단위, 심지어 시간 단위로 발생한 일들을 기술하여 놓은 엄청난 양의 일기들을 대하면서, 우선 그와 같은 기록 업무가 몇 세기에 걸쳐 지속되었고, 일단 기록된 자료들은 철저히 보존되어 온 사실에 놀라고 감탄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규장각에서 출판 된 책들과 소장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선조들의 사상과 생활 모습 등 조선시대에 기록된 조선조의 역사로서 사료적 가치와 함께 그 책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식 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다.
6. 정조 사후의 규장각
1800년(정조 24)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규장각을 통해 양성된 정조의 친위세력은 1801년(순조 1)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거의 와해되었다. 이에 따라 규장각의 정치적 성격은 거의 사라지고 그저 어제의 간행, ‘일성록’의 기록을 담당하고 역대 선왕들의 글그림 등과 책을 관리하는 기능만 가지게 되었다. 1864년(고종 1) 고종이 즉위하자 흥선대원군은 규장각의 기능을 종친부와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세도정권이 장악하였던 규장각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친의 위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868년(고종 5)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규장각은 경복궁으로 이전되었고, 1874년(고종 11) 고종이 친정(親征)하면서 규장각의 위상은 정조대의 수준으로 복구되었다. 규장각 도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각고관서목』(閣古觀書目)과『서고사목』(西庫事目) 등의 목록이 작성되었으며, 발음을 기준으로 한 색인집인『내장각장서휘편』(內閣藏書彙編)이 만들어졌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궁내부와 정부가 분리되면서 규장각은 궁내부에 귀속되었고, 다음해 4월 규장원으로 개칭되어 궁내부 산하 소속기관으로 격하되었다. 대한제국기인 1897년 규장원이 규장각으로 환원되고, 궁내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근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책들을 많이 구입하였다. 순종이 즉위한 1907년에는 식민통치를 위한 자료정리의 필요에 의해 일제는 규장각의 기능을 크게 확대하였다. 본래 소장도서 외에 홍문관시강원집옥재지방사고의 도서를 함께 관리하게 되어『조선왕조실록』『일성록』『승정원일기』와 같은 국보급 자료가 규장각 도서로 편입되었다. 또한 북한산 행궁 경기사고의 장서와 경판각의 판본 및 활자, 강화 정족산성과 봉화 태백산성 및 평창 오대산성 그리고 무주 적상산성의 장서까지 관리하게 되었다. 1909년 11월 규장각 도서의 총량은 5,493부 103,680책에 이르렀다.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규장각은 폐지되었고 규장각도서는 1911년 6월 조선총독부 취조국으로 넘어갔다. 창덕궁 내에 일본식 건물로 장서각을 지어 이왕직(李王職, 참사관실의 관리) 산하로 관리권을 넘겼다. 1922년 11월 총독부의 학무국에서 관리하던 규장각 도서는 1928~1930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161,561책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이 기간 동안 창덕궁 안에 있던 규장각 건물은 수난이 많았는데, 이문원 자리에는 창덕궁 경찰서가 들어섰고, 이안각은 순종비(純宗妃)가 누에를 치는 장소로 변했으며, 열고관, 개유와, 서고 등의 건물은 헐리고 말았다. 1946년에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규장각 도서는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규장각 도서는 1950년 6.25 전란으로 다시금 위기를 맞이하였다. 한국전쟁의 발발로『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일성록』『승정원일기』등 국보급 도서 8,657책이 전란을 피해 부산으로 긴급 대피되었는데, 규장각 도서가 일부나마 한강을 건넌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머지 도서들은 폭격등으로 인해 소실될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유엔군은 규장각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동숭동을 폭격대상에서 제외하여 책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 부산으로 옮겨진 도서는 관재처 창고, 대한부인회 창고, 경남도청 창고 등을 옮겨 다니다가 1954년 6월에 서울대학교로 돌아왔다.
1975년에 서울대학교가 현재의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규장각의 도서도 관악으로 옮겨졌다. 또한 서울대학교 도서관내에 ‘규장각 도서 관리실’이 설치되면서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의 회랑에 방치되어 있던 1만 8천여 장의 규장각 책판(冊板)을 옮겨왔다. 규장각은 1990년 7월에 현재의 독립 건물로 이전하면서 학예연구직을 두어 본격적인 연구 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1992년 3월에 규장각 관리실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중흥기를 맞았다. 정조사후의 규장각 : 역사기록의 보고 규장각, 201~203p.
7. 오늘날의 규장각과 그 교훈
정조는 재위기간 24년이라는 짧은 통치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르네상스”, “문화군주 정조”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었다. 정조가 만든 규장각 그것은 단지 왕실도서관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정조 시대의 규장각, 그것은 혁신을 위한 조선의 브레인이였으며, 그 바탕은 인류의 지혜를 담은 문헌이 중심이 된 사회였다. 규장각은 조선후기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핵심기관이자 문치를 꿈꾸는 정조의 꿈이었다.
당시 문화적으로 강성하던 중국의 책을 수입하고, 우리자체만의 문화를 만들려 고자 노력하고 변화하는 조선의 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려 했던 정조의 규장각의 꿈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규장각이 남긴 방대하고 우수한 자료들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문화적 자부심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아직도 규장각에 어떠한 자료가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양이 방대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규장각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해온 산실이며, 규장각 자료는 전통시대 기록문화의 정신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이제 규장각을 한국을 대표하는 국학기관으로서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교 두부 역할을 할 것이다. 기록은 역사의 얼굴이자 자원이다. 선조들이 이룬 장인정신과 창조정신을 계승하여 21세기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추천자료
 출판기획의 사례 분석 1.2
출판기획의 사례 분석 1.2 [전자책][전자출판][e-book][e북][이북][디지털도서][전자도서]전자책(전자출판, e-book)의 ...
[전자책][전자출판][e-book][e북][이북][디지털도서][전자도서]전자책(전자출판, e-book)의 ... [전자책]전자책(전자출판, e-book)의 개념, 전자책(전자출판, e-book)의 특징, 전자책(전자출...
[전자책]전자책(전자출판, e-book)의 개념, 전자책(전자출판, e-book)의 특징, 전자책(전자출... [e북]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의미,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기술요소와 전송권, 전...
[e북]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의미,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기술요소와 전송권, 전... [윤리][녹색윤리][교원윤리][교직윤리][전자출판윤리][신학윤리][매스미디어윤리][공학윤리]...
[윤리][녹색윤리][교원윤리][교직윤리][전자출판윤리][신학윤리][매스미디어윤리][공학윤리]... [문화경제학][문화경제학의 유형][문화경제학의 배경][문화경제학의 접근][문화경제학의 분석...
[문화경제학][문화경제학의 유형][문화경제학의 배경][문화경제학의 접근][문화경제학의 분석...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정의와 성격,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장점, 전자책(e-book,...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정의와 성격,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장점, 전자책(e-book,... [이북]전자출판(전자책, e-book)의 개념, 전자출판(전자책, e-book)의 특성, 전자출판(전자책...
[이북]전자출판(전자책, e-book)의 개념, 전자출판(전자책, e-book)의 특성, 전자출판(전자책... e-book(전자책, 전자출판)의 의미와 성격, e-book(전자책, 전자출판)의 장단점, e-book(전자...
e-book(전자책, 전자출판)의 의미와 성격, e-book(전자책, 전자출판)의 장단점, e-book(전자... [전자출판]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정의,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중요성, 전자출판(...
[전자출판]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정의,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중요성, 전자출판(... [출판업][출판산업]출판업(출판산업)의 목표, 출판업(출판산업)의 현황, 출판업(출판산업)의 ...
[출판업][출판산업]출판업(출판산업)의 목표, 출판업(출판산업)의 현황, 출판업(출판산업)의 ... [명예훼손, 모욕, 집단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명예훼손(모욕)과 ...
[명예훼손, 모욕, 집단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명예훼손(모욕)과 ... [조직문화개발] 조직개발 - 조직문화의 개발 (비공식적 조직문화 진단방법, 문화격차분석 방...
[조직문화개발] 조직개발 - 조직문화의 개발 (비공식적 조직문화 진단방법, 문화격차분석 방... [일본사회문화의이해 1A형]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있음)...
[일본사회문화의이해 1A형]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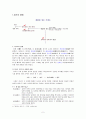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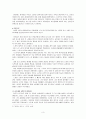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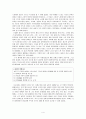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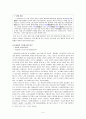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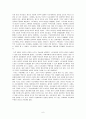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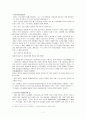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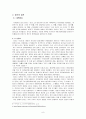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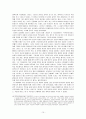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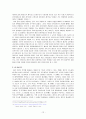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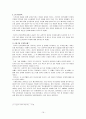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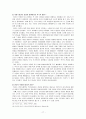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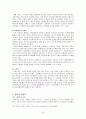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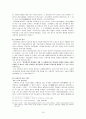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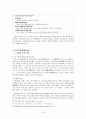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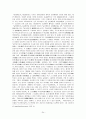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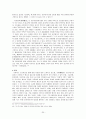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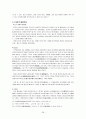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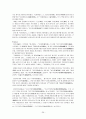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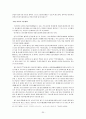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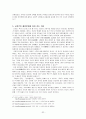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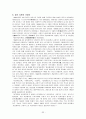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