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소위 실증 사학과 국수적 민족주의 담론에 의한 해석의 문제
Ⅲ. 영락 1-6년간의 국제 관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담론
Ⅳ. 광개토왕비 소위 ‘신묘년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
Ⅴ. ‘신묘년조’에 대한 비극, 희극적 통설을 넘어서
Ⅱ. 소위 실증 사학과 국수적 민족주의 담론에 의한 해석의 문제
Ⅲ. 영락 1-6년간의 국제 관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담론
Ⅳ. 광개토왕비 소위 ‘신묘년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
Ⅴ. ‘신묘년조’에 대한 비극, 희극적 통설을 넘어서
본문내용
실일 수는 없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 필자 역시 ‘신묘년조’의 해석과 역사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본 학계에서는 ‘신묘년조’의 기록을 “백제와 신라는 옛부터(고구려의) 속민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구려에)조공했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또는 왜가 신묘년 이래) 백제, oo,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해 왔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일본학자들은 왜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정벌과, 그에 대한 지배라는 소위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신묘년조’의 기록을 이용해 왔다. 한 걸음 나아가 임나 일본부를 운영한 정치 세력이 대화 정권이라고 해, 그 정치적 성정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결정적 자료로 ‘신묘년조’의 기록을 들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일본 황국 사관에 의한 국수적 민족주의 담론이 깔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남, 북한 학계에서는 ‘신묘년조’의 기록 중 “도해파”의 주어를 ‘고구려’라고 해 오히려 고구려가 왜를 격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일본 학계의 해석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왜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을 수 없었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묘년조’의 문장을 바꾸어 읽는 그와 같은 해석에는 문법적인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일본과 한국 학계의 ‘신묘년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많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광개토왕비가 만들어진 이유를 밝히는 작업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고구려사 자체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광개토왕비 이외의 <삼국사기> 기록들을 무시한 채 당시의 국제 관계를 해명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국제관계의 실상을 광개토왕비의 기록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개토왕비에 들어 있는 고구려인들의 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영락 원년에서 6년까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왜 사이의 국제 관계에 대해 정리했다. 그 결과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속민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왜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은 일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백제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은 일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신묘년조’의 기록은 영락 6년, 백제 토벌의 이유, 백제 토벌의 정당성을 밝히고, 또 광개토왕의 업적을 과정하기 위한 허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바꾸어 말해 ‘신묘년조’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신묘년조’의 기록은 광개토왕비 ‘영락 14년조’의 기록과 문장 구성에 있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영락 14년조’에는 ‘왜’가 ‘불(궤)’, ‘침입’, ‘(화)통‘의 주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신묘년조’ 기록의 ‘왜’도 ‘도(해)’, ‘파’, ‘(이)위’의 주어가 되어도 무리가 없다. ‘신묘년조’의 기록에 두 글자의 결자가 있어 문제가 되지만,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신묘년조’의 사료 (B)는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이르러 바다를 건너 백잔, oo, 신라를 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인 학자들의 해석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해석이 실제 역사적인 진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왜, 왜병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들이 신라나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왜는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은 일도 없었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다. 오히려 칠지도의 명문을 통해 보면 당시 왜왕은 백제 왕의 후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왜는 백제 왕세자의 통제를 받았을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묘년조’의 문법적인 해석과, 그 뒤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 달랐던 것을 분명히 할 피요가 있다. ‘신묘년조’의 기록은 광개토왕이 백제를 토벌한 이유를 밝히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며, 또 대왕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한 표현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신묘년조’의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묘년조’ 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옳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한 마딜 일본과 한국 학계의 ‘신묘년조’에 대한 연구는 사료 비판을 중시하는 실증 사학적 연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각기 다른 국수적 민족주의 담론의 희생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실증 사학은 그릇된 민족주의 담론의 도구가 된 것이 분명하다
일본 학계에서는 ‘신묘년조’의 기록을 “백제와 신라는 옛부터(고구려의) 속민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구려에)조공했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또는 왜가 신묘년 이래) 백제, oo,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해 왔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일본학자들은 왜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정벌과, 그에 대한 지배라는 소위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신묘년조’의 기록을 이용해 왔다. 한 걸음 나아가 임나 일본부를 운영한 정치 세력이 대화 정권이라고 해, 그 정치적 성정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결정적 자료로 ‘신묘년조’의 기록을 들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일본 황국 사관에 의한 국수적 민족주의 담론이 깔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남, 북한 학계에서는 ‘신묘년조’의 기록 중 “도해파”의 주어를 ‘고구려’라고 해 오히려 고구려가 왜를 격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일본 학계의 해석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왜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을 수 없었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묘년조’의 문장을 바꾸어 읽는 그와 같은 해석에는 문법적인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일본과 한국 학계의 ‘신묘년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많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광개토왕비가 만들어진 이유를 밝히는 작업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고구려사 자체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광개토왕비 이외의 <삼국사기> 기록들을 무시한 채 당시의 국제 관계를 해명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국제관계의 실상을 광개토왕비의 기록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개토왕비에 들어 있는 고구려인들의 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영락 원년에서 6년까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왜 사이의 국제 관계에 대해 정리했다. 그 결과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속민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왜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은 일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백제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은 일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신묘년조’의 기록은 영락 6년, 백제 토벌의 이유, 백제 토벌의 정당성을 밝히고, 또 광개토왕의 업적을 과정하기 위한 허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바꾸어 말해 ‘신묘년조’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신묘년조’의 기록은 광개토왕비 ‘영락 14년조’의 기록과 문장 구성에 있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영락 14년조’에는 ‘왜’가 ‘불(궤)’, ‘침입’, ‘(화)통‘의 주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신묘년조’ 기록의 ‘왜’도 ‘도(해)’, ‘파’, ‘(이)위’의 주어가 되어도 무리가 없다. ‘신묘년조’의 기록에 두 글자의 결자가 있어 문제가 되지만,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신묘년조’의 사료 (B)는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이르러 바다를 건너 백잔, oo, 신라를 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인 학자들의 해석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해석이 실제 역사적인 진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왜, 왜병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들이 신라나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왜는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은 일도 없었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다. 오히려 칠지도의 명문을 통해 보면 당시 왜왕은 백제 왕의 후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왜는 백제 왕세자의 통제를 받았을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묘년조’의 문법적인 해석과, 그 뒤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 달랐던 것을 분명히 할 피요가 있다. ‘신묘년조’의 기록은 광개토왕이 백제를 토벌한 이유를 밝히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며, 또 대왕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한 표현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신묘년조’의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묘년조’ 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옳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한 마딜 일본과 한국 학계의 ‘신묘년조’에 대한 연구는 사료 비판을 중시하는 실증 사학적 연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각기 다른 국수적 민족주의 담론의 희생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실증 사학은 그릇된 민족주의 담론의 도구가 된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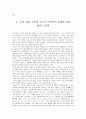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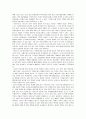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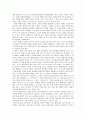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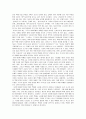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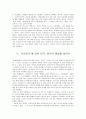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