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연구목적
Ⅰ. 서론
1. 도자기의 정의
2. 도자기의 유래
3. 도자기의 구분
Ⅱ. 본론
1. 선사시대의 도자기
2. 삼국시대 도자기
3. 통일신라시대의 도자기
4. 고려시대의 도자기
5. 조선시대의 도자기
Ⅲ. 결론
1. 체험관 및 과학관 답사내용
2. 도자기 만들기 체험
3. 도자기를 통해 알아본 당시의 시대상
4. 참고자료
Ⅰ. 서론
1. 도자기의 정의
2. 도자기의 유래
3. 도자기의 구분
Ⅱ. 본론
1. 선사시대의 도자기
2. 삼국시대 도자기
3. 통일신라시대의 도자기
4. 고려시대의 도자기
5. 조선시대의 도자기
Ⅲ. 결론
1. 체험관 및 과학관 답사내용
2. 도자기 만들기 체험
3. 도자기를 통해 알아본 당시의 시대상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순조 이후의 작품에 많이 나타난다. 이중에서 이중투각 기법을 사용한 대병선덕년제(大明宣德年制)명 청화백자연당초팔패문투각연적은 연적치고는 꽤 큰 편이다. 투각된 연판문 속에는 물을 담아 두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 바깥 주위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뚫려 있 어 필가로서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제작 방법은 굽 부분과 물을 담
아두는 곳, 외부 몸체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성형, 접합한 후 투각하였다. 굽바닥에 내부 속을 부착하고 그 위에 몸통을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불대 역시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다. 이런 이중 투각기법을 사용한 것은 연적과 항아리 등에도 그 예가 남아 있다. 또한, 화분대(도 2D나 의자, 문방기명뿐 아니라 병이나 항아리에까지 투각 기법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첩화(貼花)는 양각과 달리 문양을 따로 성형, 조각한 뒤 몸체에 접합하는 것으로 역시 순조 이후에 자주 보인다 백자향꽂이 같은 것이 대표적 작폼이다. 첩화 기법은 이전에도 간간이 사용되었으나 순조 이후 중국자기의 모방 경향이 심화되고 장식적이고 화려한 분위기의 자기가 대세를 이룸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
장식 중에는 중국자기를 모방한 것도 보이는데, 청화로 여백을 메워 배경색으로 처리한 것이라든지 기명 전체를 청화나 철화, 진사로 채색한 것들이 그것이다. 정조 이후 북학의 열기가 점차 무르익어 가면서 이런 경향은 점차 심화되어 갔다. 예를 들어, 중국자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름문 장식이나 귀를 붙여 고리를 다는 것도 순조 이후 조선백자(도 27)에 자주 응용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중국의 골동 수장이나 사치품 수집이 붐을 이루
었는데, 도자기도 크게 한몫을 하였다. 그중에서 북학파 기록이나 김홍도의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只)에 등장하는 가요문자기(哥黑文磁器)에 대해 살펴보자. 가요자기는 원래 북송대 명요로 두터운 유약 아래 드물게 난 균열이 특징으로 중국의 경우 건륭제 때 복고풍의 자기 방조에 힘입어 골동으로서도 인기가 높았던 모양이다. 이를 제작하는 방법은 비교적 상세히 적혀있고 그리 어렵지도 않아서 제작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요문 자기 만드는 법. 일명 쇄기(昨器) 또는 빙문好湖文), 백급쇄(百級件), 시요(뜻黑)라고 한다. 형태를 만들어서 예리한 칼로 다듬은 후 햇빛 아래 두어 말리고 맑은 물에 한 번 담근 후 끄집어 내어 구우 면 균열 있는 무늬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춧빛이 나는 쇄기( 件器)를 만들려면 연지석(購、暗石: 일종의 붉은색 안료)을 사용하여 적신 후 철선(鐵線)으로 만든 포대에 쇄기 잔을 넣고 숭불예 놓아 굽는 다. 그리고 재차 연지석을 한 번 바르면 된다. 대개 선홍자기(宣紅磁器)는 소성 후 불에서 꺼내고 난 다음 별도로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약한 불에 구워 완성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불 속에서도 붉은 성질을 유지한다는 주사(朱妙)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요문 자기는 열문이 드문드문 난 것이 상품이요 너무 촘촘하게 난 것은 하품이다. 가요문 자기에 채색을 할 경우 사용하는 각종 채색법은 모두 자줏빛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한 연지석 방법에 따른다. 갈색을 내려고 한다면 오래 된 차 잎을 달인 물을 사용한다.
이러한 가요문자기(哥黑文磁器)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증 골동 중에 가요의 것을 상품으로 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도 당시 조선에서도 꽤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이후 중국자기에 대한 호상, 특히 골롱에 대한 수장과 감상 취미의 전개는 상품화폐경제와 생산력 발전에 따른 도시민적 취미 활동의 하나로 조선사회를 풍미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조선에서 제작된 가요자기는 아직 발견되지않았다.
다음 상회자기에 대해 살펴보면, 북학파의 기록에는 상회자기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이 조선에서 제작되 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규경의 기록에는 도기에서 유사 상회자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도기 위에 여러 도료와 먹, 아교를 사용해 동채(鋼彩)와 흑채 등 유사 상회자기를 만드는 방법인 것이다. 또한, 이희경의 『설수외사(雪炯外史)』에는 어떤 이가 상회 기법을 중국으로부터 배워 와서 조선에서 제작하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다.
항년에 어떤 사람이 연경(熊京)에 들어가 회자법(續磁法)을 배워 돌아와서 말하기를 \"생칠(生淡)과 용뇌(龍腦)를 섞으면 칠이 불이 된다. 그 물을 사용하여 채료에 넣어 칠하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들은 사람이 이를 시혐하였지만 칠이 물이 되지 않아 포기하였다고 한다. 내가 말하기를 \"그 방법에는 이치가 있는데도 이를 상세히 공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채료를 첨가하거나, 혹은 휘저어 고르게 섞는 비율이 있거나, 혹은 밀봉해서 수개월을 두어야 완성되는 것이다. 중국을 배우는 요즘 사람들은 모두 배움이 완전하지 않아 끝내 효과를 보지 못하니 이것이 한스럽다. 어찌 발분해서 다시 공부하여 만리의 바다를 멀다고 여기지 않는 일본인과 같이 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이 모두 상회자기(上績磁器)에 대한 선호를 말해 주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몰래 유입되던 많은 장식자기 특히 양자(洋磁)로 불리던 법랑채 자기들은 헌종 연간 연행(熊行)시 금조물명(禁條物名)에 오를 정도로 조선의 일부 계층에 게는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상회자기에 대한 동경이 강했음에도 왜 조선에서는 상회자기가 제작되지 않았을까? 우선 이희경의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안료 제작에 관한 기술 이전이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 수 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병 ·청 교체의 혼란기에 중국의 장인을 통하거나 직접 중국에서 그 기법을 익혀 제작에 성공하였지 만 우리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 같다. 중국내에서도 기술의 외부 유출을 꺼렸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술적 요인 외에도 지배층의 미의식에 적합치 않아 제작에 열의를 갖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사치품으로 배격된 탓에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 말기까지 상회자기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③시유
아두는 곳, 외부 몸체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성형, 접합한 후 투각하였다. 굽바닥에 내부 속을 부착하고 그 위에 몸통을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불대 역시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다. 이런 이중 투각기법을 사용한 것은 연적과 항아리 등에도 그 예가 남아 있다. 또한, 화분대(도 2D나 의자, 문방기명뿐 아니라 병이나 항아리에까지 투각 기법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첩화(貼花)는 양각과 달리 문양을 따로 성형, 조각한 뒤 몸체에 접합하는 것으로 역시 순조 이후에 자주 보인다 백자향꽂이 같은 것이 대표적 작폼이다. 첩화 기법은 이전에도 간간이 사용되었으나 순조 이후 중국자기의 모방 경향이 심화되고 장식적이고 화려한 분위기의 자기가 대세를 이룸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
장식 중에는 중국자기를 모방한 것도 보이는데, 청화로 여백을 메워 배경색으로 처리한 것이라든지 기명 전체를 청화나 철화, 진사로 채색한 것들이 그것이다. 정조 이후 북학의 열기가 점차 무르익어 가면서 이런 경향은 점차 심화되어 갔다. 예를 들어, 중국자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름문 장식이나 귀를 붙여 고리를 다는 것도 순조 이후 조선백자(도 27)에 자주 응용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중국의 골동 수장이나 사치품 수집이 붐을 이루
었는데, 도자기도 크게 한몫을 하였다. 그중에서 북학파 기록이나 김홍도의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只)에 등장하는 가요문자기(哥黑文磁器)에 대해 살펴보자. 가요자기는 원래 북송대 명요로 두터운 유약 아래 드물게 난 균열이 특징으로 중국의 경우 건륭제 때 복고풍의 자기 방조에 힘입어 골동으로서도 인기가 높았던 모양이다. 이를 제작하는 방법은 비교적 상세히 적혀있고 그리 어렵지도 않아서 제작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요문 자기 만드는 법. 일명 쇄기(昨器) 또는 빙문好湖文), 백급쇄(百級件), 시요(뜻黑)라고 한다. 형태를 만들어서 예리한 칼로 다듬은 후 햇빛 아래 두어 말리고 맑은 물에 한 번 담근 후 끄집어 내어 구우 면 균열 있는 무늬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춧빛이 나는 쇄기( 件器)를 만들려면 연지석(購、暗石: 일종의 붉은색 안료)을 사용하여 적신 후 철선(鐵線)으로 만든 포대에 쇄기 잔을 넣고 숭불예 놓아 굽는 다. 그리고 재차 연지석을 한 번 바르면 된다. 대개 선홍자기(宣紅磁器)는 소성 후 불에서 꺼내고 난 다음 별도로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약한 불에 구워 완성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불 속에서도 붉은 성질을 유지한다는 주사(朱妙)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요문 자기는 열문이 드문드문 난 것이 상품이요 너무 촘촘하게 난 것은 하품이다. 가요문 자기에 채색을 할 경우 사용하는 각종 채색법은 모두 자줏빛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한 연지석 방법에 따른다. 갈색을 내려고 한다면 오래 된 차 잎을 달인 물을 사용한다.
이러한 가요문자기(哥黑文磁器)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증 골동 중에 가요의 것을 상품으로 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도 당시 조선에서도 꽤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이후 중국자기에 대한 호상, 특히 골롱에 대한 수장과 감상 취미의 전개는 상품화폐경제와 생산력 발전에 따른 도시민적 취미 활동의 하나로 조선사회를 풍미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조선에서 제작된 가요자기는 아직 발견되지않았다.
다음 상회자기에 대해 살펴보면, 북학파의 기록에는 상회자기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이 조선에서 제작되 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규경의 기록에는 도기에서 유사 상회자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도기 위에 여러 도료와 먹, 아교를 사용해 동채(鋼彩)와 흑채 등 유사 상회자기를 만드는 방법인 것이다. 또한, 이희경의 『설수외사(雪炯外史)』에는 어떤 이가 상회 기법을 중국으로부터 배워 와서 조선에서 제작하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다.
항년에 어떤 사람이 연경(熊京)에 들어가 회자법(續磁法)을 배워 돌아와서 말하기를 \"생칠(生淡)과 용뇌(龍腦)를 섞으면 칠이 불이 된다. 그 물을 사용하여 채료에 넣어 칠하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들은 사람이 이를 시혐하였지만 칠이 물이 되지 않아 포기하였다고 한다. 내가 말하기를 \"그 방법에는 이치가 있는데도 이를 상세히 공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채료를 첨가하거나, 혹은 휘저어 고르게 섞는 비율이 있거나, 혹은 밀봉해서 수개월을 두어야 완성되는 것이다. 중국을 배우는 요즘 사람들은 모두 배움이 완전하지 않아 끝내 효과를 보지 못하니 이것이 한스럽다. 어찌 발분해서 다시 공부하여 만리의 바다를 멀다고 여기지 않는 일본인과 같이 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이 모두 상회자기(上績磁器)에 대한 선호를 말해 주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몰래 유입되던 많은 장식자기 특히 양자(洋磁)로 불리던 법랑채 자기들은 헌종 연간 연행(熊行)시 금조물명(禁條物名)에 오를 정도로 조선의 일부 계층에 게는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상회자기에 대한 동경이 강했음에도 왜 조선에서는 상회자기가 제작되지 않았을까? 우선 이희경의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안료 제작에 관한 기술 이전이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 수 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병 ·청 교체의 혼란기에 중국의 장인을 통하거나 직접 중국에서 그 기법을 익혀 제작에 성공하였지 만 우리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 같다. 중국내에서도 기술의 외부 유출을 꺼렸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술적 요인 외에도 지배층의 미의식에 적합치 않아 제작에 열의를 갖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사치품으로 배격된 탓에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 말기까지 상회자기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③시유
추천자료
 신학에 있어 철학적 역사의 의미와 한국기독교 역사인식의 반성적 성찰
신학에 있어 철학적 역사의 의미와 한국기독교 역사인식의 반성적 성찰 한국자본주의의 역사(한국현대사레포트)
한국자본주의의 역사(한국현대사레포트)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하여 논하고,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기술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하여 논하고,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기술 [언어지도] 유아문학의 가치와 유아문학의 역사(한국의 아동 문학사와 세계의 아동문학사) 및...
[언어지도] 유아문학의 가치와 유아문학의 역사(한국의 아동 문학사와 세계의 아동문학사) 및... 화장의 어휘와 화장의 기원 및 세계 화장의 역사와 한국 화장의 역사(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화장의 어휘와 화장의 기원 및 세계 화장의 역사와 한국 화장의 역사(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술의 기원과 어원 및 유래, 술의 정의와 역사 및 한국 술의 역사, 우리의 술 문화, 금주령, ...
술의 기원과 어원 및 유래, 술의 정의와 역사 및 한국 술의 역사, 우리의 술 문화, 금주령, ... [한국문화의 이해] 술의 기원, 한국 술의 역사_고대시대부터 해방 후까지, 식민지 시대의 주...
[한국문화의 이해] 술의 기원, 한국 술의 역사_고대시대부터 해방 후까지, 식민지 시대의 주... 미용예술사_화장의 개념, 화장의 목적과 시작, 한국의 전통 화장 역사, 개화기부터의 화장의 ...
미용예술사_화장의 개념, 화장의 목적과 시작, 한국의 전통 화장 역사, 개화기부터의 화장의 ... 한국어와 일본어, 그 역사적 상관성에 대하여 -우리말이 일본어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역사...
한국어와 일본어, 그 역사적 상관성에 대하여 -우리말이 일본어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역사... [문화인류학과 한국사회의 역사] 여성의 역사
[문화인류학과 한국사회의 역사] 여성의 역사 [문화인류학과 한국사회의 역사] 역사서술의 문화사적 전환과 신문화사 - 의례, 계급, 공동체 -
[문화인류학과 한국사회의 역사] 역사서술의 문화사적 전환과 신문화사 - 의례, 계급, 공동체 - 중급재무회계1)1.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원가, 현행원가, 현행...
중급재무회계1)1.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원가, 현행원가,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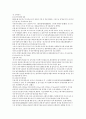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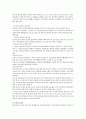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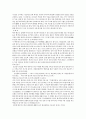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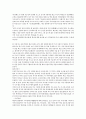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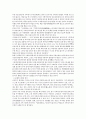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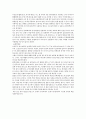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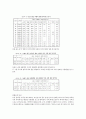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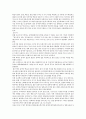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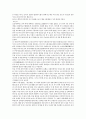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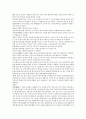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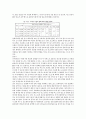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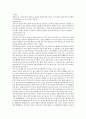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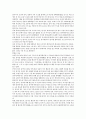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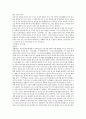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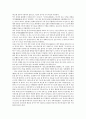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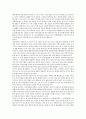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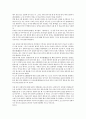









소개글